- 스위스의 크리스마스 연휴는 한국으로 치면 설 명절이다.
- 가족이 모두 모여 유대감을 확인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의 안녕을 기원하는 시간이다. 사람들은 종소리에 나쁜 기운을 날려 보내고 평화로운 요들을 들으며 새해의 행복을 예감한다.

스위스는 독일과 마찬가지로 매년 12월 31일을 질베스터(Silvester)라고 한다. 그 명칭은 로마가톨릭교회의 교황이었던 성 질베스터 1세(재위 314~335)가 선종(善終)한 날에서 유래한다.
질베스터클라우젠과 함께

클라우스란 산타클로스의 모태가 된 성인인 성 니콜라스를 가리킨다. 마을 사람들은 보통 예닐곱 명이 한 조가 돼 독특한 클라우스 분장을 한다. 분장은 그룹에 따라 아름답게 장식한 클라우스, 악마의 탈을 쓴 못생긴 클라우스, 나뭇잎 등으로 숲과 자연의 형상을 한 클라우스로 나뉜다. 이들은 어둑어둑한 새벽부터 이런 분장을 하고 무게가 최대 30kg까지 나가는 커다란 소 방울을 몸통 앞뒤로 메고 마을의 집집마다 들른다. 집주인 가족이 문 앞으로 나오면 둥글게 모여선 클라우스들은 딸랑딸랑 종소리를 시끄럽게 울려대며 악귀를 쫓아낸다. 이어 스위스 고유의 요들을 합창하고 집주인에게 새해 인사를 건넨다. 그러면 집주인은 답례로 와인이나 독한 술을 한 잔씩 대접한다. 이 집 저 집으로 방문이 이어지는 사이 클라우스들은 점점 거나하게 취해간다.
이날 나는 터이펜 마을에서 대여섯 그룹의 질베스터클라우젠을 마주쳤다. 색색의 전통의상을 입고 머리 위에는 다양한 모티프로 직접 제작한 거대한 모자를 쓰고 얼굴엔 마스크를 쓴 이들은 한눈에도 덩치가 크고 힘이 세 보였다. 무게 수십kg이 나가는 소 방울을 메고 몸을 흔들어 종을 치려면 마을의 장정들이 동원돼야 할 것이다. 빵집 앞에서는 전나무 잎과 가지로 옷을 만들어 입은 어린이 클라우스들이 요들을 합창하고 있었다. 빵집 주인이 어린이들에게 따뜻한 음료를 건네자 이들은 신나게 종을 치며 다른 집으로 향했다.
우리뿐 아니라 많은 스위스인이 이 행사를 보기 위해 이 마을로 모여들었다. 스위스에서 꽤 유명한 전통인데, 관광객을 끌 목적으로 꾸미는 인위적인 행사는 아니다. 인파 한가운데서 마주친 남편의 지인이 말했다.
“저 클라우스 중 한 명이 내 사촌이야. 이 고장에 살거든. 모자부터 마스크, 옷까지 직접 다 만들었대. 전나무로 만든 옷은 매년 새로 만들어야 해서 손이 많이 간다네. 그래도 이렇게 매년 하는 걸 보면 자기네 고장의 전통을 지킨다는 자부심이 대단한 것 같아.”
질베스터클라우젠의 정확한 기원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중세 말엽 시작된 것으로 전해진다. 질베스터클라우젠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이 1663년이라고 하니 이 지방에선 최단 350년 넘게 같은 새해맞이 풍습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가톨릭과 개신교 교도가 대다수인 스위스에서 새해맞이는 긴 크리스마스 연휴를 장식하는 대미라고 할 수 있다. 보통 유럽에서는 크리스마스 한 달 전인 11월 말부터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한다. 거리 곳곳에서 아기자기한 크리스마스 장식이 선보이고 라디오에서는 캐럴이 울려 퍼진다. 한국에서 추석에 송편을 찌듯 스위스 가정에서는 크리스마스 한 달 전부터 쿠키 굽는 달콤한 냄새가 진동한다. 스위스독일어로 구에츨리(Guetzli)라고 하는데 수십 종류의 쿠키를 미리 구워 넓적한 깡통에 담아놓고 크리스마스 때까지 간식 삼아 주섬주섬 집어먹는다.
구에츨리와 글뤼바인
12월 중 스위스 가정을 방문하면 독일어로 ‘아드벤츠칼렌더(Adventsk-alender)’라고 하는 대림절(待臨節, Advent: 성탄절 전 약 4주간의 교회 절기) 달력도 흔히 볼 수 있다. 가족끼리 재미 삼아 선물하는 것이다. 크리스마스 전 24일간의 날짜가 적힌 달력 모양에 날짜마다 창의적인 방식으로 작은 선물주머니가 하나씩 달려 있는데, 이 달력의 선물주머니를 매일 하나씩 뜯어보는 재미가 있다. ‘아드벤츠크란츠(Adventskranz)’라고 해서 네 개의 초를 월계관 모양의 전나무 장식과 함께 꾸며놓은 것도 집 안에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더한다. 크리스마스 전 4주간 일요일마다 초를 하나씩 켜기 시작해 크리스마스 직전 일요일에는 초 네 개가 모두 켜지게 된다. 대림절 풍습인데 지금은 종교에 상관없이 대다수 스위스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화다.유럽의 다른 나라들처럼 스위스에서도 큰 도시마다 광장에 크리스마스 시장이 선다. 노점에서 각종 군것질거리며 장식품 등을 파는데 단연 인기 있는 건 와인에 설탕, 계피, 오렌지 등 다양한 향료를 넣고 끓여 따뜻하게 마시는 글뤼바인(Glu··hwein)이다. 글뤼바인 노점 앞에는 늘 긴 줄이 늘어선다. 추운 겨울 날씨에도 스위스인들은 따뜻한 글뤼바인 한 잔을 들고 거리에 선 채로 삼삼오오 모여 수다를 떤다.
내가 사는 곳에서 가까운 장크트갈렌에도 매년 작은 크리스마스 시장이 열리는데, 여기서 글뤼바인을 마시고 있노라면 어김없이 아는 사람과 우연히 마주치게 된다. 그들과 서로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도 소소한 재미다. 서울과 달리 인구밀도가 낮은 도시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장크트갈렌이 고향인 남편은 여기서 글뤼바인을 마시는 동안 중학교 동창이며 옛 직장 동료들과 심심찮게 마주치고 서로 크리스마스 인사를 건넸다.
며느리의 쓸데없는 걱정
스위스인들은 보통 크리스마스이브인 12월 24일부터 1월 1일까지 연휴를 즐긴다. 공휴일은 12월 25일과 1월 1일뿐이지만 많은 직장인이 이때 일주일쯤 휴가를 붙여 쓰거나, 휴가일수 외에 추가로 휴가를 주는 후덕한 회사들도 있다. 어차피 일을 해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거래처들과도 연락이 잘되지 않는 파장 분위기이니 이때 아예 다 같이 쉬자는 것이다. 식당이나 상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도 과감히 가게 문을 닫고 느긋하게 연말 휴가를 즐긴다.예수가 탄생한 날이라는 본래 의미와 달리 한국에서 크리스마스는 연인들의 데이트를 위한 날인 양 상업적으로 변질됐다. 반면 유럽의 크리스마스는 종교적 의미와 더불어 철저하게 가족이 중심이 되는 연중 최대 명절이다. 한국의 설날과 추석처럼 스위스에서는 크리스마스에 온 가족이 고향의 부모님 댁에 모여 식사하고 선물을 주고받으며 밤늦도록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눈다.
서울에서 온 새댁인 나는 처음 스위스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냈을 때 아무래도 최대 명절이니만큼 며느리의 노릇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었다. 한국에서 ‘명절증후군’이라는 걸 수도 없이 들었으니 말이다. 그래서 호기심과 긴장이 섞인 마음으로 동서들을 관찰했다. 남편은 4형제 중 둘째다.
스위스에선 부부가 먼저 시댁에 들러야 한다는 암묵적 규칙은 없다. 대개 12월 24일, 25일에 하루는 남자 쪽 가족, 하루는 여자 쪽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한다. 사정이 안 되면 한 쪽 집만 가기도 한다.
2016년 크리스마스엔 막내 시동생 부부만 빼고 가족이 모두 모였다. 막내 동서인 나디야가 독일인인데 독일에 있는 친정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냈기 때문이다. 이 부부는 재작년 크리스마스에도 가족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연휴를 맞아 뉴질랜드로 여행을 갔다. 유교문화가 지배하는 한국의 명절에서라면 아들 며느리가 매년 명절마다 얼굴도 비치지 않으니 시부모님 속이 탈 노릇이지만 여기선 괘씸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물론 막내 시동생 부부는 평소에 시댁 식구들과 잘 어울리지만, 자기들만의 사정이나 계획이 있다면 굳이 명절에 참석하지 않을 자유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가족 구성원들도 이를 존중한다.
퐁뒤 시누아즈와 라클렛
명절이라고 해서 며느리가 시댁 어른들의 눈치를 봐가며 음식을 해야 할 필요도 없다. 한국처럼 차례를 지내거나 많은 친척을 맞느라 갖은 요리를 할 필요가 없고, 기본적으로 식구들끼리 먹는 저녁식사와 간식, 와인 정도만 준비하면 되니까 비교적 손님맞이가 간소하다. 저녁식사라고 해도 한국 음식처럼 손이 많이 가는 메뉴가 아니다. 샤브샤브와 비슷하게 얇게 자른 신선한 고기를 각자 꼬챙이에 꽂아 식탁 한가운데 놓인 끓는 육수에 담가 익혀 먹는 퐁뒤 시누아즈(Fondue Chinoise), 삶은 감자와 파인애플, 햄, 채소 등에 치즈를 얹어 녹여 먹는 라클렛(Raclette) 등이 크리스마스 대표 메뉴다.시댁의 주인은 시댁 어른들이고 우리는 식사에 초대받은 처지이기 때문에 시부모님께서 차려주시는 식사를 감사하게 맛있게 먹으면 된다. 나는 며느리이지만 손님이기도 하니까 손님으로 머물러야지 괜히 도와드린답시고 시댁 주방에서 이것저것 하려고 하면 오히려 시댁 어른들이 불편할 수도 있는 게 이곳 문화다. 그러니 상황을 봐서 접시를 식탁으로 나르거나 다 먹은 식기를 주방으로 옮기는 정도만 도와드린다.
이번 크리스마스 저녁식사는 남자들 몫이었다. 시아주버니가 애피타이저로 연어카나페와 샐러드를 만들고 디저트로 따뜻한 서양자두 소스를 얹은 시나몬 아이스크림을 준비했다. 남편이 본 메뉴인 볼로네제 파스타를 만들고 시동생 파비안은 다음 날 아침식사에 먹을 빵을 직접 구웠다. 시아버님은 식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시는 등 잡일을 도맡았다.
남편과 형제들이 요리하는 건 아무렇지 않지만 시아버님이 주방에서 일하시는데 한국인 며느리가 손 놓고 있으려니 괜히 가시방석인 건 어쩔 수 없었다. 몇 번 도와드리려 나서보았지만 번잡하니 거실에 앉아 있으란다. 손아래 동서인 알렉산드라는 아예 물어보는 시늉도 않고 소파에 앉아 맥주를 마시며 책을 읽었다. 시아버님의 파트너인 프레니 아주머니 역시 소파에서 독서삼매경. 내가 “우리 정말 아무 일 안 해도 괜찮아요?” 하고 묻자 프레니 아주머니의 우문현답이 돌아왔다. “평소에는 여자들이 더 많이 요리하잖니. 그러니 명절에는 남자들이 요리하는 게 당연하지. 어서 앉아서 계속 책을 읽으렴.”
성탄절에 친척들과 잘 싸우는 법

그런데 스위스 사람들도 크리스마스에 온 가족이 모여 화목한 시간만 보내는 건 아닌가 보다. 얼마 전 크리스마스 즈음에 스위스 신문 ‘존탁스차이퉁’에서 재미난 기사를 발견했다. ‘크리스마스에 친척들과 제대로 싸우는 법’을 다룬 기사였다. 명절 연휴에 온 친척이 모이면 이런저런 얘길 하다 감정이 상하고 급기야 싸움이 나기도 하는데, 이때 참지만 말고 제대로 반응해야 한다며 그 방법을 하나하나 조언하는 내용이었다. 역시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다는 생각에 웃음이 났다.
크리스마스 연휴를 휴가지에서 보내며 겨울스포츠를 즐기거나 느긋하게 휴식을 취하는 사람도 많다. 나도 지난 크리스마스는 겨울휴양지로 유명한 스위스 그라우뷘덴 주의 장크트모리츠(St.Moritz) 근처에서 시댁 식구들과 함께 보냈다. 시아버님께서 연말에 은퇴를 한 기념으로 해발 1800m 가까이 되는 이 산악마을에 아담한 휴가용 아파트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스위스인들 중에는 아름다운 산악지방에 휴가용 아파트를 두고 수시로 그곳을 찾아 겨울에는 근처에 널린 산비탈에서 스키를 타거나 여름에는 등산을 즐기고 신선한 공기 속에서 휴양을 하는 사람이 많다.
저녁식사 후에는 온 가족이 소파에 둘러앉아 함께 스위스의 크리스마스 캐럴을 불렀다. 나에겐 생소한 노래들이지만 시아버님이 특별히 준비하신 가사집 덕분에 웬만큼 따라 부를 수 있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같은 익숙한 멜로디도 있었다. 나는 가족과 다 함께 노래를 불러본 적이 없어 쑥스러울 줄 알았는데, 웬걸! 쑥스럽기는커녕 정말 재미있고 신이 났다. 집에서 가족과 함께, 혹은 마을이나 도시 한가운데에 서 있는 크리스마스트리 앞에서 준비된 반주에 맞추어 시민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캐럴을 부르는 것이 스위스의 풍습이다.
그렇게 분에 넘치는 느긋한 명절을 보냈다. 아름다운 풍광에 둘러싸여, 남자들이 차려주는 밥을 맛있게 먹고, 크리스마스트리 주위에 둘러 앉아 차를 마시며 책을 읽고, 틈틈이 시댁 식구들과 함께 산책을 나갔다. 평소에는 고요한 마을이지만 연휴를 보내러 온 스위스인들과 이탈리아인들이 산책길에 많이 눈에 띄었다.
도전의 연속인 외국생활
우리는 장크트모리츠에서 기차를 타고 30분쯤 떨어진, 이탈리아어로 하얀 호수라는 뜻의 라고 비앙코(Lago Bianco)에 가서 얼어붙은 호수 위에서 산책을 즐겼다. 해발 2230m의 산악지대에 자리한 면적 1.5km²의 이 호수는 여름에는 하얀 빛깔을 띤다고 하는데 당시엔 꽁꽁 얼어붙어 쪽빛을 띠었다. 얼어붙은 호수 위를 걷는 건 신나는 경험이었다. 남녀노소 모두 신나는 얼굴로 집에서 가져온 스케이트를 타거나 아이스하키를 즐기고 있었다. 눈 덮인 고봉들이 병풍처럼 둘러싼 아름다운 호수에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평화롭게 한 해를 정리했다.질베스터클라우젠의 시끄러운 종소리에 나쁜 기운을 날려 보내고 이들의 평화로운 요들을 들으니 새해에 더욱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늘 도전의 연속인 외국 생활이지만 도전할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서울대 사회학과를 나와 동아 일보 경제부·문화부, 동아 비 즈니스리뷰 기자로 일했다.
2015년부터 스위스인 남편과 스위스 장크트갈렌(St. Gallen) 근교에 산다. 스위스에서 자연을 벗 삼아 살면서 느낀 단상과 스위스 사회, 문화에 대해 블로그(blog.naver. com/sociologicus)에 글을 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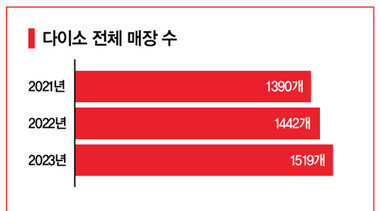

![[영상] 푸바오 살던 고향은 대한민국 경기도 용인시](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6/1f/62/dc/661f62dc1b69d273827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