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세기에 그려진 모란도.
별의별 예쁜 꽃이 많은 요즘에는 화중지왕에 대해 달리 볼 수도 있겠다. 이국적이고도 늘씬하고 농염한 꽃이 얼마나 많은가. 그렇지만 중국이나 우리나라 등 적어도 동아시아 안에선 이 모란을 꽃 중의 꽃, 미녀 중의 미녀로 쳤다. 당나라의 절세미녀 양귀비도 이 모란꽃에 비유했다. 그런데 적자(赤紫)색의 화려하고 풍성한 모란꽃을 보면, 경국지색이었다는 양귀비의 이미지가 대충 떠오르기도 한다. 늘씬하면서도 섹스어필하는 현대의 미녀와는 다르게 그려질 수밖에 없다. 르네상스 시대 화가들이 그린 베니스의 미녀들처럼 풍염한 미(美)가 아니었을까.
모란꽃을 얘기하는데 시성 이백(李白)의 시가 빠질 수 없다. 어느 봄날 당나라 현종이 양귀비와 함께 침향정에 나와 활짝 핀 모란꽃의 아름다움에 취했다. 난간에 기대앉은 양귀비를 보다가 어느 것이 사람이고 어느 것이 꽃인지 분간을 할 수 없었다. 당장 한림봉공 이백을 불러들이라 명했다. 술집에서 거나하게 취해 있다 창졸지간에 끌려온 이백은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했다. 한 바가지 물세례를 받고서야 정신을 차린 이백이 거침없이 붓을 놀리니 세 편의 시가 경각에 이뤄졌다. 그것이 저 유명한 청평조사(淸平調詞) 3수다. 그중 세 번째 시다.
꽃과 절세미녀가 서로를 보고 즐거워하니 (名花傾國兩相歡)
바라보는 군왕의 입가에 절로 웃음이 일도다 (長得君王帶笑看)
향기로운 봄바람은 온갖 근심을 날리누나 (解釋春風無限恨)
침향정 북쪽 난간에 기대어 서니 (沈香亭北倚欄干)
모란은 한자명으로는 ‘목단(牧丹)’이다. 모란이란 이름이 여기서 유래했다. 이명(異名)으로 ‘목작약(木芍藥)’이라고도 하는데 모양이 작약 꽃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모란과 작약은 둘 다 미나리아제빗과이지만 모란은 나무이고 작약은 풀이다. 이 둘은 꽃과 잎, 전체적인 생김새가 서로 비슷하다. 꽃피는 시기도 5~6월경으로 비슷하다. 각별히 관심이 있지 않으면 구분하기 어렵다. 그래서 초본(풀)인 작약을 일부러 초작약(草芍藥)이라고도 한다.
이리 봐도 예쁘고 저리 봐도 예쁘다는 뜻으로 ‘앉으면 모란, 서면 작약’이라는 말도 있다. 그렇게 모란과 작약은 우열을 가르기 어렵다. 그러나 화품의 품계를 정확히 따지면 작약이 모란보다 한 급 밀린다. 예부터 화왕을 모시는 재상이란 뜻으로 화상(花相)이라고 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화왕인 모란이 만인지상(萬人之上)이면, 화상인 작약은 일인지하(一人之下)다. 모란이 먼저 피고 작약이 그 뒤를 따라 피기 때문에 마치 재상이 왕을 보필하는 듯해서 그 품계를 정했다는 얘기도 있다. 어디까지나 옛사람들의 품평이다.

‘모란이 피기까지는’이라는 시로 유명한 영랑 김윤식 선생 생가(전남 강진읍 탑동마을)에 모란꽃이 활짝 폈다.
모란은 줄기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며 키가 1m 정도 자라는 작은 나무다. 5~8조각의 꽃잎들로 이뤄진 적자색 혹은 백색의 꽃은 피어서 일주일쯤 지나면 김영랑의 시 ‘모란이 피기까지는’의 시 구절에서처럼 ‘봄을 여윈 설움에 잠긴 듯’ 어느새 꽃잎이 뚝뚝 지고 만다.
전통적으로 모란은 청열양혈(淸熱凉血)하는 소중한 약으로 쓰였다. 청열양혈이란 피가 뜨거워져 솟구치거나(出血) 몸에 열이 나고(身熱) 피부에 반진이 돋는 증상들을 다스린다는 말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땀도 안 나는데 뼛속에서 열이 나는 듯한 증상 등에 모란을 쓴다. 이를 한의학에선 ‘음(陰) 속에 들어간 화(火)를 사(瀉)한다’고 한다. 육미지황환(六味地黃丸)이란 유명한 한약에 이 모란이 들어간다. 물론 약으로 쓰는 것은 목단피(牧丹皮) 즉, 모란의 뿌리껍질이다. 단단한 목심부를 제거하고 껍질을 말려 쓴다.
동의보감에는 모란의 뿌리껍질에 대해 “성질이 조금 차고 맛이 쓰고 매우며 독이 없다”고 쓰여 있다. 또 “배에 생긴 단단한 덩어리와 어혈을 없앤다. 피가 몰려 생긴 요통을 낫게 한다. 종기의 고름을 빼내고 타박상으로 인한 어혈을 삭게 한다”고 했다. 여성의 질환에 많이 쓰이는데 경맥(硬脈)이 막혀 생리가 나오지 않는 증상과 산후에 일어나는 제반 기혈(氣血) 병을 치료한다.
우선 모란의 뿌리껍질, 목단피는 항균소염하는 효능이 뛰어나다. 티푸스나 대장균, 포도상구균, 이질균, 콜레라균에 항균작용을 한다. 또 원인이 무엇이든 고열로 인한 토혈이나 코피, 혈뇨, 항문의 출혈 등에 효과가 있다. 과로로 인한 요통과 관절통, 타박상으로 어혈이 생긴 증상에도 좋다. 청혈진정(淸血鎭靜) 효과가 있어 신경성 두통에도 쓸 수 있다. 또 만성비염이나 비갑개의 종창에도 치료효과가 있다. 류머티스열의 초·중기에도 쓴다.
삼국사기의 선덕여왕 이야기에서도 나오지만 모란은 원래 향기가 없는 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난초의 향기를 유향(幽香)이라 하고 매화의 향기를 암향(暗香)이라 하면서 모란의 향기는 이향(異香)이라 한 까닭은 별다른 향기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꽃은 향이 없는데 반해 뿌리껍질인 목단피는 향이 진하다. 끓여놓으면 그 냄새가 고약할 지경이다. 비위가 약한 이는 냄새를 맡는 것도 무척 힘들다. 목단피가 들어가는 약은 약맛도 조금 성가셔지기 때문에 다른 약과 배합하는 데 신경을 쓰게 된다. 그래서 단방(單房)으로 목단피를 쓰기는 좀 어렵다. 또 약성이 뚜렷한 약재이므로 더더욱 함부로 쓸 수 없다.
모란에는 낙양화, 백량금(百兩金), 부귀화(富貴花)라는 이명이 더 있다. 낙양화는 중국의 낙양에서 핀 모란이 가장 아름답다 해서 붙은 이름이라고 한다. 그런데 북송 때 문인 구양수의 ‘낙양목단기(洛陽牧丹記)’에는 모란이 낙양화가 된 전설이 좀 다른 버전으로 나온다. 절대권력을 과시하던 당나라의 여황제 측천무후가 어느 겨울날 꽃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내일 아침 상원(上苑)에 놀러갈 테니 늦지 말고 모두 꽃을 피우라.”
이 명령을 나무판에 써서 걸어두자 다음 날 아침 모든 꽃이 무후의 명령대로 일제히 폈다. 그런데 오직 꽃의 왕 모란만이 오만하게 따르지 않았다. 불을 때서 억지로 꽃을 피우게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화가 난 무후가 상원의 모란을 모두 뽑아 낙양으로 추방해버렸다. 이 때문에 모란을 낙양화로 부르게 됐는데 그때 모란이 불에 그을린 탓에 줄기가 검은빛을 띠게 됐다고 한다.
백량금은 모란이 황금 100량만큼이나 귀하다는 데서 나온 것이고, 부귀화는 부귀를 가져다주는 꽃이라는 뜻이다. 우리나라 조선 후기의 민화에도 이 모란꽃이 단골로 나오는데, 역시 부귀영화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왕가의 하연(賀宴)을 비롯해 서민의 전통 혼례복이나 심지어 신방(新房)의 병풍에도 이런 의미로 모란이 많이 그려진다.
화왕 모란과 함께 짝을 이루는 꽃의 재상 작약(芍藥)도 모란 못지않게 꽃 모양이 화려하고 넉넉하다. 그래서 우리말 이름도 함박꽃이다. 붉은색, 분홍색, 백색 등으로 꽃이 피는데 변종이 많아서 꽃 색도 무척 다양하다. 중국에선 서기 3세기경인 진(晉) 대에 이미 관상용으로 재배되었다 한다. 모란보다 그 역사가 더 오래됐다고도 전해진다.
선비 닮은 예기(藝妓)의 꽃
모란이 풍염한 절세미녀나 군주라면 작약은 재주 있는 선비나 예기(藝妓)를 연상시킨다 할까. 원래 작약의 작(芍)은 얼굴이나 몸가짐이 아름답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한다. 흔히 작약의 뿌리를 약용할 때 백작약과 적작약으로 나누는데 이는 당나라 때 본초습유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전에는 약으로 쓸 때에 그다지 구분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백작약은 보혈(補血)약으로 쓰며 적작약은 목단피와 같은 청열사화약으로 쓴다. 백과 적의 구분은 일단은 꽃 색깔로 하지만 약재로 쓸 때는 흔히 외피를 벗겨내지 않은 것을 적, 벗겨낸 것을 백으로 쓴다.

깊은 산중에 핀 산작약.
그러나 원예종으로 심기 이전부터 우리나라 산야에도 자생하는 작약이 있었다. 그동안 마구잡이로 채취한 탓에 요새는 깊은 산중에서나 귀하게 만날 수 있다.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2급 식물로 지정돼 함부로 채취하면 큰일 난다. 잎사귀나 뿌리의 생김새가 재배 작약과는 약간 차이가 난다. 꽃도 홑꽃으로 다르다. 적색과 백색의 2종이 있는데 필자의 경험으로 보면 백색이 흔히 보이고 적색의 꽃이 귀하다.
작약에 관련된 아름답고 애틋한 전설이 하나 있다. 중국 쓰촨성에 한 선비가 홀로 살고 있었는데 만나는 사람도 없이 하루 종일 책이나 읽고 지내니 적적하기 그지없었다. 매일같이 대하는 것이 책이고 가끔 뜰에 나가 작약 꽃을 보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집에 미모의 처녀가 찾아왔다. 그녀는 선비의 시중들기를 간청했다. 처녀는 하루 종일 집안일을 도맡아 하면서 현숙한데다 교양도 있고 글재주도 있어 어느 사이 선비의 말동무가 됐다. 그렇게 이 처녀와 밀월같이 달콤한 생활을 하게 됐다.
그러던 어느 날 전부터 알고 지내던 유명한 도인이 선비를 찾아왔다. 그래서 처녀를 찾아 인사를 시키려는데 아무리 찾아도 기척이 없었다. 선비는 처녀를 찾아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담벼락에 몸이 스며든 채 얼굴만 내민 그녀를 만났다. 처녀의 말이 자신은 작약의 화정(花精)인데 선비를 흠모해 오래 모시려 했으나 도인이 와서 정체를 간파당해 숨게 되었노라고 했다. 더 이상 인간세상에서 선비와의 인연을 지속할 수가 없게 되었다면서 서서히 얼굴이 담벼락 안으로 들어가더니 종내 모습을 감추고 말았다. 선비는 망연자실하니 있다가 그 후 수년을 넋을 잃은 이처럼 지냈다.
한방에선 작약의 뿌리를 약용한다. 동의보감을 보면 “성질이 평하고 약간 차며 맛은 시고 쓰다. 조금 독이 있다” 했다. 주된 효능은 “몸이 저리고 쑤시고 아픈 것(血痺)을 낫게 하고 혈맥을 잘 통하게 하며, 굳어지고 뭉친 내장근과 골격근을 정상화하고(緩中), 악혈(惡血)을 흩어지게 하고, 종기를 가라앉힌다. 또 극심한 복통을 멎게 한다. 일체의 여성 병과 산전 산후 제병에 쓴다. 생리가 잘 나오게 하며 치루와 등창 등에도 쓴다” 등이다.
작약, 세상 모든 약초의 절반
작약을 잘 쓸 수 있다면 한의학의 절반을 정복한 것이라는 얘기가 있다. 사실 한의학의 절반이라기보다는 광대무변한 약초의 세계에서 그 절반이 아닐까도 싶다. 그 정도로 작약은 온갖 질환에 쓰여서 중요하고도 큰일을 해내는 약물이다. 감기에서부터 중풍이나 각종 내상질환의 치료까지 작약을 빼놓고는 한의학을 이야기하기 어렵다. 여기서는 작약이 펼치는 치유의 세계를 간신히 곁눈질하는 정도로 만족해야겠다.
작약은 적작약과 백작약으로 나눠서 그 약성을 따지지만 솔직히 적백의 구분이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다. 우선 작약의 가장 큰 효능은 보혈(補血)이다. 혈허(血虛)로 인한 모든 병증에 쓰인다. 그러나 단독으로 써서는 큰 효과가 없다. 당귀나 숙지황 등 다른 보혈제와 가미해 쓸 때 효과가 있다.
또 하나의 효능은 통증과 경련을 그치게 하는 지통지경(止痛止痙)의 효능이다. 그렇다고 작약이 진통제이거나 항경련제인 것만은 아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급만성의 통증질환 및 경련증상에 대단히 효과가 좋다. 이를테면 위경련 등에 작약을 위주로 다른 약재를 적절히 가미하면 금방 효과를 본다. 다리에 쥐가 나는 증상에도 작약이 즉효를 보인다. 복부의 경련성 통증에도 다량의 작약을 쓰면 해결된다.
|
일반적으로 적작약의 효능으로 분류되지만, 작약은 열로 인한 출혈증상을 치료하는 데도 우수한 효과가 있다. 또 어혈을 흩뜨리므로 뇌졸중에 의한 편마비나 폐색성혈전혈관염 등에 작약이 효과가 있다. 또 여성의 월경기나 산후병들을 치료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약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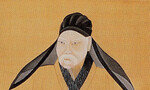








![[영상] 미친 ‘사과 값’의 나라, 생산지부터 마트까지 ‘사과 길’ 추적하다](https://dimg.donga.com/a/570/380/95/1/carriage/MAGAZINE/images/shindonga_home_top_2023/6621b46f046ed273827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