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쇳물을 쏟아내고 있는 포항제철소의 고로
지난 7월3일은 포스코의 고로(포항 1기)가 그 첫 쇳물을 토해낸 지 꼭 30년이 되는 날이었다. 이날 경북 포항제철소에서는 박태준 명예회장, 이구택 회장, 1기 설비 참여 근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제철소 역사관 개관식이 열렸다. 국내 최초로 용광로에 불을 지핀 화입봉과 초기 근무복, 부실공사로 폭파된 포항 3고로의 콘크리트 파편 등 대한민국 ‘철의 역사’를 보여주는 물품 600여 점이 전시됐다.
포스코의 역사는 곧 한국 산업화의 역사이며 그 뿌리를 든든히 떠받쳐온 노동의 역사이기도 하다. 영일만 모래펄의 맨주먹 신화가 두고두고 우리에게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그 속에 ‘생존을 위한 근대화’를 향한 전(前) 세대의 강렬한 열망과 고투가 서려 있기 때문일 것이다.
대일청구권 자금으로 시작
포스코 이전 우리나라에는 철강산업이란 것이 사실상 전무했다. 제선(쇳물 만들기), 제강(강철 만들기), 압연(금속가공) 시설을 갖춘 몇몇 군소업체가 있었으나 거의 가동이 중단된 상태였다. 전후 복구사업으로 철강재 수요가 급증하자, 정부는 일관(종합)제철소 건설을 위한 각종 계획을 수립하기에 이르렀다.
첫 시도는 1958년 자유당 말기에 있었다. 강원도 양양에 종합제철을 지으려 했지만 외자 도입 실패와 4·19 등 정국 혼란으로 인해 무산됐다. 민주당 정부 또한 대한중공업을 사업주체로 해 동해안에 제철소 건설을 계획했으나 역시 실패했다.

연 1580만t의 생산체제를 갖춘 광양제철소
이때 뜻하지 않은 돌파구가 마련됐다. 농업지원분야에 사용키로 돼 있던 대일청구권 자금을 전용하고, 일본으로부터 차관과 기술을 제공받기로 한 것이다. 1970년 4월1일, 마침내 포항 1기 설비가 착공됐다.
제철소 건설은 제품을 생산하는 순서에 따라 제선공장, 제강공장, 압연공장, 열연공장의 순으로 건설하는 것이 상례다. 이를 포워드(Forward) 방식이라 한다. 그러나 포스코는 역으로 열연공장부터 건설하는 백워드(Backward) 방식을 택했다. 압연·제강 공장은 생산공정이 짧아 이를 먼저 완성하면, 외국으로부터 반제품을 수입해 완제품을 만들어 공장 건설에 재투자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포스코는 1기 총 22개 공장설비 가운데 1972년 7월 중후판공장을 준공하고 같은 해 10월 열연공장을 준공했다. 그리고 1973년 6월9일, 우리나라 최초의 용광로를 준공해 첫 쇳물을 생산했다. 같은 달 19일 분괴공장과 강편공장을 준공함으로써 제선·제강·압연·지원 등 총 22개 공장 및 설비로 구성된 종합제철 일관공정을 모두 완성할 수 있었다. 그리고 1973년 7월3일, 마침내 포항제철소에서 포항 1기 설비의 종합준공식을 가졌다. 연인원 581만명, 경부고속도로 건설비용의 3배에 해당하는 1205억원의 자금을 쏟아 부은 결과물이었다.
이후 포스코는 포항제철소 2~4기, 광양제철소 1~4기, 광양 5고로 증설 등 30여 년 동안 끊임없이 설비를 확장해 왔다. 1기 준공 원년 44만9000t이던 조강 생산량은 올해 2800만t으로 늘어났으며, 2005년에는 3000만t 시대를 열 것으로 보인다.

제철소 건설 현장을 찾은 박정희 대통령
포스코의 활약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철강생산국으로 도약했다. 포스코가 그동안 생산한 열연코일은 1억7124만t으로 지구 둘레를 289바퀴 돌 수 있는 양이다. 후판제품은 여의도 63빌딩 2331개를 건설할 수 있는 5376만t, 선재제품은 지구에서 달까지를 218회 왕복할 수 있는 3050만t을 생산했다. 냉연제품의 경우 소형승용차 2억8073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1억843만t을 생산했다.
회사 설립부터 1986년까지 정부가 출자한 종자돈 2205억원(현재 가치 환산 4조8000억원)에 대해서는 민영화되던 2000년 10월 초까지 배당 2744억원, 주식매각 및 양도 3조6155억원 등 총 3조8899억원(현재 가치 환산 6조9000억원)을 되돌려줬다. 지금까지 납부한 세액만 5조5640억원에 달한다.
포스코의 성장은 끊임없는 공기 단축과 그를 위한 살인적 철야 작업, 신기술 개발과 정부의 전폭적 지원에 힘입은 바 크다. 특히 “민족의 목숨 값이라 할 수 있는 대일청구권 자금이 바탕인 만큼 실패하면 사표가 아니라 죽음으로 사죄한다”는 각오로 뛴 초기 경영진 및 근로자들의 사명감과 불굴의 의지는, 오늘날 포스코를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규모·품질·가격경쟁력을 자랑하는 기업으로 성장케 하는 정신적 밑거름이 됐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장인 이원표(60) 부사장은 “1기 고로의 출선구에서 용암처럼 시뻘건 쇳물이 힘차게 흘러나오던 때의 감동을 잊을 수 없다”며 “한여름 에어컨 시설도 안 된 공장에서 더운 숨을 몰아쉬며, 24시간 3교대로 고투를 벌이던 초기 직원들의 노고가 오늘의 포스코를 있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과 일본을 넘어

1973년 6월9일, 첫 출선을 지켜보던 직원들이 만세를 부르고 있다.
특히 포스코의 높은 수익성은 서구와 일본 철강회사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2002년 기준으로 일본의 신일본제철이 150억달러의 매출에 영업이익은 3억7900만달러에 그친 반면, 포스코는 매출액은 99억달러지만 영업이익은 15억4600만달러로 오히려 더 많았다. 1999년 모건스탠리는 세계 철강업체 중 포스코의 생존가능지수를 가장 높게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포스코의 미래가 꼭 장밋빛인 것만은 아니다. 당장 내년부터 세계무역기구 합의에 따라 철강제품에 대한 관세장벽이 철폐된다. 이에 따라 2~3년 내 중국의 값싼 철강제품이 몰려나오는 ‘차이나 쇼크’가 예상된다. 세계 주요 철강기업이 국경을 넘나드는 인수합병으로 덩치를 키우고 있는 것도 우려할 일이다.
1990년대 말 철강 생산량 1위를 차지하던 포스코는 현재 5위로 내려앉은 상태다. 외국에 의존해온 친환경 기술을 자체 개발해야 하는 부담도 크다.
이와 관련 포스코는 지난 5월부터 시험가동에 들어간 60만t 규모의 파이넥스 설비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파이넥스 설비는 철광석과 유연탄을 가루 형태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제철소 환경오염의 주범인 덩어리화 과정을 생략해 환경친화적 생산공정 달성과 비용 절감을 동시에 기할 수 있는 최첨단공법이다.
포스코는 올해 민영화 3년째를 맞았다. 기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 지배구조 개선에 모범을 보여야 하는 과제 또한 떠안고 있다. 국내외 투자자들의 감시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경영 환경이다. 자본·기술·환경의 쉼없는 도전. 세계는 포스코의 응전을 기다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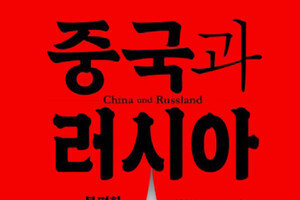




![[전쟁이 남긴 빈자리①] 가족 사라진 뒤 멈춘 삶... 14년째 기다리는 사람들](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40/ab/fb/6940abfb23c4a0a0a0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