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아리랑’ 제작 도중 제작진이 기념사진을 찍었다. 가운데 아이를 안고 있는 사람이 춘사 나운규.
‘학내시위 및 학생지도 대책마련’을 위한 회의는 무거운 분위기 속에 이어졌다. 뒤늦게 자연과학대학의 김 교수가 헐레벌떡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는 평소 좀 눈치 없는 행동을 하기는 했지만, 교수로서의 진중함과 엄격함을 충분히 갖춘 성실한 학자였다.
김 교수 : (이마의 땀을 훔치며) “헉헉…, 선생님들, 크 큰일, 큰일 났습니다!”
교무처장 : (긴장한 목소리로) “아니, 김 교수 무슨 일입니까? 긴급조치 10호라도 내려졌습니까?”
김 교수 : “그, 그 글쎄 나훈아랑 김지미가 결혼한답니다!”
몇몇 교수 : (입을 딱 벌리고) “아 아니, 저, 정말입니까?”
또 다른 몇몇 교수 : (벌러덩!)
한 대학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한다. 1976년 여름 나훈아-김지미의 결혼 발표는 또 다른 긴급조치의 발동보다, 아니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충격적인 일이었던 것이다. 미장원에 모인 동네 수다쟁이 아줌마들에게뿐 아니라 교무회의에 모인 근엄하신 교수님들에게도 말이다.
나훈아와 김지미가 누구던가. 그들은 1960년대와 70년대를 대표하는 스타 중의 스타로 한국을 대표하는 가수요 영화배우였다. 나훈아는 1947년생, 뒤늦게 군대에 가 제대 직전에 이혼한 그는 당시 서른 살이었다. 역시 이혼녀였던 김지미는 나훈아보다 일곱 살이 많은 연상이었다. 두 사람은 세인의 눈을 피해 몰래 연애를 하며 갖은 연막을 다 피우다 전격적으로 결혼 발표를 한 것이다. 당시 톱스타의 사생활이야말로 긴급조치만큼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이다.
얼마 전 남이섬에 다녀온 사람의 말을 들으니 요즘 남이섬은 일본인 여성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 모두 ‘후유노소나타’, 즉 ‘겨울연가’의 인기 때문이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겨울연가’의 주연 배우 배용준, 욘사마의 인기 덕분이다.
‘겨울연가’가 만들어낸 한류(韓流)의 효과는 단지 관광수입의 증가에 그치지 않는다. 이제 적지 않은 일본 여성이 한국 남자와 사귀고 싶어할 뿐 아니라, 결혼까지 하고 싶어 몸살이 날 지경이라고 한다. 배용준이 드라마에 심어놓은 이미지에 홀려 일본의 미혼·기혼 여성들이 한국 남자에 대해 환상을 품게 된 것이다. 한국 남자는 다 ‘둔땅이’(극중 남자 주인공 ‘준상이’의 최지우식 발음)처럼 다정하고 순정적일 거라는. 일본 여성들이 한국 남자에 대해 집단적 호감을 보인 것이 처음은 아니지만 이번 신드롬은 그 어느 때보다도 광범위하고 강력하다고 한다(유재순, ‘한국 남자에게 혹하는 일본 여성들’, ‘주간조선’, 8월20일자 참조).
‘한국 남자 = 둔땅이(?)’
일본 여성들은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다정다감하고 순정적인 남성상을 일본 남성에게서는 발견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한다. 그러나 그런 남성상을 찾기가 일본에서만 어렵겠는가? 기실 그 ‘둔땅이’는 한국 남자의 평균과는 정반대되는 인물일지도 모른다.
추상적인 동경의 대상인 그런 남성은 드라마 속에만 존재한다. 현실에선 불가능한 환상에 사로잡혀 그들은 배용준을 욘사마로 부르게 된 것이다. 첫사랑의 아련함과 희생적 사랑에 대한 추억이 향하는 자리에 준상이라는 이름의, 또는 배용준이라는 이름의 남성이 있고, 그는 하필 한국인인 것이다.
욘사마 같은 애인이 있었으면 하고 소망하는 일본 여성들의 환상이야 물론 한국 남자 한두 사람만 만나보면 깨질 것이지만 ‘겨울연가’가 유발한 경제효과만은 이만저만한 게 아니다. 관광수입만 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니, 그 외의 유·무형 경제효과까지 합친다면 스타 한 사람이 만들어낸 ‘대박’치고는 어마어마한 경제적 이득을 챙긴 것이다. 도대체 스타가 무엇이관대?
가히 우리는 스타를 먹고 산다고 할 만하다. 단지 스타가 유발하는 경제효과가 대단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끝없이 스타를 이야기하고, 스타를 즐기고, 스타를 통해서 사고하고, 스타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뜻이다. 스타가 만드는 경제효과는 이런 우리의 삶을 경제적으로 표현한, 그야말로 부대효과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스타를 소비하고 동경하고, 스타에 매달리는 향(向)스타성은 물론 여성에게서 더 강력하게 나타나고 젊은이에게서 더 강하지만, 현대를 사는 남녀노소에게 이런 현상은 거의 예외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언제부터, 어떻게 스타는 그야말로 별이 되어 우리의 하늘 위에 떴는가? 과연 스타는 어떤 표상인가? 그들은 누구인가?
스타가 탄생하기 전에도 인기인과 유명인은 있었다. 물론 지도자나 영웅도 있었다. 그러나 스타는 그들과는 분명히 다르다. 어디까지나 스타는 대중매체에 의해, 대중매체를 위해, 대중매체에서 만들어지는 유명인이자 영웅이며, 자본주의적으로 조직된 예술영역에서 나타났다. 스타는 철저히 현대적인 현상인 것이다.
한국에서도 창극과 판소리 및 신파극을 포함한 무대공연 예술은 1900년대부터 진작 발전하고 있었고 인기인도 배출되고 있었다. 예컨대 근대 판소리 5대 명창이라 일컬어지는 송만갑, 이동백, 김창환, 김창룡, 정정렬 등이 있었고, 전통예술 분야가 아닌 연극 분야에서도 배우들이 세인의 관심을 모으기 시작했다. 한국 연극·영화사에서 영화는 연극에 빚을 많이 졌다. 초기 영화계의 중요한 인적 자원 대부분이 연극계로부터 인입되었기 때문이다. 또 연극 이외의 문학이나 음악 분야에서도 유명인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스타 = made in USA’
그러나 진정한 ‘스타’는 좀더 늦게 나타났다. ‘스타’의 원산지는 미국이다. ‘스타 시스템’ 자체가 할리우드 영화 제작 시스템과 흥행 경쟁체제로부터 생겨났기 때문이다. 영화사가(史家)들은 할리우드에서 ‘스타’가 최초로 등장한 해를 1909년으로 본다. 그 이전까지는 배우의 이름이 영화의 자막에 나오지도 않았다 한다.
당시 할리우드 영화계 후발주자이면서 독립영화제작사의 하나였던 페이머스 플레이스사의 프로듀서 칼 램믈은 대기업에 맞서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개발한다. 자신이 제작한 영화의 흥행 성공을 위해 플로렌스 로렌스라는 여배우를 다른 회사로부터 스카우트한 뒤, 신문에 그녀가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거짓 루머를 흘린 것이다. 신문들이 이를 보도하자 그는 그 보도가 메이저 영화사들이 퍼뜨린 거짓말을 그대로 실은 것이며 플로렌스 로렌스는 자사에서 만든 영화에 출연할 것이라고 발표한다. 바로 이 사건이 플로렌스 로렌스라는 이름을 세인에게 각인시켰고 이후 그녀가 출연한 영화는 크게 히트했다.
이때부터 스타는 영화 흥행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었고, 스타라는 사회 문화적 현상은 할리우드 영화가 세계로 퍼져나간 것처럼 곧 전세계로 번져나가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다. 한국 신문에서 ‘스타’라는 단어가 실린 것은 1920년대 중반 이후이다. 동아일보는 1925년 11월27~29일 ‘영화계 진화(珍話)’라는 제명하에 할리우드 배우에 관한 외신 가십을 사흘 연속으로 실었고, 같은해 12월1일엔 ‘영화배우계 현재’라는 기사를 실었다. 한국 영화계를 이끌고 나갈 ‘조선배우학교’ 배우들과 ‘합자회사 토월회’의 소속 배우들을 소개하는 내용이었다. 이 기사들은 그 무렵 배우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스타를 다룬 전형적인 연예기사는 아니었다. 기사에서 다룬 인물들이 아직 제대로 된 의미의 ‘스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드디어 같은해 12월5일자 연예면에 ‘스타’라는 말이 쓰인 기사가 나타난다. 제목은 ‘지상최행복(地上最幸福) 스타 생활’. 역시 할리우드의 대스타들을 다룬 외신 인터뷰 기사를 번역한 것이었다. 이 기사는 일번타자로 ‘일신(一身)으로 이신(二身)의 생활, 정말 자기와 ‘스크린’의 자기 - 빠렌치노씨 감상록’을 다루었다.
루돌프 발렌티노의 인터뷰
기사의 주인공인 루돌프 발렌티노는 1920년대를 대표하는 할리우드 남자 스타였다. 이탈리아인 아버지와 프랑스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이민 출신의 그는 갖은 고생을 하다 스타가 된다. 검은 머리와 갈색 눈을 가진 전형적인 라틴 미남이던 그는 ‘춘희’ ‘시크’ 등에 출연하며 여성 관객의 사랑을 한몸에 받다가 인기 절정이던 31세의 젊은 나이로 짧은 생을 마감했다.
이 인터뷰 기사는 스타의 존재 방식에 대한 전형적이고도 흥미로운 문제를 제기한다. 인터뷰에서 발렌티노는 “판(fan) 제씨가 스크린으로부터 친해지신 (…) 극히 로맨틱한 사나이로 열정적 사랑에 살아서 적을 무찌르고 마침내 사랑하는 애인을 자기 품에 안고야 만다든가, 혹은 구차한 운명에 쪼들려 이것을 대항하다 못하여 영웅적으로 최후를 마치는” 스크린 속 발렌티노가 있고, “가난한 이민자 청년이다가 대단한 노력으로 남의 갑절씩이나 행복을 누리는 청년으로 팬들이 별로 만나보지 못한” 실제 인물이 있다고 말한다.
이 실제 인물과 극중 인물 사이의 거리는 꽤 먼데, “영화에 나타나는 젊은 발렌티노를 참말 발렌티노와 같이 봐주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스크린의 발렌티노가 진짜 발렌티노보다 세상의 관심을 더 많이 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구태여 참말 발렌티노를 들추어 보이고자 생각지 않습니다”라고 말한다. 영화 속에서 열정적이고 낭만적인 연인이거나 비극적인 영웅인 발렌티노와 현실의 발렌티노는 차이가 있지만, 현실의 모습을 다 드러낼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다.

스타는 뛰어난 외모와 카리스마를 가진 인물인 동시에 엄청난 부를 누리는 반신(半神)적 존재로 인식된다. 사진은 세계적 미남배우 그레고리 펙이 열연한 영화의 한 장면.
그런데 스타는 하늘의 별로 저 천상에 박혀, 신화적인 존재로만 있을 수 없다. 한 작품으로 그럴싸한 이미지와 인기를 얻었다 해도 다음 작품에 실패를 무릅쓰고 출연해야 하고, 허다한 기자들을 만나서 인터뷰에 응해야 할 뿐 아니라, 세인의 편견과 입방아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 모두가 그저 반만 신(神)일 뿐인 그들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과정이다. 게다가 극중의 이미지로 얻은 페르소나와 다른 그의 실체는 알려지게 마련이다. 양자 사이의 거리야말로 그 배우나 스타의 스타성을 결정짓는다. 과연 그 거리란 무엇일까?
1925년 동아일보의 루돌프 발렌티노 기사 아래에는 그보다 더 흥미로운 조견표(早見表)가 하나 붙어 있다. 앞에서 말한 스타의 본질-별이면서 별이 아닌 -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조견표는 유명한 할리우드 영화배우의 ‘전신(前身)’이 무엇이었는가를 적은 일람표였다. 그들의 전신은 평범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운동선수, 주부, 남공(男工), 여공(女工), 이발사, 기자 등은 비교적 그럴 만하거나 평범한 축에 속한다.
그런데 몇몇 배우의 전신은 평범의 범위를 좀 넘어서 있다. 동아일보 기사는 이를 당대 조선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흥미로운 용어들로 설명하고 있는데, 특히 여배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포라 네리그라는 유명한 여배우는 ‘기생 포주’였고, 로시 캐쉬는 ‘불량소녀’, 아리쓰 듸리는 ‘귀부인’, 부 니엘은 ‘음지발화(陰地發花)’, 리의 안 쉬는 ‘여승’이었다. 한편 나라리 코코는 ‘양첩(洋妾)’, 마게리트센은 ‘여주의자(女主義者)’, 마리야 야코비니는 ‘미망인’, 마치 폐라미는 ‘상인여식(常人女息)’, 니타 날는 ‘노기생(老妓生)’, 아라나 지모바는 ‘노처녀’였다.
이 기사가 추구하는 것은 그들의 스타성과 실제 사이의 거리가 불러일으키는 흥미이다. 내가 좋아하는 스타의 전직(前職)이 무엇이었는지가 나에게 불러일으키는 효과는 무엇인가? 또는 청순가련형 인기 여배우의 전직이 룸살롱 종업원이었다거나, 이지적으로 생긴 여배우가 기실 머릿속이 텅텅 비어 있다거나 하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불러일으키는 효과는 무엇인가?
여배우의 前職은 포주(?)
긍정적인 이미지와 의미를 적극적으로 구성해내지 못하는 캐릭터는 절대로 스타가 될 수 없다. 사람들은 드라마나 영화에 등장하는 배역의 이미지와 캐릭터를 실제 인물의 이미지나 캐릭터와 혼동한다. 관객이 많이 배웠거나 적게 배웠거나 관계없다. 극중에서 멋지고 영웅적이고 호감 가는 역할을 한 사람은 좋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기 쉽다. 환상을 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환상을 환상만으로 간직하려 하지 않고, 환상인지 실제인지 확인하려 든다는 것이다. 그 확인 작업을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사람들이 신문과 잡지사 연예부 기자들이고 파파라치들이며 때로는 팬클럽이며 일상적으로 연예계 뉴스를 전파하는 입소문 전달자들이다.
스크린이나 브라운관에 나타난 그들의 이미지가 실제와는 다르다는 것, 한편 그들의 성공과 이미지가 그저 신화(神話)나 허구(虛構)이며 ‘기획사’나 매니저와 미디어의 마력에 의해 창조된 것일 뿐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일은 과연 즐거운 일인가? 별로 즐겁지 않다면 왜 그런 일을 꼭 해야만 하는가?
연예계 스타를 다루는 기사는 모두 관객과 팬이 품고 있는 일반적인 인상, 즉 스타가 소지한 페르소나에서 출발해서 그 환상을 재확인하거나 또는 그 뒷면을 허물거나, 반대로 그 신비감이나 긍정적인 이미지를 높이는 임무를 띠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접 그 스타를 인터뷰해야 한다. 스타는 직접 연예오락 프로그램에 나와서 제 얼굴과 음성으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한다.
환상과 실재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충격과 흥미는 커진다. 우리는 때로 배신감을 느끼면서 그 기사에서 절대로 눈을 떼지 못한다. 청순하고 귀여운 것으로 인기를 모았던 C양이 무명 시절에 찍은 비디오가 있다거나 숭고한 인술을 편 의녀로 열연한 H양이 동거남과 상습적으로 마약을 복용했다는 기사가 실린 신문은 그야말로 낙양의 지가를 올린다. 그래서 옐로 페이퍼들은 사실을 과장하고 독자의 눈을 현혹하는 과장된 기사를 생산하게 마련이다.
대중과 스타의 관계는 대단히 복잡한 심리학을 동반한다. 대중은 모두 호오(好惡)에 대한 판단을 지닌 주체로서 스타를 좋아하거나 싫어한다. 우리는 모두 어느 스타를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있다. 그 이유들은 대부분 남이 보면 얼토당토않은 것이거나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것들이다. 그리고 우리 개개인이 그 스타를 욕망의 대상으로 한다. 저 ‘오빠’를 한번만 만나보면 좋겠다거나, 저 여자 배우와 하룻밤 자보고 싶다거나 하는 욕망은 대단히 사적인 차원의 것이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순간, 혹은 노래를 듣는 순간 그 스타들은 내 속에 깊이 내장된 기억과 욕망과 동경을 불러일으키고 나는 그와 단독자로서 만난다. 그래서 이는 남이 파헤치기 정말 어려운, 남에 의해 분석되기 어려운 심리학적 영역에 속한다.
그런데 이런 개인적 차원을 넘어 어떤 영화배우나 가수(기실 그 페르소나)가 팬을 만들어내고 집단적 환상을 만들게 된다면 이는 사회학이나 사회심리학의 차원에 놓이게 된다. 배용준은 물론 한국에서도 톱 클래스의 배우이지만, ‘겨울연가’가 처음 방영되었을 때의 인기는 오늘날 일본에서의 인기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다. 오늘날 일본 여성들이 놓여 있는 사회 문화적 상황과 ‘겨울연가’의 스토리와 ‘준상이’라는 인물은 그래서 함께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남자가 여배우 역할도
우리나라에서 스타 시스템과 배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본격화된 시기도 1920년대 중반이었다고 볼 수 있다. 배우에 대한 기사가 본격적으로 신문에 등장한 1925년 중반에도 동아일보 영화 기사에서 다룬 배우는 대부분 미국 할리우드 배우였다. 그들이 얼굴이나 몸에 거액의 보험을 들었다는 류의 이야기가 가장 많다.
1926년 5월29일자 동아일보는 ‘배우 일인에 염서(艶書) 천 통’이라는 기사를 실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최근 2~3년 사이에 일본 영화계가 감독과 배우의 역량이나 촬영술 등 모든 면에서 ‘비상히 진보했으며 그에 따라 일본 영화 판(fan)들도 매우 향상되어 스타덤에 오른 배우에게는 석 달 동안 팬레터가 무려 1000통이나 왔다는 것이다. 이에 비할 때 ‘조선영화계는 아직도 참담한 지경에 있는 터’라는 것이다. 아마도 이런 인식이 한국 영화배우를 소개하는 기사를 별로 싣지 않은 요인인지도 모른다.
실제로 한국에서 여배우의 등장은 매우 늦었다. 활동사진 연쇄극 시대까지는 여자역을 남자 배우가 맡는 일도 허다했다. 1923년 무성영화 ‘춘향전’이 일본인의 손으로 제작되었을 때 기생 출신의 한용(韓龍)이 춘향 역을 맡은 것이 우리나라 영화에 여배우가 등장한 최초의 사건이라고 전해진다. 그때까지 여성의 사회적·문화적 지위는 낮았고, 교육의 기회가 주어졌어도 이를 누릴 수 있는 여성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그나마 여학생, 기생, 카페 여급 등의 신여성들로부터 여배우가 속속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192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분위기는 달라진다. 1926년에 개봉된 영화 ‘아리랑’은 식민지 시대의 최고 영화로 꼽히는데 이 영화는 스타 문제에서도 획기적인 면을 가지고 있었다. 이 영화를 통해서 나운규와 신일선이라는 두 대형 스타가 만들어진다.
1902년에 태어난 나운규는 함경북도 회령 사람인데 어릴 때 간도와 시베리아 지역의 독립운동에 가담하다가 서울로 와서 1923년에 신극단 예림회(藝林會)에 발을 들여놓은 뒤 배우로서의 삶을 시작했다. 1926년에는 ‘농중조(籠中鳥)’라는 현대극에서 주연을 했다. 이어 그 해에 무성영화 ‘아리랑’의 감독·주연을 맡게 되는데 이로써 무성영화 시대 최고의 스타이자, 민족 예술인의 한 사람으로 등재된다.
최초 여성스타 신일선
‘아리랑’은 당시로는 첨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 기법을 도입하고, 강렬하고도 분명한 저항 민족주의적 메시지를 담았으며 흥행에도 성공하여 식민지 시대의 한 표상이 된다. 이런 작품을 통해 민족과 민중의 심성은 표상을 얻게 되었다. 표상은 만드는 것이며 또한 창출되는 것이다. 그 범위는 영화가 가진 모든 것에 걸친다. 무엇보다 우선, 영화의 제목과 주제가(영화는 무성영화였지만 ‘신아리랑’이라는 가요가 영화의 주제가로 변사에 의해 읽힌다)로 사용된 ‘아리랑’이라는 말이 재발견되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큰 영향력을 발휘한 영화나 소설 속의 인물은 스스로 표상이 된다.
나운규가 연기한 주인공 최영진은 몰락한 중농의 아들로, 서울 유학을 갔다가 병을 얻어 광인이 된다. 여기서 ‘몰락한 중농’ ‘서울 유학생’ ‘광인’은 모두 표상 창출을 위한 코드다. ‘몰락한 중농’과 ‘서울 유학생’은 전형성을 나타내고, ‘광인’은 최영진의 살인을 통해 일제에 대한 저항이라는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우회적 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최영진의 반대편에 선 식민지적 수탈의 대리인인 마름 오기호나 영진의 친구이자 서울에서 이념적 민족운동을 하는 학생 현구 또한 말할 것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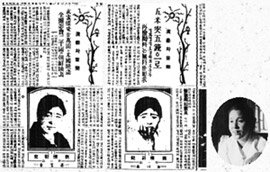
1927년 2월 동아일보는 영화 ‘아리랑’에 출연한 신일선(맨 오른쪽)에 대한 연재기사를 10회나 게재한다. ‘신일선 - 표정연구’라는 제목의 이 기사 중 왼쪽 기사에는 ‘본얼굴’이라는 제목이, 오른쪽 기사에는 ‘놀라움’등의 제목이 붙어 있다.
최영희 역을 맡은 신일선은 한국 최초의 대형스타였다. 신일선을 통해 우리나라 최초의 스타덤·팬덤의 양상을 살펴보자. 신일선은 서울 견지동에서 태어나 열 살 때 동덕여자보통학교에 입학하여 4학년에 다니다 말고 13세의 나이로 오빠를 따라 ‘조선예술단’에 입단한다. 이를 계기로 그녀는 순회 공연단 여배우가 되었다. 함흥에서 공연하다가 토월회(土月會) 일행과 우연히 만났는데, 그중에 유명한 영화감독이자 연극연출가인 이경손(李慶孫)이 있었다. 이경손은 신일선의 재능을 보고 그녀의 오빠와 의논한 뒤, 서울로 와서 ‘조선키네마회사’에 그녀를 소개했다. 1926년 불과 15세의 나이로 처음 출연한 영화가 바로 무성영화 시대의 최고 명작인 ‘아리랑’이었다.
1927년 2월18일부터 3월5일 사이에 동아일보는 인기 여배우 신일선을 대상으로 독특하고 보기 드문 시도를 했다. 5면 상단에 ‘신일선 - 표정연구’라는 제목을 달고 신일선의 얼굴 사진을 10회에 걸쳐 연달아 게재한 것이다. 기사는 특별한 내용 없이 그저 첫 번째에 ‘본 얼골’, 두 번째는 ‘놀라움’, 세 번째는 ‘원한’, 네 번째는 ‘시기’, 이런 식으로 해서 8회에는 ‘고통’, 9회에는 ‘희망’, 마지막 10회에는 ‘만족’이라는 소제목을 붙여서 내보냈다.
신일선의 얼굴이 당시로서는 ‘연구’ 대상이 될 만큼 풍부한 표정을 가지고 있었거나 최고로 인정되었다는 의미이다. 신일선을 키웠던 나운규는 훗날 그녀를 평가하면서 ‘신일선에게는 만인의 시선을 끄는 자태가 있으며 스크린 속에 피는 나리꽃 같은 시원한 양자(樣姿)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천도교 계통의 대중잡지 ‘별건곤’ 1927년 7월호는 신일선 인터뷰 기사를 실으면서 ‘조선영화계 유일의 화형(花形) 여우(女優)’라는 제목을 달았다. 오늘날의 ‘꽃미남, 꽃미녀’에 해당하는 말이 그때에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지금은 거의 쓰이지 않지만 ‘꽃 같은’ 정도로 번역될 만한 ‘화형(花形)’이란 말은 당대의 관용어였다. ‘천승일행(天勝一行)의 화형 배구자양의 탈퇴 입경’(동아일보 1926년 6월6일), ‘화형 여우, 문예봉양의 대답은 이러합니다’(‘삼천리’ 1936년 2월) 등과 같이 주로 여배우 앞에 붙어 쓰였지만 ‘조선영화계 화형 점고(1) 이경손’(동아일보 1926년 10월12일)처럼 남자 앞에도 간혹 쓰였다.
‘별건곤’의 신일선 인터뷰 기사에는 당시의 스타와 팬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점이 나타나 있다. 신일선이 영화 ‘금붕어’(1927)를 촬영하다가 한강 로케이션 현장에서 실족하여 강물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이 사실을 두고 신일선이 자살하려고 일부러 물에 빠졌다는 루머가 나돌았다는 점. 그리고 신일선은 ‘아리랑’에 출연한 이래 300여통의 팬레터를 받았는데 ‘모두 오빠가 맡아서 보시는’ 이 편지 가운데에는 ‘여자들에게서 감사한 편지’가 오고 ‘남자에게서 오는 것은 대개 지저분한 연애 문구뿐’이라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 ‘별건곤’이라는 월간지 기사가 스타에 대한 매우 전형적인 인터뷰의 요소를 모두 다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기사는 지금이야 흔해빠진 것이지만 당시엔 매우 드물었다. 기자는 ‘팬들을 대신해서 팬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묻는다면서 신일선의 출신과 영화계 데뷔 동기와 취미, 좋아하는 외국 영화와 배우, 읽고 있는 책 등 팬들이 알아야 할 기본적인 것부터 영화 찍을 때 어떤 역을 맡을 때가 좋은지, 또는 싫은지, 왜 그러한지, 결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같은, 시시콜콜해 보이지만 결코 중요하다 하지 않을 수 없는 질문을 한다.
이에 대해 신일선은 이런 인터뷰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혹은 아직 16세 소녀라서 그런지 무척 쑥스러움을 타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녀를 직접 만나보자.

1920년대 인기 연극 ‘부활’에서 카추샤 역을 맡은 복혜숙은 이화학당을 거쳐 일본에 유학한 인텔리 여배우였다.
仙(신일선) “녜-”
記 “뭇는 나 자신이나 또는 잡지사에서 알고 싶은 것을 뭇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화를 사랑하는 이들이 알고 싶어할 듯한 것을 내가 대신 뭇는 것이니까 나중에는 엉뚱한 말도 뭇게 됩니다.”
仙 (웃기만 한다) (중략)
記 “아즉 열여섯살 이시라닛가 일르기도 하지만은 결혼문뎨에 관해서 엇더케 생각하는 일이 업슴닛가?”
仙 “아이그” 하고 고개를 풀숙이면서 웃는다.
記 “아모 때 당해도 당하고야 말 문뎨닛가 거긔에 대해서 아모 생각도 전혀 업지는 안켓지요. 그러고 당신의 영화를 사랑하는 팬들이 제일 알고 십허하는 말임니다.”
仙 “스무살까지만 배우 노릇을 할테야요.”
記 “그러고 스무살부터는 엇전단 말임닛가. 집을 간다 간단 말슴인가요?”
仙 “그럿치요.”
記 “결혼을 한다면 엇던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될까요.”
仙 “아이그, (또 고개를 숙이고 웃는다) 참.”
“스무 살까지만 배우 노릇 할테야요”
記 “우스운 말 갓해도 그런 말을 들어다가 써야 팬들에게 내가 층찬을 듯지요. 엇던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될 것 갓슴닛가. 꼭 그럿케 안되드래도 지금 생각에만 말임니다. 가령 간단하게 말하면 예술가 갓흔 이와 하게 될 것 갓슴닛가. 예술가와는 전혀 인연을 끈코 다른 방면의 남자와 하게 될 것 갓슴닛가.”
仙 “(고개를 폭 숙이고) 예술가요.”
記 “그러시겟지요. 물론…”
仙 (고개가 더 숙으러진다.)
기자는 “활동배우 같지 않게 너무 얌전하여서 더 묻기도 미안하였다”로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다. 신일선이 대중에 대한 스스로의 이미지를 ‘수줍은 소녀’로 설정하고 행동했는지는 물론 알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면모와 관련해서 ‘별건곤’의 기자는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진다. “조선에서는 여배우라 하면 정조관념도 없고 아무것도 볼 것 없는 아주 천하고 더러운 사람으로만 여기는데 거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는 질문이었다. 이에 대해 신일선은 “그거야 모르고 그러는 것이니까 저만 안 그러면 그만이지요. 그러기에 저는 극장에를 가도 오빠와 꼭 동행을 하고 다른 동무와는 같이 다니지도 않아요”라고 답한다. 이 또한 매우 전형적인 답변이 아닌가? “남자친구는 없어요”라든가 “통장은 엄마가 관리해요”와 같은, 요즘 유명 연예인들의 대답과 상통하는 답변이 아닐 수 없다.
기자의 물음 속에는 중요한 점이 또 하나 있다. 지금이야 달라졌지만 한국인들이 연예계 인물이나 배우를 ‘딴따라’로 낮춰보거나, 여배우나 가수를 창녀(娼女) 또는 탕녀(蕩女)시하는 경향은 아주 오래된 것이다. 여기에는 여자 스타를 대하는 보편적 욕망의 문제와 현실적이며 역사적인 배경도 함께 깔려있다.
분열적인 욕망이 스타인 그녀들에게 투사된다. 존 F. 케네디는 마릴린 먼로를 침실로 끌어들이고 싶어했고, 박정희의 요정 파티에는 심수봉이 불려왔으며, 한국 재벌의 아들이나 손자들도 잘 나가는 탤런트나 영화배우들과 파티를 벌이기 원한다. 그들이 원하는 스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거나 섹시한 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힘이나 돈을 많이 가진 남성들은 그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욕망을 불태운다. 순간 그녀들은 가장 아름답고 섹시한 여자로 변모하는 것이다.
한편 그녀들에게는 세상에서 엄격한 도덕적 기준이 적용된다. 그녀들은 순결해야 하고 모범적인 사생활을 해야 한다고 믿어진다. 그녀들이 ‘공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음주운전을 한 그녀나 비록 사생활이라고 하더라도 이상한 비디오를 찍은 그녀는 가혹하게 단죄된다. 그녀가 극에서 맡은 역이 순결하고 청순해 보이는 쪽일수록 더욱 그러하다. 남성들은 청순해 보이는 여자 스타를 좋아하면서도 그녀에게서조차 탕녀의 이미지를 읽고자 한다. 그리하여 여성들은 자기보다 더 예쁘거나 인기가 좋은 여자 스타들을 질투하고, 남성들은 여자 스타들을 취한 다른 남자들을 질투한다.
그렇다면 현실에서는 어떠한가? 스타가 되어 매니저나 광고주에 대한 협상력이 커지기까지 스타산업의 공급자들에 비해 매우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연예계 지망 여성들은 자신의 몸을 협상의 도구로 삼는 경우가 많다. 가진 것이 몸뚱이밖에 없을 경우 그럴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여성 연예인들도 권력을 가진 남자들의 속성을 이용하여 아르바이트 전선에 뛰어들기도 했다. 그리하여 실제로 그녀들은 브라운관이나 스크린 속의 이미지와 전혀 반대되는 사생활을 갖게 되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초창기 연예계에는 기생과 카페 여급 출신이 많았다. 또 식민지 시대 여자가수 중에는 평양기생학교 등의 ‘권번’ 출신이 적지 않았다. 이들 기생학교에서 노래와 춤 등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켜왔기 때문이다. 1930년대 중반의 톱가수 선우일선이나 왕수복 등도 평양기생학교에서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은 이들이었다. 여성은 집밖에 나다니면 안 된다는 봉건적 인식이 강해 남들에게 몸과 얼굴을 내보이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연예인을 천하게 취급했고 이에 따라 여성 연예인의 배출 경로도 극히 제한되었던 것이다.
월간지 ‘삼천리’ 1936년 4월호에는 ‘여고 인테리 출신인 기생, 여우(女優), 여급 좌담회’가 실려 있다. 오늘날 같으면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잘나가던 영화·연극배우와 룸살롱 아가씨를 한자리에 앉힌 좌담회인 셈이다. 지금 같아서는 이런 좌담회 자체를 생각해내기가 힘들 것이지만 이 시대에는 가능했던 모양이다. ‘남성을 어떻게 보나요’ ‘돈 잘 쓰는 손님 종류’ ‘어떤 사내가 기질에 맞는가’ ‘수입은 얼마나 되는가’‘정조의 위기를 어떻게 물리쳤던가’ 등이 좌담회의 주요 화제였다.
이 자리에는 당시 대표적 신극단 ‘토월회’의 멤버였던 스물아홉 살의 여우 복혜숙도 참석했다. 복혜숙은 이화학당을 거쳐 일본 유학까지 한 후 1920년대 인기 연극인 ‘부활’에서 카추샤 역을 맡아 인기를 얻은 보기 드문 인텔리 여배우였다. 해방 이후에는 배우협회장과 서울시 문화위원으로도 활약했고 문공부장관 공로상과 이화여대 문화상도 수상했다. 1933년 ‘삼천리’ 1월호에는 이런 기록이 있다.
“그후 그는 무엇이 동긔가 되여 몸을 휘날려 인천 어떤 권번에 적(籍)을 걸고 기생으로 변하고 말았는가? 그의 ‘데프류-드’ 백작은 누구였으며 그의 부활제날 밤은 어느날 밤이었는지? 소문에 의하면 그는 XX년 XX월 XX일 밤 모 귀족의 ‘쌀론’의 손이 되었다고 한다. / 필경 그 귀족의 X실에 끌려 들어가서 최후의 것을 요구당하였으나 완강히 거절하였더니 정욕에 타오를 대로 타오른 그 귀족은 ‘피스톨’을 가지고까지 강박하야 필경 그는 무참히도 그 귀족의 더러운 진흙발 아래 짓밟히고 말았다고도 한다. (중략) 석일에 무대 여배우로 오직 혼자인 것처럼 빛나던 복양은 지금은 인천을 뛰어나와서 대경성의 중심 종로의 ‘바- 비-너쓰’의 홍등 청등 아래서 야반(夜半)의 취객에게 애교를 발산하면서 있다니 때때로는 그의 붉은 입술에서는 그리운 ‘컬럼비아’의 ‘레코-드’에 맞추어 ‘가츄-사 내사랑’이 흘러나오지나 안는지.”(삼천리 제5권 제1호 “우리들의 ‘가츄-사’ 복혜숙양” 1933년 1월호)
얼굴만 갖고서야…
짐승 같은 귀족에 관한 이야기는 그저 소문이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녀가 권번과 바에서 일했던 것은 사실이다. 복혜숙은 여성 스타에 대한 복잡한 대중의 욕망이 투사되는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이다.
감독 나운규는 1933년에 쓴 글에서 신일선을 두고 이렇게 묘사했다. 신일선은 시집을 간 뒤 한동안 활동을 중지했다가 ‘살림을 깨고’ 다시 영화계로 나왔다. 그녀에게 나운규는 공부할 것을 충고했다면서 당대의 대표적인 미녀 배우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그에게는 교양이 부족하다. 보통 학식도 동덕여학교를 3년급까지인가 다녔다니까, 충분하다고 볼 수 없는데 더구나 극예술에 대한 지식은 말할 것도 업다. 그는 옛날에는 환영을 받았다. 그렇지만 옛날의 환영이란 얼굴에 대한 환영이 대부분이었다. 인격이나 배우로서의 기량에 대한 환영이 아니었다. 시대는 나아갔다. 이제는 얼굴만 가지고 명배우 노릇할 때는 이미 지나갔다.’(나운규, ‘부활한 신일선’관(觀), “극계와 영화계의 이 일 저 일까지”, 삼천리 제5권 제9호, 1933. 9)
그렇다면 나운규의 말은 과연 실현되었는가? 오늘날은 어떤가? 얼굴만 가지고 명배우가 되는 건 물론 불가능해졌지만 얼굴만 가지고 스타가 되는 건 여전히 가능하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최근 인터넷에서는 청소년들의 ‘성형 폭로전’이 인기라고 한다. 용모가 출중한 연예인의 데뷔 전 옛날 사진을 찾아내 인터넷에 공개하는 일이다. 이 또한 우리가 스타들에게 갖는 복잡하고 이중적인 심리의 표현일 것이다. 연예인은 남달리 예쁘고 모범적이어야 한다는 엄격한 기준과, 그러나 그들이 우리와 비슷한 인간일 뿐이라는 점을 확인해보고 싶은 이중적인 심리는 오늘도 여전히 팬들의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밀착취재] 리딩방 70여 명 대부분이 한통속…기망하는 수법까지 매뉴얼화](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48/98/bd/694898bd2399a0a0a0a.jpg)


![[지상중계] 제12회 나지포럼, “북미 정상회담 성과내기 어려워”](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43/48/32/69434832107aa0a0a0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