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조 이성계의 5대조인 목조가 살았던 금당촌, 이순신 장군이 둔전제를 실시했던 녹둔도, 러시아 군부대에 무참히 짓밟혀 역사속으로 사라진 나선동.
- 두만강 일대 국경지역에는 수백년 전의 역사와 수십년 전 근대사의 아픈 과거가 공존하고 있다.

핫산에 있는 핫산호수. 호수 건너 바라다보이는 철교가 ‘두만강 철교’다.
이 지역은 또 3개국의 접경지대로 국제정세의 변화와 국가간의 관계변화에 따른 국경분쟁의 소지가 상존해왔던 만큼, 거주민들에게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생활이 보장되는 곳도 아니었다. 하지만 이곳에는 한때 200여 개에 달하는 한인마을이 분포해 있었다.
이곳 한인마을은 크게 두 지역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탐험대만의 크라스키노로부터 남쪽 길을 따라 두만강 하구에 이르는 핫산(Khasan)지역이다. 이 길의 끝이 바로 북한, 러시아, 중국 국경이 만나는 핫산이다. 그곳에서 마주보이는 두만강 건너편이 북한의 경흥이다. 핫산의 남쪽은 늪지대다. 길이 없어 접근할 수 없는 지역으로 과거 크라스노예 셀로라 불렸던 녹둔도(鹿屯島 또는 鹿島)가 있다. 크라스키노에서 크라스노예 셀로에 이르는 중간 지역 곳곳에는 지금으로부터 70여 년 전까지만해도 한인마을들이 자리잡고 있었다.
또 다른 지역은 크라스키노로부터 서쪽으로 일직선으로 뻗어 있는 도로를 따라 중국의 훈춘(琿春)에 이르는 곳이다. 과거 크라스키노와 훈춘 사이의 이 지역에도 한인마을들이 여러 군데 형성돼 있었다. 이 길은 현재도 훈춘으로 들어가거나 반대로 중국에서 러시아로 나오는 상인이나 관광객들의 주요통로다.
“길이 구릉 위로 사라졌다 다시 나타나고…”
영국의 여행가였던 이사벨라 버드 비숍(Isabella Bird Bishop)은 1894년 가을 조·러·중 3국의 국경지역을 방문했다. 러시아와 조선의 국경지대를 거쳐 조선 경흥과 중국 훈춘을 직접 보고자 했던 그녀의 노정은 크라스키노를 떠나 크라스노예 셀로를 거쳐 다시 훈춘과의 국경지방으로 이어졌다. ‘조선과 그 이웃나라들’이라는 책은 그녀가 이 지역을 방문하면서 보고 느꼈던 바를 기록하고 있다.
비숍의 책을 보면 핫산으로 가는 중간에는 포시에트만 해안을 따라 여러 개의 한인마을들이 있었다. 주민들은 염전을 일궈 소금을 만들었는데 정제과정을 거친 소금은 중국의 훈춘으로 운송했다. 바닷가로부터 내륙 안쪽으로 들어가는 길가 곳곳에 한인마을이 있었다. 그 광경을 비숍은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이 아름다운 시골마을 어디에서나 한인의 집을 쉽게 볼 수 있다. 중국인의 집은 다 허물어져 쓰러질 것 같고 얼마 되지도 않는다. 무단으로 점유했든 구입했든 한인들은 토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이들은 가축을 길러 땅을 아주 비옥하게 만든다. 깊게 갈고 작물을 돌려가며 재배해 상당한 수확물을 거둔다.”
오늘날 핫산에 이르는 도로는 비교적 상태가 좋다. 도로 양편으로 펼쳐져 있는 평원과 간헐적으로 등장하는 낮은 구릉 사이로 쭉 뻗어 있는 것. 하지만 19세기 후반에는 늪과 개천이 많아 다니기 쉬운 길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비숍은 “달리는 마차 앞에 뻗은 길이 구릉 위로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곤 했는데, 특히 처음 40베르스타(약 42km) 거리에 늪이 많았다”고 적었다.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를 비롯한 조선시대의 고지도에도 이 지역은 팔지(八池)라고 표시돼 있다. 여덟 개의 크고 작은 호수 또는 못들을 의미하는 것. 또한 홍양호(洪良浩)의 ‘북새기략(北塞記略)’에 의하면 팔지 주변지역은 알동(斡東, 音은 烏東)이라고 불렸다. 특히 여덟 개 호수 가운데 세 번째 호수 위에 있는 산의 이름이 흑각봉(黑角峯)인데, 그 산밑 금당촌(金堂村)이란 촌락이 조선왕조의 창건자인 태조 이성계(李成桂)의 5대조 목조(穆祖)가 경흥의 용당(龍堂)으로부터 옮겨와 살던 곳이다. 초기 한인농민 마을 가운데 하나다.
물 속에 담긴 듯한 자레치예
러시아의 고지도를 보면 이 지역의 강과 호숫가에 1937년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되기 전까지 한인마을들이 산재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고지도와 문헌자료에 나타난 이 지역의 대표적인 한인마을은 자레치예(Derevnia Zarech’e)다.
크라스키노로부터 25베르스타(약 27km) 떨어진 곳에 있던 자레치예에 1880년 지신허, 연추, 그리고 조선 국내로부터 이주해온 농민 14가구가 정착했다. 이후 조선으로부터의 이주가 금지된 1889년까지 주민의 수가 늘어갔고 주변지역에도 여러 개의 마을들이 형성되었다. 1895년경에는 포시에트만의 토본가이만[(Zaliv Tobongai, 현재의 레베디니이만(Zaliv Lebedinyi)]으로부터 두만강가의 박석골마을(Paksekori)에 이르는 자레치예 평원에 8개의 마을이 있었다. 넓은 의미에서 ‘자레치예’라는 이름은 이들 8개 마을의 총칭으로도 쓰였는데, 좁게는 삭파우호[(Ozer Sakpau, 현재 자레치예 호수 Ozer Zarechnoe)]가에 위치했던 마을 하나를 지칭했다.
비숍이 방문했을 당시 120가구 600명이 살았던 자레치예 마을은 ‘집들이 잘 지어졌고 풍부한 물화로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당시 주민 600명 가운데 450명이 러시아정교로 개종했다. 자레치예 마을의 주민수는 1914년 일제당국의 조사에는 350명으로 되어 있지만, 1906~07년경 조사한 러시아측의 조사에는 102가구(입적 138가구, 비입적 22가구) 822명(입적 684명, 비입적 138명)으로 돼 있다.
자레치예 마을 외에 문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마을들은 신천(Sincheni), 향산동(香山洞 또는 香山社), 박석골(Paksekori, 朴石洞), 금당촌(金堂村), 토본가이만가의 토본가이(Tobongai), 타게르치(Tagerty), 탈미 호수[(Ozer Tal’mi, 현재의 프치치예 호수(Ozer Ptich’e)]가의 베르흐네 탈미(Verkhne Tal’mi, 上月峰), 니즈네예 탈미(Nizhnee Tal’mi, 下月峰), 카체기(Kachegi), 칼레발라만[(Bukhta Kalevala, 현재의 시부치에야만(Bukhta Sibuch’ia)]가의 타우토이(Tautoi)와 침부다기(Chimbudagi), 니윤디프치호수(Ozer Niundypty)가의 니윤디프치 등이다.
이들 마을은 대개 호수와 늪, 그리고 작은 강가에 위치해 있었다. 이 지역을 답사했던 러시아 지리학자들은 크라베섬에서 포시에트항구로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왼쪽을 내려다보면 자레치예의 집들이 마치 물 속에 있는 것 같았다고 한다. 자레치예 주변에 크고 작은 호수, 개천과 늪들이 늘어서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들 마을 가운데 향산동은 후일 한인사회의 부호가 되는 최봉준(崔鳳俊)이 1875년에 개척한 마을이다. 이로부터 20년 후인 1895년, 최봉준의 의형제이기도 한 한인사회의 원로 최재형의 주선으로 러시아정교교당과 학교가 향산동에 세워졌다.
1895년에 작성된 러시아측 기록을 보면 당시 자레치예에는 블라고베첸스크의 2급 신학교를 졸업한 유진율(니콜라이 유가이)씨가 교사로 26명의 학생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자레치예는 11개 마을을 총칭한 것이고 실제 학교가 있던 곳은 바로 향산동이었다. 이후 러시아문무성의 인가를 받은 이 학교는 성장을 거듭해 1914년에는 교사 2명에 학생수가 75명으로 늘어났다.
비숍은 자레치예를 비롯한 국경지대 한인마을들은 생활조건이 윤택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녀는 이 지역 한인이주자들의 생활상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한인마을들은 3~4마일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데, 이들 마을들의 특징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풍요(prosperity)라고 말할 수 있다. 집들은 크고 튼튼하게 지어졌으며 농가의 마당에는 잘 자란 가축들이 있다. 주민들과 아이들은 좋은 옷을 입고 있으며 농토는 제대로 경작되고 있다.”
비숍의 이런 관찰은 러시아 학자들의 기록과 비교하면 매우 대조적이다. 러시아 학자들은 비숍의 지적과 달리 자레치예 마을의 한인농민들이 그다지 부유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옅은 흑토층의 모래가 많은 토양이라서 수확량이 많지 않았다는 것. 학자들은 이 지역 한인농민들은 수이푼 지방의 한인농민들에 비해 소득이 형편없었다고 분석했다. 같은 한인마을에 대한 평가가 이처럼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비숍이 자레치예를 조선 국내의 농촌과 비교했던 데 비해, 러시아 학자들은 수이푼의 한층 부유했던 한인농민들과 비교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3국이 만나는 요충지 핫산지역
오늘날 북한과 러시아, 중국의 접경지대 핫산. 그 지명은 서북쪽 두만강에 가까이 위치한 핫산호수(Ozer Khasan)에서 비롯된 것이다. 핫산호수의 이전 이름은 우리말로 ‘긴 호수’라는 뜻의 장지(長池)였다.
핫산에 도착하자마자 필자는 러시아와 북한을 연결하는 두만강철교로 향했다. 북한과 소련간의 친선을 상징하여 ‘친선철교’라 불리는 두만강철교는 20~30m 정도의 길이인데, 북한과 소련 철로의 폭이 달라 북한에 들어가려면 이곳 핫산에서 열차의 바퀴를 갈아 끼워야 한다.
핫산 역사 구내 오른쪽에는 장고봉전투 또는 핫산전투를 기념하는 비가 서 있다. 비문에는 “여기 핫산호수지역에서 소비에트군대는 1938년 7~8월 우리의 조국을 배신적으로 공격한 일본 사무라이들을 분쇄하였다”며 65년 전에 벌어졌던 전투를 압축적으로 기록해놓았다. 핫산전투기념비 뒤편 작은 구릉 위에 남아 있는 소련군의 토치카(진지)에는 당시의 치열한 격전을 말해주기라도 하듯 여기저기에 총탄자국이 남아 있었다.
장고봉전투에 대해서는 부연설명이 필요할 듯하다. 1938년 7∼8월, 신흥 소련군과 조선주둔 일본군이 핫산호수에 인접한 장고봉(長高峰) 일대에서 무력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일본과 소련 간에 벌어진 최초의 국경충돌이었는데 그 전투에서 일본군은 소련군에게 대패했다. 그 다음해인 1939년 노몬한(Nomonhan)전투에서 일본군은 한층 대규모의 병력으로 쥬코프가 지휘하는 소련군과 몽골 연합군을 상대로 다시 대결했으나 무참히 패하고 말았다.

연추지역에 있는 파타쉬 마을(현재명 카므이쇼브이 마을) 입구.
한편 핫산지역에 있었던 한인마을의 한자식 이름은 와봉(臥峰)이었다. 와봉마을은 다시 상(上)와봉과 하(下)와봉의 두개 마을로 나누어졌다. 한인들은 이들 두 마을을 순수한 우리말로 부르기도 했던 것 같다.
러시아기록에는 상와봉은 파드고르니(Podgornyi) 또는 우니불미(Unnyburmy), 하와봉은 나고르나야(Nagornaia) 또는 니불미(Nyburmi)라고 표기돼 있다. 이를 좀더 설명하면 ‘니불미’는 ‘누울 뫼’ 즉 한자어 ‘와봉’이 되고 ‘우니불미’는 ‘상와봉’이 되는 것이다. 이 두 개의 한인마을 가운데 현재의 핫산은 과거 상와봉이 위치했던 곳으로 추정된다. 비숍이 “강 위에 솟아 나온 경사진 언덕에 높다란 표지석이 러시아와 청국 간의 국경이 만나는 지점”이라고 묘사한 곳이 바로 이 핫산이다. 여기에서 표지석이란 러시아와 청국 간의 국경조약에 따라 세워진 정계비(定界碑)를 말한다. 핫산지역은 또한 1908년 여름 안중근을 비롯한 동의회(同義會) 의병부대가 국내 진격시 경흥으로 거쳐간 곳이기도 하다. 와봉의 북한 쪽 건너편은 용현(龍峴)이다.
어쨌든 이 두 마을(상와봉, 하와봉)을 구별하지 않고 총칭할 때는 나고르나야 데레브냐(Nagornaia Derevnia)라고 했다. 나고르나야 데레브냐는 1875년 남쪽에 한인마을 크라스노예 셀로가 형성되면서 여기에 부속돼 있다가 1889년에 독립됐다. 초기의 주민 대다수는 조선에서 직접 건너온 사람들이었지만, 일부는 포시에트만의 크라베(Krabbe)섬에서 이주해온 가구들도 있었다. 1895년 무렵에 나고르나야 데레브냐는 세 개의 작은 마을 단위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각각 18가구, 8가구, 4가구였다. 러시아당국이 1906~07년경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나고르나야 데레브냐의 인구는 38가구 260명(입적자 27가구 203명, 비입적자 11가구 57명)이었다. 그러던 것이 1914년경에는 70가구로 늘어났으며, 러시아문무성의 인가를 받은 마을학교에는 1명의 교사가 38명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김광훈(金光薰)과 신선욱(申先郁)은 고종(高宗)에 의해 1880년대 초 남부우수리 지역에 파견돼 이 지역의 한인마을들을 조사했다. 이들이 귀국 후 1885∼86년경에 작성한 아국여지도(俄國輿地圖)에서 남북 10리 동서 20리, 남쪽으로 녹둔과 70리, 서쪽으로 경흥과 40리, 북쪽으로 나선동(羅禪洞)과 40리, 동쪽으로 연추영(延秋營)과 60리 떨어져 있다고 설명한 한인마을 서선택촌(西仙澤村)이 바로 이 나고르나야 데레브냐로 추정된다. 당시 주민은 76가구 478명에 달했다. 이 지도에는 서선택촌에 러시아수비대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 수비대의 막사가 비숍이 1894년 가을 하룻밤을 머물렀던 곳으로 알려진다.
비숍이 방문했을 당시 러시아 초소에는 총 15명이 있었다. 1895년에 작성된 러시아 기록에는 1895년경 12명으로 구성된 장교수비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있다. 비숍은 영국신문에 “러시아가 조선과의 국경에 5000명의 병력을 배치하고 4000명을 훈춘에 주둔시키고 있다”고 보도한 사실을 인용하면서 사실과 다른 기사의 오류를 지적하기도 했다.
조선정부에서 파견된 김광훈과 신선욱은 나고르나야 데레브냐의 북쪽 40리에 위치했었으나 이미 소멸된 한인마을 나선동에 대해 매우 자세히 보고하고 있다. 러시아와 청국 간에 야기된 국경문제의 좋은 선례이자 참고자료로 제시하고자 함이었다.
나선동은 1875년 음력 8월 안형국(安炯國)과 김구삼(金求三) 등이 러시아의 인가를 얻어 지신허 주민 30여 가구가 이주해 개척한 마을이다. 청국의 영토였을 때는 흑정자(黑頂子)로 불렸는데, 마을을 개척하고 신라(新羅)와 조선(朝鮮)에서 각각 한 글자씩을 따서 나선동이라고 이름지었다. 나선동의 토질은 아주 비옥해 수년이 되지 않아 대부락을 이루게 되었다고 한다. 1885년경 나선동의 모습은 이러했다.
“남북 25리, 동서 30리에 남쪽은 경흥과 20리, 서북쪽은 경원과 100리, 북쪽은 중국령 훈춘과 80리, 동쪽은 연추영과 70리, 목허우영(포시에트)과는 90리, 주산관(珠山關)과 30리 떨어져 있다. 마을 전면 왼쪽으로는 수택(水澤)이고, 후면 오른쪽은 육지이다. 북쪽은 본국, 러시아, 청국 3국간의 요해지였다. 1881년 러시아와 청국 간에 국경이 재조정되어 나선동은 청국의 영토가 됐다. 이에 청국은 러시아 주민에게 청국에 귀환, 입적케 할 것을 설득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자체 내부 논의를 거친 후 크라스키노 군영으로부터 러시아 마병(馬兵) 500명을 이끌고 와서 나선동 주민들에게 이 땅은 청국땅이 됐으므로 청국과 함께 살든가 철수해 러시아 영토로 이주해야 한다고 협박했다. 이에 나선동 주민들은 청국에 귀화할 뜻을 밝혔고, 러시아 장교는 병졸들에 명하여 이들 주민들을 몰아내 사방으로 흩어지게 했다. 러시아는 나선동을 청국에 돌려주지는 않고 오히려 요새를 설치하고 주둔병 1000명을 배치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전선(電線)을 설치해 연추와 연결시켰고, 남쪽으로는 서선택과 녹둔도에 이르기까지 관방(關防)을 설치해 외부의 침입에 대비했다. 철거 당시 나선동 주민은 270여 가구 2600여 명으로 큰 마을을 이루고 있었는데, 주민들은 가재들을 하나도 건지지 못했다. 주민 중 일부는 국내로 돌아갔으며 김몽렬, 김풍갑 같은 이들은 내륙지방인 도비허(都兵河, Daubikhe, 아누치노 지역. 현재의 아르센예프 지역)로 이주해 새로운 마을을 개척했으니 1884년의 일이다. 이때 나선동 주민들의 손해는 5만5000여 루블이었다고 한다.”
‘아국여지도’에서 김광훈과 신선욱은 나선동의 경험에 대한 논평에서 러시아의 정책을 득책(得策), 청국의 정책을 실책(失策)이라고 평가했다. 당시 나선동이 청국의 영토가 됐다면 녹둔도가 우리의 번(藩)이 되었을 것이라며, 청국의 ‘실책’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해(害)는 가장 절박한 것(最迫)이었다고 아쉬워했다. 이들은 결론적으로 “나라의 일을 맡고 있는 자(經國之務者)는 마땅히 땅의 지점과 지리를 잘 알아 살피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라고 위정자들에게 경고했다.
또 하나의 대표적인 한인마을이 바로 크라스노 셀로다. 우리말로 녹둔도, 녹도 또는 녹평(鹿坪)이라 불렸던 마을이다. 녹둔도라는 명칭은 고려말 조선초에는 지금과 같이 육지에 붙어 있지 않고 두만강 하구에 있었던 섬, 즉 해중도(海中島)를 칭했던 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때 녹둔도는 우리 영토인 제안고진(濟安古鎭)에 속했는데 세종의 육진(六鎭) 개척시 북방 국경지방의 지명을 확정하면서 붙인 이름이었다.
녹둔도는 조선시대 초 두만강 건너편 조산(造山)지역의 군민(軍民)들이 배를 타고 섬을 드나들며 경작하고 농산물을 수확해왔던 곳이다. 1587년에는 여진족이 무리를 지어 녹둔도에 침입해 방비하던 조선병사와 농민들을 살해하고 말과 농산물을 약탈해간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이순신(李舜臣) 장군이 여진을 토벌하고 조산만호(造山萬戶)로 와서 둔전제(屯田制)를 실시했는데, 이후에도 외적의 약탈과 위협이 계속되자 둔전을 파하고 농민들을 돌아오게 했다. 이후 녹둔도는 조선정부의 관심 밖에서 오랜 기간 방치돼왔다.
본디 섬이었던 녹둔도는 두만강 하류의 범람으로 인한 모래의 퇴적이 오랜 세월 이어지면서 동쪽부분이 육지와 연결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1860년 청나라가 러시아와 맺은 북경조약에 따라 우수리강 동쪽 연해주가 러시아에 할양되었는데, 1861년 흥개호(興凱湖) 조약이 추가로 체결되면서 녹둔도는 완전히 러시아 영토가 되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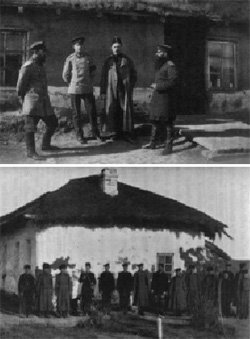
크라노스셀로 러시아 수비초소 앞에 서 있는 러시아 장교(위)와 훈춘 초소 앞 러시아 군인들의 모습(비숍의 여행기 중).
“길이 거의 없어 노보키예프스크로부터는 말을 타고 가야 한다. 땅은 모래토양이고 심지어 들판까지도 모래가 많다. 마을 주민들은 빈곤하게 살고 있으며 강 근처에 살고 있는 일부 주민들이 평저선 6척과 큰 어망 하나를 갖고 있다. 이외에 제염소가 하나 있다. 강 근처의 주민들은 농사 외에도 자기 소유의 평저선으로 게, 생선, 굴 등을 싣고 블라디보스토크로 팔러간다.”
크라스노 셀로는 정확히 말해 녹둔도에 위치하고 있었던 11개의 작은 마을을 총칭하는 이름이었다. 문헌자료에 나타난 이들 마을의 명칭을 열거하면 바른패(Varynfei)로 불리기도 한 작포도, 학수평(鶴水坪), 와룡평(臥龍坪), 센기(Sengi), 튠코이(中所, Tiuncoi), 상소(上所, Shansoi), 원전역(遠田驛), 성장(城場), 달봄목(Tarbomogi), 카체기(Kachegi), 부디포(Budyfo), 앞세카리미, 솟카리미, 세카리미 등이다. 이 가운데 동사무소가 위치해 있던 상소가 크라스노 셀로였다. 1906~07년경 러시아당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크라스노 셀로에는 133가구 839명(입적자 116가구 771명, 비입적자 17가구 68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1914년의 기록에는 크라스노 셀로에 러시아문무성 인가를 받은 마을학교가 있었는데 2명의 교사가 85명의 학생들을 가르쳤다. 크라스노 셀로의 두만강 연안에 위치했던 상작포도(上雀浦島)에는 세관초소가 있었는데 경흥의 토리동(土里洞)으로부터 오는 사람과 짐을 점검했다.
서울대 사범대 이기석 교수가 이끄는 조사팀이 1996년, 2000년, 2002년 3차에 걸쳐 녹둔도를 답사한 바 있다. 이교수팀의 2000년도 답사보고서에 따르면 녹둔도로 추정되는 두만강 하구지역은 현재 사구와 저습지, 키높이의 끝없는 갈대숲으로 이루어진 황무지상태라고 한다. 군사용 비포장도로가 있으나 도로 곳곳에 물웅덩이가 있어 차량통과가 불가능한 상태이며, 녹둔도 사이를 흐르는 샛강지역에선 원주민들이 물오리 사냥을 하기도 한다고 한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교수팀이 2차 답사에서 한인마을의 흔적이 분명한 논자리와 집터, 그리고 연자방아 맷돌 한 짝을 발견했고 제방의 흔적을 찾아낸 점이다.
북한의 선봉, 중국의 훈춘과 더불어 녹둔도는 몇 년 전까지 유엔개발프로그램의 주도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남북한, 몽골 등이 참여하는 두만강델타개발프로젝트의 주요한 대상지역이었다. 이처럼 녹둔도는 영토분쟁의 소지가 잠재해 있는 지역인 한편, 동북아국가들간의 경제협력과 공존의 실험대로서 새로이 주목받는 지역이기도 하다.
엄격한 위생규정으로 청결한 마을
비숍은 녹둔도에서 돌아오면서 국경지대에 살고 있는 한인농민들의 생활상을 가까이서 관찰한 후 자치제도 등 한인마을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이들 이방인들은 실제로 자치를 누리고 있다. 각 구역의 우두머리로 ‘노야’라는 것이 있는데 마을 규모에 따라 1~3명의 보조원을 두었다. 경찰들은 모두 한인이다. 모든 구역에는 서기가 딸린 2∼3명의 재판관이 있어 마을의 사소한 범죄들을 처리한다. 노야는 마을의 질서와 세금징수의 책임을 지는데 봉급과 함께 여러 가지 형태의 수당을 받는다. 공무를 맡은 이들은 모두 한인들이고 마을 주민 가운데서 선출한다.(중략) 크라스노 셀로와 노보키예프스크 간에 자리잡고 있는 한인마을들은 러시아 한인정착마을의 평균적 표본이다. 길은 잘 닦여져 있고, 늪들은 잘 관리되어 있다. 위생규정은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데, 노야가 마을의 청결을 책임진다. 가난하고 망가지고 더러운 한반도의 마을과는 달리 이들 한인마을은 조선식으로 잘 지어졌고 흰 벽면에 이엉을 엮어 꾸몄다. 마당은 깔끔하게 엮은 갈대울타리로 둘러싸여 있는데, 매일 아침 비로 청소한다. 돼지우리도 구역경찰관의 아르고스(argus-눈이 100개 달린 신) 같은 눈초리에 의해 감시당하고 있다. 모든 주택은 4, 5개 또는 6개의 방이 있는데, 각 방은 종이로 벽과 천장을 바르고 반투명의 종이로 창문을 발랐다. 바닥엔 단정한 매트를 깔았다.”
결론적으로 비숍은 조선에서 내렸던 조선인들에 대한 절망적 평가를 바꾸게 되었음을 고백한다. “조선에서 나는 조선인들은 찌꺼기 같은 종족이며 이들의 조건이 절망적이라고 여겼지만 프리모르스크(연해주)에서 이러한 나의 견해를 바꾸어야만 하는 이유들을 보았다. 러시아의 경찰관, 이주민, 군인들로부터 똑같이 좋은 행동방식과 뛰어난 근면성을 배워 윤택한 농민계급으로 길러진 이들은 결코 특별한 이들이 아니었다. 대다수가 기근으로부터 도망쳐온 굶주린 무리들이었다. 그런데 이들의 번영과 우아함을 볼 때, 조선에 있는 이들의 동포들도 자신들을 보호해주는 정직한 정부를 만난다면 ‘사람’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핫산에서 크라스키노로 돌아오면서 필자는 국경지역 한인마을들의 흔적을 찾는 일이 학자 개인으로서는 너무나 힘든 작업임을 절감했다. 국경지역이라 러시아당국의 출입허가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도로사정이 나빠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외에 한인들의 주거지였음을 말해줄 수 있는 맷돌이나 집터 등 흔적을 말해주는 사람들조차 만나기 어려웠다. 사전에 모든 행정적 절차와 장비들을 준비하지 않는 한, 이들 한인마을들의 흔적을 찾는 일은 거의 절망에 가깝다.
핫산 방향과는 달리 크라스키노에서 훈춘까지 이어지는 길가에도 과거 한인 마을의 흔적들이 줄지어 있었다. 그 길을 따라가면 카미쇼바야강(Rechka Kamyshovaia)을 만나게 된다. 과거에는 파티예강(Rechka Fatie)으로 불렸다. 바로 이 강가에 위치했던 마을이 파타쉬(Fatashi)로 한인들은 ‘바도소’ ‘바도쇠’라 불렀다고 전해진다. 이 마을은 ‘베르흐네 파타쉬(상바도소)’ ‘스레드네예 파타쉬(중바도소)’ ‘니즈네예 파타쉬(하바도소)’의 3개 마을로 구성되어 있었다.
1895년에 작성된 러시아 기록에 따르면, 하바도소는 집과 텃밭이 딸린 농가 58가구가 있었던 마을로 이른바 러시아국적을 취득한 원호인 마을(原戶村)이었다. 탐험대만 연안에 자리잡은 이 마을에는 4개의 제염소가 있었다. 상바도소에는 8가구, 중바도소에는 50가구가 거주했다.
이 마을의 토지는 점토가 섞여 있는 흑토층이었는데 귀리와 감자 배추 등이 잘 자랐다. 덕분에 주민들은 이들 채소와 작물을 군부대에 1년에 3000루블어치어치씩 납품해 비교적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
김광훈과 신선욱은 ‘강좌여지기’에서 “바도소의 호총(戶總)이 143가구에 달하는데 거민(居民)의 여러 가지 모습은 흑정자와 같다”고 기술했다. 그러나 2년 후에 작성된 ‘아국여지도’에서는 97가구 639명이 거주하고 있다고 하여, 앞서의 기술을 수정하였지만 러시아 기록과는 거의 일치하고 있다. 이 마을에는 1909년 당시 선흥의숙(鮮興義塾)이 설립되어 있었는데, 한기육 등이 청년자제들을 열심히 가르쳤다. 이 마을 인근에 또 다른 한인마을인 풍투이마을이 있었다고 하는데 아쉽게도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림같이 아름다운 경치
바도소 마을에서 30리 정도 떨어진 곳에 노바야 데레브냐(Novaia Derevnaia)라는 한인마을이 있었다. 주류허강(Rechka Churikhe, 珠留浦 또는 珠河), 즉 현재의 노보고로도브카강(Rechka Novogorodovka)가다. 한인들은 강 이름을 따 주류포, 또는 주하촌이라고 불렀다. 노바야 데레브냐 역시 상, 중, 하의 3개 마을로 이루어졌는데, 각각 상소(上所), 중소(中所), 하소(下所)라고 부르기도 했다. 이 마을은 1878년 지신허와 연추에서 온 이주민들이 개척했다. 이들은 주류허강의 거의 모든 계곡에 흩어져 정착했는데, 계곡의 길이는 20베르스타(21km), 폭은 2베르스타(2.1km)다. 마을들은 경사가 완만한 비탈과 크지 않은 참나무 숲이 있는 낮은 산에 둘러싸여 있다.
한인농민들은 늪지대를 제외한 거의 모든 계곡을 경작했다. 심지어는 산의 비탈까지도 일궜다. 이 마을에는 1907년 겨울 마을 유지들이 아이들 교육을 위해 모현의숙(帽峴義塾)을 창립하였지만 운영난을 겪다가 1909년 봄 장기준, 허익 등이 발기하여 교사를 새로 짓고 학교 이름을 창흥학교(昌興學校)라고 바꿨다. 이 학교는 1917년까지 러시아당국의 지원을 받아 유지되었지만, 러시아혁명 이후 다시 어려워졌다.
노바야 데레브냐에서 5베르스타(5.3km) 떨어진, 바로 중국과의 국경지대에 작은 한인촌락이 있었는데, 마을이름을 ‘밝은 계곡마을’이라는 뜻의 ‘명산사(明山社)라고 했다. 공식적으로는 노바야 데레브냐에 속해 있지만, 전혀 별개의 작은 마을이었다. 1890년대 초반 이 지역을 답사한 러시아 지리학자는 “여기에 이르는 길은 그다지 안전하지는 않지만 깊은 산 크지 않은 계곡 사이로 나 있다. 그림같이 아름다운 산과 경치에 둘러싸여 불편한 길을 잊게 한다”고 주변의 경관을 예찬했다.
노바야 데레브냐에서 가도를 따라 국경방향으로 2베르스타(2km) 더 가면 러시아령 훈춘(Khunchun)이 나온다. 이 곳에는 주산관(珠山關)이라 불린 러시아수비대에 300명의 기병이 주둔하고 있었다. 주산관과 훈춘 사이에도 겐막골(Genmiakori), 샤벤지(Siabendi), 치차골(Tsiatiakori 또는 Tsyziakori) 등의 작은 한인마을들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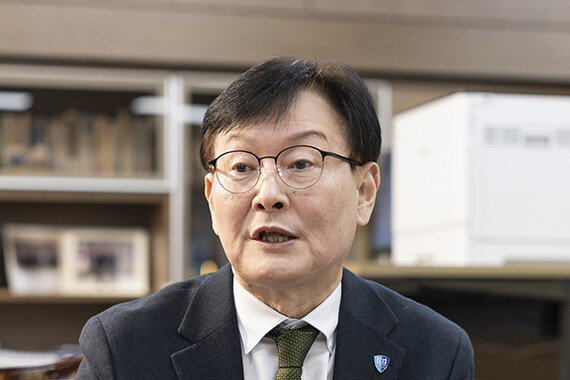


![[밀착취재] 리딩방 70여 명 대부분이 한통속…기망하는 수법까지 매뉴얼화](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48/98/bd/694898bd2399a0a0a0a.jpg)


![[지상중계] 제12회 나지포럼, “북미 정상회담 성과내기 어려워”](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43/48/32/69434832107aa0a0a0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