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2기의 원전을 가동하고 있는 일본은 혼슈(本州) 최북단에 위치한 롯카쇼무라(六ヶ村)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임시 보관장을 운영하고, 최근에는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공장을 짓고 있다. 롯카쇼무라는 왜 이러한 ‘혐오시설’을 유치하게 되었는가.
- 롯카쇼무라는 원자력 시설 유치를 주장한 주민들과 반대한 주민들이 주민소환 투표까지 치르는 갈등을 겪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지역 개발론이 우세를 점해, 과감히 원자력 시설을 유치했다. 이로써 롯카쇼무라는 지역발전과 함께 원자력은 위험하지만 통제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한낮인데도 기온은 6℃. 기자는 일본 전역이 한여름일 것이라 생각하고 반팔 티셔츠에 한여름용 재킷만 걸치고 이곳을 찾아왔다. 도쿄(東京)는 서울보다 더웠지만 이곳은 예상 밖으로 쌀쌀했다. 아오모리켄은 쓰가루(津輕)해협을 경계로 홋카이도(北海道)를 마주한 북위 41。쯤에 있다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 실수였다.
바람도 매우 거세서, 이곳 저곳에 다소곳이 서 있는 벚꽃과 개나리는 맥없이 꽃잎을 떨구고 있었다. 일본어에 서툰 기자가 어설프게 “사무이데스네(寒いですね·춥네요!)”라고 하자, 마중 나온 일본인들이 “에에, 사무이데스카(예에-. 춥습니까?)” 하며 웃는다. 그들은 점퍼 안에 스웨터까지 입고 있었다.
여섯 개의 마을이 모인 촌락
롯카쇼무라는 신록에 덮여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매우 황량했다. 오죽 특색이 없었으면, 이곳 지명이 ‘여섯 개의 마을’이라는 뜻을 가진 롯카쇼무라(六ヶ村)가 됐을까. 실제로 이곳은 메이지 천황 때인 1889년 4월1일 구라우치(倉內) 등 여섯 개 마을을 모아 ‘롯카쇼무라’라는 행정 단위를 만들었다고 한다.
이곳은 태평양에 면하고 있어 바람이 아주 세고 겨울도 길어서 농작물 재배에 적당치 않다. 때문에 이곳에서는 추위에 강하고 땅 속으로 자라는 당근이나 감자·마·무 따위의 고랭지 채소가 주로 생산된다. 6월까지도 눈을 이고 있는 하가타(八甲田)산 국립공원마저 없다면, 볼 것도 먹을 것도 적은 아주 쓸쓸한 지역이 되었을 것이다.
지금은 그래도 덜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롯카쇼무라는 일본에서 가장 가난한 곳 중의 하나였다. 이곳에는 초등학교는 8개, 중학교는 5개가 있으나, 고등학교는 1개뿐이고 대학은 없다. 따라서 이곳 아이들은 중학교를 마치면 대부분 현청(縣廳) 소재지인 아오모리 등 대처로 떠날 수밖에 없었다. 한국의 농촌처럼 젊은이는 떠나고 노인만 남아,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곳이 롯카쇼무라인 것이다(현재 인구는 1만1700여 명 정도다).
그런데 최근 이곳에 새로운 볼 것이 생겼다. 1985년 일본원연(原燃·‘핵연료’라는 뜻)주식회사가 이곳에 농축우라늄 공장을 건설하고, 1992년에는 방사성 폐기물(방폐물) 처분장을 만들었다. 그리고 현재는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해 MOX 연료(Mixed OXide Fuel·혼합 산화연료)를 만드는 재처리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관광객들은 이러한 시설 옆에 들어선 일본원연(原燃)주식회사의 홍보관을 새로운 관광 코스로 방문하고 있었다.
이러한 시설 유치는 갈수록 황량해지던 롯카쇼무라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1970년 이곳의 주민 1인당 소득은 전체 일본 국민소득의 64.7%에 불과했다. 하지만 일본원연주식회사가 들어선 1994년에는 82.4%까지 따라붙었다. 일본원연주식회사 유치는 이 지역이 안고 있는 두 가지 골치 아픈 문제를 거의 동시에 해결해주었다. 하나는 방금 설명한 지역 발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원자력은 통제하지 못할 만큼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의 확산이다.
원자력은 위험하지만 통제할 수 있다는 인식을 토대로, 소득 증대를 꾀한 롯카쇼무라 주민들의 지혜는 우리에게는 타산지석(他山之石)이 아닐 수 없다. 일본인들은 ‘윈(win)-윈 전략’을 선택했는데, 현재까지 한국은 그 반대로 가고 있다. 그렇다고 일본에서 원자력 사고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오래 전부터 일본에서는 미쓰비시(三菱)계열의 ‘미쓰비시 원자연료’란 회사와 스미토모(住友)금속 계열의 ‘JCO(일본핵연료변환공장)’라는 회사가 핵연료를 만들어왔다.
한국은 경수로와 중수로만 운용하고 있으나, 일본은 이것 외에도 차세대 원자로라고 하는 ‘고속증식로’를 개발하고 있다. 경수로에서 사용하는 핵연료에는 우라늄 235가 3% 정도 들어가나, 고속증식로용 핵연료에는 20% 정도 들어간다. 일본은 시험용 고속증식로를 운영해 왔는데, 이바라키(茨城)켄 도카이무라(東海村)에 있는 JCO 공장에서는 시험용 고속증식로에 쓰이는 핵연료를 제작했다.
우라늄 235는 일정 농도가 될 때까지는 핵분열을 일으키지 않으나 어느 수치에 도달하면 갑자기 핵분열을 일으키는데, 이렇게 핵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임계(臨界)반응’이라고 한다. 1999년 9월30일 도카이무라의 JCO에서 임계반응 사고가 일어나, 작업자 한 명이 죽고 한 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일어났다. 사고 원인은 고속증식로용 핵연료의 제작 날짜가 다가오자 마음이 급해진 작업자가 제작공정을 무시하고 일시에 너무 많은 양의 우라늄을 집어넣어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고로 인해 일본 열도가 시끄러워져, JCO는 사실상 해체되었다. JCO가 사고를 일으켰다면 일본원연주식회사의 우라늄 농축공장이 있는 롯카쇼무라의 주민들도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롯카쇼무라 주민들로서는 일본원연에 대해 “당장 공장 가동을 중단하라”고 압력을 가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예상 밖으로 작았다. 그 결과 롯카쇼무라에는 재처리공장 건설이 진행되었고, 이제는 이러한 시설이 들어섰음을 알리는 홍보관이 관광코스로 자리잡았다.
한국에서는 한전원자력연료(주)가 경수로용 핵연료와 중수로용 핵연료를 가공·제작한다. 이러한 기관에서 임계사고를 일으켰다면, 언론과 시민단체들은 사고와 무관한 기관에 대해서도 “가동을 중단하고 당장 폐쇄하라”고 외쳤을 것이다. 그러나 JCO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일본 언론은 사실 보도만 하고 더 이상의 선동을 자제했다. 이는 ‘원자력은 규정대로 다루지 않으면 위험하다. 하지만 일본의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는 이러한 시설이 꼭 필요하다’는 인식을, 일본 언론들이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원폭으로 인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국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을 육성해야 한다고 판단한 일본 중앙정부와 기업들, 그리고 정부와 기업의 이러한 의지를 이용해 지역 발전을 꾀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절묘한 타협이 롯카쇼무라에 들어선 일본원연의 시설들이다. 롯카쇼무라에 일본 원연이 들어서기까지의 과정은 민주적인 타협이라는 지방자치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까지 한국에서는, 한국전력이 거의 모든 전기를 생산하고[發電], 이 전기를 각 가정과 공장에 나눠주었다[配電]. 그러나 올해부터 배전은 한국전력이 독점하되, 발전은 여섯 개 발전 회사가 담당하게 되었다. 일본의 전력(電力)시스템은 우리 시스템과 크게 다르다. 일본은 여러 개의 섬으로 구성된 관계로, 무려 10개의 전력회사가 있다.
이 전력회사들은 과거의 한국전력처럼 그들이 위치한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과 배전을 모두 담당한다. 한국전력은 공기업이지만, 일본의 전력회사들은 민간기업이다. 10개 전력회사 중 오키나와에 있는 ‘오키나와전력’은 소비되는 전력이 너무 적어, 발전 용량이 큰 원자력 발전소를 짓지 않았다. 오키나와전력을 제외한 일본의 아홉 개 전력회사는 모두 원자력발전소를 갖고 있다.
그리고 10개의 전력회사 외에 일본원자력발전주식회사라는 또 하나의 발전회사가 있다. 이 회사는 미국에서 원자력발전을 도입하던 시절 원자력 발전 기술을 익혀 9개의 전력회사에게 기술을 나눠주기 위해 만들어진 회사다. 이 회사와 9개의 전력회사가 보유한 원자력 발전소는 모두 52기다(한국은 16기).
롯카쇼무라에 위치한 일본원연주식회사는 9개 전력회사와 일본원자력발전주식회사가 공동으로 투자해 설립한 회사다. 롯카쇼무라에 일본원연주식회사가 위치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단체인 롯카쇼무라와 일본원연주식회사 사이의 이해 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이야기는 196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본 중앙정부가 낙후된 지방을 발전시키기 위해 ‘신(新)전국종합개발계획’을 결정한 것은 1969년 5월30일이었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오지인 아오모리켄 일대에 대한 개발 계획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일본 중앙정부는 롯카쇼무라 일대에 석유화학 콤비나트를 건설한다는 계획안을 검토했다.
지역 개발은 그 지역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터를 수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누대에 걸쳐 한곳에서 살아온 사람들 중 일부는 고향을 떠나기 싫어 롯카쇼무라 개발 계획에 반대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롯카쇼무라는 개발 찬성과 개발 반대로 갈려 시끄러워졌다.
개발 반대를 외친 대표자는 롯카쇼무라의 촌장(村長)인 데라시타 리키사부로(寺下力三郞)씨였고, 개발 찬성론의 대표자는 촌의회 특별위원장인 하시모토 가츠시로(橋本勝四郞) 의원이었다. 찬반 대립이 극대화하자, 양파(兩派)는 상대를 굴복시키기 위해 주민투표로 상대의 파면을 결정하는 ‘주민소환’을 발의했다. 1973년 롯카쇼무라에서는 두 사람을 놓고 주민소환(파면)을 결정하는 주민 투표가 치러졌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간발의 표차로 소환을 모면했다. 제1차전은 무승부가 된 것이다.
그러나 그해 12월에 치러진 촌장 선거에서는 개발 지지파인 후루카와 이세마츠(古川伊勢松)씨가 당선됨으로써, 개발 쪽으로 축이 기울기 시작했다. 그 후 후루카와씨는 4선을 기록하며 89년까지 촌장을 지냈는데, 그가 촌장을 보던 시절 일본은 1차 오일쇼크(1973년)와 2차 오일쇼크(1979년)에 부딪혔다. 이 일을 계기로 일본 중앙정부는 석유화학 콤비나트 건설을 포기하고 석유비축기지 건설을 서둘렀다. 1979년 이러한 일본 중앙정부의 의지를 파악한 후루카와 촌장은 일본의 제1호 석유 비축기지를 롯카쇼무라에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그런데 기대했던 만큼 많은 석유비축 기지가 들어서지 않아, 공단 예정지로 설정해놓은 땅이 남게 되었다. 1984년 일본전기산업연합회가 “롯카쇼무라가 놀리는 땅에 핵연료 시설을 지어도 되겠느냐”고 문의해왔다. 이에 대해 후루카와 촌장은 여론 수렴에 나섰는데, 유치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이듬해인 1985년 일본의 10개 발전회사들은 공동으로 일본원연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이곳에 우라늄 농축공장을 짓기 시작했다.
쓰치다 村長의 벼랑끝 전술
우라늄 농축공장 건설은 이 지역에 개발 찬성과 반대라는 또 다른 분쟁을 가져왔다. 그 결과 후루카와 촌장이 출마하지 않은 채로 치러진 1989년 촌장선거에서는 “더 이상 공단을 유치하지 않겠다”고 공약한 ‘동결파’의 쓰치다 히로시(土田浩)씨가 당선되었다. 쓰치다 촌장은 명분만 추구하지 않고 실리를 좇는 성동격서(聲東擊西) 전술을 구사할 줄도 알았다. 그는 농축우라늄 공장 건설에 이어 이곳에 재처리공장과 고준위 방폐물 임시보관장을 짓고 싶어하는 일본원연주식회사 등과 마주앉아 오랜 협상에 들어갔다.
쓰치다 촌장은 전형적인 ‘벼랑끝 전술’을 구사했다. ‘개발 동결’을 내세운 그는 사용후핵연료와 방폐물의 보관장소를 찾지 못한 일본전기산업연합회와 일본원연주식회사를 애태웠다. 그리고 좋은 조건을 받을 때마다 조금씩 개발을 허용했는데, 그가 촌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일본원연주식회사는 우라늄 농축공장을 완공하고 이어 저준위 방폐물 영구처분장을 만들어 조업에 들어갔다(1992년). 그리고 1995년에는 가장 문제가 된 고준위 방폐물 임시보관장을 완성했다.
가장 빡빡한 상대였던 쓰치다 촌장 시절, 일본원연주식회사가 고준위 방폐물 임시보관장을 완성했다는 것은 상당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이 시기 일본원연주식회사는 52기 원전에서 받은 사용후핵연료를 영국의 BNFL과 프랑스의 코제마 사로 보내 재처리를 맡겼다. BNFL과 코제마는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해 다시 원자로에 넣는 MOX연료를 만들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고준위 방폐물을 함께 일본으로 보내주고 있었다(현재는 코제마사만 고준위 방폐물을 일본으로 보내고 있다).
MOX연료와 고준위 방폐물은 배에 실려 롯카쇼무라에 있는 무츠오가와라(むつ小川原) 항구로 운반되는데, 이 배가 출항을 준비하면 ‘그린피스’를 비롯한 전세계의 반핵(反核)단체들은 바빠진다. 한국의 반핵단체들도 이 배가 대한해협을 비롯한 한국 근해로 지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벤트성’ 시위를 준비한다. 이 배가 무츠오가와라 항구에 도착하면 다카기 진사부로(高木仁三郞) 박사와 히로세 다카시(廣瀨隆)씨 등 대표적인 일본의 반핵운동가들이 사람들을 이끌고 무츠오가와라 항구에 나타나 시위를 벌이곤 했다.
롯카쇼무라에 도착한 MOX연료는 곧 원전으로 옮겨가 사용되지만, 고준위 방폐물은 롯카쇼무라에 보관된다. 반핵단체들이 주목하는 것이 바로 고준위 방폐물이다. 고준위 방폐물은 방사능덩어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위험한 쓰레기다. 때문에 영국과 프랑스의 재처리 공장에서는, 이 쓰레기를 고열을 가해 액체상태의 유리에 섞어, 높이 1.3m, 지름 33㎝, 두께 5㎜의 스테인리스 원통에 집어넣는다. 그리고 스테인리스 원통을 냉각하면 유리 성분은 단단한 고체로 변해, 자기와 뒤섞인 고준위 방폐물을 꽉 잡고 있게 된다(유리화).
유리질 속에 갖혔는 데도 불구하고 고준위 방폐물은 열을 내뿜는다. 때문에 스테인리스 원통의 외부 온도는 무려 200℃까지 올라간다. 이 온도가 100℃ 이하로 내려가는 데 30~50년이 필요한데, 이 기간 동안 스테인리스 원통은 롯카쇼무라의 창고에 임시 보관되는 것이다. 롯카쇼무라 도착 다음날 기자는 이 회사의 홍보과장인 모리 하루미(森春美)씨의 안내를 받아, 프랑스에서 가져온 스테인리스 원통을 보관하는 임시 보관장을 방문했다.
모리 과장의 설명에 따르면, 이 임시 보관장은 강력한 지진에도 끄떡 없도록 지하 20m까지 파내려가 거대한 암반을 찾아낸 후, 그 위에 건설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거대한 암반 위에 ‘연탄’처럼 구멍이 숭숭 뚫린, 콘크리트 ‘저장 피트(pit)’를 만들었다. 저장 피트에 뚫린 이 구멍들은 ‘수납관’이라고 하는데 16m 깊이의 수납관에는 9개의 스테인리스 원통이 들어간다. 9개의 원통이 들어간 수납관은 두께 1.9m의 거대한 뚜껑이 덮여 30∼50년간 관리된다. 롯카쇼무라의 임시 보관장에는 160개의 수납관이 건설돼 있어 모두 1440개의 스테인리스 원통을 집어넣을 수 있다. 모리 과장은 “이러한 시설과 별도로 현재 160개의 수납관을 가진 임시 보관장을 추가로 건설하고 있다”고 밝혔다.
30∼50년이 지나 스테인리스 원통이 100℃ 이하로 내려가면, 수납관에서 꺼내 이 원통들의 ‘무덤’이라고 할 수 있는 지하 500∼1000m의 영구 처분장으로 옮긴다. 일본 조야는 아직 영구 처분장을 마련하지 못했는데, 고준위 방폐물의 영구 처분장 지정과 건설은 향후 일본 조야가 고민해야 할 문제다.
한국은 국내는커녕 해외에서도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고준위 방폐물 임시 보관장을 건설조차 못하고 있는데 일본은 이 단계를 훌쩍 뛰어넘은 것이다. 한국은 그 전단계에 해당하는, 16기의 원전에서 쏟아져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할 때까지 보관하는 시설과 중·저준위 방폐물의 영구 처분장 등을 짓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유치 공모를 벌이고 있다.
롯카쇼무라에서 50㎞ 남쪽에 있는 미자와(三澤)시에는 F-16 전투기를 운영하는 미 제5공군의 제35전투비행단과 일본 항공자위대 북부항공방면대 산하 제3항공단 기지와 공군 사격장이 있다. 때문에 전투기들은 공중 기동 훈련을 하다 실수로 롯카쇼무라의 고준위 방폐물 임시 보관장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에 대비해 일본원연주식회사는 임시 보관장에, 최고 지름 45㎜ 철근을 집어넣은 강화콘크리트를 이용해 두께 1m 이상의 지붕과 벽을 씌웠다.
미국에서 실제 실험한 결과 이러한 재질과 두께를 가진 건물은 중형기가 떨어져도 파괴되지 않는다고 한다. 2000년 6월15일 일본원연주식회사는 F-16을 참조해서 일본이 미국과 공동 개발한 F-2전투기가 추락했을 때를 가정해, 방호벽 두께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는데, 미국에서와 같은 결론이 도출됐다고 한다.
기자를 임시 보관장 안으로 안내한 모리 과장은 “법적으로 허용된 이곳의 최대 방사선량은 연간 최대 2밀리 시비트인데, 실제로는 그 1000분의 1 내지는 1만분의 1만 검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시보관장 내에 있는 계측기는 100분의 1 밀리 시비트까지만 잴 수 있는 것이라, 이 계측기는 0.00밀리 시비트를 가리키고 있었다. 모리 과장은 “임시 보관장으로 돌아와야 할 스테인리스 원통은 모두 2200개인데 5월10일 현재 464개가 돌아와, 이중에서 검사를 끝낸 320개가 수납관에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준위 방폐물 임시 보관장을 건설했으면, 저준위 방폐물 영구 처분장을 짓는 것은 그야말로 ‘누워서 떡 먹기’다. 저준위 방폐물은 노란색 드럼통 안에 들어가는데, 드럼통에서는 미약한 방사선이 나오기 때문에 방호복을 입지 않고 가까이 가도 안전하다. 일본원연주식회사는 오부치(尾驕) 호수 건너편에 있는 야산을 파, 가로 세로가 25m이고 높이가 6m인 콘크리트 박스를 여러 개 설치한 후, 그 안에 5000개의 드럼통을 넣고 콘크리트를 부어 밀봉하고 있다. 일본원연은 두 개의 저준위 방폐물 처분장을 운영중인데, 이곳이 다 차면 4m 두께로 흙을 덮고 그 위에는 꽃밭을 만들 계획이라고 한다.
1995년 일본원연은 쓰치다 촌장을 설득해 ‘일본 원자력계의 꿈’인 재처리 공장을 짓기로 하는 데 합의했다. 현재 68%의 공정률을 보이는 이 공장은 2005년 7월 완공될 예정이다. 이 공장이 완공되면 일본원연은 영국과 프랑스로 보내 위탁 재처리하던 사용후핵연료를 이곳에서 일부 재처리하게 된다.
1997년 12월 치러진 촌장 선거에서 3연임에 나섰던 쓰치다 촌장은 적극적인 개발론자인 하시모토 히사시(橋本壽)씨에게 패해 촌장직에서 물러났다. 하시모토 촌장이 당선됨으로써 롯카쇼무라의 원자력 연구 본산지화는 더욱 빨라졌다. 반면 찬반 양론으로 갈려 대립했던 주민들은 일상 생활로 돌아가게 되었다.
일본에서 가장 깊이 판 온천
일본원연주식회사 담장에서부터 불과 500m쯤 떨어진 곳에는 일본에서 가장 깊은 데서 물을 끌어올린다는 ‘롯카쇼무라 온천탕’이 있었다. 기자는 일본원연을 취재하는 과정에 수차례 이 온천탕 앞을 지나갔는데, 그때마다 ‘과연 고준위 방폐물 임시보관장 곁에 있는 온천탕이 장사가 될 것인가?’라는 의문을 품었다.
이러한 의문을 풀 겸 으슬으슬한 추위도 떨칠 겸, 기자는 취재 차량을 세우고 300엔(약 3300원)을 내고 온천탕에 들어갔다. 사우나는커녕 비누도 수건도 비치돼 있지 않은 아주 작은 온천탕이었다. 기자는 다시 300엔을 주고 수건을 샀는데, 수건에는 국립공원인 하가타(八甲田)산 높이인 2100m만큼 파고 들어갔다는 그림이 그려 있었다.
탕은 너무 작아서 네 명만 들어와도 꽉 찰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탕 바로 앞에는 노천탕(露天風呂)이 있었다. 노천탕은 1.2m쯤 돼 보이는 판자로 담을 치고 그 위로 한참 공간을 남겨둔 채 반투명 슬레이트 지붕을 올렸다. 그래서 몸을 세우면 비를 맞고 있는 주변 풍경을 바라볼 수 있었다. 문제는 강풍을 타고 을씨년스럽게 쏟아지는 비였다. 바람을 등에 업은 빗줄기는 슬레이트 지붕과 판자 담 사이로 난 공간으로 사정없이 몰아쳐, 노천탕은 텅 비어 있었다.
온천물은 혼탁한 다갈색(茶褐色)이라서 욕조 바닥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무심결에 찍어 먹어본 물맛은 찝찔했다. 2000여m를 파 들어갔으니 태평양 물이 침투한 까닭이리라. 그렇다면 만의 하나 일본원연의 시설물이 파괴돼 고준위 방사성 물질이 지하로 스며든다면, 온천수를 오염시킬 수도 있다. 한국에서라면 이러한 곳에 설치된 온천탕은 장사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곳 농부들은 온천탕 이용을 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인 듯, 목욕가방과 수건을 들고 들어와 한참을 쉬다가 돌아갔다. 일본원연은 롯카쇼무라의 일부가 된 것 같았다.
롯카쇼무라는 원자력 시설을 유치하는 대신 일본 정부를 비롯한 각종 기관에서 제공한 지원금으로 1997년 700여 석의 객석을 갖춘 극장과 대소 연회장, 3만 권의 책을 소장한 도서관까지 갖춘 ‘롯카쇼무라 문화교류플라자’를 지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변화가 일어났다. 일본원연에서 일하기 위해 롯카쇼무라로 이주해오는 사람이 늘어나, 1995년부터는 인구 감소가 중지된 것이다. 롯카쇼무라는 아오모리켄의 67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15세 이하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되었다.
JCO의 임계 사고 같은 위기에도 불구하고 롯카쇼무라 주민과 일본원연은 타협점을 찾아내, 롯카쇼무라도 살고 일본 원자력산업도 사는 윈-윈 구도를 만들어냈다. 일본의 이러한 성공은 같은 문제로 고뇌하는 우리에게도 큰 참고가 된다. 한국과 일본은 석유나 석탄 같은 에너지원을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한국은 석유가 전혀 나지 않지만 일본은 니카타 부근에서 소량의 원유를 채취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일 양국은 일찍부터 원자력 발전을 시작해, 전체 발전량의 30∼40%를 원자력 발전으로 생산하고 있다. 두 나라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하고 나온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해 MOX 연료를 만드는 데도 똑같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 원자력계는 JCO 사고를 겪고도 재처리시설과 고준위 방폐물 임시 보관장을 짓는 데 성공했다.
이제는 한국도 결정해야 한다
한국의 원자력계는 JCO와 같은 사고를 낸 적이 없다. MOX 연료를 생산하는 과정에 나오는 고준위 방폐물을 임시 보관하는데 일본은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냈으나 우리는 재처리는커녕 원자력 발전소 안의 사용후핵연료를 옮겨다 보관할 관리시설을 짓는 데도 전혀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은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을 짓는 데 필요한 60만 평의 부지를 내줄 기초자치단체 유치 공모에 들어갔다. 이 공모 작업은 오는 6월 말로 마감한다.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을 유치하는 자치단체에 정부와 한전은 3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Y군과 또 다른 Y군 등이 롯카쇼무라처럼 방폐물 관리시설을 유치해 지역발전을 도모할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은 과연 윈-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인가. 지방자치단체들이 결단을 내려야 할 시간이 코앞에 다가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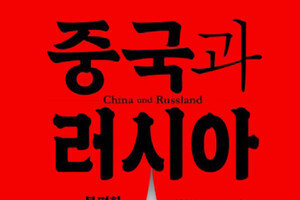




![[전쟁이 남긴 빈자리②] 혼자 아닌 ‘연대’로... 요르단 난민들의 회복 공동체](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3f/d5/4a/693fd54a1f36a0a0a0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