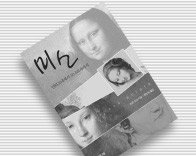
‘미소-안티고네에서 모나리자까지’ 소피 쇼보 지음, 진인혜 옮김/영림카디널
미소는 유토피아를 향해 열린 마지막 창문이다. 그것은 “불가능 속에서 가능함이 솟아오르게 하는 것(조르주 바타이유)” 또는 “땅 위에 하늘이 잠시 나타나는 것(크리스티앙 드 바르티야)”이다.
미소는 눈·입·이마·관자놀이·입아귀 등이 관련된 신체의 움직임이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드러낸다. 미소는 누구의 눈에도 쉽게 띄기에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지만 다른 한편 붙잡을 겨를도 없이 한순간에 사라진다. 그래서 미소는 수수께끼다. 미소는 “인간의 문화와 문명이 현세의 삶을 매력적으로 바꾸기 위해 만들어낸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발명품”이다.
또 미소는 타자와 소통하는 매개적 행위다. 미소는 “권위와 확신, 자아의 껍질로 둘러싸인 자기방어의 벽을 허물고” 육체 저 깊은 곳에 숨은 마음에까지 스며든다. 나의 미소는 상대방의 공격성을 완화하고 경직성을 누그러뜨려 나의 뜻과 의지를 상대방의 마음에 닿게 한다.
부처의 미소, 모나리자의 미소
미소와 웃음은 분명 다르다. 미소는 웃음의 흔적이 아니라 독자적인 영역에 속한다. 미소는 내부에서 생성된 기쁨의 자연스러운 표현이며 내면에 확립된 견고한 정신적 자세를 드러낸다. 미소는 신체의 표면으로 밀려나온 심리적·정신적 만족감이며 기쁨이다. “미소는 의례의 표현이면서 육체적·심리적 상징체계에 속한다. 미소에 함축된 상징적 의미는 기호와 의미, 의미작용의 세계에 속해 있다.”
반면 웃음은 “온몸에 파문을 일으키고 몸의 내부와 외부 사이에 살며시 열려 있는 입을 중심으로 몸의 기운이 한데 모이게 하지만, 그로 인해 무의식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다. 아울러 웃음은 “수치심에 대한 자기방어이자 자기 자신과 거리를 두는 하나의 방식”이고 그리하여 “우리 안의 잉여물, 무의식적인 사고, 좋지 않은 추억 등을 내보내는 것”이다. 이처럼 웃음은 내부에서 강제되지 못한 채 바깥으로 밀려나오는 도발이며 폭발이다.
웃음은 긴장을 해소하고 내적 이해에 이르게 한다. 정신분석학자들은 웃음이 언어를 압도하고 사고를 순간 정지시킨다는 사실 때문에 일종의 퇴행 현상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웃음은 일순간 에너지를 웃음 그 자체에 집중시키기 때문에 행동과 판단을 무력화시키기도 한다.
고대 이집트의 파윰에서 로마시대의 조각상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군데에도 미소를 찾아볼 수 없는데, 이는 중세 전기까지 서양에 미소가 없었음을 말해준다. 신들은 인간의 죄를 응징하는 천둥과 번개를 내리는 존재였기에 이들은 자비로운 미소 대신 형이상학적인 고함이나 꾸짖음만 퍼부었다. 이 어두운 시대에 미소는 악덕으로 여겨졌다.
13세기에 와서야 비로소 얼굴은 단순히 신체의 표면이 아니라 정신과 영혼을 드러내는 거울이 된다. 보티첼리, 리피, 페루지노, 기를란다요, 레오나르도 다 빈치, 라파엘로의 회화에 미소가 나타난 것도 그 무렵이다.
미소는 시대와 문화에 따라 그 차이를 드러낸다. 이를테면 일본인의 미소는 엄격한 처세술의 원칙이라는 규범에 갇힌 미소다. 일본인은 미소를 사회 규범으로 발전시켜 제도화했다. 그것은 중세 일본사회에 일상화된 폭력과 관련이 있다. 폭력이 일상화된 사회에서 미소는 상대방을 안심시키며 아울러 폭력을 유발하는 빌미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일본인은 미소의 사회적 유용성을 일찍이 깨달았던 것이다. 일본사회에서 미소는 공동체의 삶에서 유발되는 우발적 폭력을 제압하고, 사회적 평화와 일체감에 기여하는 제도로 정착했다.
가장 이상적인 미소는 부처의 미소다. 저자도 고백하고 있지만 서양인의 눈으로 보자면 부처는 못생긴 얼굴이다. 아름답지도 젊지도 않으며, 성별·연령을 분별할 수 없는 모호한 얼굴이다. 하지만 부처의 미소는 “모든 미소의 정수이고 절정이며 극치”다. 사람의 미소는 대상을 필요로 하지만 부처의 미소에는 대상이 없다. 아울러 부처의 미소에는 목적도 없고 객체도 주체도 없다. 부처의 미소는 해탈과 평정, 무욕과 선한 본성, 숭고한 자기집중에 이른 내면에서 스스로 솟아 바깥으로 뻗쳐나가는 빛과 같다. 우리는 다만 그 빛의 수혜자일 뿐이다.
가장 알 수 없으며 그렇기에 신비한 미소는 모나리자의 미소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가 그린 모나리자가 짓는 미소는 시간을 초월한 미소다. 모나리자는 눈썹이 없다. 모나리자의 미소는 양쪽 입가를 살짝 올린 이상야릇하며 부자연스러운 미소다. 보는 이마다 그 미소에 대한 해석을 달리한다. 누군가는 모나리자가 임신중이었을 거라고 추측한다. 누군가는 모나리자가 크나큰 슬픔을 참고 있는 거라고 말한다. 누군가는 몇 시간의 모델 노릇에 엉덩이와 팔다리가 눌리고 저려서 화가에게 쉬고 싶다는 사인을 보내는 거라고 말한다.
모나리자의 미소에는 인간과 신, 천사와 악마, 고상함과 관능성, 혐오스러움과 매혹, 가면과 실체와 같은 양가(兩價)적 요소들이 동시에 구현되어 있다. 남자들이 여자에 대해 여전히 잘 모르는 것처럼 모나리자의 미소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 모나리자의 미소는 애매하며 수수께끼를 안고 있다. 그래서 수많은 해석과 추측이 나온다.
미소 없이는 사랑도 없다
미소의 도덕성은 고귀함과 저속함 사이에 걸쳐 있다. 슬픔, 울음이 내면의 표출이라면 기쁨, 웃음은 외부의 자극에서 비롯된다. 미소는 그 중간쯤에 위치한다. 내면에 충만한 기쁨과 행복함에서 나온 내적인 미소, 승리의 미소, 고통을 감추고 실패를 승화시키는 패자의 미소, 갓 태어난 아기의 미소, 간호사의 미소, 노인의 미소, 자연의 미소. 이는 고귀한 미소들이다. 미소의 고귀함은 종교의 덕성이 지닌 숭고함에 비견할 만하다. 그것은 불행에 대한 항체이자 무관심과 잔인성, 어리석음과 증오에 대한 훌륭한 치료약이자 진통제다.
반면에 가면 속의 미소, 매춘부의 유혹하는 미소, 인종차별주의자의 미소, 모략가의 미소, 술수에 능한 정치가의 미소, 가식적인 자선가의 미소, 선동가의 미소 등은 부정적이며 저속한 미소들이다. 저속한 미소의 특징은 거짓된 애정이나 상냥함을 가장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저속한 미소는 일반적으로 미소에 위배되는 것을 미소로 위장한다.”
미소 없이는 사랑도 없다. 미소는 상대방을 사랑하겠다는 무언의 약속이며 자신이 상대방의 소유물임을 고백하는 행위다. 그래서 미소는 “베풂”이고, 고집스럽게, 혹은 순박하게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다. 미소가 내면화하는 그 한없는 신뢰의 고백 덕분에 “연인들을 육체 행위, 즉 사랑의 행위”로 이끌게 되는 것이다. 미소는 키스와 포옹의 대체적 행위며 마취제이자 최음제이다. “그리하여 눈이 감기고 몸이 서로 엉킬 때 미소는 키스와 포옹 속으로 녹아 들어간다.” 모든 것을 불태우려는 미친 듯한 사랑의 욕망 앞에서 짓는 미소는 “숨겨진 자아 깊숙이에서 흘러나오는 감동, 그리하여 상대방의 모든 것에 대해 무방비로 마음을 열어놓은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때의 미소는 외부로 향한 것이자 내면을 향한 것이다. 그 미소는 낯설기만 한 한 영혼에게 나를 맡길 때 내면에서 일어나는 혼란과 서투름, 두려움과 불안을 다독이고 잠재운다. 그 미소가 없다면 나는 누군가에게 내 몸과 영혼을 맡겨 사랑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 책을 쓴 프랑스 여류소설가 소피 쇼보는 미소를 박멸하는 공격적이며 냉혹하고 폭력적인 세계의 게릴라이자 미소의 혁명가다. 그는 우리에게 “슬픈 현실에 적극 대항하는 미소, 행복의 무기로서의 미소”를 부활하자고 선동한다. 또 그는 파라오 중 유일하게 미소 짓는 얼굴로 묘사된 이크나톤, 동양인의 미소, 부처의 미소, 아기의 미소, 서양 회화에 나타난 미소, 강제수용소에 갇힌 유대인과 나치의 미소, 동물의 미소, 연인들의 미소를 독창적인 시각으로 탐구한다. 이 책은 문명의 가장 소박하고 가장 이상적인 이미지라는 미소에 대한 찬가이자 매력적인 탐구를 담은 에세이다.



















![[밀착취재] 리딩방 70여 명 대부분이 한통속…기망하는 수법까지 매뉴얼화](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48/98/bd/694898bd2399a0a0a0a.jpg)


![[지상중계] 제12회 나지포럼, “북미 정상회담 성과내기 어려워”](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43/48/32/69434832107aa0a0a0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