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정했던 이두호씨의 부모. 이씨의 부친은 주벽이 심했으나 모친은 정성을 다해 이를 받아주었다. 그러한 어머니의 성정이 이씨를 바로잡아 주었다고 한다.
나는 3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어릴 때 아명은 ‘삼시’였다. 삼 줄기처럼 질기게 오래오래 살라고 할머니께서 지어주신 이름이란다. 집안에서는 물론, 나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 나를 삼시라고 불렀다. 그러나 초등학교에 들어간 후로는 삼시라는 아명 대신 두호로 불렸으며 중학교 때쯤에는 아무도 나를 삼시라고 부르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단 한 분 아버지께서는 가끔 초저녁이나 밤중에 대문 밖에서 “삼시야” 하고 나를 부르셨다. 그러면 나는 하늘이라도 날 듯 기뻐했다. 그런 날은 아버지께서 술을 드시지 않은 날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참으로 술을 좋아하셨다. 담배도 손끝에서 떠날 때가 없었다. 오죽했으면 동네 청년들이 “아무개 어른 지금 손에 담배를 들고 계실까, 술잔을 들고 계실까?” 하는 내기까지 했을까.
한 달에 스무대여섯 날은 만취로 귀가가 늦으셨고 그런 날이면 우리 식구들은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어머니께선 아무리 늦은 시간이라도 아버지께서 들어오지 않으면 주무시는 법이 없었다. 우리 형제들은 자다가도 아버지가 오시면 일어나 인사를 드려야 했다. 어머니께서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셨다.
선잠이 들었다가도 아버지가 오시는 기척이 나면 나는 대문 쪽으로 바짝 귀를 기울였다. “어험어험” 하시는 아버지의 헛기침 소리가 두어 번 들리면 나는 숨이 끊어질 것처럼 긴장했다. “삼시야” 하고 부르시면 나는 “예에” 큰소리로 대답하고 얼른 뛰어나가 대문을 열어드렸다.
그러나 “삼시야”라고 부르는 대신 “문 열어라” 하실 때면 가슴이 철렁하는 불안과 공포에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잦아들었다. 그런 날은 십중팔구 술을 드신 날이기 때문이다.
그런 날은 지옥이었다. 아버지의 주정으로 어머니는 물론 우리 형제들도 밤새도록 잘 수가 없었다. 아버지는 금방 주무실 때도 있었지만 그런 일은 가뭄에 콩 나기였다.
초등학교 다닐 때쯤으로 기억된다. 그 날 아버지께선 몹시 취하셨다. 밥상이 엎어지고 방문짝이 날아갔다. 마당의 장독들도 박살이 났다. 좀처럼 대거리를 하지 않으시던 어머니도 더는 참을 수가 없으셨던지 목청을 높이셨다. “애들 더 고생시키지 말고, 고마 이녁하고 나 죽읍시다!”
어머니의 말씀이 끝나기 무섭게 아버지는 마루 밑에서 무엇인가 들고와 방 안에 뿌리셨다. 방 안에는 기름 냄새가 등천했다. 아버지께서는 마루 밑 기둥 뒤에 놓여 있던 라이터용 휘발유가 든 병을 갖고 나와 뿌리신 것이다. 나는 ‘휘발유 냄새’라는 것을 직감했고 반사적으로 윗목에 있던 라이터와 성냥을 품안에 감추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어머니는 며칠 동안 앓아 누우셨다. 술이 깨신 아버지께 나보다 열 살이나 위인 누나가 호소와 원망을 퍼부었으나, 아버지는 아무 말씀 없이 부서진 문짝을 고치실 뿐이었다.
아버지는 솜씨가 참 좋으셨다. 아버지의 손을 거치면 도저히 쓸 수 없을 정도로 박살난 문짝도 말끔하게 새것으로 되살아났다. 밥상도 말짱해졌다.
그래서인가, 가끔 동네 어른들은 내가 그린 그림을 보고 “그놈 참, 솜씨는 영판 아버지 닮았구먼”하고 말씀하시곤 했다
아버지는 솜씨뿐만 아니라 머리도 참 좋으셨던 것 같다. 4대 독자로 태어나 하기 싫은 공부와는 담을 쌓고 사셨다지만 웬만한 한문은 줄줄이 꿰셨다. 스무 명 남짓 되던 일꾼들의 임금을 아무 기록도 없이 일한 날짜와 돈을 기억해가며 머리로 정확히 계산해내셨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가 미웠고 술이 원망스러웠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버지보다 술이 더 원망스럽고 미웠다. 술을 드시지 않았을 때의 아버지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술만 드셨다 하면 온 집안이 공포에 떨어야 했으니 술이 원수 같았다. 그런데 그 원수 같은 술이 우리 집엔 늘 떨어지지 않았다. 어머니께서 술을 담가놓았기 때문이다.
하루하루 끼니 걱정을 해야 할 만큼 어려운 살림이었음에도 어머니가 술을 담근 것은 순전히 접대용이라고 할 수 있다. 아버지께선 이상하게도 집에서는 좀처럼 술을 드시지 않았다. 손님이 와도 조금밖에 안 드셨고 주정도 하지 않으셨다.
우리 집엔 찾아오는 손님이 많았다. 지나가는 까마귀라도 불러서 먹이고 입히고 할 만큼 인심이 좋은 아버지의 성품 탓이기도 했지만 어머니 역시 아버지가 계시든 안 계시든 집으로 찾아오는 손님을 그냥 보낸 적이 없을 정도였다.
미처 준비된 술이 없으면 나를 시켜 가게에 가서 술을 사오게 하셨다. 어머니께선 친척은 물론, 아버지 친구나 아버지 밑에서 일을 하던 일꾼들에게까지 정성껏 끼니를 대접하고 술을 내놓았다.
일이 별로 없는 추운 겨울에는 밤마다 아버지 친구분들이 우리 집에 오셔서 통행금지 시간이 다 되도록 놀다가 가셨다. 그때마다 방 안은 담배연기가 자욱해서 눈을 뜰 수 없을 지경이었다. 담배 몇 개비 걸어놓고 화투를 치거나 술내기 화투를 칠 때면 더욱 그랬다. 간혹 다투는 소리에 귀가 멍멍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나는 그게 좋았다. 아버지가 밖에 나가 술을 드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다음날,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면 또다시 불안하고 초조해지기는 마찬가지였다. 아버지의 주정은 변함이 없었다.
내 어금니가 깨진 사연
중학생이었을 때로 기억되는데 비가 약간 내리는 어느 날 밤이었다. 앉은뱅이책상 앞에서 무언가 긁적이고 있던 나는 설핏 동네어귀에서 고성이 오가는 소리를 들었다. 아버지 목소리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께서도 들으셨는지 형한테 가보라고 하셨다. 고등학교에 다니던 형은 창피스럽다면서 이불을 뒤집어썼다. 그러니 나라도 뛰어갈 수밖에 없었다.
구멍가게 옆 후미진 공터에는 구경꾼들이 빙 둘러서 있었고, 그 가운데에 웬 젊은이가 아버지의 멱살을 잡고 사정없이 흔들어대고 있었다. 나는 앞뒤 가릴 겨를도 없이 뛰어들어 그 젊은이의 턱을 머리로 받아버렸다. 이날 이때까지 누구한테도 얘기한 적이 없지만, 내 왼쪽 어금니 하나가 깨진 것은 그때였다.
나는 여전히 술이 원망스러웠고 아버지가 미웠다. 그러나 이것저것 생각이 많아지고 나름대로 사리판단도 깊어진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는 술보다도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더 커졌다.
어릴 때는 아버지를 취하게 만드는 것이 술이라는 생각에 술을 더 미워했는데, 이제는 ‘술 하나도 통제하지 못하는 아버지’라는 생각이 들어, 술보다 아버지가 더 원망스럽고 미웠던 것이다.
누나와 작은형은 여덟 살이나 차이가 난다. 어느 날 무단히 집을 나간 아버지가 조선팔도로 만주로 떠도시다가 여덟 해 만에 돌아오셨기 때문이다. 나중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그렇게 무책임한 아버지일 바에야 차라리 그때 영영 돌아오지 않았던 게 나았을 것이다’라는 생각까지 들었다.
행동으로 반항을 하거나 입으로 내뱉지는 않았지만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미움은 점점 커져만 갔다. 그런데 이처럼 차갑게 굳어가는 내 마음을 녹여준 것은 뜻밖에도 서슬 퍼런 어머니의 한 말씀이었다.

내가 미처 뛰어나갈 사이도 없이 “문 열어” 하시는 아버지의 고함과 함께 대문짝이 와지끈 부서졌다. 어머니께서 정갈하게 봐두신 밥상도 아버지의 발길에 마당으로 곤두박질쳤다. 아버지의 거친 주먹이 어머니의 얼굴로 날아갔다.
나는 뒤에서 아버지를 껴안았다. 억병으로 취한 아버지는 힘을 쓰지 못했다. 당시 내 키는 아버지와 어금버금했었다. 나는 아버지를 자리에 뉘여드리면서 한마디 내뱉었다.
“아부지는 아부지도 아입니더. 고마 돌아가셨으면 좋겠심더.”
한바탕 소란 끝에 아버지는 겨우 잠드셨다.
아침이 되자 평소와는 달리 어머니께서 나를 깨우셨다. 내가 눈을 비비며 뭉그적거리자 “일어나서 거기 좀 앉아보거라” 하셨다.
나는 여느 때와는 사뭇 다르게 상기된 어머니의 목소리에 벌떡 일어나 자세를 가다듬고 어머니의 안색을 살폈다. 어머니의 눈두덩이 퍼렇게 멍들어 있었다. 어머니는 정색을 하며 딱 한 말씀을 하시고는 부엌으로 나가셨다.
“이놈, 아부지가 아이라니? 이놈, 이 세상천지 어디에…, 아부지가 돌아가셨으면 좋다카는, 불효막심한 놈이 어디 있노?”
나는 한참이나 멍하니 앉아 있었다. 나를 보시고 “이놈” 하시던 어머니의 그 말씀! 나는 그때까지 한번도 어머니에게 “이놈” 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종아리 한 대 맞아본 적도 없었다.
어머니는 내가 막내라고 해서 편애하시거나 특별히 챙겨주지는 않으셨지만 늘 칭찬해주고 웃음을 짓는, 자애롭고 포근한 분이었다.
언젠가 어렸을 때, 밖에서 신나게 놀다가 집에 왔더니 늘 반겨주시던 어머니께서, 어디가 편찮으신지 혼자 방 안에서 앓고 계셨다. 나는 어머니의 이마를 짚어보고 다리도 주무르고 조바심을 치다가 부엌으로 가서 몰래 울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실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얼마나 울었던지…. 어머니께선 울다가 잠이 든 나를 꼬옥 끌어안아 주시면서 “걱정 말그래이. 엄마는 안 죽는다”고 하셨다.
등을 톡톡 두드려주며 날 안심시켜주던 어머니께서 나에게 이놈이라고 하셨으니…. 나는 놀라움보다도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나한테 이놈이라고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옆방으로 건너갔다.
아버지는 그때까지도 취중이라 세상 모르게 코를 골며 주무시고 계셨다. 나는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아부지예, 지가 잘못했심더. 다시는, 절대로, 그런 말 안 하겠심더” 그렇게 빌었다.
비록 아버지께서 술과 담배를 좋아하고 하룻밤 노름으로 집까지 날릴 만큼 온갖 잡기에 능하셨지만 그런 아버지를 어머니는 지극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나는 그제야 느꼈다.
내가 아버지를 껴안고 “아부지도 아입니더. 차라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심더”하고 악을 썼던 그때, 어머니께서 “하모, 맞다, 맞아. 애비가 애비 구실을 해야 애비지, 저 인간이 애비야? 웬수지!”라고 맞장구를 치셨더라면, 나는 아버지를 사랑할 수 없었을 것이다. 어머니도 사랑하고 존경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 것인가?
무단가출 여덟 해 만에 집으로 돌아오신 아버지는 낮에는 부끄러워 집으로 오실 수 없어 강 건너 나루터의 주막에 누워 천정갈비를 세고 계셨다고 한다. 그때 어머니는 (할머니가 시킨 것이었다고 하지만) 정성껏 푸새해 곱게 다듬질한 아버지의 옷을 가지고 주막으로 찾아가셨다고 한다.
그때, 누워계시던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 어머니의 손을 덥썩 쥐며 “임자, 고생 많았제?”라고 하셨다는데, 어머니는 아버지의 그 말씀에 마치 새색시처럼 잡힌 손이 떨리고 어찌나 부끄럽던지 고개도 들지 못하셨단다.
내가 군에서 제대를 하고 서울에서 자취를 하고 있을 때까지도 아버지의 주정은 여전했다. 가정 형편상 복학할 엄두도 못 내고 만화를 그리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가까운 친구가 찾아왔다.
나는 그와 저녁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간밤 꿈에 느닷없이 내 이빨이 빠지더라”며 꿈 이야기를 꺼냈다. 그때 주인 아주머니가 황급히 뛰어와 쪽지를 건네주었다. 펴보니 “부 친 위 독 속 래”라는 전보였다. 나는 곧바로 서울역으로 달려가 대구행 기차를 탔다.
아버지는 나를 겨우 알아보셨으나 말씀은 하지 못하셨다. 그저 입만 우물우물하시기에 귀를 바짝 갖다댔더니 들릴락말락하게 “삼시 왔나”고 하셨다. 나는 그때 참 많이 울었다.
아버지는 삼 년 동안 자리보전을 하다가 돌아가셨다. 어머니는 지극 정성이셨다. 대소변 받아내기는 물론이고 거의 매일같이 씻겨드렸다. 아버지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시고 말씀도 하실 수 없었지만 편찮으시기 전보다 오히려 더 건강한 모습이었다.
세월이 흘러 손자 녀석을 안고 어르시는 어머니께 내가 이렇게 여쭈어보았다.
“어무이요, 아부지 보시고 싶지예?”
어머니는 손자녀석 뺨에 입을 쪽쪽 맞추시며 “나 보기 싫어서 먼저 간 영감인데 보고 싶기는 뭐가 보고 싶노”라고 하셨다.
그러시면서도 이렇게 덧붙였다.
“아부지는 그 놋그릇에 밥을 담고 국을 퍼드리면 그렇게 좋아하셨는기라!”
아, 그 놋그릇은 내가 중학교 다닐 때 사생대회에서 장원을 해서 받은 상품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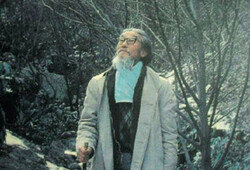


















![[밀착취재] 리딩방 70여 명 대부분이 한통속…기망하는 수법까지 매뉴얼화](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48/98/bd/694898bd2399a0a0a0a.jpg)


![[지상중계] 제12회 나지포럼, “북미 정상회담 성과내기 어려워”](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43/48/32/69434832107aa0a0a0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