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좋은 수석을 찾는 探石보다 더 중요하고 어려운 것이 養石이다. 양석은 바위 덩어리가 자연에 깎이고 깎여 수석으로 변모하기까지의 오랜 세월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수반에 앉혀진 수석에 시간이 날 때마다 물을 뿌려줘 물 속에 있던 원래의 제 색깔을 찾아주는 것이 양석이다. 수석 세계에서는 양석을 통해 인내를 배우라고 한다. 짧게는 1~2년, 길게는 십여 년이 넘도록 양석을 해야 수석에서 古態美가 돋아난다. 고태미가 돋아날 때까지 양석할 줄 아는 수석인이 참된 수석인이다.》

“이게 뭐처럼 보이냐?”
“돌”
자연 공부도 시킬 겸해서 수석의 형(形)이 무엇이냐고 물어본 것이었는데, 조카의 대답은 너무 간결했다. 잘못된 물음이었구나 싶어 얼른 고쳐 물었다.
“이게 뭐처럼 생겼냐?”
“돌”
또다시 명쾌하고도 간결한 대답이 나와, 나를 어지럽혔다. 이 일은 수석문화사에 입사해, 매달 전국의 베테랑 수석인들을 만나 취재하고 또 그들의 멋진 소장석(所藏石)을 감상해온 나의 수석관(壽石觀)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맞다. 돌이다. 아무리 멋진 수석이라도 그것의 본질은 돌이다. 가끔 수석인들은 이 사실을 잊고 사는 경우가 있다.
한갓 돌에 지나지 않는 자연물에 수석인들은 화려한 옷을 입혀 수석이라 칭한다. 또 이를 감상하며 정서적인 안정을 취하고 이러한 문화를 인류가 향유할 수 있는 최고의 정신문화로 자부하기도 한다. 수석인들의 자부심은 어디에서 연유한 것일까?
선택의 미학

예술품은 대개 예술가가 물질적 혹은 정신적 재료를 이용해 그의 능력으로 창조한 것이다. 수석은 이러한 창조 행위는 아니다. 그래서 수석을 ‘선택의 미학 속에서 추구되는 종합적인 예술’이라고 말한다. 종합적인 예술이라는 말 속에는 그 어떤 예술가보다 위대한 자연이 빚은 작품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다. 자연이 수백년 혹은 수천년 간 어루만지며 만들어 낸 작품을 예술가의 안목으로 발견해 내는 것이 수석이고, 그 발견은 바로 창조와 다름없다고 설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수석을 ‘선택의 미학’ 혹은 ‘발견의 미학’이라고 부른다.
이런 이론을 들을 때마다 억지가 아닌가 싶을 때가 있었다. 말없는 돌을 가지고 억지춘향식으로 예술이니, 자연의 작품이니, 신이 빚은 작품이니 하며 법석을 떠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취재를 거듭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수석은 사람들의 안목을 충족시킬 만한 그 무엇을 지니고 있다고….
진화론은 네 발로 땅을 짚고 다니던 원인류(猿人類)가 진화를 거듭해 두 발로 설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그렇게 해서 자유로워진 손에 무엇인가를 쥐게 됐는데, 그것이 나무와 돌이었다. 이처럼 돌은 원인류의 첫 허전함을 채워주는 그 무엇으로 인류와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돌은 인류 문명 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웠다.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에는 가장 중요한 도구이자 무기를 만드는 재료로 쓰이면서, 구석기와 신석기 문화를 이끌어 나갔다. 청동기와 철기 시대를 거쳐 지금까지도 돌은 건축 자재를 비롯한 다방면에서 소재로 이용되고 있다.
도구나 무기나 재료로 쓰인 돌은 전부 사람이 가공한 것들이다. 인공(人工)이 가미된 돌인 것이다. 그러나 수석은 다르다. 수석은 자연이 빚어냈다. 이처럼 자연이 빚은 예술을 찾아(이를 探石이라고 한다) 감상하는 것이 수석이다. 수석인들이 감상하는 돌 속에는 자연의 경치가 축소되어 있다. 이 축소된 자연을 바라보면서 연상력을 통해 원래의 자연으로 펼쳐내 감상하는 것이 수석인의 예술관이다.
때문에 마리아상을 한 수석을 탐석하면 그 만큼 경건히 어루만지게 된다. 경북 경산군에 사는 정춘덕씨는 달마 형상을 한 수석을 탐석한 후 이 돌을 제대로 감상하기 위해 달마와 선(禪)에 관련된 책자를 십여 권이나 읽었다고 한다.
박학다식한 聯想力이 수석하는 첫째 조건
좋은 수석을 소장하려면 남보다 뛰어난 심미안(審美眼)이 있어야 한다. 심미안을 가지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가?
내 경우에는 먼저 수석 이론에 관한 책을 읽었다. 여러 권 책을 읽다 보면 여러 책에 중복해서 소개된 내용이 발견되는데, 그것만 파악해도 일단은 성공이다. 그리고는 필자가 현재 일하고 있는 ‘월간 수석문화’ 등 수석 전문지를 읽는 것이다. 전국 각지에서 탐석한 다양한 수석을 매달 잡지에서 접하는 것은 심미안을 높이는 지름길이다.
세 번째로는 매년 봄 가을 전국 각지에서 개최되는 수석 전시회를 찾는다. 아무래도 사진으로 보는 수석보다는, 실물로 보는 수석이 심미안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네 번째로는 수석 산지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여 직접 탐석여행에 나서는 것이다. 이러한 순서를 거쳐 심미안을 쌓아나가면 초보자들도 산지(돌밭)에 나가 어떤 수석을 탐석해야 하는지 감을 잡게 된다.
수석인은 박학다식(博學多識)함을 많이 강조한다. 특히 미술과 관련된 분야에 박학다식해야 좋은 돌을 탐석할 수 있다. 때문에 수석인 중에는 화가나 서예가, 또는 고서화를 수집하는 사람이 많은 편이다.
이러한 준비를 끝냈으면 수석을 감상하는데 필요한 연상력(聯想力)을 갖춰야 한다. 연상력이란 조그만 돌에 갇혀 있는 수천 수만 년의 자연을 역사에 빗대 객관적으로 풀어낼 줄 아는 능력이다. 연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역사서·종교서를 비롯한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취미로 수석을 즐기는 사람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김대중 대통령도 청와대에 수석을 두고 즐긴다고 한다. 그 외에도 숱한 연예인과 음악인, 미술인 등 예술계 쪽 종사자들이 수석을 즐기고 있다.
수석을 즐기는 사람들은 대개 장년층이다. 젊은 수석인도 있지만 그래도 나이가 든 분들이 주로 수석을 즐기고 있다. 수석인들은 공통적으로 고서화나 골동품 수집, 낚시, 분재, 난 기르기 등을 취미로 병행하고 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점점 흥미를 잃어가는데, 유독 수석만은 그렇지가 않다고 입을 모은다.
한 원로 수석인은 그 이유를 “나이가 들수록 낚시는 힘에 부치고, 난이나 분재는 잠깐이라도 관심을 놓으면 죽어 여간 애를 태운단 말이지. 그러나 수석은 그런 일이 없어요”라고 설명했다.
수석의 매력은 돌의 불변성에 있다. 탐석한 돌을 잘 닦아 감상할 수 있도록 좌대(나무로 조각한 받침)나 수반(자기나 동으로 만든 수석 받침)에 올려놓으면, 한 달 이상 방치해도 변함이 없다. 수석 즐기기에는 늘 물을 뿌려주는 양석(養石)이라는 과정이 있지만, 이러한 과정을 생략해도 돌은 죽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원로 수석인들은 지금의 삶에서 더 이상의 변화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수석을 좋아하는지도 모르겠다.
자연은 사람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존재다. 그러나 현재를 살아가다 보면 ‘일상에 쫓기다 보니…’라는 핑계로 자연을 잊고 홀대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멋진 자연을 화폭에 옮겨 안방에 걸어 두거나, 정원을 지어 “여기가 무릉도원입네” 하며 시를 짓고 살아온 사람도 적지 않다.
수석이 바로 자연을 옮긴 그림이고 정원이다. 자연을 닮은 돌, 즉 ‘축경(縮景)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돌이 수석이다. 금강산 만물상을 닮은 돌을 탐석해 자기(瓷器) 수반이나 동(銅)수반에 고운 모래를 깔고 올려 놓으면, 수석인은 안방에서 유유자적(悠悠自適)히 금강산을 노니는 신선이 된다.
우리나라의 역사에는 수석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온다. 삼국유사에는 80여 개의 돌을 보고 불경을 설했다는 승전(勝詮)법사 이야기가 있다. 조선 세조 때의 서화가인 인제(仁齊) 강희안(姜希顔)은 ‘양화소록(養花小錄)’에서 ‘괴석(怪石)은 굵고 곧은 덕을 지니고 있어서 참으로 군자(君子)의 벗이 됨이 마땅하다’며 수석을 찬양했다. 강진에서 유배 생활을 한 다산 정약용도 직접 탐석한 수석으로 작은 산(石假山)을 만들고 그 주위를 파내 연못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지금도 남아 있다.
퇴계 이황과 매천 황현은 수석에서 선비 정신을 찾았고, 추사 김정희도 수석을 즐겼다. 보길도에서 유배 생활을 한 윤선도도 수석을 아꼈고, 이를 바탕으로 ‘오우가(五友歌)’라는 시조를 지었다. 창경궁이나 덕수궁 경내에는 전래석(傳來石)이라는 수석이 있고, 대원군 이하응이 애석(愛石)한 기록이 운현궁에 남아 있다.
이렇게 전통을 쌓아오던 수석 문화는 일제 강점기를 지나며 삶에 겨워 단절되다시피 했었다. 근근이 명맥을 유지하던 수석 문화는 30여 년 전 이비인후과 의사로 명성을 날리던 한기택 박사에 의해 부활하였다. 한박사 이후의 수석 문화에서는 새로운 기준이 많이 생겨 조선조까지의 수석 문화와는 달라진 점이 많다.
좋은 수석은 질과 형과 색에 의해 결정된다. 질(質)은 돌의 경도를 말하는 것으로 수석이 되려면 어느 정도 단단해야 한다. 그러나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할 필요는 없다. 너무 단단하면 수석의 다음 기준인 형(形)이 좋은 수석이 되기 힘들기 때문이다. 돌의 경도를 나타내는 모스(MOHS) 경도로 5도 정도의 돌이 수석으로 적당하다. 이러한 경도를 가진 수석의 대표로는 남한강에서 많이 나는 오석(烏石)이 있다.
형(形)은 돌의 생김새를 말하는 것으로 수석이 되려면 그 형이 희귀해야 한다. 과거에는 수석의 기준으로 질이 으뜸이었지만 지금은 형을 먼저 살피는 것으로 순위가 바뀌고 있다. 수석의 형에는 산수경석(山水景石)·형상석(形象石)·물형석(物形石)·문양석(文樣石)·색채석(色彩石)·추상석(抽象石) 등이 있다.
산수경석은 말 그대로 산·바위·섬·폭포·호수 같은 산수(자연물)의 형태를 가진 수석을 말한다. 형상석은 생명이 있는 것, 다시 말해 사람이나 물개·두꺼비·거북 등을 닮은 수석을 말한다. 물형석은 생명이 없는 물건, 즉 초가 지붕이나 조각배·자동차·고인돌·도자기·항아리 등의 형상을 한 수석이다.
문양석이란 돌 표면에 양각이나 음각으로 문양이 그려진 수석을 말한다. 이때 그려진 문양은 객관성이 있어야 하고, 자연 경관을 닮은 것이 좋다. 추상석은 그 형이나 문양이 뚜렷한 것 외에 감상자의 심미안에 따라 분류되는 수석을 말한다. 추상석이라고 해서 주관적인 해석을 너무 강조해서도 곤란하다. 주관적인 해석이 강조된 추상석은 소장자 이외의 사람들은 가치를 두지 않게 된다.
색(色)은 돌의 색깔을 말하는 것으로, 은은한 것일수록 좋은 평가를 받는다. 보면 볼수록 정감이 솟아나도록 금방 싫증이 나지 않는 색깔이 좋다. 수석인들이 선호하는 색은 검은색 계통이다. 남한강산 오석(烏石)이 수석의 대명사로 꼽히는 것은 색이 좋기 때문이기도 한다. 이 외에도 청색, 묵색(墨色), 녹색, 적색 등의 색이 있는데, 이들도 원색이 아니라 검은 색이 많이 함유돼야 좋은 평가를 받는다.
한기택 박사에 의해 현대 수석이 시작될 때만 해도, 수석 하면 산수경석이었다. 산수경석 외의 것은 수석 범주에 넣지도 않을 정도였다. 이때를 대표하는 산수경석이 남한강산 오석으로 된 그 유명한 ‘단봉 원산석(單峯遠山石)’인데, 이 돌은 현대 수석의 고전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산수경석의 탐석이 점점 더 어려워지자, 수석 분류가 다양해졌고 그에 맞춘 탐석이 시작됐다. 강변에서만 탐석하던 문화가 해변으로 넓어져, 해석(海石)을 수집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다(그러나 해석의 가치는 강변에서 탐석한 수석에 비해 떨어진다).
古態美가 나올 때까지 養石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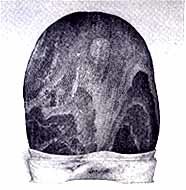
양석이란 한마디로 바위 덩어리가 자연에 깎이고 깎여 수석으로 변모하기까지의 오랜 세월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수반에 앉혀진 수석에 시간 날 때마다 물을 뿌려 물 속에 있던 원래의 제 색깔을 내게 하는 것이 양석이다. 이러한 양석은 수석을 찾는 탐석과 수석을 잘 감상할 수 있도록 수반에 배치하는 연출보다 훨씬 더 지루하다.
그래서 수석인들은 양석을 통해 인내를 배우라고 한다. 짧게는 한두 해, 길게는 십여 년이 넘도록 양석을 해야 수석에서 고태미(古態美·예스러움)가 돋아난다. 수석을 제대로 감상하려면 고태미가 날 때까지 느긋이 기다리며 양석할 줄 알아야 한다.
수석인들의 영원한 고향은 남한강이다. 충주댐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수석인을 만나려면 남한강으로 가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돌 좋던 남한강변 일대가 충주호의 담수로 수몰된 후 충북 단양군 일대의 수산·괴곡·지곡·도화리·청풍·한수 등이 새로운 탐석지로 꼽히고 있다.
충주댐 하류에 있는 충북 충주시 엄정면 묵계리에는 대한민국 제일의 수석 장터가 있는데 이곳도 훌륭한 탐석지로 꼽히고 있다. 엄정면에 인접한 조탁골과 덕은리 일대, 그리고 괴산군 청천면·청원군 미원면 등도 좋은 돌이 많은 곳이다.
그 다음으로는 임진강과 한탄강, 남한강 상류인 영월과 정선이 꼽히고 있다. 금강 줄기와 경북 점촌·문경 일대, 경북 북부에 있는 농암천 부근, 대구 팔공산 파계사 계곡, 지리산, 전남 보성의 제석산 일대도 괜찮은 탐석지다.
바닷돌, 즉 해석을 찾을 만한 곳으로는 전남 완도 일대의 섬과 부산의 일광 해변, 울산시 동주 주전동 일대 해안, 그리고 충남 서산과 포항 해변 등지가 꼽히고 있다.
수석인들은 말한다. 돌밭을 찾았을 때, 생활의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어서 좋다고. 그러나 탐석이 도피는 아니다. 탐석은 마음의 안정에서 오는 편함을 즐기는 수련 과정이다.
여울을 따라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며, 혹은 잘박잘박 발 아래 부서지는 작은 파도를 느끼며, 마음에 드는 수석을 찾으려고 집중하다 보면 어렵기만 하던 세상 일들이 착착 정리된다. 더위도 식히고 마음도 가라앉히는 탐석이야 말로 최고의 피서법이다.
우리나라에서 수석을 한 점 이상 소장하고 있는 이는 12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상류층에서만 즐기는 취미로 알았던 수석이 이제는 대중화된 것이다. 이러한 수석인들이 정보를 교류하고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곳으로는 수석인총연합회(전화 02-386-6833)가 있다. 원로 수석인들의 모임으로는 석기원(石耆苑)이 있는데 석기원은 수석인총연합회의 자문기구이기도 하다.
수석인들이 받은 오해 중 하나가 자연 파괴자 또는 환경 파괴자라는 것이다. 과거 수석 이론이 제대로 정립돼 있지 않던 시절, 일부 수석인들은 큰 바위에서 수석 모양이 되는 부분을 절단하기도 했다. 또 자연보존에 대한 인식이 낮았던 때라 환경오염을 유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의 수석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자연을 아끼고 보존하려고 애쓰고 있다.
壽石人은 자연 파괴자인가?
수석인들은 작은 돌에서 삼라만상의 아름다움을 찾는다. 수석에서는 선조들처럼 선비 정신을 찾고,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도 키우고 또 건강도 유지할 수 있으니 이것보다 더 좋은 취미가 어디 있으랴! 그러나 밝음 뒤에는 그늘이 있다. 우리의 수석 문화가 젊은 층에게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마음과 정신을 살찌우자고 시작한 수석이 고액의 돈 거래로 변질되는 현상도, 또 인공이 가미된 조석(彫石)이 자연석으로 둔갑해 판매되는 것도 모두 답답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이런 그늘은 빨리 걷혀야 한다.
수석에 관심 없는 친구에게 수석 한 점을 내놓고 “이것이 달(月)이고, 이것은 단풍이 짙게 든 가을 산이네. 이 부분은 폭포야. 들어보게! 시원한 폭포수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라고 했더니, 그 친구 왈 “수석인들은 정신 나갔구먼. 어디에 폭포가 있고, 폭포수는 또 뭔가…”라고 하더란다.
“여러분, 자연은 여러 분 마음 속에 있습니다. 마음 속에 있는 자연을 담을 수 있는 취미가 바로 수석입니다.”






















![[지상중계] 제12회 나지포럼, “북미 정상회담 성과내기 어려워”](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43/48/32/69434832107aa0a0a0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