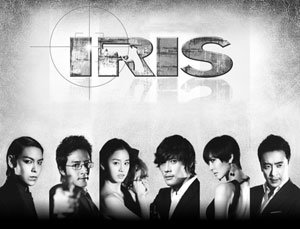
KBS2 TV 드라마 ‘아이리스’
이 드라마는 ‘시청자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헤럴드경제 2009년 12월 10일 보도) 사실 우리의 일상은 TV에 강력히 종속돼 있다. 그래서 재미있는 드라마가 방영되는 동안엔 국민의 평균 ‘삶의 질’이 올라가고 그 드라마가 종영되면 ‘삶의 질’도 내려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많은 시청자는‘아이리스’ 같은 인기 드라마를 보면서 ‘플로(flow)’를 경험한다. 미하이 칙센트미하이(Michaly Csikszentmihalyi)에 따르면 ‘플로’는 “어떤 것에 깊게 몰입하면서 시간의 흐름이나 공간, 자신에 대한 생각까지 잊어버리게 되는 상태”다.
아이리스의 ‘정치 메시지’
드라마에서 배우는 드라마 작가가 써준 대로 연기하고, 작가는 대개 ‘평범한 재능’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대사와 액션이 작가의 손을 떠나 TV화면을 통해 수천만 시청자에게 노출되는 순간 그것은 ‘괴물’이 된다. 대사와 액션은 ‘독립된 생명력’을 얻고 ‘특정한 메시지’를 전파한다. 플로 상태의 시청자는 이를 무의식적으로 수용한다. 메시지는 때때로 사회를 보는 틀, 즉 ‘교과서’가 된다. ‘아이리스’는 남북정상회담, 대통령, 국가정보기관을 배경으로 삼는 ‘정치 드라마’다. 그렇다면 ‘아이리스’가 주는 ‘재미’와 그 속에 담긴 ‘정치 메시지’의 구조는 무엇일까.
이 드라마는 ‘블록버스터 첩보극’이라는 새로운 형식으로 시선을 잡았다. 그런데 이 형식을 구성하는 줄거리 흐름과 이야기 장치들은 미국 드라마 ‘24’와 닮은꼴이다.
‘아이리스’의 NSS(국가안전국)는 ‘24’의 CTU(대테러방지단)와 기구 성격, 임무, 사무실 구조, 내·외근조의 인적 구성, 인공위성을 이용한 추적, 조직 내부의 배신자, 전기 고문, 테러단에 습격을 받는 일화까지 비슷하다. NSS 현장요원 김현준의 활약상은 대통령 암살 저지, 핵 테러 저지인데 CTU 현장요원 잭 바우어의 ‘특기’가 바로 그것이었다.
다른 한편으로 초국가적 글로벌 비밀조직인 ‘아이리스(IRIS)’의 설정은 ‘앨리어스(Alias)’에서 따온 것이다. 김현준이 자신의 신분을 둘러싼 미스터리를 푸는 건 ‘본(Bourne)’ 시리즈의 매트 데이먼과 흡사하다.
이런 점에서 드라마 ‘아이리스’의 외형적 특성은 ‘브리콜라주(bricolage)’, 즉 ‘여기저기서 좋은 것들 가져와서 짜깁기하기’라고 할 수 있다. 이것들을 한반도의 정치 지형, 한국 특유의 감성적 러브라인에 자연스럽게 녹여 기존의 한국 드라마와도 다르고 ‘원형’인 미국 드라마와도 다른 느낌의 드라마가 나온 것이다.
‘국가’라는 괴물
특히 국제적 이슈인 ‘북한 핵’을 드라마 소재로 선택한 것은 아시아뿐 아니라 유럽, 미주 수출까지 염두에 둔 ‘상업주의’ 속성에 기인한다. 이 드라마의 제작사인 태원엔터테인먼트 정태원 대표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서양인들은 이명박 대통령은 몰라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다 안다”고 했다.
적어도 18회분까지 드라마 ‘아이리스’가 전달한 ‘정치 메시지’의 첫 번째 구조는 ‘국가주의(statism)’로 보인다. 이 드라마에서 국가의 이익은 개인의 이익보다 절대적으로 우선시된다. 이는 “아이리스가 뭔데 NSS와 대한민국을 배신해야 했어?”라는 최승희(김태희 분)의 대사에 집약된다.
백산 NSS 국장(김영철 분)은 이렇게 말한다. “대통령께서 이 나라를 위해 하고자 하는 일에 어떤 문제나 방해도 없이 그 뜻을 이루도록 도와드리는 게 저희의 임무이고 존재이유입니다.” ‘국가의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마키아벨리즘(machiavellism)’을 떠올리게 한다. 실제로 드라마에선 무수한 살상이 국가의 명령으로 실행된다. 김현준은 친구가 자신에게 총구를 겨누어도 결국 “나 역시 국가의 명령을 받았다면 그랬을 것”이라고 이해한다. 그는 대한민국을 배신했다 다시 돌아옴으로써 국가주의를 강화한다.

드라마 ‘아이리스’
‘NSS’와 ‘공화국(북한)’‘아이리스(IRIS) 조직’은 서로 대립적 관계이지만 국가주의는 이 셋을 관통한다. 박철영(김승우 분)은 아이리스 조직의 음모에 맞서 ‘공화국’을 구원한다. 핵 테러단의 캡은 원격 기폭에 실패하자 “광화문으로 직접 가서 터뜨린다”고 말한다. 부하들이 “우리 모두 죽자는 얘기입니까”라고 반발하자 “닥치고 내 말 들어. 우리의 죽음으로 임무를 완수할 수 있다면 조국과 인민은 우리를 기억할 것이다”라고 말한다.
이 대목에서 드라마 ‘아이리스’와 미드 ‘24’는 서로 다른 길을 간다. ‘24’의 후반부 시즌으로 갈수록 미국 대통령은 ‘위선주의자’‘겁쟁이’‘딸과 불화를 겪는 어머니’‘테러에 비참하게 죽는 약자’로 자주 묘사된다. 미국 대통령은 ‘정의의 수호신’에서 ‘인간’의 영역으로 끌려 내려온다. 대신 그 자리는 ‘휴머니즘’이 채운다. 잭 바우어는 대통령과 국가를 위해서가 아닌 단지 ‘많은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 대량살상무기와 맞선다.
‘포스트 포디즘’의 자화상
‘아이리스’의 ‘정치 메시지’를 구성하는 두 번째 구조는 ‘자본의 지배 구조’다. ‘NSS’와 ‘공화국’‘IRIS 조직’에서 각각 활약하는 주인공들은 비록 소속은 다르지만 ‘최고의 정예요원’이라는 공통된 캐릭터를 갖고 있다. 평균적인 수준의 직장인들에 의한 단순대량생산(포디즘·Fordism)은 이들 엘리트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주인공들은 조직 내에서 폭넓은 자율권을 행사하고 풍족하게 보상을 받으며 창의적으로 활동한다.
최승희는 툭하면 내규를 어기지만 조직은 이런 정도의 일탈을 용인한다. ‘융통성’은 현대의 자본이 고급 노동력을 포섭할 때 사용하는 유명한 전략이다. 궁극적으로 회사는 이들 정예요원들로부터 최고의 생산성을 이끌어내고 이들 요원을 거대한 지배구조에 종속시키는 ‘포스트 포디즘(Post Fordism)’을 구현한다. 주인공들은 회사가 무엇을 요구해도 해내고 만다. 그리고 이들은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가끔은 “우린 괴물이 될지 모른다”(김현준-최승희)고 자각하긴 하지만 말이다.
‘초경쟁사회’인 우리 사회에서 수많은 사람은 ‘회사의 전사(戰士)’가 되어가고 있다. 드라마 ‘아이리스’의 주인공들은 이들의 자화상이나 다름 없다.























![[지상중계] 제12회 나지포럼, “북미 정상회담 성과내기 어려워”](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43/48/32/69434832107aa0a0a0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