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 전문 기자인 제임스 만이 펴낸 책 ‘레이건의 반란(The Rebellion of Ronald Reagan)’.
레이건과 수전 매시는 이 만남을 통해 ‘뜻이 맞는 사이’로 발전했다. 매시는 러시아 전문가였지만 일류라고 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레이건은 매시가 전해주는 소련에 대한 설명에 큰 관심을 보였다. 배우 출신인 레이건은 중앙정보국(CIA)에서 올리는 소련 정보 보고서의 스타일을 싫어했다. 대학원 논문 쓰듯 소련의 군사·정치·경제·사회 분석을 담은 문서는 이미 일흔 줄에 들어선 레이건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반면 매시가 전하는 모스크바 정세에는 ‘사람 냄새’가 있었다. 소련의 일반 주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으며, 반세기가 넘은 공산당 지배에 대해 소련 인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외부 세계는 어떻게 보는지 생생한 이야기가 있었다.
수전 매시의 남다른 인생 역정도 레이건의 이목을 끌었다. 스위스 출신 부모를 둔 매시는 1950년대 미 해군장교와 결혼해 아들을 낳았다. 문제는 아들 로버트가 혈우병을 갖고 태어났다는 사실이다. 조그만 상처가 생겨도 피가 멎지 않는 혈우병은 매시로 하여금 혈액 제공자와 병원을 찾아 전전하게 만들었다. 그 후 매시는 성인학교에 등록해 러시아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혈우병을 앓는 아들을 둔 엄마로서 뭔가 그 심적 고통에서 벗어나는 출구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1960년대에 여덟 차례 소련을 방문한 매시는 70년대 ‘불새의 나라(Land of Firebird)’ 등 몇 권의 책을 출간했다. 그러나 러시아 역사를 다룬 이 책은 그리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그 후 매시는 아홉 번째로 소련에 가고자 했지만 소련대사관은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그전에 매시가 펴낸 소련의 망명 시인을 다룬 책이 당국의 비위를 거스른 것이다.

1985년 11월20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서기장(왼쪽)과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틀간 가진 정상회담을 마치면서 악수하고 있다.
이후 소련 문제를 담당하게 된 콥은 매시의 친필사인이 들어 있는 책 ‘불새의 나라’를 소련 측 당국자들에게 선사하기 시작했다. 1983년 봄 매시는 뉴욕 주재 소련대표부로부터 ‘만나자’는 전갈을 받게 된다. 뉴욕의 소련대표부에서 매시가 만난 사람은 게오르기 아르바토프였다. 당시 KGB 소속이었던 아르바토프는 안드로포프 서기장의 오른팔이었다. 매시가 비자 문제를 꺼내자 아르바토프는 이렇게 말했다. “일단 신청해보시오.”
“전쟁이 임박했다”

냉전 말기 수전 매시의 역할을 보여주는 사진들. 1 레이건 대통령과의 집무실 대화 2 레이건 대통령 부부와의 식사 3 고르바초프 서기장과의 만남.
1983년 9월 모스크바에 도착한 매시가 만난 사람은 ‘미국-캐나다연구소’의 라도미르 보다노프 부소장이었다. 부소장은 위장직함일 뿐 보다노프는 실제로는 KGB의 핵심간부였다. 당시 모스크바에서 미국-캐나다연구소의 위세는 하늘을 찔렀다. 원래 미소 관계를 담당하는 소련 측 라인은 외무성과 워싱턴 주재 소련대사관 라인이었다. 당시 소련 대사는 아나톨리 도브리닌이었지만, 1981년 레이건 취임을 계기로 외무성-도브리닌 라인은 급격히 힘을 잃었다. 새 정부의 등장과 함께 도브리닌의 백악관 접근이 어렵게 된 때문이었다. 그러자 KGB 출신으로 서기장 자리에 오른 안드로포프는 KGB와 미국-캐나다연구소에 힘을 실어준다.
이날 미국-캐나다연구소에서 미국에서 온 이류 러시아 전문가인 매시를 만난 보다노프의 첫마디는 “전쟁이 임박했다”는 것이었다. 소련은 실제로 ‘전쟁이 임박했다’고 믿고 있었다. 레이건은 소련을 ‘악의 제국’으로 묘사했다. 또 소련과의 협상 채널을 닫고 군비증강을 시도했다. 레이건 집권 1기에는 단 한 번도 소련과 전략무기 협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또 미국은 유럽에 신형 퍼싱미사일을 배치했는데, 이는 소련을 7분 안에 공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였다.
여기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배치된 소련의 스파이도 미국의 ‘임박한 공격’에 대한 정보보고를 연신 모스크바에 보내고 있었다. 뒤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당시 NATO에 파견된 KGB 지부장 올레그 고디프스키는 이미 영국 정보기관인 MI6에 포섭된 이중간첩이었다. 이 무렵 레이건 행정부는 핵무기 통제와 관련한 NATO 가입국들의 지휘체계를 점검하는 ‘아벨아처83(Abel Archer 83)’이라는 군사훈련을 준비하고 있었다. 고디프스키는 이와 관련해 ‘핵무기 지휘점검은 곧 핵 선제공격 준비’로 해석한 보고서를 모스크바에 날렸다. 훈련과정에서 NATO가 가상의 군사력을 이동시키고, 통신암호를 바꾸고, 비상수준을 격상시키자 고디프스키는 본국에 ‘미국의 핵 선제공격이 임박했다’는 정보보고를 올리기에 이른다.
사실 소련이 ‘전쟁이 임박했다’고 믿고 있다는 매시의 전언은 레이건에게는 새로운 내용이 아니었다. CIA는 이미 모스크바의 그 같은 동향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CIA 내부에는 그 정보의 해석을 놓고 두 갈래의 흐름이 있었다. 하나는 소련이 대미 평화공세를 위해 그 같은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스크바가 진짜로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이었다.
매시로부터 소련 수뇌부의 ‘전쟁 공포’에 대해 전해 들은 레이건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는다. 레이건의 상식으로는 소련이 미국의 선제공격을 겁내고 있다는 것을 믿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레이건은 자신의 안보보좌관인 로버트 맥팔레인을 불러 “소련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매시의 전언은 효과가 있었다. 레이건은 그해 12월 자신의 별장인 캘리포니아 팜스프링스에서 크리스마스 휴가를 보내면서 조지 슐츠 국무장관을 조용히 불러 “소련 수뇌부와 새로운 대화채널을 열라”고 지시하게 된다.
21회의 면담
이 과정에서 백악관 NSC는 수전 매시를 레이건 대통령의 ‘비공식 밀사’로 쓰기로 결정했다. 맥팔레인 보좌관은 매시에게 “모스크바에 가서 문화교류를 타진하라”고 지시했다. 백악관이 매시를 활용하기로 한 것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우선 매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민간 러시아 전문가였다. 따라서 소련이 미국의 제안을 거부하더라도 백악관으로서는 아무런 부담이 없었다.
게다가 매시는 백악관과 크렘린 사이의 직접 대화채널을 개설하는 데 안성맞춤이었다. 당시의 대화채널은 그로미코 소련 외무장관과 도브리닌 대사가 독점하고 있는 상태였고, 따라서 이 채널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외교적 결례라는 소련 측 항의를 피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매시는 기존의 채널을 뛰어넘어 크렘린 수뇌부와 직접 선이 닿을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었다.
여기에 매시는 레이건의 ‘소련 가정교사’ 역할도 수행했다. 대통령이 된 후에도 딱딱한 정치연설보다는 ‘재미있는 이야기’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즐겼던 레이건은 안보 분야에서도 끊임없이 ‘이야기’를 찾았고, 매시가 바로 그 적격이었다. 예를 들어 레닌그라드 사람이 러시아를 언급할 때는 ‘우리’라고 하지만 소비에트와 공산당을 언급할 때는 ‘걔네들’이라고 하더라는 식이었다. 레이건이 소련과의 핵 협상에서 애용한 ‘믿어라 그러나 검증하라’는 러시아 속담 역시 매시가 그에게 귀띔해준 것이었다.
1985년 고르바초프가 소련의 지도자로 등장하자 ‘비공식 밀사’ 매시는 한층 더 바빠졌다. 그해 11월 레이건은 제네바에서 고르바초프와 첫 번째 정상회담을 한 다음 핵협상과 2차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었다. 당시의 최대 고민은 2차 정상회담의 장소. 당시 소련은 매시를 통해 레이건 대통령에게 “모스크바에 오라”는 입장을 전달했고, 백악관은 “워싱턴 또는 제3의 장소에서 하자”는 입장을 전했다. 양국 정상의 이 같은 메시지가 수시로 오간 통로가 바로 매시였고, 매시는 이 막후 흥정의 한 축을 담당했다.
레이건 집권 2기에 미소 관계가 본격화하고 비공식 밀사인 매시의 역할이 더욱 커지자, 매시는 워싱턴 내부에서 견제를 받기 시작한다. 단순히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뿐 아니라 대통령을 통해 정책에도 간섭을 하고 있다는 것이 비판의 골자였다. 당시 백악관 NSC에서 소련을 담당하고 있던 잭 메틀록이 견제의 총대를 멨다. 여기에 1986년 이란-콘트라 사건이 터지자 백악관은 ‘프리랜서를 배제한다’는 방침에 따라 매시의 역할을 줄여나가기 시작한다.
매시가 이 무렵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100% 정확히 밝혀진 것은 아니다. 하지만 백악관 기록에 따르면 매시와 레이건은 1984년부터 1988년까지 총 21회 만났고, 수많은 서신을 주고받았다.
기울어가는 제국
잘 알려져 있다시피 고르바초프의 당초 목표는 미소 냉전의 종식이 아니었다. 우선은 소련 체제를 혁신하는 것이 그의 첫 번째 목적이었다. 다만 고르바초프는 어떻게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를 몰랐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권력기반인 공산당과 KGB, 군부와 충돌하면서 서서히 힘을 잃어갔다.
그중에서도 특히 심각했던 것이 군부 갈등이었다. 고르바초프는 집권 2년차인 1987년 5월 베를린을 방문해 동독과 폴란드,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의 공산당 수뇌부와 회동했다. 이 회동에서 고르바초프는 전격적으로 ‘바르샤바 독트린’을 발표한다. 소련과 동구권의 군사동맹을 방어용으로 국한하며 다른 나라에 군사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이는 1968년 소련이 체코의 인민봉기를 탱크로 쓸어버린 것과 180도 다른 정책전환이었다.
고르바초프의 바르샤바 독트린은 동구 공산권의 불만은 물론 소련 군부의 반대에도 부딪히게 된다. 소련 군부는 바르샤바 독트린이나 미국과의 핵협상을 ‘바보 짓’으로 간주했다. 소련의 안보를 위태롭게 만들고 군사력을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당시 소련 국방장관이던 세르게이 소콜로프는 바르샤바 독트린 발표 2주 뒤에 기자회견을 자청해 NATO가 군사력을 현대화하고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소련군은 군사력을 일방적으로 감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르바초프에 대한 군부의 불만을 간접적으로 표출한 것이었다.
이때 한 사건이 고르바초프와 소련 군부 사이를 결정적으로 갈라놓는다. 마티아스 러스트라는 19세 서독 출신 은행원이 단발 세스나기를 타고 핀란드에서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 착륙한 사건이었다. 당시 소련군은 레이더로 이 비행기를 포착했으나 4년 전 대한항공 격추 사건 때와 같은 국제적 비난을 우려해 5시간 동안 방치했다. 당시 동독을 방문 중이던 고르바초프는 사건을 뒤늦게 보고받고 노발대발했다. 모스크바로 돌아온 고르바초프는 소콜로프 국방장관을 비롯한 군부 장성 수백 명의 옷을 벗겼다. 그는 이 조치로 군부에 대한 자신의 장악력이 강해졌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같은 시기 소련군 장군들은 막후에서 고르바초프의 퇴출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고르바초프는 공산당이 자신이 목표로 하고 있는 체제개혁에 앞장서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고르바초프와 공산당도 충돌하게 된다. 1986년 4월 체르노빌 원전 사건이 발생하자 당시 공산당 간부들은 책임추궁이 두려워 사건 보고를 늦췄다. 뒤늦게 보고를 접한 고르바초프는 공산당이 ‘사건을 은폐한다’고 생각했다. 그 결과 소련의 신문과 방송은 체르노빌 사건을 연일 대서특필했고, 이어 고르바초프는 공산당에 대해 대대적인 물갈이를 실시했다. 이듬해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9차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정부와 공산당 간부들을 비밀투표로 선출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대표적이었다.
고르바초프가 군부와 충돌한 것은 필연적인 결과였다. 고르바초프는 소련의 경제를 회복하고 체제를 개혁하길 원했지만, 당시 소련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엄청난 돈을 퍼붓고 있었다. 따라서 고르바초프는 아프간 전쟁을 끝내고 국방비를 줄여 그 정치적 경제적 공간을 활용해 체제를 활성화하자는 전략을 세웠다.
그러나 1986년 무렵 시작된 고르바초프의 정치실험은 1990년대에 들어서자 도도한 흐름이 되어버렸다. 더군다나 이 와중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으로 소련 군부와 공산당 보수파들은 하나둘씩 그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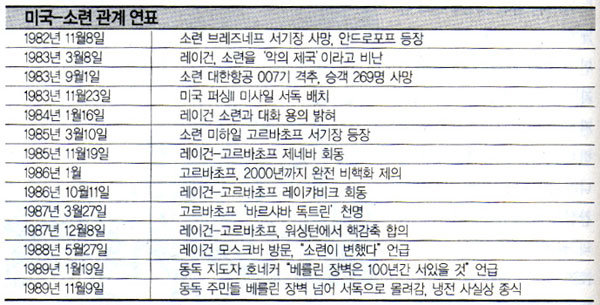
이렇게 놓고 보면 ‘별들의 전쟁(SDI)’은 냉전 종식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1986년 10월 레이건과 고르바초프는 아이슬란드의 레이캬비크에서 만났다. 당시 고르바초프는 소련이 전략무기를 일방적으로 50% 감축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이 제안에는 한 가지 조건이 달려 있었다. 미국이 ‘별들의 전쟁’ 계획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레이건은 이 요구를 거부했고, 정상회담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소련이 ‘별들의 전쟁’을 우려해 군비를 증강했다는 가설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레이건이 집권 2기에 고르바초프와 핵협상에 나서자 미국의 골수 우파와 리처드 닉슨 같은 우익 정치인들은 우려와 반대를 표했다. 고르바초프는 소련 공산당의 ‘또 다른 얼굴’에 불과하므로 그와 마주 앉아 무엇을 협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레이건은 겉으로는 우파적인 수사를 구사하면서도 고르바초프를 다른 눈으로 보고 다른 정책을 구사했다. 이러한 행보가 고르바초프에게 ‘정치적 공간’을 마련해준 것이었다.
레이건도 고르바초프가 개혁과 개방에 성공하지 못할 공산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레이건은 고르바초프와 얼굴을 맞대고 제네바와 레이캬비크, 모스크바에서 잇따라 정상회담을 가졌다. 당시 레이건이 노린 것은 이 정상회담을 통해 소련의 군부와 골수 공산당, KGB의 눈에 고르바초프의 ‘정치적 위신’을 세워준 것이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들 회담의 초기 메신저 역할을 담당한 것이 바로 매시였다.
고르바초프는 이러한 일련의 미소 정상회담에서 확보한 정치력으로 1985년부터 5년간 내부적으로 개혁과 개방이라는 자유화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었다. 미소 냉전은 레이건의 승리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고르바초프가 포기함으로써 끝난 것에 가깝다. 레이건의 공이 있다면 고르바초프를 반공이 아닌 다른 눈으로 보고 냉전 종식의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소련 체제는 레이건과 고르바초프가 만든 정치적 공간에 휩쓸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그 역사적 전환의 뒤에는 수전 매시라는 한 여인이 있었다.



















![[밀착취재] 리딩방 70여 명 대부분이 한통속…기망하는 수법까지 매뉴얼화](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48/98/bd/694898bd2399a0a0a0a.jpg)


![[지상중계] 제12회 나지포럼, “북미 정상회담 성과내기 어려워”](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43/48/32/69434832107aa0a0a0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