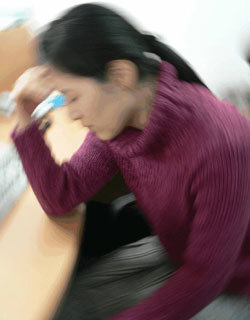
심리적 압박이 원인인 경우가 많아 이명은 ‘마음의 울음’이라고도 불린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소리가 외부에서 곧장 귀로 전달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소리는 우리 몸의 내부에서 만들어진다. 외부의 진동이 귀로 들어오면 몸속 각 기관이 이를 자기만의 파동으로 바꾸어 소리를 인식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소리는 외부의 소리와 내부의 소리(자율신경 리듬)가 합쳐진 ‘나만의 소리’라고 할 수 있다. 똑같은 바람이지만 대나무 밭에 가면 대나무 소리가 나고 소나무 밭에 가면 소나무 소리가 나는 것과 같은 원리다. 사람들이 ‘조용하다’고 느끼는 것도 사실은 공기 중에 소리를 발생시키는 진동이 전혀 없기 때문이 아니고, 자율신경이 20dB 이내의 진폭으로 유모세포를 흔들어 뇌가 조용하다고 생각하는 것일 뿐이다.
외부의 음원이 없는데도 사람들은 종종 소리를 느끼는데, 그것은 자율신경이 귀 내부에서 자신만의 소리를 만들기 때문이다. 이를 자율신경의 리듬이라고 한다. 자율신경은 본래 내 것이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생명유지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심장이 뛰는 것도, 숨을 쉬는 것도 모두 자율신경이 보여주는 묘기일 뿐이다. 자율신경은 몸과 마음 사이에서 몸의 부담은 마음으로 전가하고 마음의 부담은 몸으로 전가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룬다. 자신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 과도해지자 신경계가 몸에게 그 책임을 넘겨버린 것이다. 어린아이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틱증상’도 정신적으로 받은 충격을 몸이 대신해서 표현하는 자율신경전달 이상현상으로 알려져 있다.
심리적 압박으로 자율신경이 엄청난 부하를 받으면 몸은 들어오는 소리의 주파수를 빠르게 혹은 느리게 왜곡시켜 아픈 소리를 만들어낸다. 그것이 바로 ‘이명’이다. 그래서 이명은 ‘마음의 울음’(귀울음)이라고도 불린다. 환자가 받는 심리적 고통을 가장 아픈 주파수로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명 환자를 치료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환자의 내면과 맞닥뜨리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 환자의 상당수는 부부간의 갈등을 심하게 겪고 있었다.
평범한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만, 비범한 위인에게도 부부간의 갈등은 감내하기 힘든 고통이 아닐 수 없었다. 이를 뒷받침하는 예는 역사 속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전라도 순천에 살았던 이함형에게 퇴계 이황이 보낸 편지인데, 이 편지에는 부부갈등에 대한 퇴계 자신의 경험담이 실감나게 적혀 있다.
“나는 일찍이 재혼을 했으나 한결같이 불행이 심하였다. 그러나 나는 스스로 각박하게 대하지 않고 애써 잘 대하기를 수십 년이나 했다네. 그간에 더러는 마음이 뒤틀리고 생각이 산란하여 고뇌를 견디기 어려웠네.”
부부갈등과 여우 생식기

부부금실의 상징인 원앙새
그러나 한의학적으로 따져보면 여우 생식기가 금실을 좋게 한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한자의 뜻만 보면 금실을 해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결론이 나온다. 여우는 한자로 표현하면 호(狐)인데, 이것은 외로울 고(孤)와 맥을 같이한다. 외롭게 혼자 다니는 짐승이라는 뜻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자생했던 여우는 의심이 많아 무리생활을 하지 않기로 유명했다. 그래서일까. 중국 측 기록에 따르면, 자주 영화의 소재가 되는 구미호도 원산지는 한국이다. 중국 최고의 지리서인 ‘산해경(山海經)’은 이렇게 적고 있다.
“靑丘(청구)의 산에는 여우가 있으며 九尾(구미)로 능히 사람을 먹는다.”
여기서 청구는 우리나라의 옛 지명이다.
동의보감의 잡방에는 부부가 서로 사랑하게 하는 처방도 나와 있어 눈길을 끈다. 여기엔 두 가지의 처방이 나오는데, 원앙새 고기로 죽을 끓여서 알지 못하게 먹이거나, 음력 5월5일에 뻐꾸기를 잡아 다리와 머리뼈를 차고 다니게 하는 것이다. 그 중 원앙새 처방은 금실 좋기로 소문이 나 있는 원앙새의 금실을 빌리려는 주술적 처방에 해당한다. 그러나 실제로 원앙은 소문과는 달리 금실이 좋지 않다. 원앙의 암컷이 총을 맞고 쓰러져도 수컷이 암컷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금실이 좋은 것처럼 전해왔지만, 이와 상관없이 실제의 원앙은 매년 상대를 바꾸어 산다.
한방에서 보면 사실 부부금실과 관련해 원앙새를 넘어선 동물은 바로 원앙어다. 김려라는 조선후기 학자는 그의 저서 ‘牛海異語譜’(우해이어보)에 이런 기록을 남겨놓았다.
‘이름은 원앙어라고도 하고 해원앙이라고 한다. 생김새는 연어와 비슷하나 입이 작고 비늘은 비단처럼 곱고 아가미는 붉다. 꼬리는 길고 몸통은 짧은 것이 마치 제비처럼 생겼다. 이 물고기는 암컷과 수컷이 항상 붙어 다니는데 수컷이 달아나면 암컷이 수컷의 꼬리를 물고는 죽어도 놓아주지 않는다. 낚시꾼들은 원앙을 낚게 되면 반드시 쌍으로 낚는다. 이 고장 토박이의 말에 따르면 원앙어의 눈을 뽑아서 잘 말려가지고 남자는 암컷의 눈을 차고, 여자는 수컷의 눈을 차고 다니면 부부간의 금실을 좋게 할 수 있다고 한다.’
이 책에는 실제 경험담도 적혀 있는데, 이웃집 젊은이가 거제도 앞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낚아 가져 왔는데 물고기가 절반쯤 말랐는데도 오히려 꼬리를 물고 떨어지지 않는 채로 있었다는 것이다. 최근에 밝혀진 결과로 보면 원앙어 외에도 백년해로하는 물고기로 아귀가 있다. 그중에도 심해어인 초롱아귀가 그렇다. 초롱아귀의 수컷은 암컷의 몸에 지느러미처럼 작게 달라붙어 산다. 깊은 바다에서 같은 종족끼리 만날 확률이 낮아서인지 수컷은 암컷의 피부에 악착같이 달라붙는다. 작지만 번식기가 되면 아비 구실을 해내 자손을 남긴다.
|
그러나 이런 것들이 모두 사실이라 해도 부부금실을 위해 원앙어를 가지고 다닐 수도, 초롱아귀를 데려다 키울 수도 없는 게 솔직한 현실이다. 하나 분명한 사실은 모든 병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마음이 달라지지 않으면 몸이 바뀌지 않는다. 부부의 금실도, 그로 인한 고통도 다 마찬가지다.





















![[밀착취재] 리딩방 70여 명 대부분이 한통속…기망하는 수법까지 매뉴얼화](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48/98/bd/694898bd2399a0a0a0a.jpg)


![[지상중계] 제12회 나지포럼, “북미 정상회담 성과내기 어려워”](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43/48/32/69434832107aa0a0a0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