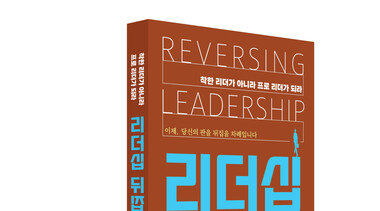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업무방해죄를 인정했다. 2심도 같은 판결을 내렸는데,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공무가 포함됨을 전제로 한 판결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형법엔 업무방해죄와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취지는 사적 업무와 공무를 구분해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그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한해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했다.
■ 고발 사실 자체가 고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지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 김씨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비록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그것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고발 사실 자체만으로 고발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은 작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