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말 짜증난다. 절망스럽기까지 하다. 귀와 입은 여전히 안 열리고, 공들여 ‘찍은’ 토익 점수엔 한숨이 나올 지경이다. 도대체 10년 넘게 배운 영어가 왜 이 모양일까. 그래, 이건 내 팔자다. 운명이다. 이젠 깨끗이 잊고 맘 편하게 살자. 아, 그러나 그럴 수가 없다. 내 아이가 나와 똑같은 운명을 앞두고 있다. 안 된다, 막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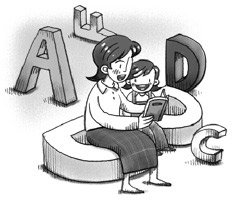
그러나 영어 못하는 건 운명도 팔자도 아니다. 굳이 팔자라고 한다면 고쳐야 할 팔자이고 충분히 고칠 수 있는 팔자다.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누구나 할 수 있고 쉽게 깨칠 수 있는 길이 있다.
사람의 뇌 중 언어능력을 관장하는 부분은 10세에 전성기를 맞고 12세 무렵이면 발달을 멈춘다고 한다. 그래서 13세 이전에 영어를 접하지 않고는 원어민처럼 구사하기 힘들다는 말이 나왔을 것이다. 그런데 10세는 대개 초등학교 3, 4학년이고 12세는 5, 6학년 시기이므로 초등학생 때 영어를 공부하면 모국어처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다는 얘기다.
현실적인 면을 보더라도 초등학생 시기는 영어를 익히기엔 적기다. 인생에서 가장 여유로운 시기일 뿐 아니라 다른 학과목에 대한 부담도 크지 않아서 영어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할 수 있다.
정서적인 면에서도 초등학생 때는 유리하다. 아직 자의식이 자라기 전이라 별 생각 없이 종알거리고 그걸 즐긴다. 혹 실수를 하더라도 헤헤거리며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하지만 5, 6학년만 돼도 슬슬 자의식이 고개를 들면서 주변을 살피기 시작한다. 언어를 배우는 과정이야 원래 실수투성이고, 이를 통해 실력이 향상되는 것이건만 조금만 실수를 해도 마음이 상한다. 그러다 보니 영어를 입 밖에 내는 걸 꺼린다.
이런 감정 소모를 겪지 않으려면 자의식이 자라기 전 영어공부가 습관이 돼 있어야 한다. 자의식이 자라기 전에 말하고 듣고 읽고 쓰는 데 별 어려움이 없도록 영어공부 스케줄을 짜는 게 좋다.
이렇게 보면 기성세대가 영어를 잘 못하는 이유가 분명해진다. 중학교에 들어가 영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으니 그거 하나만 봐도 결과가 뻔하다. 뇌 발달과정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불리하기만 했다.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학습 부담이 갑자기 커진다. 거기다 사춘기까지 시작되어 생각이 많아지고 말수가 적어진다. ‘water’를 ‘워러’, ‘little’를 ‘리를’이라고 할라치면 몸부터 꼬인다. 그런 상황에서 영어를 시작했으니 잘될 리가 없지 않은가.
우리말 배우는 과정 답습하라

우리말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유치원 때까지는 자연스럽게 익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등 네 기능을 분리해 집중적으로 가르친다. 그러다 중고등학교 시기에는 문학작품을 간간이 읽으며 문법을 배운다. 그동안 말하고 듣고 읽고 써온 것들에 대해 계통을 짚어보고 갈래를 갈라보면서 문법적인 체계를 세운다. 대학에 가서 그런 대로 괜찮은 보고서와 논문을 쓸 수 있는 것도 다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다.
이 과정을 영어에 적용하면 된다. 100%는 아니지만 90% 이상은 들어맞는다. 그렇다면 왜 100%가 아니고 90%일까. 영어의 본고장이 아닌 데서 배운다는 환경적인 제약, 각기 다른 철자와 소리의 체계 때문이다.
언어는 듣는 게 기본이다. 사람은 들으면 말할 줄 알고, 말하면 쓸 줄도 알게 된다. 듣기가 언어의 4기능(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첫 단추다. 무엇으로 어떻게 듣는 게 효과적일까. 많은 사람이 카세트테이프를 이용한다. 하지만 대상이 어린이라면 카세트테이프보다는 TV가 낫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TV 보는 걸 좋아한다. 당연히 좋아하고 익숙한 매체를 이용해야 효과도 크다. 또 TV는 별다른 준비과정 없이 언제든지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활화하기 쉽다. 하루이틀 듣고 말 게 아니니 가장 접하기 쉬운 걸 이용하는 게 유리하다. 거기다 TV는 영상으로 언어 상황을 전하기 때문에 카세트테이프로 공부한 경우보다 실제 상황에 부딪쳤을 때 현장적응력이 뛰어나다.
EBS나 AFN을 뒤져 짧은 프로그램들은 같이 본다. 긴 프로그램은 녹화했다 아이들이 쉬는 시간이나 간식 시간 같은 때 20∼30분씩 끊어서 보여준다. 웬만큼 알아들으면 아이들이 지루해하는데, 그때는 프로그램 난이도를 좀 높여달라는 요구로 받아들이면 된다.
그런데 대부분 듣기능력이 전성기인 초등학생 시기를 소홀히 하고, 나중에 중학생이 되어 학원에서 카세트테이프를 들으며 인위적으로 하려고 한다. 언어는 심오한 학문이 아니다. 습관이고 생활이다. 밥 먹듯이 심심할 때마다 영어 프로그램을 보게 하면 된다. 어릴 때부터 TV 시청하는 습관 하나만 잘 들여도 해결되는 게 듣기다.
TV를 볼 때는 어른이 아이랑 같이 봐야 한다. 그래야 외롭지 않고 그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처음에는 ‘(화면 속) 쟤가 왜 저러니?’ 식의 얘기를 하며 마음 편하게 보도록 한다. 그러다 아이가 TV 보는 게 어느 정도 습관이 됐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어른이 들리는 대로,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연습장에 속기를 했다 노트에 옮겨준다. 필요하다 싶으면 간단하게 토를 달고 설명도 곁들인다. 노트한 건 바로 읽히기보다 몇 시간 뒤나 다음날 읽히면 자연스럽게 연상 작용을 일으켜 복습효과를 얻을 수 있다. 고학년부터는 프로그램을 보며 직접 받아쓰기를 하도록 한다. 그러면 듣기 실력이 크게 향상된다.
우리말과 영어로 된 프로그램부터 보기 시작해 원어방송으로 옮겨가고 원어방송도 아이의 반응과 이해 정도를 감안해 조금씩 난이도를 높여간다.
◇ 유치원
‘도라도라의 영어나라’ ‘티모시네 유치원’ ‘고고의 영어탐험’(이상 EBS) ‘Go! Go! Giggles’ ‘Dora the Explorer(‘도라도라의 영어나라’의 원본)’ ‘Little Bear’ ‘Teletubbies’ ‘Sessame Street’ ‘Blue’s Clues’(이상 AFN)
◇ 초등 1~3학년
‘Bob the Builder’ ‘Little Bear’ ‘Clifford’s Puppy Days’ ‘Rugrats’ ‘Pokemon’ ‘Sagwa’ ‘Madline’ ‘Spongebob Square-pants’ ‘What’s New Scooby Doo?’ ‘Remeo’ ‘All Grown Up’ ‘Wishbone’(이상 AFN) ‘English Cafe’ ‘Survival English’(이상 EBS)
◇ 초등 4~6학년
AFN 시청 프로그램을 ‘Children’에서 ‘Juvenile(청소년)’ 단계로 올려준다. ‘Scouts Safari’ ‘All That’ ‘Popular Mechanics for Kids’ ‘Literty’s Kids’ ‘Jackie Chan Adventure’ ‘The Mummy’(이상 AFN), ‘영어회화’(EBS)
◇ 중학교
AFN의 ‘Juvenile’ 프로그램을 계속 보면서 지상파 방송에서 방영되는 영화는 ‘음성다중 외국어’로 전환해 본다. 영화전문채널 OCN, EBS의 일요시네마 등은 자막을 가리고 본다. 아리랑 TV와 함께 CNN, AFN의 뉴스를 보며 시사에 눈을 떠간다.
◇ 고등학교
중학교 때처럼 시간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편 정도는 영화를 보고 아리랑 TV, CNN, AFN 뉴스를 본다.
편의상 연령대별로 구분은 했으나 이것이 정답은 아니다. 고학년이지만 듣기를 처음 시작하는 경우에는 아래 연령대로 내려가 시작해야 한다.
그런데 듣기만 해선 청취력이 크게 늘지 않는다. 듣는 것에도 지속적인 ‘영양공급’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문자고 책이다. 책에서 접한 걸 TV를 통해 다시 보게 되면 아이들은 훨씬 잘 듣게 된다. 책에서 미리 정보를 파악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영어책을 읽을 때는 우리말로 된 책을 읽을 때와는 방법이 달라야 한다. 그게 바로 소리 내어 읽기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말을 하는 크기로 읽는 것이 좋다. 실제 언어 상황과 비슷해 효과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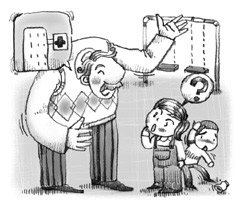
소리 내어 읽기의 이점은 많다. 우선 소리 내어 읽은 단어나 문장은 나중에 들을 때 더욱 잘 들리게 된다. 소리 내어 읽는 순간 자신의 귀로 듣게 되는데, 그게 한 번 더 들은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또 소리 내어 읽을수록 발음이 좋아진다. ‘cheer up’이 ‘치어럽’으로, ‘meet you’가 ‘미이츄’로 되는 건 외워야 할 발음규칙이 아니다. 발음하는 순간 입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런데 소리 내어 읽을수록 이러한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나며 발음이 다듬어진다.
소리 내어 읽기의 이점은 또 있다. 어느 기간이 지나면 읽은 내용이 제 말이 되어 입에서 술술 나오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문법까지 저절로 읽히게 된다. 읽은 문장들이 언어의 규칙인 문법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문법을 자연스럽게 통째로 익히는 결과가 된다.
이렇게 듣기와 소리 내어 읽기만 해도 ‘들을 수 있고 말할 줄 아는 영어’가 가능하다. 사실 말하기를 가르치기 위해서 영어로만 말하는 건 한국에서는 쉽지 않다. 그렇게 유창한 사람도 많지 않고 배우는 학생 입장에서도 부담이 크다. 하지만 소리 내어 읽는 건 가르치는 사람도 배우는 학생도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고, 스트레스도 크지 않다.
그런데 소리 내어 읽기가 좋다는 것은 알겠는데 아무 책이나 읽혀도 괜찮을까. 특히 연령대별로 어떤 책을 아이에게 읽히는 것이 좋을까. 필자가 아이를 기르면서 읽혔던 책들 중 추천할 만한 도서를 소개한다.
◇ 유치원
‘The Baby’s Catalogue’ 시리즈(총 4권), ‘봉봉 만화 영어(하루에 한 에피소드씩 읽어나간다)’ ‘The Star That Fell’ ‘Read with Me’ 시리즈(총 16권)
◇ 초등 1~3학년
‘Cocky’s Circle Little Book’ 시리즈(총 90여권 중 선택), ‘A Piece of Cake’ ‘Disney’s My Very First Winnie the Pooh’ 시리즈(총 8권), ‘Start with English Readers’ 시리즈 1~3단계(총 15권), ‘Storytime Books’ 시리즈 1~3단계(총 36권), ‘English Today Readers’ 시리즈 1~3단계, ‘Storytime’ 1~3단계, ‘Let’s go’ 시리즈 1~3단계, ‘Up and Away’ 시리즈 1~3단계(각 단계 2권으로 구성됨), ‘English Time’ 시리즈 1~3단계, ‘Oxford Storyland Readers’ 시리즈 1~4단계(각 단계 4권으로 구성)
◇ 초등 4~6학년
‘Start with English Readers’ 시리즈 4~6단계(총9권), ‘English Today Readers’ 시리즈 4~6단계, ‘Storytime’ 시리즈 4~6단계, ‘Macmillan Bible Stories’ 시리즈(13권 중 선택적으로), ‘Read with Ladybird’ 시리즈(총 6권), ‘Let’s go’ 시리즈 4~6단계, ‘Up and Away’ 시리즈 4~6단계(각 단계 2권으로 구성됨), ‘English Time’ 시리즈 4~6단계, ‘Oxford Storyland Readers’ 시리즈 5~12단계(각 단계 4권으로 구성됨), ‘Favorite Tales’ 시리즈(총 33권 중 선택적으로), ‘Favorite Golden Look-Look Books’ 시리즈(총 56권 중 선택적으로)
◇ 중학교
‘American Folk Tales’ ‘Ladybird Classics’ 시리즈, ‘Windows Of Gold’ ‘Nursery Tales’ ‘Harry Potter’ ‘Charlotte’s Web’ ‘Animal Storises and Rhymas’ ‘A Little House Christmas’ ‘Elite English Cassette Library’ 시리즈(총 24권 중 선택적으로), ‘The Baby-Sitter’s Little Sister’ 시리즈(총 43권 중 선택적으로)
◇ 고등학교
원문으로 읽는 세계명작 시리즈(총 29권, 도솔), ‘Love or Money?’ ‘The Ghost of Genny Castle’ ‘Jo’s Boys’ ‘Little Women’ ‘The Magician’s Nephew’ ‘The Open Door to Reading’ ‘The Count of Monte Cristo’
듣기와 소리 내어 읽기를 꾸준히 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면 말하기와 쓰기에 대해서도 체계를 세워줄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국어도 읽기, 말하기, 듣기, 쓰기 책으로 분리해 각 기능을 체계적으로 학습시키듯이 영어도 그 길을 따라가면 된다. 방법은 간단하다. 단계별로 나와 있는 ‘activity book’과 ‘work book’을 하루 한두 페이지씩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말하기·쓰기를 동시에
‘activity book’은 말 그대로 활동(activity)을 하면서 표현(expression)을 익히는 과정을 통해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책이다. 새로운 주제가 나올 때마다 관련 단어를 먼저 소개하고 그 단어들이 사용되는 상황이 그림과 함께 펼쳐진다. 그림을 보면서 묻고 대답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표현에 익숙해지고 상황에 대한 적응력도 높일 수 있다. ‘work book’은 초등학교의 쓰기 교과서라고 생각하면 된다. 낱말을 쓰는 것부터 시작해 문장쓰기, 글쓰기로 점차적으로 나아간다.
필자는 주로 ‘Longman’의 ‘activity book’과 ‘work book’을 교재로 썼다. 두 책이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activity book’으로 활동을 한 다음 ‘work book’에 들어가면 벌써 익숙해진 용어와 그림, 표현들이 기다리고 있다. ‘activity book’에서 연습한 걸 ‘work book’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이는 말하기와 쓰기를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된다.
아이가 유치원에 다닐 때는 자꾸 말을 하도록 유도한다. 그러면서 발음규칙을 자연스럽게 설명해주는 ‘Between the Lions’ Library(위성방송 중 ‘어린이 TV’에서 방영)’ 같은 프로그램을 시청하게 한다. 또 어떤 책이든 소리 내어 읽게 한 다음 글 없이 그림만 보고 아이가 혼자 말하게 한다. 초등학생이 되면 읽은 책의 내용을 혼자 영어로 정리해 말하게 한다. 중학생 이상이 되면 원어민과의 전화영어 서비스나 회화 학원을 다니게 하는 것도 좋다.
쓰기는 말하기와 긴밀하게 연관돼 있다. 따라서 쓰기 학습은 말하기와 동시에 이뤄져야 효과가 크다. 유치원 시기에는 대·소문자 철자를 익히게 하면서 단어와 아주 간단한 문장을 써보게 한다. 물론 이때 강제로 외우게 해서는 안 된다. 초등학생이 되면 읽은 책의 내용을 짧게 정리해보게 하고 같은 제목으로 글을 써보게 한다. 중학생 이상이 되면 이메일로 외국인 친구를 사귄다거나 영어 일기를 쓰는 등의 방식으로 다양한 주제의 에세이를 쓰도록 한다.
우리말이 영어를 배우는 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어순이 서로 달라 영어를 배울 때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 것이라 여기기도 한다. 하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다보니 그건 편견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시기를 잘못 선택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쓰지 않아서 그렇지, 모국어인 우리말이 외국어인 영어를 익히는 데 걸림돌이 되진 않았다. 오히려 우리말 실력이 영어를 공부하는 밑거름이자 에너지원이 되었다.
우리말 실력이 영어 실력
‘How are you?’ ‘Fine, thank you’ 할 때는 별 생각 없이 중얼거리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말 실력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단계가 올라갈수록, 특히 영어동화책에서 본격적으로 스토리가 등장하고 얼개가 짜이고 다양한 표현과 함께 유머, 위트가 등장하기 시작하면 얘기는 달라진다. 모국어인 우리말을 잘 익힌 아이들은 그쯤부터 더 재미를 느낀다. 공부에도 가속도가 붙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한다. 거꾸로 우리말 기반이 약한 아이들은 이 시기부터 힘들어하고 영어는 외울 것만 많다고 투정을 부린다. 전반적인 언어능력과 이해력 부족에서 온 결과다.
그런데 요즘 젊은 엄마들 사이에서 아이가 우리말을 잘하기도 전에 엄마가 영어로 말하고 아이도 영어로 말하도록 하는 이중 언어환경 조성 붐이 일고 있다. 나름대로 이점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는 모국어 용량을 키우고 잠재력을 키워주는 시기로 삼는 건 어떨까. 영어를 익혀나가는 긴 과정에서 보면 일상영어를 2, 3년 먼저 익혔다고 해서 대단한 차이가 생기는 건 아니다.
그리고 뭔가를 배우는 데는 반드시 스트레스가 따른다. 꼭 어린 시기에 그렇게 이중의 부담을 줄 필요가 있을까. 우리말 용량을 키워주고 언어적인 기반을 넓혀주는 시기로 만드는 게 장기적으로 볼 때 오히려 유리하다. 유치원에 들어간 뒤 마치 이유식을 먹이듯 우리말에서 영어로 옮겨갈 준비를 해도 늦지 않다.
게다가 우리말을 잘하면 영어를 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영어 실력은 또 우리말 실력을 높여준다. 영어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아이는 TV와 책을 통해 수많은 간접경험을 하게 된다. 그러면서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점을 알아간다. 우리는 ‘입다, 쓰다, 끼다, 신다’로 다른 표현들을 사용하는데 영어는 옷, 모자, 안경, 신발에 관계없이 ‘wear’ 한 가지로 쓰는 것에 놀라워한다.
그런가 하면 영어에서 우리와 똑같이 쓰는 표현을 발견하고는 놀란다. ‘~하고 싶어 죽겠다’는 표현이 영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be dying to~)을 보고는 동질감을 느끼며 행복해한다. TV 속 등장인물이 손가락을 꼬면서 ‘I’ll keep my fingers crossed’ 하면 그들은 행운을 빌어줄 때 저렇게 한다는 것을, 즉 그들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
이렇게 우리말과 영어는 서로 도우며 언어능력을 자극하고 발전시켜나간다. 듣기와 소리 내어 읽기가 서로 상승작용을 해나가듯 우리말과 영어도 배타적이 아니라 서로 협동하며 언어라는 탑을 쌓아간다.
나이 들수록 어려운 게 영어
아직도 문법 중심인 현재의 중고등학교 영어교육 방식이 가까운 시일 내에 바뀌기는 힘들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을 인정하고 이용할 방법을 찾는 편이 낫다. 지금의 교육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려면 초등학생 때 영어를 충분히 익혀놓아야 한다. 그렇게 되면 중고등학교에 진학해선 국어 공부에 들이는 노력 정도만 영어에 기울이면 된다. 학교 수업은 그동안 익힌 영어에 대한 문법적인 체계를 세우는 시간으로 활용하고, 집에서는 좋아하는 문학작품을 간간이 소리 내어 읽고 주말에는 원어로 영화 한편 보는 정도면 충분하다. 언어는 써야 유지되고 끊임없이 갈고 닦아야 발전한다.
하지만 초등학생 시기에 충분히 익히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물론 학교 시험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말하고 들을 수 있는 영어를 하는 것이 목표라는 걸 잊지 않아야 한다.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영어를 위해 개인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이를테면 EBS의 영어학습 프로그램이나 AFN 방송을 쉬운 것부터 꾸준히 시청해야 한다. 적기를 놓쳤으니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중고등학생 때는 급하니까 일단 점수 따는 영어만 하고, 진짜 공부는 대학에 가서 여유 있게 하지 뭐’라고 생각했다간 더 큰 희생이 따른다. 말하고 들을 수 있는 영어를 배우는 건 나이가 많을수록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듣는 노력을 하면서 어렵지 않은 원서를 택해 꾸준히 소리 내어 읽어나가길 권하고 싶다. 듣기와 소리 내어 읽기의 두 엔진이 있어야 현지가 아닌 곳에서 공부하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최적기인 초등학생 시기를 놓친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다.
영어를 제대로 잡지 못하면 평생 영어에 끌려다녀야 한다. 더욱 안타까운 건 영어 때문에 다른 걸 할 수 있는 기회마저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을 보라. 중고등학교 시절 그렇게 파고도 모자라 대학시절 4년 내내 영어에 매달려 산다. 그러다 보니 다른 능력을 개발할 시간도 여력도 없다. 영어에 매몰되어 영어만 하다 끝난다. 그러고도 여전히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상태로 콤플렉스를 안고 산다.
마지막으로 우리집 얘기를 해보겠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한 필자의 남편은 대기업 종합상사에 입사했고 해외영업부로 발령이 났다. 그런데 해외영업부가 뭔가. 해외에 나가 돈 벌어오는 부서가 아닌가. 하지만 남편의 영어실력은 형편없었다. 할 수 없이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 하루 30분씩 영어책을 읽기로 했다. 처음 일주일은 그런 대로 할 만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시들해졌다. 이미 굳을 대로 굳은 뇌로 무조건 외우기만 하는 공부가 재미 있을 리 없었다. 결국 한 달을 못 넘기고 그만뒀다.
회사는 직원들을 한 달씩 연수원에 ‘감금’시켜 집중교육을 시키는 등 영어를 익히게 하려고 무진 애를 썼고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했다. 덕분에 다들 자기 분야에서 영어로 비즈니스를 할 정도에 이르렀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영어를 배운 우리 아이와는 달랐다. 영어를 생활의 일부로 즐기는 아이와는 ‘차원’이 달랐기 때문이다.
성인이 된 후 필요에 의해 급박하게 배운 영어는 불안한 역삼각형 구조를 갖게 된다. 비즈니스는 그런 대로 꾸려 간다. 품목이 정해져 있고 거기 쓰이는 단어도 뻔하기 때문에 숫자놀음으로 서로 흥정하고 일정을 맞추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즈니스가 어디 그것뿐인가. 일을 하다 보면 함께 밥을 먹기도 하고 차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게도 된다. 땜질식으로 극약처방을 받은 영어로는 그런 자리가 항상 불안하기만 하다. 영어로 쌓은 상식과 교양의 깊이가 부족한 탓이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TV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외국 문화와 호흡하고, 수많은 영어동화책을 읽으면서 문학을 감상하고, 영어원서로 다양한 정보를 접한 아이들의 경우는 다르다. 우리말도 어느 수준에 이르면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 제 나름의 길을 찾아 발전시켜 나아가듯, 영어도 어느 수준에 이르면 제 스스로 길을 찾아 발전하고 향유해 나간다. 팝송도 듣고, 영화도 보고, 인터넷으로 전화로 외국 친구들도 사귄다. 원어 뮤지컬이 들어오면 관람하고 CD를 사다 들으면서 문화를 누린다. 이렇게 차곡차곡 영어의 탑을 쌓은 아이들은 기초가 튼튼한 빌딩구조를 하고 있다.
최고의 선생은 부모
필자의 큰아이는 이미 영어터널을 빠져나와 과학 공부에 열중하고 있다. 작은아이는 이제 아홉 살이지만 큰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에 이르렀던 단계에 올라 속도조절로 고심하게 하고 있다. 영어공부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 그동안에 쌓인 노하우가 작용한 셈이라고 생각한다.
아이들과 남편을 보면서 가끔 생각에 잠긴다. 어쨌든 아이들은 그런 대로 잘 가르쳤는데 왜 남편은 실패했을까. 생각해보니 이유는 간단했다. 첫째, 그는 초등학생이 아니었다. 둘째, 나는 그의 엄마가 아니었다. 엄마였다면 우리말 배우는 과정을 다 지켜봤기 때문에 그걸 따라하다 보면 영어공부도 순조롭게 진행됐을 것이다.
어차피 영어 없이는 살기 힘든 세상이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은 세계인으로 자신 있게 커 갈 수 있도록 기초공사를 튼튼히 해야 하지 않을까. 이 글이 영어로 고민하고 고생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님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밀착취재] 리딩방 70여 명 대부분이 한통속…기망하는 수법까지 매뉴얼화](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48/98/bd/694898bd2399a0a0a0a.jpg)


![[지상중계] 제12회 나지포럼, “북미 정상회담 성과내기 어려워”](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43/48/32/69434832107aa0a0a0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