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회의에서 다루는 주제만 대충 훑어봐도 2012년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갈등, 테러와 폭력, 기아와 불평등, 인터넷과 SNS 등 국제정치 주요 키워드를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다. 따라서 포럼은 다채로운 주제와 관련한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일종의 경연장이라고 하겠다.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올해 학술회의도 주제가 풍성하고 다양한 시각이 공존했다. 핵심 이슈는 예년에 비해 더 많은 관심을 끌었다. 북한의 정권 이양 과정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미사일 발사 움직임과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맞대응으로 긴장이 고조되는 한반도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
해마다 이 학술회의에서 한반도 관련 논의를 주도하는 허브 역할을 한 단체가 재미한국정치연구학회(Association of Korean Political Studies)다. 1973년 창립된 이 학회는 올해 ISA 학술회의에서도 주최 측으로부터 한국 관련 패널을 3개 배정받아 2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전문가들과의 토론을 주관했다.
서울대 고고인류학과 70학번
2010년부터 재미한국정치연구학회를 이끌고 있는 채혜숙 회장(볼드윈 월레스 대학 정치학 교수)은 1977년 미국에 처음 발을 디뎠다. 서울대 고고인류학과 70학번이다. 1990년대 초 미국 남가주대(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20년 가까이 미국 대학에서 정치학을 가르치고 있다. 채 회장을 올해 ISA 학술회의가 열린 샌디에이고에서 만나 미국 대선과 최근 한반도 문제 등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었다.
▼ 재미한국정치연구학회는 어떤 단체입니까.
“1970년대 초, 미국에서 학위를 받고 이곳 대학에서 강의하던 20여 명의 한국계 정치학자가 학술 협력과 친목 도모를 위해 만든 모임에서 출발했습니다. 1980년대 중반쯤 한국 정치를 연구하는 미국 학자들이 회원 가입을 요청해오면서 외국 학자에게도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현재는 240여 명 회원 중 4분의 1가량이 미국 중국 일본 등 비(非)한국계 학자들로 이뤄져 있습니다.”
▼ 최근 역점을 둔 사업이 있다면 소개해주십시오.
“ISA 학술회의 같은 대규모 학회 때 패널을 조직해 한국 관련 논문을 발표하는 것 이외에도 한국학의 미래를 위해 대학원생이 쓴 논문 중 우수작을 선정해 시상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 있는 학자나 대학원생에게도 문호는 개방되어 있습니다. 2007년부터는 미국 내 한국학 교수들과 함께 커리큘럼, 강의계획서를 공유하면서 한국 관련 강의의 질을 높이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 미국 정치학계에서 최근 몇 년 사이 한국 관련 연구는 어떤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까.
“최근 10년간 기록을 살펴보면 매년 최다 30편까지 논문이 발표됐는데 그중 절반가량이 한국 국내정치 및 정치 경제 관련 논문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를 다룬 논문이 약 30%를 차지하고 나머지 20%가량은 북한을 다룬 논문입니다.”
▼ 미국 공화당 경선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경선은 어떤 특징이 있었나요.
“과거와 달리 4월 초까지 공화당 후보가 결정되지 않은 채 장기 레이스가 펼쳐졌습니다. 4년 전 존 매케인 후보는 2월에 이미 공화당 후보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플로리다와 애리조나 등 몇 개 주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공화당 후보 지명 방식을 승자가 독식하지 않고 비례로 대표하는(proportional representative) 것으로 바꿨기 때문인데요. 승자독식은 한 주에서 어떤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라도 이기면 그 주의 대의원 지지표를 모두 확보한 것으로 간주하는 반면 새로운 제도는 득표율에 따라 대의원 수를 한 명 한 명 세어나가면서 1144명의 대의원을 확보할 때까지 예선전을 계속하는 방식입니다. 자연스레 예선 승부가 길어질 수밖에 없었죠.”
▼ 공화당 예선이 길어진 게 본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미트 롬니 후보는 진보적 색채가 비교적 강한 매사추세츠 주지사 출신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보수라기보다는 온건 중도 노선으로 봅니다. 따라서 공화당의 전통적 지지자들이 ‘진정 보수를 대표할 만한 후보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게 사실이죠. 사정이 이렇다보니 예선 내내 롬니 후보는 이런 우려를 불식하고자 자신은 대단히 보수적 (severely conservative)이라고 강조해왔습니다. 낙태나 동성 결혼에 대해서는 입장을 바꿨다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본선에서 다시 중도표를 잡으려면 그동안 내놓은 보수 일변도의 정책 노선을 거꾸로 완화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어요.”
▼ 미국 대통령선거 체계와도 관련한 문제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미국 대통령후보는 보통 예선에서는 자신이 속한 당의 이념과 자신의 이념 성향이 비슷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본선에 들어가면 자신이 중도 성향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오바마 대통령 역시 본선이 시작되면 40%에 육박하는 중도 세력을 잡기 위해 보수적 노선을 어느 정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 본선에서는 어떤 대결 양상이 펼쳐질까요.
“결과를 예측할 수 없을 만큼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겁니다. 열쇠를 쥔 것은 중도파가 될 것이기에 오바마와 롬니 모두 중도를 자처할 거예요. 오바마는 집권 초 2년간 전 국민 건강보험 등 진보적 정책을 밀어붙였지만 3년째부터는 중도로 자신이 서 있는 곳을 옮겼습니다. 집권 전반기에는 자신이 소속한 당의 이념에 부합하는 정책을 주로 펴고 후반기에는 다음 선거에 이기고자 중도로 선회하는 것이 미국 정당 정치의 기본적 패턴입니다. 오죽하면 공화당 예선에 나온 릭 센토럼 후보가 롬니를 공격하면서 오바마와 롬니는 비슷한 성향인데 오바마가 계속하면 될 걸 뭘 힘들게 새로 뽑느냐고 비아냥대기까지 했겠습니까?”
중도 자처하는 오바마
▼ 전통적 지지층의 태도에 변화 조짐은 없나요.
“문제는 두 후보 모두 자신의 지지 기반을 이루는 전통적 지지 세력으로부터 열광적 지지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바마도 4년 전과 같은 폭발적 인기를 기대하기 힘들고 롬니 역시 공화당원의 전폭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본적 가정은 30% 남짓한 민주당 지지자는 오바마에게 투표할 것이고 비슷한 숫자의 공화당원은 롬니에게 표를 던지리라는 겁니다. 선거 당일 어느 쪽 지지자가 더 많이 투표장에 가느냐가 승부의 관건이 되겠죠.”
▼ 올해 11월 미국 대선에서 가장 큰 정책적 쟁점은 무엇이 될까요.
“경제 문제가 다른 어떤 이슈보다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보 문제도 관심을 모을 거고요. 오바마는 과감한 정부 개입 정책으로 경제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어 10%대이던 실업률이 최근 8%대 초반으로 떨어지는 등 회복 기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내세울 것입니다. 반면 롬니는 성공한 비즈니스맨인 자기 같은 사람만이 자유로운 시장 경쟁과 작은 정부를 통해 경제 부흥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입니다.”
▼ 아프가니스탄 철군 일정이나 이란 핵 문제 등 국가 안보 이슈는 파급력이 얼마나 있을까요.
“오바마 쪽에서는 이라크 전쟁을 끝냈고, 아프가니스탄 상황을 정리하고 있으며, 오사마 빈 라덴과 카다피를 제거했다는 점을 내세웁니다. 민주당에서는 보기 힘든 ‘안보 대통령’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거죠. 이란에 대해서도 외교적 방식으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군사작전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떠오르는 중국을 관리하고자 한국, 인도, 호주와의 협력을 공고히 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 롬니 측에선 어떻게 반론하나요.
“최근 10년간 아프가니스탄에서 도대체 무엇을 성취하고 떠나는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오바마식 안보 정책의 허점을 파고드는 거죠. 또 아프가니스탄이 안정을 찾기도 전에 미군 철수 날짜부터 정해놓은 것이 과연 잘한 일인지 문제를 제기할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아직은 전면에 부상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두 후보 사이에 흥미로운 토론이 벌어질 겁니다.”
▼ 티파티(Tea Party) 같은 풀뿌리 조직의 영향력은 이번 대선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지난번 선거와 달리 이번에는 별로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2년 전만 해도 티파티의 지지를 받는 인사가 90명 넘게 하원에 진출했지만 이번에는 사정이 다릅니다. 티파티를 대표하는 후보라고 할 수 있는 미셸 바크먼 하원의원이나 뉴트 깅리치 전 하원의장 같은 후보가 조기에 경선 레이스를 포기했습니다. 한동안 관심을 모았던 사라 페일린 전 알래스카 주지사의 영향력도 거의 없고요.”
▼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한미관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오바마가 재임하든 롬니가 당선되든 큰 변화는 없을 겁니다. 중국의 입지가 강해짐에 따라 미국 처지에서는 아시아의 우방국과 더욱 튼튼한 동맹관계를 유지하려 할 것입니다. 오바마의 이러한 태도는 이미 밝혀졌고 롬니 역시 중국을 강력한 경쟁자로 보기 때문에 비슷한 견해를 피력할 공산이 큽니다. 게다가 이번 대선 레이스에서 한미관계가 선거 이슈로 언급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카다피와 김정은
▼ 북한은 어떤 경로를 통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북핵 이슈는 20년 동안 지속된 문제입니다. 북한은 핵 프로그램이 자신을 보호한다고 믿기에 웬만한 압력이 가해지지 않고서는 이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아랍의 봄’이 중동을 휩쓸 때 카다피가 핵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서방 국가가 쉽게 리비아를 공습할 수 있었을까요? 북한은 이를 잘 알기 때문에 더더욱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 북핵 문제의 해결은 요원하다는 말씀인가요.
“북핵 문제는 다음 두 가지 중 한 가지가 일어날 때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될 겁니다. 첫째는 북한이 내부로부터 붕괴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이러한 상황을 기다려왔지만 이는 예측을 불허하는 일입니다. 둘째로는 중국이 북핵 문제를 자신들의 국익을 해치는 위협으로 생각하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우입니다.”
▼ 중국 입장에서 현재 북핵 문제는 국익을 해칠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군요.
“북핵이 중국을 직접 겨냥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예컨대 2002년 2차 북핵 위기가 터졌을 때 중국은 당사자(relevant parties)끼리 협상하라고 했지요. 즉 미국과 북한이 협상을 하라는 겁니다. 중국은 당사자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나 만약 북핵 때문에 동북아시아의 다른 나라가 핵 보유를 심각하게 고려한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그때는 북핵 이슈가 중국의 문제가 되니까요. 일본이나 대만, 한국이 핵을 보유하는 것은 중국의 국익에 그만큼 위협이 되는 것 아닙니까?”
▼ 중국의 속내는 뭘까요?
“중국은 미국이 일본이나 한국 같은 우방국의 핵 보유 야심을 단속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지요.”
▼ 역대 한국 정부가 수행한 북핵 해결 노력은 어땠나요.
“북한이 웬만한 압력으로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명박 정부나 김대중·노무현 정부 모두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명박 정부는 일어나지 않을 일을 가정해놓고 북핵을 포기하면 경제 지원을 하겠다는 식의 실효성이 작은 연계 정책을 펴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게을리 했습니다. 반면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은 뒷전에 놓아두고 남북관계 개선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을 동시에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북핵 폐기는 우리 힘만으로는 힘들고 국제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현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병행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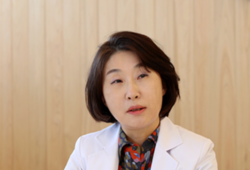


















![[밀착취재] 리딩방 70여 명 대부분이 한통속…기망하는 수법까지 매뉴얼화](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48/98/bd/694898bd2399a0a0a0a.jpg)


![[지상중계] 제12회 나지포럼, “북미 정상회담 성과내기 어려워”](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43/48/32/69434832107aa0a0a0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