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년 뒤 모습을 갖출 행정수도 건설에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는 그들 표현대로 ‘명운’을 걸었다. 그러나 정작 국가의 명운을 걸 일은 따로 있다. 빠르면 10년 뒤 현실화될 ‘에너지 안보’ 위기가 그것이다.

석유를 사려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룬 바그다드. 10~20년 뒤면 석유생산량 감소로 에너지 난이 닥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석유는 국가생존과 직결”
‘국토안보’ ‘식량안보’ ‘에너지안보’ 중 어느 한가지만 무너져도 국가는 존속되기 어렵다. 이 중 에너지안보의 핵심요소는 크게 세 가지다. 석유자원의 안정적 확보, 에너지소비의 효율성 증대, 석유고갈 전 석유를 대체할 새 에너지 개발이 그것이다.
2003년 4월 한국 정부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에너지 확보를 위한 동북아시아 국가간 다자간 협의체 구성 회의를 주도했다. ‘에너지 위기’를 비로소 체감한 한국 정부의 한 부처가 러시아 시베리아 유전 등 새로운 석유자원 공급처 확보에 뛰어든 것이다.
그러나 이 회의에는 한국, 북한, 몽골 정도만이 참석했다. 정작 핵심 국가인 중국과 일본은 외면했고 러시아는 자국에서 열리는 회의라 마지못해 얼굴을 내미는 모습이 역력했다. 부존자원 하나 없으면서 다른 나라들이 새로운 석유 공급처 확보에 열을 올릴 때 뒷짐만 지고 있던 한국이 뒤늦게 “나도 끼워달라”고 나서자 에너지 강국들은 차가운 반응을 보인 것이다.
2004년 6월 서울에서 에너지전문가 심포지엄이 열렸다. 서울에서도 비로소 ‘에너지 안보’라는 개념이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석유자원 확보는 이제 한국의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가 됐다”는 민간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이 무렵 러시아 시베리아 이르쿠츠크 가스전의 공급노선이 한국-중국 방향 대신 일본으로 사실상 변경됐다. 한국의 에너지원 확보 정책이 다시 한번 실패에 직면하는 순간이었다.
2004년 7월 ‘신동아’ 편집실로 수차례 전화가 걸려왔다. 러시아가 노선을 변경한 내부 사정을 자세히 설명한 러시아 현지 연구원의 ‘신동아’ 기고를 본 한국 정부기관이 부랴부랴 그 연구원 수소문에 나선 것이다.
정태수의 유전(油田) 사냥
이르쿠츠크 가스전엔 사실 한국이 땅을 칠 만한 사연이 있다. 1996년 한보그룹의 정태수 당시 회장은 이 가스전 개발권을 소유한 러시아 회사 지분 27.5%를 사들여 최대주주가 됐다. 국내에선 ‘정경유착의 화신’으로 각인돼 있지만 정태수씨는 1990년대 중반에 이미 유전, 또는 그 유전 채굴권을 소유한 석유회사가 금싸라기가 될 것을 예상하고 전세계를 무대로 유전 사들이기에 나섰다. 선견지명이 있었던 것이다. 한보가 이르쿠츠크 가스전을 확보한 것은 그러한 에너지 전략의 결실이었다.
그러다 한보비자금 사태가 터지고 정씨가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어수선한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정씨의 아들은 가스전 지분을 3000만달러에 영국석유회사에 몰래 매각하고 만다. 당시 한보의 채권을 확보해야 할 한국정부의 명백한 직무유기였고 그 결과는 너무 참혹했다.
지금 한국정부가 돈보따리를 싸들고 바로 그 이르쿠츠크 가스를 팔아달라고 하는 데도 러시아는 일본과 저울질을 하고 있다. 완전히 ‘매도자 우위’ 시장이 돼버린 것이다. 한국이 3000만달러에 넘긴 이르쿠츠크 가스전 지분은 현재 30억~50억달러의 가치로 평가받는다. 잠재적 부가가치는 훨씬 더 크다.
가스채굴권 회사의 최대주주 자리를 지키기만 했어도 한국기업은 막대한 가스판매 수익을 얻고, 한국은 이르쿠츠크 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었다. 이르쿠츠크 가스전 배후에 자리잡은 시베리아 석유유전 개발사업에 뛰어들기도 용이했다. 또한 동아시아 대륙을 가로지르는 수십억달러 규모의 가스관, 송유관 공사를 따내기도 수월했을 것이다.
사실 정태수씨는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한보철강을 세운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손에 들어온 천재일우의 기회를 날려버리고 말았다. 한국의 가스관, 송유관 용접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말이다.
정태수씨는 지금도 모스크바 등지에서 유전확보와 석유회사 지분 사들이는 일에 열성적이다. 국내에서 석유가 생산되지 않더라도 정태수씨처럼 하면 ‘산유국’이 되는 것이다. 미국 석유회사가 러시아 사할린 유전을 사들인 것도 비슷한 이유에서다. 한국보다 훨씬 에너지 사정이 좋은 강대국도 안정적인 석유자원 공급처 확보를 위해 ‘국가원수급’이 직접 나서서 전력투구한다. 고이즈미 일본 수상이 러시아 석유자원 확보에 나선 것도 그렇고, 부시 미국 대통령이 이라크전쟁을 벌인 것도 따지고 보면 이와 연관이 있다. 그런데 한국 정부에선 에너지 정책이 특정 정부 부처, 그 안의 특정 부서의 소관업무로 축소되어 있다. 제대로 된 성과가 나올 리 없다.
에너지소비의 효율성 증대 문제에서도 청와대와 정부는 세계적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 2004년 8월 도요타는 저속주행은 전기모터로 추진하는 전기-휘발유 겸용 ‘하이브리드카’를 미국시장에 내놓았다. 현재의 자동차보다 휘발유 값이 3분의 1 밖에 안 된다. 미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이미 인기 조짐이 보인다고 한다. 석유 의존도를 대폭 줄인 차세대 자동차 개발에 도요타는 한국 자동차회사보다 10년 이상 앞서 있다는 평이다.
미국 존 케리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최근 ‘하이브리드카’ 개발에 100억달러의 정부예산을 투입하겠다고 공약했다. 한국정부는 관련 예산이 미미해 자동차회사가 알아서 하라는 쪽에 가깝다.
석유를 대체할 대체에너지 개발에서도 한국은 미국, 일본, 러시아 등에 크게 뒤처져 있다. 러시아의 경우 수소를 활용한 대체에너지 개발이 상당히 진척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4년 한국은 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을 위해 196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난해보다는 2배 늘어난 것이지만 미국의 2%, 일본의 3.5%에 불과하다.
다음은 10여명의 러시아 현직 장관급 인사들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한러문제연구소 권영갑 소장의 말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전략이 없다. 대규모 석유자원을 갖고 있는 러시아를 먼저 한국의 파트너로 끌어들이면 북한, 일본, 중국은 자연히 참여하게 되어 있다. 러시아를 끌어들이기 위해선 민·관이 협력해 러시아 정부내 주요 인사들을 친한(親韓) 인사로 만들어 그들로 하여금 사안별로 러시아 정부를 설득하게 하면 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생략한 채 ‘에너지 동북아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하는 건 바늘 허리에 실을 꿰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다.”
‘에너지 안보’ 로드맵은 왜 없나
지금도 한국경제는 고유가로 비상사태지만 빠르면 10년, 늦어도 20년 뒤면 석유생산량 저하에 따라 가격급등, 공급차질 등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 이 문제에 근본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선 해외 석유자원 확보를 위한 투자, 에너지효율성 증대를 위한 기술개발,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수십조원이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그래도 지금의 미국, 일본의 일상적 투자수준밖에 안 된다. 지금이라도 투자에 나서지 않으면 주변 4강과의 에너지 격차는 ‘주권’을 위협받을 정도로 벌어지게 된다는 경고가 나온다.
결국 한정된 재원의 배분문제로 다시 돌아간다. 4조3000억원으로 ‘공주-연기의 땅’과 ‘외국의 석유 채굴권 지분’ 중 어느 것을 쇼핑하는 것이 더 애국적인지 청와대가 한번이라도 진지하게 계산기를 두들겨봤는지 의문이다. 이사는 여유가 있을 때의 선택의 문제이지만 에너지가 없으면 국가가 당장 정지하게 되므로 에너지안보 문제는 청와대와 정부가 관심과 정성을 쏟아야 할 사안이다. 더구나 10년 뒤의 에너지 위기는 이미 예고된 것이나 진배없기에 더 그러하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현실은 민간에선 위기감을 절감하고 있고, 정부의 실무 부서에서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는 단계에 이르렀지만 대통령과 청와대는 에너지안보를 국가의 중장기 과제로 설정해 역량을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다. ‘로드맵’ 정권에 ‘에너지안보 로드맵’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2004년 6월 서울 한 호텔에서 테이무라스 라미슈빌리 주한 러시아 대사는 “에너지안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라고 말했다. 외국 외교관의 눈에 한국 국민의 앞날이 얼마나 걱정스럽게 보였으면 주재국 정부를 향해 이런 직설적 경고까지 하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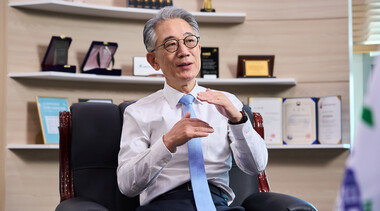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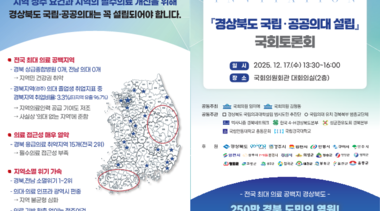

![[전쟁이 남긴 빈자리③] 왜 한국이 중동 난민 ‘가족 재결합’ 돕나](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3f/d5/4b/693fd54b0e05a0a0a0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