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 자리에서 바로 사진을 찍고 동반자 세 명과 함께 홀인원의 감격을 만끽했다. 동반했던 친구들은 하나같이 ‘복 있는 녀석’이라고 덕담을 해주었다. 1994년 골드CC, 이듬해 뉴서울CC를 거쳐 지난해 그랜드CC에 이은 경사였다. 공교롭게도 그랜드CC만 빼놓고는 모두 6번 아이언으로 홀인원을 했다.
더욱 의미 있는 공통점은 네 번의 홀인원이 모두 ‘멤버’가 좋았을 때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좋은 기록이 나올 때, 공이 잘 맞는 날은 내가 공을 잘 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의 멤버, 동반자가 좋기 때문이라고 나는 믿는다. 그럴 때는 라운딩은 물론 식사와 티 그라운드까지 모두 부드럽게 이어진다. 나만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스코어가 잘 나올 때는 한번쯤 동반자를 살펴보라. 아마 내 말이 틀리지 않을 테니.
흔히 ‘그린 위의 백팔번뇌’라 하지 않는가. 스트레스를 주는 행동, 날이 선 말, 무례한 스윙, 너무 오래 걸리는 어드레스…. 상대방의 무언가가 마음에 걸리는 날에는 결코 좋은 스코어가 나오지 않는다. 결국 ‘네 명의 좋은 동반자 = 좋은 스코어’인 셈이다. 나는 이런 날 치는 골프가 좋다. 평생 좁은 사각의 링에서 서로 죽일듯이 주먹을 휘두르는 운동만 해왔던 사람이라 더욱 그런 모양이다.
골프와 권투는 그래서 다르다. 분노가 힘이 되는 권투보다는 함께하는 기쁨이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이 골프다. 그러나 두 운동 사이에는 공통점도 있다. 다음은 내가 잊지 못하는 그린 위의 ‘4전5기’ 이야기다. 어찌 링 위에만 감동의 역전 드라마가 있을쏘냐. 사실 따지고 보면 세상 모든 스포츠의 묘미는 바로 그 역전에 있는 것일진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후배 2명(이들은 로 싱글 수준이었다)과 S병원에 근무하는 보기 플레이어 H씨와 라운딩에 나섰다. 모두 내기를 좋아하는 화끈한 성격의 친구들이었다. 실력들이 만만치 않은 만큼 언제 버디가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 이어졌다.
H씨는 보기 플레이어라고 하지만 아무리 살펴봐도 싱글 핸디캡이라고 보는 것이 옳았다. 그러나 역시 실력은 실력. 숏홀에서 무너진 그는 17번 홀에서도 무너져내렸다. 마음속으로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너무 깨지는 거 아냐? 딴 돈 돌려줘야겠는걸….’
그런데 이 양반이 마지막 홀에서 갑자기 “따블!”을 외치는 것이었다. 지금으로부터 26년 전, 카라스키야에게 네 번 다운당한 후에도 기를 쓰고 다시 일어났던 내 옛 모습과 다를 게 없었다.
그러나 상황은 갈수록 태산이었다. 네 명 가운데 세 명의 티샷은 오른쪽에 있는 벙커를 넘어 모두 피칭 웨지나 9번 아이언 거리에 안착했는데 H씨의 티샷은 벙커로 들어갔다. 그것도 벙커 모래가 아닌 모래와 언덕 사이 긴 터프 속이었다.
두 명의 로 싱글들은 벙커터프에서 샷을 준비하고 있는 H씨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이미 승부는 끝났다고 판단했던 것이리라. 우리의 불쌍한 H씨는 신중에 신중을 기한 끝에 공을 쳐올렸다. 도저히 각도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친 공은 하늘로 치솟아 18번홀 그린 왼쪽 러프에 다시 쳐박혔다. 게다가 내리막 그린. 더블 보기나 트리플이 불 보듯 뻔했다. 이미 두 싱글의 두 번째 샷은 깃대를 향해 각각 4m 정도까지 붙었다. 나는 70cm로 붙였지만 내리막이어서 3퍼트도 나올 수 있는 위치였다.
H씨는 러프로 가서 연습스윙을 몇 번 하더니 바로 공을 쳤다. 이런! 이번에도 분명 잘못 맞은 샷이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 그린 에지를 맞은 공이 내리막을 만나더니 데구르르…, 아주 천천히 구르면서 홀컵으로 빠져버리는 것이 아닌가. 버디였다. 그 순간 동반자 세 사람의 가슴도 쿵! 하고 떨어졌다. 놀란 입은 다물 줄을 몰랐고….
2온에 성공한 후배 두 명은 파로 마무리 지었다. 이제 내 차례다. 자칫하면 ‘버디가 보기 되는’ 상황이었다. “긴장감이 클수록 더 편해진다”는 주문을 가슴속으로 뇌까리며 공을 때렸다. 다행히 버디 성공이었다. 두 후배는 마지막 홀에서 버디를 하고도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도록’ 얻어맞은 셈이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블’을 외친 H씨는 8만원짜리 게임에서 32만원을 찾았다. 멋진 승부였다.
라커룸으로 가는 길에 H씨에게 말을 건넸다.
“정말 4전5기 했구만.”
“그러게요. 한 방에 다 찾았어요.”
한 방, 한 방이라…. 권투가 글러브를 벗는 순간까지 결과를 알 수 없듯, 골프 또한 장갑을 벗을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교훈을 뼈저리게 깨달은 날이었다. 끝을 보기 전에는 절대 알 수 없다는 ‘승부의 가르침’. 그러다 너무 요행수에 익숙해지는 것 아니냐고? 무슨 소리,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집념이 남지 않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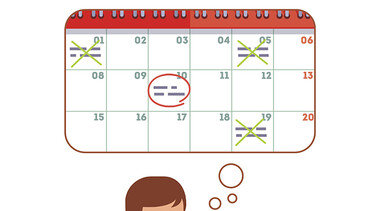


![[지상중계] 제12회 나지포럼, “북미 정상회담 성과내기 어려워”](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43/48/32/69434832107aa0a0a0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