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서부 개척 시기에 비견되던 ‘신경제’ 시절, 닷컴기업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된 것은 세상을 깜짝 놀래킬 만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발굴이었다. 수익성은 일단 사업을 벌여놓은 다음에 고려할 문제였다. 그러나 벤처거품이 빠지면서 경영난에 봉착하자 닷컴기업들의 태도가 돌변했다. 자신들이 제공하는 온라인 컨텐츠 이용자들에게 대가를 요구한 것이다. 한국의 온라인 컨텐츠 시장에서 특히 그 사업성을 주목받은 것은 교육시장이다.
온라인 네트워크는 교육이 추구하는 이상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많다. 기존의 미디어 교육과는 달리 교육자와 피교육자 간에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한 쌍방향 교육 시스템일 뿐 아니라 완전 개별화한 1대 1의 교류가 가능하다. 또한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을 수 있고, 디지털화한 정보는 재활용하기도 쉽다. 그러다 보니 온라인 교육은 피할 수 없는 대세로 인식됐다.
하지만 평생교육을 주창하며 등장한 사이버 대학도 기존 오프라인 대학의 관행을 답습하고 있는 느낌이다. 학생들은 대학을 선택할 때 안정된 시스템에 바탕을 둔 체계적 교육지원, 그리고 책임감 있는 교수의 성실한 지도가 아니라 기존 대학의 명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당수 대학들은 온라인 교육기반을 탄탄하게 닦으려 하기보다 연합전선을 구축해 이름만 걸쳐놓고 있는 실정이다. 저명 인사의 총장 영입 붐도 그들의 이름값으로 대학의 권위를 확보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 또한 사이버 대학이 서울에 집중해 있다는 점도 오프라인과 사정이 비슷하다.
학생들이 온라인 교육 시스템의 장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다. 사이버 대학도 정규 대학이니만큼 학사관리가 엄정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지난해엔 일부 사이버 대학생들이 PC방에 모여 집단적으로 ‘커닝’을 한 일이 벌어졌다. 이는 온라인 교육의 취지를 일거에 무너뜨리는 행위라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사이버 대학이 고시 준비를 위한 병역 연기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라인 학습 분위기를 해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역시 공부는 배우는 사람의 태도에 달린 것이지, 환경과 학습방법을 탓할 일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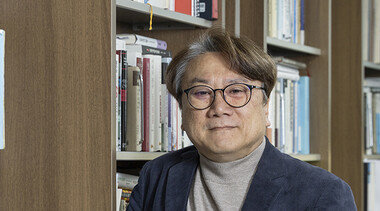
![[신동아 만평 ‘안마봉’] 2026년 ‘반중 지도자군(群)’의 행진](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9e/7c/5e/699e7c5e023ba0a0a0a.png)

![[영상] 김다현 “언제나 내 편인 ‘얼씨구다현’과 함께 붉은 말처럼 달리렵니다”](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8b/df/02/698bdf022269d2738e2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