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간을 거슬러 잉카제국으로
더 이상 철마가 달릴 수 없는 종착지 마추픽추역의 아담한 광장에서 바라본 주변 풍광은 타임머신을 타고 잉카제국으로 들어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가파른 산자락에 옹기종기 매달려 있는 작은 집들과 계곡인지 길인지 구분하기조차 어려운 골목의 풍경, 전통복장을 입고 물건을 파는 아낙네의 표정에 이방인의 심장은 쿵쾅거리기 시작한다.
원주민어로 ‘늙은 봉우리’란 의미의 마추픽추를 좀더 체계적으로 둘러보기 위해 전문 가이드 안나 마리아를 소개받았다. 길이 먼 탓인지 가이드는 통성명을 하자마자 유적지를 향해 발걸음을 재촉한다. 내 나이보다 다섯 살이나 아래임에도 사촌누이만큼이나 나이들어 보이는 그녀의 본업은 쿠스코 고등학교의 영어선생님. 부업인 가이드 수입이 본업보다 더 많다고 한다.

왕가의 무덤 창문 뒤편에서 바라본 계단식 경작지
독특한 모양새 ‘독사의 통로’
수백 개의 계단을 내려와 능묘(陵墓) 앞에 마주섰다. 잉카인들은 작은 궁전을 연상케 하는 이 능묘의 벽에 미라를 안치시켰다고 안나가 설명해준다. 미라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바 없다. 능묘 주변에는 용도를 알 수 없는 샘과 관개수로 등 시신을 보관한 흔적이 남아 있지만 정작 능묘에서는 단 한 구의 미라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마추픽추 유적의 중심지는 단연 ‘태양의 신전’과 ‘신성한 광장’이다. 자연석을 가공해 건설한 신전에는 여러 개의 창문과 구멍이 뚫려 있는 유적지가 많이 남아 있다. 그 중 가장 독특하고 흥미로운 곳이 ‘독사의 통로’. 마추픽추 유적지를 세상에 알린 미국인 역사학자 하이람 빙엄이 이름을 지었다는 이 통로는, 작은 물체를 넣으면 빙글빙글 돌아 모두 안쪽으로 떨어지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그 모양새가 뱀과 흡사해 이같은 이름을 얻게 됐다.
‘신성한 광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사원 터와 그 뒤쪽에 위치한 왕가의 무덤이다. 정교하게 다듬어진 커다란 창이 세 개씩이나 나란히 뚫려 있는데 이런 양식은 지금까지 세상에 알려진 잉카 유적지 중 마추픽추에서만 볼 수 있다. 아마도 특별한 의식을 주관할 때 쓰였던 의식용 구조물로 추정하고 있다.

마추픽추 마을의 한산한 거리 풍경
무려 1만여 명이 생활하기에 충분한 공간과 경작지를 갖추고 있지만, 언제 누가 왜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은 ‘잃어버린 도시’ 마추픽추. 유적을 뒤로하고 하산하는 버스에 올라 차창 너머로 멀어져 가는 공중도시를 바라보는 나그네의 귓가에, 멀리서 “굿 바이∼”하고 외치는 소리가 내려앉는다. 피부색이 다른 이방인을 눈여겨보았던 것일까. 한 순박한 잉카 소년이 산마루에 서서 필자에게 보낸 작별인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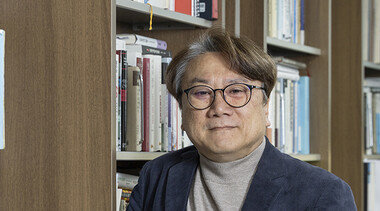
![[신동아 만평 ‘안마봉’] 2026년 ‘반중 지도자군(群)’의 행진](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9e/7c/5e/699e7c5e023ba0a0a0a.png)

![[영상] 김다현 “언제나 내 편인 ‘얼씨구다현’과 함께 붉은 말처럼 달리렵니다”](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8b/df/02/698bdf022269d2738e2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