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한호 아시아연구소(Korea-Australia Research Centre, 이하 KAREC)로 출범해서 2010년 12월에 한국학연구원(Korea Research Institute, 이하 KRI)으로 승격한 이 기관의 좌장은 한국계 서중석 연구원장(상경대 경영학부 교수)이다.
한호 아시아연구소(KAREC)의 출범

호주에서 한국학 연구를 이끌어가고 있는 4인방. 권승호, 서중석, 김현옥, 신기현 박사(왼쪽부터).
KAREC은 호주 내 한국학 연구가 주춤해지던 2000년에 UNSW에 설립됐다. 한국 내에서는 작고한 배무기 전 울산대 총장과 서울대 최송화 부총장이 역대 자문위원장을 맡아 지금까지 연구원의 발전을 주도했고, 당시 박석무 이사장이 이끌던 학술진흥재단에서 KAREC에 대한 초기 지원금을 제공했다.
그동안 KAREC(KRI)은 호주, 한국, 동남아를 연계하는 국제 네트워크를 수립해 호주 내 한국학이 중흥기로 진입하는 데 일조했다. 또 한국학의 태동기를 맞은 동남아 지역에서 한국학이 깊게 뿌리내리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
6년 전 ‘KAREC 4인방’을 만난 적이 있다. 열악한 여건에서 연구소를 반석 위에 올려놓기 위해 밤낮없이 애쓰던 서중석 소장, 권승호 부소장, 신기현 자문위원, 김현옥 부장(당시 직책)이 그 주인공들이다. 특히 서중석·권승호·신기현 교수는 20대 중반에 호주에서 석·박사를 마친 호주에 정통한 학자들이다.
서중석 원장은 서울대를 졸업하던 해인 1979년 12월 가족과 함께 호주로 이민 왔다. 그의 학업은 중단 없이 이어져 UNSW에서 한국인 최초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같은 학교의 상과대학에서 한국인 제1호 경제학교수가 됐다.
‘1호 명찰’을 두 개나 획득한 서 원장은 그때 몇 가지를 결심했다고 한다. 그중 하나가 조국을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기여하겠다는 다짐이었고 그는 그 다짐을 한시도 잊지 않았다. 그는 지난 25년 동안 UNSW에서 경제학과 국제경영학을 가르치며 호주 학생들뿐 아니라 동남아의 인재들을 키워 보내는 귀중한 경험도 했다.
1단계 / 동남아 한국학 연구 교류 네트워크의 구축
1990년대 초반 이후, 호주는 동남아 국가들의 유학 거점으로 자리매김했다. 우선 호주는 지리적으로 동남아 국가들과 가깝다. 또한 영어권 국가인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중에서 동남아와 대양주를 학문적 차원에서 이어줄 수 있는 제반 여건을 갖췄다.
거기에 운까지 따라주었다. KAREC이 출범할 즈음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한류(韓流) 열풍이 동남아에 불기 시작했다. 비록 대중문화에 국한된 사회현상이지만 한국의 드라마와 대중가요를 좋아하는 사람이 크게 는 것은 한호 아시아연구소가 한국학을 자리매김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뒤 5년 동안 서중석 원장은 동남아 4개국의 최고 대학 총장실부터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고, 현지에서 인정받는 최고 학자들을 초빙했다. 특히 동남아의 한류 현상을 보며 우리 문화 상품의 수출 증대에 대부분의 관심이 쏠려 있을 때, 서 원장이 각국 최고 대학 내 한국학 정착을 염두에 두고 한류와 한국학을 접목하려는 장기적인 포석을 깐 것은 눈여겨볼 만하다.
이렇게 5년간 KAREC은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4개국 6개 대학을 연결하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지인 학자들과 함께 시범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했다. 또 한국학과 한류의 현지화를 위해 네트워크 구성 작업을 완성했다.
이렇듯 한국 내에서 한류 연구 및 동남아와의 교류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이 일기 이전에 연구와 교류의 기초를 다진 상태여서 이 연구소는 높은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 제 1단계가 끝날 무렵 KAREC은 태국 출라롱콘대, 말레이시아 말라야대, 인도네시아대, 베트남 호치민 인문사회과학대 등 동남아 4개 유수 대학과 연계해 영문 한국학 학술지 발간을 시작했다.
2단계 / 현지화
2000~05년에 해당되는 KAREC의 1단계가 호주와 동남아 국가들 간의 장기적인 네트워크 구축과 신뢰기반을 조성하는 과정이었다면 2006~10년에 해당되는 제 2단계는 네트워크를 제도화해 정착시키는 시기였다. 또 지역도 핵심 4개국에서 필리핀, 라오스, 캄보디아가 추가돼 7개국으로 규모가 커졌다.
이 시기에 규모가 커졌을 뿐만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큰 발전을 거듭했다. 명실 공히 7개국 최고의 대학들이 망라된 것이다. 또한 7개 대학 총장, 부총장이 주축이 돼 동남아 한국학회를 결성했으며, 이들이 학회의 회장단과 자문위원이 되어 동남아 지역 내 한국학 발전의 주축을 맡았다. 각국 최고대학에서 스스로 투자해서 스스로 발전해나가도록 KAREC가 이끈 것이다.
한국을 동남아에 널리 알리고, 한국의 경험을 동남아에 전수하는 과정에 시혜적인 태도를 통한 일방적인 노력만 가지고는 자존심이 강한 현지 학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할 수 없다. 서 원장은 이 점을 감안해 한국과 동남아가 서로 배운다는 취지로 한국과 동남아 비교연구를 연구 활동의 기조로 삼았다.
서 원장은 이렇게 한국에서 추구하는 한국학의 세계화가 현지에서 주도하는 한국학의 현지화와 병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서 원장은 연구의 주제 선정, 교수법, 연구방법 등의 측면에서 현지 상황과 우선순위가 반영돼야 한국학이 현지에서 튼실하게 뿌리내릴 수 있다는 지론으로 동남아 각 대학과의 공동 프로젝트를 기안할 때에도 철저하게 수요자 위주로 결정했다.
이런 방식으로 현지화 작업을 진행한 결과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큰 성과를 얻었다. 동남아 7개국의 10개 대학을 중심으로 한국학 커뮤니티가 만들어졌다. 이 커뮤니티는 10개 대학의 총장과 학장들이 주춧돌이 되고 각 대학의 핵심 학자들이 참가하는 공동체가 되어 동남아 한국학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 KAREC 관계자들의 겸손한 자세와 꾸준한 노력이 이뤄낸 쾌거였다.
3단계 / 한국 발전모델 공동연구
KAREC의 10년에 걸친 노력은 UNSW 내부에서도 높이 평가받아서 연구소에서 연구원 KRI로 승격돼 새로운 비전을 가질 수 있었다. 서 원장에게 앞으로 10년 동안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었다.
“한국의 국가 브랜드가 제고되고 동남아 각국에서 한국의 발전을 벤치마킹하고 배우려는 열정이 있다. 우리가 완성한 계획을 그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공동연구를 수행해 그들의 손으로 시사점을 찾고 그들의 입으로 정부, 학계, 재계를 설득하게 하는 것이 올해 KRI가 시작한 5개년 연구 프로젝트의 목표이다.
또 10년 전에 시작한 일이 우리가 은퇴한 후에도 계속되려면 차세대 리더들을 발굴해야 한다. 현재 박사 과정을 밟는 학생들 중에서 호주와 한국을 연결하며 동남아 학자들과는 인내와 존경으로 따뜻한 친구가 되어줄 인재를 찾아 키워야 한다. 그리고 우리 뒤에 오는 이들이 우리보다 더 멀리, 더 높이 날게 되고 우리가 잊힌다면 그것이 바로 성공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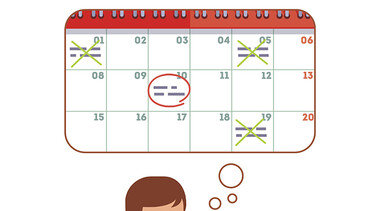


![[지상중계] 제12회 나지포럼, “북미 정상회담 성과내기 어려워”](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43/48/32/69434832107aa0a0a0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