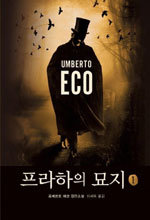
프라하의 묘지(전 2권)<br>움베르토 에코 지음, 이세욱 옮김, 열린책들, 각권 1만3800원
이제부터는 글을 쓰되 개인에 관한 묘사(…)는 되도록이면 피하려고 한다. 이는, 들판에 가을이 오면 꽃이 시들어 꽃대에서 사라져버리듯이, 인간 또한 그렇게 사라져버릴 터인즉, 인간의 외양만큼이나 덧없는 것이 또 어디 있겠느냐는 보에티우스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 그러나 윌리엄 수도사의 풍모만은, 그 비범한 모습이 크게 내 마음을 흔들었기로 여기에다 자세히 그려 남기고 싶다.
-움베르토 에코 ‘장미의 이름’ 중에서
2012년 8월 2일. 체코 프라하 엘베 강 옆 요제포프(유대인 구역)에는 신중한 표정의 이방인들이 그룹을 지어 시나고그(유대인 회당)와 유대인 묘지 주위에 모여 있었다. 프라하에는 도시 외곽 카프카가 묻혀 있는 신유대인 묘지와 도심의 구유대인 묘지가 있다. 구묘지에서 내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공동묘지라고 하기엔 비좁은 뜰에 포개지듯 촘촘히 세워져 있는 비뚜름한 비석들과 고목의 검푸른 그늘 아래 언뜻언뜻 햇살에 돌올하게 드러나는 비문들이었다. 나는 비석들이 그처럼 겹쳐져 있는 사연과 고목의 이름을 귀국 후, 에코의 소설을 통해 알았다.
프라하와 유대인
프라하의 게토에 이 묘지가 생긴 것은 중세 때였는데, 게토의 유대인들은 애초에 허가된 테두리를 벗어나 묘지를 확장할 수가 없었던 터라 수백 년 동안 무덤 위에 또 무덤을 쓰는 터라 수백 년 동안 무덤 위에 또 무덤을 쓰는 식으로 약 10만 구의 시신을 여기에 묻었다. 그에 따라 비석들은 갈수록 빼곡하게 들어차서 서로 등을 댈 지경에 이르렀고 (…) 비석들에는 그저 딱총나무의 검은 그림자만이 드리워 있었다. (…) 나는 거기에 랍비들이 모여 있는 광경을 상상했다.
-프라하의 묘지 1권 ‘어느 날 밤 프라하에서’ 중에서
2013년 3월 9일 토요일. 나는 파리의 팡테옹 언덕에서 그 아래 모베르 광장 쪽으로 천천히 걸어 내려갔다. 에코와 파리, 그리고 프라하와 유대인의 상관관계를 반추했다. 생각은 지난 2월 파리행 비행기를 타기 전 에코의 ‘프라하의 묘지’(전2권)를 챙기면서 비롯됐다. 1980년 ‘장미의 이름’ 출간 이후, 평균 8년에 한 번 신간을 발표하는 에코의 6번째 소설 한국어 번역본이었다. 제목과는 별도로 파리와 관계가 깊었고, 첫 단락부터 긴 의고체로 파리를 묘사하고 있었다.
어느 행인이 있어 1897년 3월의 그 우중충한 아침나절에 위험을 각오하고 모베르 광장, 또는 무뢰한들이 라 모브라고 부르는 곳(…)을 건너갔다면, 그 행인은 악취 나는 골목들이 얼키설키한 동네의 한복판에서, 오스만 남작의 파리 재개발사업 때 드물게 허물리지 않은 장소 한 곳을 마주하게 되었을 터인즉, 이 동네는 비에브르천(川)을 경계로 두 구역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오래전에 복개되어 파리의 내장 속에 갇혀버린 비에브르천은 이 동네에서 다시 빠져나와 열에 들뜬 채 신음과 독소를 뿜어내면서 센 강으로 흘러들고 있었더라.
-프라하의 묘지 1권 중에서
일찍이 보들레르와 발터 벤야민이 탐했듯, 파리는 세계에서 제일 걷기 좋은 도시. 내 발길은 모베르 광장을 거쳐 고급 레스토랑 ‘투르 다르장’이 있는 센 강변을 따라 걷다가 예술교를 건너 루브르 박물관으로 향했다.
거짓과 진실의 게임
지난해 7월 이곳에서 벌어진, 책에 관련된 희극적인 퍼포먼스를 기억하고 있었다. 당시 언론 보도에 의하면 루브르 박물관 장서각 2층에서는 재미있는 이벤트가 벌어졌는데, 일명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 종이책과 전자책 리더(ebook reader) 킨들을 동시에 바닥에 던지기’. 연출은 다큐멘터리 기획사였고, 실행자는 80세의 노작가 자신이었다.
결과를 지켜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이 뻔한 사실을 취재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문학담당기자들이 몰려들었다. 뻔한 질문이나마 작가에게 주어졌고, 에코 왈, 뻔히 알고 있는 사실도 때에 따라 해보일 필요가 있는데, 진실과 관계될 때 그러하다는 것. 기자들의 목격담은 그때 2층 난간에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바닥에 던진 책은 ‘장미의 이름’, 킨들은 산산이 부서지고, 종이책은 조금 구겨졌을 뿐이라는 것.
몇 달 뒤, 에코는 시모니니라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위조범을 소설 역사상 가장 혐오스러운 주인공으로 내세운 장편소설 ‘프라하의 묘지’를 발표했다.
유대인들이 프라하의 묘지에 모여 세계를 정복할 회의를 했다는 위조문서가 그의 손으로 작성됐고, 결국 20세기 초 전쟁과 유대인 학살 참극의 기원은 바로 이 거짓 문서의 역사에서 비롯된다는 것. 여기에서 내 흥미를 끄는 것은 에코가 천착해온 거짓과 진실의 게임(상관관계)보다도 800쪽에 달하는 추리 형식의 이 소설을 이끌어가는 것은 일기, 평생 중세와 기호학, 철학 연구에 열정을 바친 대석학이 최후에 차용한 소설적 장치가 일기라는 것이 새삼 주목을 요했다.
나는 누구인가? 아마도 내 인생에 무슨 사건들이 있었는지 자문하기보다 내가 무엇에 열정을 바쳤는지 물어보는 편이 더 유용할 것이다. 나는 누구를 좋아하는가? 내가 사랑한 얼굴들이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는다. 내가 맛있는 요리를 좋아한다는 것은 알고 있다. ‘라 투르 다르장’이라는 이름을 입에 올리기만 해도 전율 같은 것이 온몸으로 스쳐간다. 이런 게 사랑일까?
-프라하의 묘지 1권 ‘나는 누구인가?’ 중에서
루브르에 온 길에 클로드 로랭의 그림들을 찾아보려다가 상설전과 기획전 목록으로 눈길이 갔다. 몇 년 전, 루브르는 이례적인 사업(?)을 감행했다. 움베르토 에코에게 루브르의 전시 기획을 요청한 것이다. 루브르는 물론 전 세계 미술계가 주목한 그의 전시 기획명은 ‘궁극의 목록’.
획기적인 것이 더는 가능하지 않은 21세기, 그가 선택한 것은 기본에 충실한 평범함의 극치. 누구보다 얼리어댑터인 동시에 아날로그주의자(종이책 숭배자)인 말년의 에코가 도달한 이번 소설 역시 궁극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 사내의 진실한 고백담
‘프라하의 묘지’는 1897년 3월 24일부터 1898년 12월 20일(연속적으로는 1897년 4월 19일까지)에 이르는, 음식을 제외한 세상과 여자에게 극단적으로 냉소적인 시모니니라는 사내의 ‘일기 목록’으로 배치되어 있다. 일기인 만큼 사내의 내면 풍경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이 목적.
그동안 소설 이전의 질료로 여겨온, 한 인간의 진솔한 고백담인 ‘일기’가 궁극적으로 소설의 자리를 차지하는 하나의 장관이 창출되고 있는 셈.
랍비들의 발언록을 작성하기 위해 아직 간직하고 있던 모든 자료를 골로빈스키에게 넘겨주고 나자 나 자신이 텅 비어버린 기분이 들었다. 마치 젊은 시절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이제 뭘 하지?’ 하고 자문하던 때와 비슷했다. 게다가 인격이 분열되어 있던 상태에서 치유된 뒤로는 내 이야기를 들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프라하의 묘지 2권 ‘중단된 일기’ 중에서
2013년 3월 9일 오후 5시, 루브르 박물관을 나서는 내 손에는 목록과 카탈로그, 팸플릿들이 한 뭉치 들려 있었다. 밤이면 스탠드 불빛 아래 목록을 넘기며, 에코식으로 말하면, 인류 문화의 기원을 일별할 수 있는 즐거운 선물이었다.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발길은 어느덧 예술교를 건너 생제르멩데프레로 접어들었다. 들라크루아의 ‘대천사와 싸우는 야곱’이 예배당 벽에 역동적으로 그려져 있는 생 쉴피스 교회 앞에서 발길이 멈췄다. 거기 40년을 꿈꾸고 노력한 끝에 얻은 파리의 아파트 서재에서 움베르토 에코가 책장을 넘기고 있을 것이었다.























![[지상중계] 제12회 나지포럼, “북미 정상회담 성과내기 어려워”](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43/48/32/69434832107aa0a0a0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