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은희(79)씨는 명동예술극장 객석에 앉아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다. 반세기 전 주연 배우로 서서 울고 웃던 자리다. 그 공간에 다시 와 있는 것이 감개무량한 듯, 활짝 웃는데도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다.
5월29일, 명동예술극장 개관을 딱 한 주 앞둔 날 마무리 준비가 한창인 극장에서 최씨를 만났다. 이 극장의 전신은 1934년 일제가 영화 상영 및 연극 공연을 위해 지은 명치좌(明治座). 광복 후에도 시공관(市公館), 국립극장으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 역사는 이어졌다. 오페라 ‘춘희’(1948년), 셰익스피어극 ‘햄릿’(1949년)이 이 무대를 통해 처음 우리나라에 소개됐고, 수준 높은 연극 영화 프로그램이 연중 계속됐다. 최씨는 그 시절, 무대에서 가장 빛나던 배우 가운데 한 명이다. 1943년 극단 ‘아랑’에 연습생으로 입단하며 데뷔한 그는 명치좌부터 국립극장까지, 이 극장의 모든 시기를 함께했다. ‘맹진사댁 경사’ ‘춘향전’ ‘오셀로’ ‘세일즈맨의 죽음’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작품으로 무대에 섰고, 1955년 신상옥 감독과 함께 작업한 첫 영화 ‘꿈’도 이곳에서 개봉했다. 유치진 이해랑 김동원 장민호 백성희 김진규 최무룡 허장강 도금봉 황정순 등 한 시대를 풍미한 배우들이 그와 함께 극장에서 청춘을 보냈다.
“그 시절 명동은 우리 문화의 중심지였어요. 거리 곳곳에 예술가들이 넘쳐났고, 열정과 낭만이 가득했지요. 배우와 시인, 연출가와 화가가 무시로 어울렸고요. 이 자리에 앉으니 까맣게 잊은 줄 알았던 기억이 하나하나 되살아나 정말 꿈을 꾸는 것 같네요.”
예술인의 터전
최씨가 그 시절을 꿈처럼 기억하는 건, 1973년 국립극장이 남산으로 옮겨가면서 화려한 날들도 막을 내렸기 때문이다. 극장 건물은 한 금융회사에 넘어갔고, 창의가 넘치던 생산의 공간들도 급속히 상업시설로 변모했다. 이 극장에서 공연된 마지막 작품 ‘한네의 승천’ 팸플릿에는 “명동의 명물(名物) 석조 건물이 40년 만에 요절하다니… 안녕! 안녕! 안녕!”이란 고별사가 남아 있다.
소비 중심지가 된 명동에 예술가들도 더 이상 머무르려 하지 않았다. ‘명동백작’이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명동을 사랑했던 소설가 고 이봉구씨는 ‘명동시대’의 종말을 이렇게 기록했다.
나는 오랜 세월을 명동의 조촐한 대폿집 목로 앞에서 언제 보아도 불그레 주기에 젖어 있는 얼굴을 하고 홀로 독작을 즐기며 살아왔다. … 그 조촐한 대폿집도 없어져버리고 따스하고 흐뭇한 정감과 낭만도 사라지고 대신 삭막하고 어지럽기만 한 오늘의 명동 … 어디로 가나, 참으로 망연했다.

최은희씨는 명동예술극장 개관 축하 작품 ‘맹진사댁 경사’에 마을 할머니 역으로 특별출연했다.
“그 극장 그 무대에 다시 한 번 서는 게 늘 꿈이었어요. 다시 극장이 열리면 혹시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었지요. 그런데 정말 거짓말처럼 연락이 왔어요. 개관축하작에 출연해달라기에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첫마디로 ‘네’ 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맹진사댁 경사’라는 작품에 여자 배역이 넷밖에 없는 거예요. 젊은 처녀 역 둘 하고, 어머니 역 둘. 젊을 때는 내가 늘 주인공을 했는데, 이제 와 그걸 할 수는 없기에 그냥 특별출연 형식으로 작은 역할을 하겠다고 했지요.”
연극과 영화로 수차례 제작된 ‘맹진사댁 경사’에서 ‘입분이’ 역을 도맡았던 최씨는 이번 공연에 마을 노인 역으로 찬조 출연한다. 제작진이 그를 위해 단 세 마디뿐이지만 대사도 만들어줬다. 생전 처음 맡아보는 단역인데도 그는 “연극을 처음 시작할 때만큼 떨린다”고 했다.
그와 함께 극장 안을 둘러봤다. 매표소가 있던 자리는 로비가 됐고, 객석은 2~4층으로 물러앉았다. 무대가 잘 보이도록 말발굽형으로 조성된 객석은 모두 552석. 명치좌(1178석)나 국립극장(820석) 시절과 비교하면 많이 줄어들었지만, 최씨는 “무대 보기 편하게 잘되었네” 하며 좋아했다.

‘명동시대’를 이끌었던 1970년대 명동국립극장 전경. 명동예술극장은 이 형태를 그대로 복원해 개관했다.
‘다방시대’
극장을 벗어나 최씨가 오래도록 그리워한 명동 거리로 걸음을 옮겼다. 정문을 나서자 바로 앞에 전통찻집이 보인다. ‘명동국립극장’ 시절 ‘1번지 다방’이 있던 자리란다.
“건물은 바뀌었는데, 거리 모양은 그대로예요. 아, 그 자리에 이렇게 다시 찻집이 생겼네. 예전에 배우들과 같이 참 자주 왔지요. 그때도 이렇게 조용하고, 편안한 분위기였어요. 그 시절엔 다방을 많이 다녔습니다. 저기 아래, 조선호텔 방향으로 쭉 나가다가 오른쪽 골목으로 들어가면 있던 ‘모나리자 다방’도 좋아했어요. 영화음악을 주로 틀어줬는데, 거기서 듣던 영화 ‘역마차’ 주제가는 지금도 뚜렷이 생각나요.”
‘1번지 다방’ 얘기가 나오자, 최씨의 기억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옷가게와 음식점의 쇼윈도로 휘황찬란한 명동 거리가 아직 흙길이던 시절, 이 길의 주인은 ‘다방’이었다. 작가 고은은 ‘이중섭 평전’에서 “지구 위의 어디에 술 마시는 것으로만 예술가가 될 수 있는 곳이 있을 것인가. … 1950년대의 서울 명동뿐이었다”고 썼다. 그 시절 다방은 그렇게 예술인의 요람이자 창조의 공간이었다.
열두어 평 남짓한 다방 안은 언제나 걸죽하게 내뿜는 담배연기와 술냄새가 범벅이 돼 있었다 … 이 바닥에서의 주인은 따로 있다. 다방주인 마담은 터줏대감 노릇을 자임해 오는 몇몇 문객(文客)들 눈치보기가 노상 바빴다 … 시인, 소설가, 평론가, 연극인, 영화인, 음악인, 잡지·신문기자, 출판인, 만화가, 문학청년 등등 문학과 예술장르에 사돈의 팔촌쯤 얽혀도 죄 모여들어 들볶아치는 동방싸롱은 그야말로 방귀깨나 뀌는 장안의 유명 예술인은 모두가 모여들었다.
작가 김시철이 ‘격랑과 낭만’에 묘사해놓은 명동 ‘동방싸롱’의 모습이다. 최씨도 이곳을 기억한다. 연극인 이해랑 선생이 운영하던 곳. 당시 명동 다방은 어디를 가든 으레 문인이 주축을 차지하게 마련이었는데 여기는 좀 달랐다. 문인들 사이로 연극인도 제법 있었다.
“차 한잔 시켜놓고 하루 종일 앉아 있는 사람이 많았지요. 그런 사람들을 놀리는 말로 ‘벽화’라고 불렀어요. 그래도 누구 하나 뭐라 하지는 않았던 게, 그 시절엔 그게 다방 문화였거든요. 우리한테 다방은 차 마시는 곳이 아니라, 사람 만나고, 글 쓰고, 음악도 듣는, 그런 곳이었어요. 사무실 있는 극단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연극하는 사람도 다들 다방에 모여 작품 얘기하고 회의도 했지요.”
‘세월은 가도 … 내 가슴에 있네’
각종 문화행사도 다방에서 열렸다. 최씨가 즐겨 가던 돌체다방은 하루 종일 클래식 음악만 트는 곳으로 유명했는데, 특별한 날이면 기꺼이 예술인들에게 공간을 빌려줬다. 서울대 법대 졸업생 음악회, ‘새로운 언어’ 출판기념회, 양주동 문학강연회 등이 이곳에서 열렸다. 다른 다방에서도 시 낭송의 밤, 전시회, 음악회, 문학토론회 등이 흔히 열렸다. 해외로 떠나는 예술인을 위한 환송회나 귀국 보고회도 다방에서 열렸고, 가난한 예술가들은 지인들로 북적이는 다방 안에서 소박한 결혼식을 올리기도 했다.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 눈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있네
바람이 불고 비가 올 때도
나는 저 유리창 밖 가로등 그늘의
밤을 잊지 못하지
사랑은 가고 옛날은 남는 것
여름날의 호숫가 가을의 공원
그 벤치 위에 나뭇잎은 떨어지고
나뭇잎은 흙이 되고 나뭇잎에 덮여서
우리들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내 서늘한 가슴에 있네
가수 박인희가 부른 노래 ‘세월이 가면’은 그 시절 명동이 만들어낸 걸작이기도 하다. 강계순이 쓴 박인환 평전 ‘아! 박인환’에 따르면, 시인 박인환은 1956년 봄 명동의 한 대폿집에서 가수 나애심, 작곡가 이진섭, 언론인 송지영 등과 함께 술잔을 기울이다 갑자기 시를 쓰기 시작했다. 그것을 넘겨다보던 이진섭이 즉석에서 곡을 붙였고, 나애심은 흥얼흥얼 콧노래로 가락을 따라 했다. 나중에 합석한 테너 임만섭이 우렁찬 목소리로 이 곡을 노래하자, 지나던 행인들이 걸음을 멈추고 박수를 보냈다고 한다. 이날 이후 ‘세월이 가면’은 순식간에 명동에 퍼졌다. 마치 거짓말처럼.
“가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시절이 돌아올 수 있을까. 명동에서 다시 연극을 하고 예술을 얘기할 수 있을까. 명동예술극장이 문을 여니 그 꿈이 이뤄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로 돌아갈 수는 없다 해도, 명동에 다시 예술과 낭만이 돌아오게 할 수는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이지요.”
최근 명동에 문화예술공연장이 속속 들어서는 것도 최씨가 희망을 품게 되는 이유다. 지난 4월 M-플라자 5층 서울문화교류관광정보센터 안에 200석 규모의 다목적 공연장 ‘명동해치홀’이 문을 열었다. 지난해 5월에는 명동유네스코 회관 안에 410석 규모의 명동아트센터가 자리 잡았다.
연습부터 공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연극이 명동에서 만들어지면, 연극인을 비롯한 예술인들이 명동에 머물며 창의와 열정의 또 다른 역사를 쓰기 시작할 것이다. 최씨는 그 안에서 자신도 한몫을 하고 싶다고 했다.
“지금은 이 무대에 다시 오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지만, 다음에는 내게 맞는 작품에서 주인공도 하고 싶어요. 명동을 기억하는 이들이 다시 이 극장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6월5일, 마침내 개관한 명동예술극장에서 최씨는 노인 분장을 하고 지팡이를 짚은 채 무대에 섰다. 일평생 주연만 하던 그가 맡은 생애 가장 작은 역이었지만, 무대 위에서 그는 그저 행복해 보였다. 작품이 끝난 뒤 커튼콜 자리에 최씨가 나타났을 때, 객석에서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다. 명동예술극장에도, 최씨에게도 또 다른 ‘명동시대’의 시작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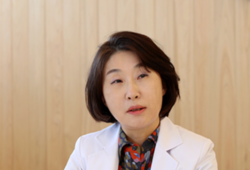


















![[밀착취재] 리딩방 70여 명 대부분이 한통속…기망하는 수법까지 매뉴얼화](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48/98/bd/694898bd2399a0a0a0a.jpg)


![[지상중계] 제12회 나지포럼, “북미 정상회담 성과내기 어려워”](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43/48/32/69434832107aa0a0a0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