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종의 통과의례랄까. 나환자들이 세상의 멸시를 피해
- 소록도로 가려면 숨막히는 더위 속 붉은 황톳길을 걷고 또 걸어야 했다.
- “지까다비를 벗으면 발가락이 또 한 개 없어지는” 아픔도 이를 악물고 견뎌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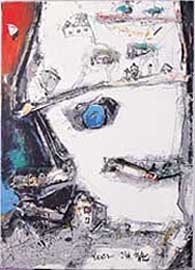
▲ 소록도는 여의도 한배 반 정도의 크기에 온갖 전경을 다 담고 있다.
이름하여 월례 정기면회. 나환자 부모와 그 아이들의 만남은 한달에 한번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다. 안거나 만져볼 수도 없다. 그렇긴 커녕 나병이 전염될까 무서워 부모는 바람을 안고, 자식은 바람을 등진 채 만나야 했다. 바람 방향이 바뀌면 면회는 바로 취소됐다.
가슴이 찢어졌을 것이다. 숯처럼 새까맣게 탔는지도 모른다. 월례 면회를 수탄장(愁嘆場), 즉 근심과 한탄의 장이라 부른 것도 그 때문이다. 1950년대 무렵에나 있었던 일이지만 전남 고흥 소록도, 국립 나병원이 있는 그곳엔 당시의 한과 눈물이 지금도 서럽게 배어있다.
황톳길 소묘
섬 모양이 폴짝 뛰는 아기 사슴을 닮았대서 소록도(小鹿島)다. 이름만 깜찍하고 예쁜 게 아니다. 여의도의 한배 반 정도 크기에 온갖 절경을 다 담았다. 하얀 백사장, 철썩이는 바다, 눈 가득 들어오는 육지와 올망졸망한 섬들의 조화. ‘가위손’으로 다듬었음직한 멋진 공원. 그리고 야트막한 둔덕을 빽빽이 메운 송림과 눈부신 햇살….
가슴이 미어질 듯 무거운 한과 슬픔을 안은 섬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건 참으로 역설적이다. 거기다, 일찍이 ‘문둥이 시인’ 한하운 선생이 한탄했듯 그 섬에 가는 길도 역설적이다. ‘소록도로 가는 길’이란 부제를 붙인 시, ‘전라도 길’에서 그는 “가도 가도 붉은 황톳길/숨막히는 더위뿐이더라”며 고개를 저었다.
한시인이 나환자의 애상을 담은 ‘전라도 길’을 발표한 건 1949년이다. 53년 만에 그의 행로를 더듬어 보성 벌교를 지나 고흥반도로 들어섰으나 ‘가도 가도 붉은 황톳길’은 쉽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천봉산 월악산 등성이를 넘어 과역을 지나 팔영산 운암산 천등산을 옆구리에 끼고 숨가쁘게 반도의 끄트머리를 향해 나아가 보지만 황톳길은 눈에 띄지 않는다.
흰사슴의 눈
“도대체, 한시인이 읊은 황톳길이란 어디를 말합니까?”
참다못해 묻자 안내인은 짐짓 의외라는 표정이다. 그러다 이내 간단하게 “여깁니다”고 답한다. 여기라니, 소록도로 가는 가장 크고 좋은 길 27번 국도를 따라 파릇파릇한 숲과 논 사이로 시원스레 달리고 있는데 바로 여기가 황톳길이라니….
안내인의 말은 맞았다. 푸른 산과 논 사이를 구불구불 돌며 갓길의 야생화가 적절히 운치를 더해주는 아스팔트 국도. 그게 50년 전에는 끝없이 붉은 황톳길이었다는 것이다. 칠팔월 땡볕 속에 거길 걷노라면 그야말로 천형을 받는 듯 시뻘건 해와 흙이 사람조차 붉게 물들이며 턱턱 숨을 막히게 했다는 것이다.
일종의 통과의례랄까. 나환자들이 세상의 멸시를 피해 조금 나은 삶과 치료를 위해 소록도에 가려면 숨막히는 더위 속 붉은 황톳길을 걷고 또 걸어야 했다. “지까다비를 벗으면/발가락이 또 한 개 없어지는” 아픔도 이를 악물고 견뎌야 했다. 붉은 길이 야속하고 쨍쨍 내리꽂는 해가 미워 병든 몸과 마음을 사무치도록 원망하기도 했을 것이다.
그처럼 가도 가도 끝없는 길이 이젠 번듯한 국도로 변모했다. 새로 4차선 도로를 내려고 산을 깎아낸 현장이나 각지게 구획한 논 사이의 좁은 농로 정도에나 붉은 황토의 흔적이 남아있다. 그곳에 닿기까지의 혹독한 통과의례 - 턱턱 숨막히는 황톳길 발품을 생략한 소록도는 그럼에도 찾는 이에게 치료와 안식을 줄 것인가.
고흥반도의 서쪽 끝 녹동항에서 소록도까지는 배로 5분, 직선으로 600m 거리다. 헤엄을 쳐도 30분이면 닿을 수 있지만 보통사람들의 출입은 얼마 전까지 엄격히 통제됐었다. 한센병(나병)이 거의 전염되지 않고 완치가 가능한 데다 발병률도 현저히 떨어지기 시작하자 당국은 소록도에 일반인 출입을 허용했다.
그렇다고 해서 관람객들이 섬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기 사슴의 절반 상체에 해당하는 부분은 병사지역, 하체 쪽은 직원지역으로 구분해 방문객의 병사지역 출입을 금한다. 이곳에서 투병 요양중인 800여 명의 환자들은 자조적으로 자신들이 있는 곳을 유독지대, 관광객들이 둘러볼 수 있는 곳을 무독지대라 부르기도 한다.
유·무독지대의 경계선으로 삼은 길이 글 첫머리에 소개한 ‘수탄장’이 섰던 곳이다. 1960년대까지 철조망이 쳐있었으나 모두 철거했다. 한때 눈물과 탄식, 비통의 현장이었던 그곳은 이제 소록도가 자랑하는 솔 향기 은은한 숲길이 되었다. 섬 안을 도보로만 이동할 수 있는 관람객들은 이 수탄장 근처에서 종종 사슴들과 마주치곤 한다.
소록도 사슴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숲길을 걷다 문득 시선을 느껴 고개를 들면 사람을 물끄러미 쳐다보는 사슴의 눈과 마주친다. 뒷발에 힘을 주고 가슴을 당당히 편 희디 흰 사슴이 다소 붉은 기가 도는 큰 눈망울을 껌벅인다. 다가가려 하면 슬그머니 시선을 거두고 뒷걸음질하듯 숲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모습이 단아하다.
소록도병원에서 8년째 근무하는 김정희씨는 섬에 사는 흰사슴과 꽃사슴들은 나환자들과 닮은 점이 많다고 얘기한다. 우선 수줍음이 많고 신체 접촉을 꺼린다. 그러면서도 사람이 그리운지 지나가는 이들을 힐끗힐끗 동경의 눈으로 지켜본다는 것이다. 마음이 여리고 남을 배려하며 조용히 사는 것도 빼닮았다고 설명하는 김씨의 표정도 역시 사슴과 닮은 듯하다.
아기사슴섬을 뛰노는 사슴을 보고, 사슴을 닮은 환자들과 마주치며 숲길을 걷다보면 소록도의 대표적 명소 중앙공원에 이른다. 1930년대 말 약 4년간 연인원 6만여 명의 나환자들이 강제동원돼 6000평 산을 깎아 만든 공원이다. 세상 그 어느 공원보다 한과 눈물과 서러움이 안으로 응집돼 이루어졌음직한 이 공원은 그러나 세상 그 어느 곳보다 아름다운 외양을 갖추고 있다.
인간사로 돌아가보니

▲ 800여 명의 환자들은 병사지역에 발 묶인 채 하루하루를 살아낸다
중앙공원 한가운데에는 천사가 나균을 무찌르는 형상의 탑이 서있다. 사면에는 “한센병은 낫는다”는 문구가 절규처럼 새겨져 있다. 불치의 천형을 앓는다며 손가락질받던 나병 환자들이 오직 한마디 “병은 낫는다”는 말을 입안으로 되뇌이며 온갖 박해와 노동을 견뎌냈을 모습이 그 탑엔 응축돼 있다.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뒤 월 평균 1만여 명의 방문객이 소록도를 찾는다. 이중 대부분이 자원봉사자들이다. 일반인은 섬에 들어와도 한나절 머물기만 할 뿐 숙박할 수가 없다. 섬 전체가 국유지로 상업용 숙박시설은 한 곳도 없다. 밤이 되면 소록도 일대는 병동 주변에만 불이 들어올 뿐 캄캄한 어둠, 그리고 정적에 휩싸인다.

▲ 나환자들의 한과 눈물과 서러움이 응집돼 있을 중앙공원은, 그러나 세상 그 어느 곳보다 아름다운 외양을 갖추고 있다
불과 5분 거리의 녹동항에 도착해보니 세상의 번잡이 이곳에 다 모인 듯하다. 모텔과 노래방, 주점들의 네온사인이 벌써부터 휘황찬란하게 비쳐 바다를 물들인다. 선창에선 술 취한 사람들이 승강이를 벌이고 있다. 밤낚시를 나가려 엔진을 점검하는 배 안에서는 원정 낚시꾼들이 엔진 소음보다 더 큰 목소리로 선원들에게 어황을 묻는다. 어촌 전체가 살아 움직이는 것이 그대로 느껴진다.
착 가라앉은 소록도와 번잡한 녹동항을 비교하며 다시 한하운 시인을 생각해본다. 과연 어느 쪽의 삶이 가도 가도 붉은 황톳길 숨막히는 삶일까.




















![[밀착취재] 리딩방 70여 명 대부분이 한통속…기망하는 수법까지 매뉴얼화](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48/98/bd/694898bd2399a0a0a0a.jpg)


![[지상중계] 제12회 나지포럼, “북미 정상회담 성과내기 어려워”](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43/48/32/69434832107aa0a0a0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