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군과 벌인 전쟁에서 대승한 월나라의 두 공신은 각기 다른 운명을 맞았다. 범려는 탁월한 처세술로 승승장구한 뒤 은퇴의 시기까지 잘 선택해 영웅으로 남았다. 반면 문종은 자신의 거취를 두고 우물쭈물하다 월왕 구천에게 자살을 강요당했다. 두 사람의 상반된 운명은 난세를 살아가는 처세의 차이에 있었다.

그 성공의 그늘에 있던 양대 공신은 전선군의 총사령관 격인 범려(范?)와 후방을 맡아온 보급 총사령관 격의 문종(文種)이다. 그러나 구천왕은 공신의 안전을 보장하고 그 노후를 보살필 만큼 도량이 크지 못했으며, 의심 또한 많았다. 그래서 범려는 일찌감치 국외로 탈출했고, 문종은 국내에 남아 있다 자살을 강요당하고 말았다.
월나라도 6대 후에는 초나라 군대의 침략으로 멸망하고 만다. 난세를 살아가는 지식인, 처세술과 인생론 내지 진퇴(進退)의 철학에 관심을 갖는 한중일 삼국인들은 오늘날도 당시 범려의 거취와 지혜를 거듭 음미하거나 성찰의 자료로 삼곤 한다.
범려는 전쟁에서 승리한 후 상장군(上將軍)답게 당당한 위세를 누리게 됐으나 이에 연연하는 속물이 아니었다. 그는 국가의 장래와 자신의 향후 처세에 대해 깊이 숙고했다.
“정상에 오르면 반드시 내리막이 따른다. 올라가면 떨어지고, 흥하면 망한다. 이는 하늘의 법칙이다. 개인으로 말하면, 드높은 명성은 오래도록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할 바가 못 된다. 번성의 영속을 망상하다간 재난에 부닥뜨린다.
게다가 구천이라는 군주를 보아하니, 비록 고생을 같이할 수는 있으나 안락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성격은 아니다. 이래저래 되도록 빨리 떠나는 것이 상책이다.”
올라가면 떨어지고, 흥하면 망한다
월군이 본국으로 개선한 후 범려는 탈출 준비를 마쳤다. 그러고는 30년에 걸친 군신(君臣)관계의 정을 못 잊어 월왕 구천에게 이별의 서신을 남겼다. 요지는 “이제 군왕께서 설욕을 마치고 패권을 장악하셨으니 소신도 미력이나마 신하된 보좌의 책임을 다하려고 애써온 보람을 느끼게 된 시점입니다. 떠나감을 하량해주십시오” 하는 것이었다.
구천왕은 그 서신을 읽고 깜짝 놀라 급히 만류하는 답장을 써서 특사를 보냈으나, 범려는 이미 출발한 뒤여서 도로(徒勞)에 그쳤다. 범려는 몸에 지니기 편한 보석 등만 챙기고 모든 가족과 시종을 인솔하고는 배를 타고 해상으로 사라진 것이다.
범려 일행은 산둥반도를 돌아 발해로 북상했다가 제나라에 상륙했다. 당국의 허가를 받아 해안에 정착한 그는 범려라는 이름을 ‘치이자피(?夷子皮)’라 고쳐 부르며 생업을 농사로 전환했다. ‘치이자피’란 말가죽 자루처럼 자유롭게 여러 모로 쓰일 수 있는 사람이란 뜻이다. 연구와 노동을 결합한 협동적인 다각 영농이 성공하여 범려는 수년 내에 호부로 대성했다고 한다(史記, 貨殖列傳).
소문이 전국에 퍼지자 제나라 조정은 범려를 재상으로 임명했다. 그는 재직기간 중 치적을 많이 쌓았다. 그러나 뒤늦지 않게 다시 사직했다. 오래도록 고위직에서 존명을 누려서 좋을 것이 없다는 성찰의 결과였다. 거의 모든 재산을 여러 사업에 기부하고, 수고를 많이 한 부하들에게 나누어 주고는 사라지듯 정처 없이 떠나간 것이다.
그러나 범려는 도(陶)라는 고을에 이르자, “이곳은 교통의 중심지이고 유통기지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그곳에 멈췄다. 이번엔 상업과 농업을 결합해 역시 수년 내에 천하의 거부로 알려지게 됐다. 후세에 도주공(陶朱公)이란 이름이 부호의 대명사가 된 연유가 여기에 있다.
범려의 인생 행각이 현대에 남기는 경험적 교훈은 무엇인가. 우선 그는 탁월한 정치가이자 군사가였으며 보기 드문 경영자였다. 생각건대 범려는 고대인이기 때문에 비록 현대 교육학의 이념인 ‘전면적 발달’은 아니라 해도 일반 교양에 관심을 갖고 다방면으로 독서하고 사색했던 지성인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그는 또한 “공을 이루면 그 자리에서 물러난다”는 이른바 ‘명철보신(明哲保身)’의 처세 철학을 터득하고 실천한 모범을 보였다. 이 점은 좀더 부연할 필요가 있겠다.
주역의 교훈과 중국 지성인
노자(老子)는 난세를 살아가는 선비의 처신을 이렇게 가르쳤다. “공을 이루면 자리를 떠나야 한다. 그것이 하늘의 도리다”고(功遂身退, 天之道. 老子, 9장). 역사적 과제의 수행, 시대적 요청의 해결, 정권의 당면 수요 충족 등이 일단락되면 더는 욕심내지 말고 뒤늦지 않게 물러서라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한계를 지닌 과도적 존재인 인간답게 자기실현(self-realization)이나 역할기대(role expectation)를 인지할 수 있다면, 그 정도에서 물러나는 편이 슬기롭게 살아남는 길이라는 일깨움으로 해석할 수 있다.
모든 경우에 한계를 헤아리고, 결코 미련을 두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 처세의 담백함은 난세에서 살아남는 요체다. 현대 중국의 사학자 한조기(韓兆琦)에 따르면, 춘추시대의 범려가 바로 그러한 노자 사상으로 무장했다는 것이다.
예부터 중국에서는 권세나 지위에 연연치 않는 은퇴의 용기를 사군자다운 미덕이라고 찬양해왔다. 문제는 은퇴의 시기 선택이다. 범려의 경우 ‘장기 집권은 결과가 좋지 않다(久處尊名不祥)’는 행동강령에 충실했다고 한다(韓兆琦, 史記題評, 越世家, 北京, 2000).
이에 대한 ‘반면교사’의 사례를 문종의 실패에서 찾을 수 있다. 범려는 월나라를 떠나면서 문종에게 비밀서신을 보냈다. “쏘아댈 새가 사라지면 좋은 활이라도 사장되며, 사냥할 토끼가 없어지면 사냥개마저 삶아 먹지요. 게다가 월왕의 관상을 보아하니 목이 길고 새 주둥이 꼴이오. 환란을 같이할 수는 있으나, 안락을 함께할 사람됨은 아니오. 귀하도 시기를 놓치지 말고 떠나심이 어떠하겠소?”
그래도 문종은 망설이며 설마 했다. 그러나 나중엔 그도 신병을 가장하면서 출근하지 않았다. 그러자 간신배가 문종의 모반 가능성을 참언했다. 결국 잔인하고 의심이 많은 구천왕은 문종에게 자살을 강요했다.
이런 문종과 대조적으로 부각되는 범려는 오늘날도 중국인들에게 ‘이상적 인간상’으로 경애받고 있다. 슬기롭고 도량이 활짝 트인 큰 인물이며, 천하를 활보한 자유인이라는 것이다. 어디를 가건 큰돈을 벌고 벼슬을 하며, 재산을 아낌없이 뿌리는가 하면, 관직에서 제때 물러날 줄도 알아 난세를 훌륭하게 살아낸 처세술의 능수라는 것이다.
무릇 은퇴는 그 시기가 중요하다. 앞서 범려가 노자의 은퇴사상으로 무장했다는 사학자의 견해를 소개한 바 있다. 여기서는 그가 은퇴의 성패에 있어 으뜸으로 중시한 시기 측정에 주역(周易)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이라는 점을 첨언하고 싶다. 주역은 춘추시대에 유난히 부각된 제1의 교양서적이었다.
주역은 그 첫머리에서 ‘정상에 오르면 내리막을 바라볼 뿐이니 위험하다(亢龍有悔)’고 가르친다. 마루턱에 이르면 더 욕심내지 말고 내려서는 것이 안전하다고 한다. 범려가 언제나 명심하고 실천한 그대로다.
또한 주역 33괘는 은퇴 문제만 전문적으로 다루면서 일깨워주는 바가 많다. 우선 시기의 선택이 중요하니, 최후의 갈림길에 이르기 전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다고 한다.
다음으로 은퇴 후에는 자기의 종전 주장이나 권위 등을 전혀 내비치지 말아야 한다(신임 집권자의 불만을 사게 되는 까닭이다). 은퇴한 이상 자신의 안락이나 추구하지 실무에는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권위 회복의 유혹에 말려들지 말아야 한다. 거듭 명심할 바는 아쉬움을 남기고 떠나야 한다는 것이다. 범려의 실천은 이 같은 조목들에 어긋남이 없었다.
은퇴의 시기를 헤아린 손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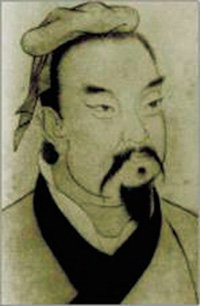
손무는 은퇴 시기를 절묘하게 헤아린 군사가였다. 손무의 초상화.
그는 원래 제나라에서 출생했으나 내란에 말려들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자 오나라로 단신 탈출했다. 오늘날의 저장성(浙江省) 부춘강변에 정착해 농사를 지으면서도 전쟁에 대한 자타(自他)의 관찰과 경험을 집대성하여 불후의 명저 ‘손자병법’을 남겼다.
근처에 초나라 망명객인 오자서(伍子胥)가 살고 있었는데, 친교가 깊었다. 후일 그의 소개로 오왕 합려를 만나 장군으로 임명되어 초나라를 격파하는 전쟁에서 탁월한 군공을 세웠음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그런데 손무는 개선 후 오래지 않아 현직에서 깨끗이 사퇴하고 다시 은거생활로 돌아갔다. ‘자아실현’을 일단락지은 다음에는 뒤늦지 않게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실천에 옮긴 것이다. 이로써 그는 안전할 수 있었고, 정계에 저항감을 남기지 않고 후세에 길이 빛나는 인물이 됐다.
그의 사후 약 100년이 지나 제나라에 남긴 후손 중에서 손빈(孫?)이라는 위대한 군사가가 출현하여 ‘손빈병법’을 썼다. 오늘날도 출신지인 산둥성 혜민현에는 ‘손자 고원(故園)’이 남아 있고, 양측에 손무서원과 손무박물관이 건립되어 관광 명소로 유명하다.
한편 손무가 거주하던 오늘의 저장성 부양시에는 ‘손권고리(孫權故里)’라는 관광지가 보존되어 있다. 삼국지의 영웅 손권의 고향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그 손권이 바로 병법가 손무의 후손이라고 정사(正史) 삼국지는 밝히고 있다.
애당초 권력과 지위에 집착하거나 명성과 평판에 과민하면 비속할뿐더러 위험해진다. 그러한 바깥 치장은 자아실현을 위한 내실화 노력과는 판이하다. 식자들의 빈축을 사다가 만인에게 외면당하게 마련이다. 오늘날 장기집권의 비참한 종장(終章)이라든지, 일부 정치인의 ‘신문과 벌이는 신경전’에서 보는 바와 같다.
손자병법의 특징
손자병법의 저작·성립 연대는 춘추시대 후기라고 알려져 있으니 지금부터 약 2500년 전이다. 저간에 세월의 유수에 따라 많은 것이 변천했다. 특히 인류가 인류를 대량 살상하는 군사전쟁과 막다른 생존경쟁의 승패에서 그러했다. 본시 무기가 달라지면 투쟁기법도 변화하고, 전쟁의 형태도 상이해지게 마련이다.
그럼에도 아득한 옛날인 기원전 770년∼기원전 403년이라는 시대적 제약성을 면치 못했을 ‘전쟁의 예술(The Art of War)’에 관한 저작이 21세기의 오늘날까지 중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거듭 숙독되는 까닭은 무엇일까.
현대의 통설은 명백하다. 손자병법은 결코 단순한 전쟁기술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 우승열패(優勝劣敗)라는 자연현상의 유추에 기초해 사회현상을 간단히 해명하려는 시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일까.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기본적으로 다를 바 없는 ‘인간성’의 본질적 양상에 대한 예리한 통찰에 입각하여 경쟁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행동의 원리를 찾아보려는 개연적 법칙성의 탐구 노력이다. 이 경우 온갖 사물과 현상은 결코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는 ‘만물유전(萬物流轉)’의 철학적 사유가 뚜렷하다.
스스로 변화하고 발전하며 운동할 뿐만 아니라 상대적인 관계에서 위상이 바뀌고 상호 전환하는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쟁과 대결과 경쟁에는 언제나 허다한 모순이 존재하며, 대(大)와 소(小), 강(强)과 약(弱), 실(實)과 허(虛), 공(攻)과 수(守), 정(正)과 기(奇) 등 모순이 상호 전환될 수 있다. 형세가 불리하더라도 전화위복을 위해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두뇌를 유연하게 움직여야 하는 것이다.
전쟁은 희생이 크므로 피해야 한다. 하물며 바보천치나 떠벌이처럼 패배할 게 뻔한 싸움을 시작해선 안 된다. 그런데 승패는 체력이 아니라 지혜로 가름된다. 그리고 전쟁의 지혜란, 평시와 달라서 ‘비정상적 수법의 적용’ 즉 궤도(詭道)에 좌우된다. ‘비정상적 수법’이란 단순한 ‘속임수’에 그치지 않는다. 그 이상으로 손자가 중시한 것은 현대 심리학과 행동과학에서 자주 거론하는 ‘동기부여’ 또는 ‘유인 조성(Motivation)’이다. 이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아군측이 의도하는 행동을 취하게 만드는 ‘밖으로부터의 자극’ 즉 유인(誘因)의 제공이다. 바꿔 말하면, 상대방이 이쪽에서 바라는 특정한 행동을 보이게 하는 심리적 조건을 형성하는 것이다.
예컨대 이쪽의 약점을 부풀려 보여줌으로써 상대방이 다른 함정의 가능성을 고려치 않고 서둘러 덤벼들게 하는 포석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손자는 슬기로운 작전이나 기획은 절대로 어느 한쪽으로 쏠리거나 빠져들지 말아야 하며, 언제나 이해와 명암의 쌍방 가능성을 고루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가르쳤다.
하기야 그러한 경우의 오판도 군왕의 성격 나름이어서 쉬 고치지 못한다. 따라서 만전을 기하려면 창의성에 신중함까지 지닌 참모진을 붙여둘 필요가 있다. 그래도 측근의 조언을 듣지 않으면 ‘갈 데까지 가는 것’이니, 참모나 고문도 큰 의리가 없다면 제때에 퇴장할 수밖에 없다. 요컨대 손무의 전쟁 연구는 인성(人性) 탐구와 결부됐다고 할 수 있다.
‘피전(避戰)’ 아닌 ‘신전(愼戰)’
춘추시대의 손자병법이 전국시대에 더욱 폭넓고 깊이 있게 보급되면서 오늘에 이르는 동안 영향이 컸던 몇 가지 대목을 간추려 본다.
손자병법은 우선 평화를 옹호하고 전쟁을 삼가는 ‘신전(愼戰)’을 기조로 삼는다. 그러나 결코 평화를 구걸하며 비겁도 마다하지 않는 이른바 ‘피전(避戰)’ 사상으로 흐르지 않는다. 전쟁은 막는 것이지 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부 정치인들은 언필칭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전쟁은 피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런 자세는 전쟁의 위협 상황에서는 노예적 굴복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비겁한 심리의 표현에 불과하다. 호전(好轉) 세력 앞에서 중립을 표방하면 동맹의 파괴와 상대방의 멸시를 초래하므로 전쟁을 예방하긴커녕 도리어 그것을 부채질하게 된다.
그러면 평화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우선 억지력을 갖춰야 한다. 손자의 설명을 인용한다면, ‘상대방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방심하는 대신, 우리의 억지력 준비를 자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無恃其不來, 恃吾有以得也)’는 것이다(九?篇).
다음으로 상대방의 언동에 대해 감정적 대응을 일삼아선 안 되며, 불필요한 자극을 줘서도 안 된다. 손자의 현명한 표현을 인용하면, ‘집권자는 냉정해야 하며, 분노로 개전하지 말아야 한다. 또 장군은 이해득실을 따져야지 감정으로 싸워서는 안 된다(主不可以怒興師, 將不可以툘而致戰…火攻篇).’
셋째로 냉정하고 침착하면, 대치 중이라도 여유 있게 교류와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그래야 희생 없이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손자가 갈파한 바 ‘싸우지 않고 적군을 굴복시킨다(不戰而屈人之兵…謀攻篇)’는 것이다. 곧 실력을 배경으로 하되, 경솔하게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는 평화적인 문제 해결이다.
세계사에 특기할 모범적 사례가 동서냉전을 종식시킨 서방측의 ‘평화적 이행’ 전략에서 발견된다. 20세기 중엽 이후 공산주의의 팽창 위협에 따른 동서냉전에 서방측은 소리 없는 군비경쟁과 부분적인 국지전쟁으로 대응했다. 한편 교류와 협상, 원조와 홍보의 방법으로 20세기 말엽에는 소련 붕괴와 동유럽 변혁에 작용함으로써 평화적 문제해결에 성공했던 것이다.
전쟁 승패를 가름하는 ‘오사칠계’
손자는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기본 요인으로 먼저 오사(五事), 즉 승리의 5가지 결정적 조건을 들었다. ①도(道)란 국론통일과 국민단결이 가능한 정치를 말한다. ②천(天)이란 때를 만나고 기상조건이 좋아야 한다는 것 ③지(地)란 지리적 조건 ④장(將)이란 지력을 비롯한 신의·인자·용기·엄격 등 지휘관의 자질 ⑤법(法)이란 기강이다.
나아가 칠계(七計), 즉 7가지 비교사항을 놓고 거듭 피아간의 실정을 검토하라고 했다. ①집권자의 민심 장악 ②장군의 능력 ③천시와 지리에 걸친 쌍방의 이해 ④명령에 대한 준봉의 정도 ⑤병력의 수량 ⑥병사의 훈련 ⑦상벌의 공정성이다(計篇).
다만 오늘날에 와서는 문명의 변천에 따라, 전쟁이란 종합 국력의 대결이라는 관점이 우세하다. 특히 경제력, 과학기술력, 국제관계와 외교력, 조직과 사상에 걸친 동원력 등이 중시된다. 손자의 고전적 계시와 함께 냉철하게 비교·검토해야 한다.
장군의 선용과 수양
유사시에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좌우할 장군의 위상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손자는 장군의 자격 요건으로 5가지를 들었다. ①지혜(智) ②신의(信) ③인자(仁) ④용기(勇) ⑤엄격(嚴)이라는 자질 조건을 강조한 것이다. 특히 지혜를 첫째로 꼽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計篇).
옛날의 무지·무능한 왕조라면 우선 ‘체력이 강하고 무예에 능하니 장군감이다’고 했는데, 이는 유치원 수준의 발상에 불과하다. 현대에 와서는 이른바 ‘혁명적 기개’가 크니 등용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자칫하면 모험성의 찬미로 이어지고, 종국엔 패망으로 연결될 것이다.
그리고 어떤 집권자는 ‘개혁 성향이 같으니 등용한다’는데, 이 경우는 파벌정치에 대한 집착이기 때문에 결국 고립 속의 실패를 자초하게 될 것이다.
손자는 장군의 으뜸 과업으로 ‘적정 파악과 군대 장악이 훌륭하면 백전백승한다’는 유명한 갈파를 남겼다(知彼知己, 百戰不殆…謀攻篇). 적정(敵情) 파악의 중요성에 관해서는, ‘적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장군은 무자격의 극치’라고 지적했다(用間篇). 또 군대의 장악에 관해서는 사상적 일치와 사병을 돌보는 사랑의 정신에 바탕을 둔 군기 확립을 들었다(行軍篇).
그런데 정세란 고정불변하지 않으며 사물과 현상은 유동적인 명암 양면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장군의 슬기로운 정세 판단은 반드시 이해 쌍방을 고루 감안해야 한다(智者之慮 必雜於利害)’고 손자는 가르친다(行軍篇). 게다가 적장과 그 참모진도 가만있지 않는다. 예외 없이 아군의 허약한 점을 탐색하며, 특히 장군의 인간적 약점을 이용하여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다.
일찍이 손자는 ‘군사는 비정상적 방법의 운용’이라 갈파했다(兵者詭道也…計篇). 그 비정상적 방법에는 폭력과 속임수가 포함되며, 동기부여라는 심리학적 수법이 포함된다. 동기부여란 어떤 생활체의 성격이나 체험을 감안하여 그에게 외부로부터 특정한 자극을 주어, 그 대상으로 하여금 우리측이 바라는 행동을 취하게 하는 심리적 조작을 말한다. 물론 손자는 2500년 전 사람이기에 이러한 심리학 소양이 없었다.
그러나 천재적인 군사학자였으므로 탁월한 통찰력으로 그러한 심리학적 현상까지 슬기롭게 고찰할 수 있었다.
손자는 장군들에게 ‘5가지의 위험한 심리적 함정’, 즉 오위(五危)가 있다고 지적한다.
①필사(必死)의 결의는 군인다운 용기이기는 하지만, 한편 장래를 길게 내다보지 못하는 용기의 성급한 표출은 무익한 전사를 재촉하는 꼴이다.
②꼭 살아남으려는 인내심은 역시 지휘진에 요청되는 자질이지만, 한편 생환에 집착하면 비겁자의 우유부단에 흐른다. 우물쭈물하다 포로로 잡히기 쉽다.
③분노에 일어서고 결단이 빠른 것은 군인다운 자질이지만, 한편 장군마저 성급하다면 급기야 적의 모욕적 도발에 직면하여 앞뒤를 계산 못하고 진격하다 함정에 빠진다.
④인격이 결백하고 염치가 고상하다보면 평소엔 우러러보이지만, 전시에는 적의 치욕적 매도에 당면할 때 명예를 지킨다고 격분하다 모략에 걸려들거나 섬멸당하기 쉽다.
⑤백성을 사랑하고 부하를 아끼는 인자한 마음은 윗사람다워 존경받는 인격이지만, 한편 전시에도 사랑에 지나치게 구애하면 승리 없이 지치고 쇠약해져 적의 번거로운 작란에 말려들기 쉽다.
이러한 장군의 위험한 성격적 결함은 평시라면 ‘성격상 모순’에 해당한다. 한자로는 오위(五危)가 필사(必死), 필생(必生), 분속(忿速), 결렴(潔廉), 애민(愛民)으로 표기된다.
무릇 인간을 판단할 때에는 긍정적인 면만 보고 장래의 유용성을 속단할 것이 아니다. 명암 양면을 살필 줄 알아야 한다. 손자병법의 여타 전략·전술 분야는 차후의 각론으로 미룬다.
춘추시대는 낡아빠진 가문과 대의명분에 대한 숭상을 퇴색케 했다. 그 대신 실력 본위의 패권 경쟁, 나아가 민족적 대융합·대교류를 가져왔다. 그 연장선 위에 ‘전국시대’가 도래한다. 난세의 진일보한 ‘자아발견’ 노력이 전개되는 것이다.























![[지상중계] 제12회 나지포럼, “북미 정상회담 성과내기 어려워”](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43/48/32/69434832107aa0a0a0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