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우내 꽃 소식을 지켜보던 아파트 앞마당의 매화와 산수유가 환한 꽃망울을 터뜨렸을 때 도리어 참을 수 없는 무상(無常)을 느끼는 것은 그래서일까. 그러나 무상하다는 말은 한순간 한순간이 복음(福音)이라는 말과 같다.
봄날은 가지만 순환의 짧은 틈새마다 꽃이 핀다. 야산 산록에서 알싸한 생강냄새가 나는 생강나무와, 향기가 너무 좋아 길손의 발길을 멈추게 하는 길마가지꽃이 서둘러 봄소식을 알리더니, 뒤이어 매화와 산수유가 꽃을 피우고 보춘화, 개불알꽃, 머위꽃, 현호색, 산자고의 꽃이 피었다. 산과 들에 노루귀, 얼레지, 바람꽃, 진달래, 벚꽃이 피고 도로변 여기저기 개나리꽃, 목련꽃, 애기사과꽃, 농촌 마을에선 장미과의 유실수들, 모과꽃, 명자꽃, 사과꽃, 앵두꽃, 복숭아꽃, 살구꽃, 배꽃이 축제라도 벌이듯 만개한다. 그렇게 꽃이 피면서 단 한순간도 그 생멸의 흐름을 붙잡을 수 없는, 아쉬운 봄날은 한들거리는 봄바람처럼 스쳐 지나간다.
봄에 피는 산과 들의 조그만 꽃들 중에도 약으로 쓰이는 게 여럿 있다. 노루귀, 현호색, 산자고 등이 그것이다. 따져보면 약 아닌 것이 없지만 그중에서 좀 추려보자면 그렇다. 이른 봄, 산록의 잔설이 녹으면 앙증맞고 소담한 꽃이 잎보다 먼저 고개를 내미는 노루귀는 잎의 생김새가 귀여운 노루의 귀를 닮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흰색, 분홍색, 청색 등 여러 색으로 꽃이 핀다. 따사로운 봄기운이 느껴지기엔 아직 이른 시기에 산비탈 그늘진 곳이나 계곡 부근에 무리지어 피는 노루귀의 꽃은 흡사 봄을 맞는 여신처럼 보인다. 우리나라 전역에 흔하지만 꽃피는 기간이 짧아 아차하면 못 보고 지나간다.
두통, 폐결핵 효용 노루귀

노루귀
한의원의 한약재로 쓰이지는 않으나 민간에서 단방(單方)약으로 써왔다. 6~7월경 전초를 채취해 두통 등에 진통제로 쓰거나 폐결핵, 오줌소태(임질), 설사 등에 쓰기도 하고 상처가 곪아서 잘 낫지 않는 화농성 피부질환에 전초를 달여서 세척제로 쓴다. 미나리아재빗과 식물이 대부분 그렇듯 뿌리에 독성이 있으므로 생식은 금한다.
산과 들판, 밭 주변을 걷다보면 흔히 볼 수 있는 봄꽃 중 하나가 현호색이다. 약간 눅눅하고 습한 곳을 좋아한다. 가녀린 줄기에 보라색 혹은 분홍색의 꽃이 5~10개씩 총상꽃차례로 피는데, 3월 말이나 4월 초쯤이면 밭두렁 옆 시골길이나 천변의 둔덕에서도 봄바람에 하늘거리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꽃 생김새가 종달새 머리 깃을 닮았다 해 희랍어 속명이 종달새를 뜻하는 ‘콜리달리스’다. 보라색의 꽃과 섬세하게 여러 갈래가 진 잎의 생김새가 사랑스러워 몇 무더기 캐다가 집 마당이나 화분에 심고 싶어진다.
온 산천에 흔하게 나는 이 현호색의 우리말 이름이 없다는 게 좀 의아스러운데, 워낙 한약재로 유명한 탓에 한약 명칭이 그대로 굳어져버리지 않았나 싶다. 조심스럽게 주변의 흙을 파보면 여린 꽃줄기 밑에 의외로 큼직한 알뿌리가 묻혀 있다. 잔 것은 콩알만하지만 큰 것은 조그만 감자알만하다. 이 덩이줄기가 한방에선 현호색(玄胡索), 또는 연호색(延胡索)으로 불리며 모르핀을 능가하는 진통제로 쓰인다. 신경통과 관절통, 생리통, 협심통 등에 뛰어난 지통(止痛)효과를 낸다. 혈액의 순환을 돕고 굳은 피를 없애므로 타박으로 붓고 어혈이 심할 때 없어서는 안 되는 귀중한 약재다.
앵속(양귀비)과에 속하는 현호색은 전통적으로 활혈거어약(活血祛瘀藥·혈액의 순환을 촉진하고 어혈을 제거하는 약)으로 분류된다. 대개 5~6월경 덩이줄기를 채취해 외피를 제거한 후 물에 넣고 끓여 내부의 색이 황색이 될 때까지 삶아서 말려 쓴다. 성질이 따뜻하고 맛이 매우며 독은 없다. 그러나 어혈약이므로 임신부나 출혈질환이 있는 환자에겐 신중하게 써야 하는 약이다.
현호색, 모르핀 능가한 진통효과

현호색
본초강목에서는 “능히 혈중기체(血中氣滯)와 기중혈체(氣中血滯)를 풀어서 일신의 상하 모든 통증을 다스리는데, 그 쓰임이 적중하면 신묘한 효과를 이루 다 말할 수 없다”고 했다. 그 사례가 몇 가지 있다.
“형목왕의 비(妃) 호씨가 메밀로 만든 면을 즐겼는데 자주 화를 냈다. 그러다 위에 병이 들었는데 가슴앓이가 심해 통증을 참아낼 수 없을 지경이 됐다. 의원들이 약을 썼지만 목구멍으로 약이 넘어가기 전에 모두 토하니 효과가 없었다. 덩달아 대변도 수일씩을 못 보았다. ‘뇌공포자론(雷公?煮論)’에 심통으로 곧 죽을 듯하면 급히 현호색을 써야 한다는 말이 있었다. 그래서 이 현호색을 가루 내 따뜻한 술에 타 먹게 했더니 비로소 토하지 않았는데, 약이 들어가자 곧 변을 보고 통증이 사라졌다.”
“나이 50쯤 되는 이가 설사와 복통으로 곧 죽게 돼 관까지 맞춰놓았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 현호색 3전을 가루 내 미음으로 먹였다. 극심한 복통이 가라앉더니 일도에 통증의 10 중 5가 잡혔다. 이후 조리를 잘해 회복됐다.”
“한 사람이 병이 들었는데 몸의 반쪽만 통증이 극심했다. 내로라하는 의원들이 혹은 중풍이라 하고, 혹은 중습이라 하고, 혹은 각기라 해 약을 썼으나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의원 하나가 이는 기혈(氣血)이 응체(凝滯)된 탓이라 진단하고 현호색과 당귀 계피를 등분해 가루 내 따뜻한 술로 먹였더니 차도가 보였다. 얼마 뒤 병이 나았다.”
4월 초쯤 들판에 나가 이 현호색을 캤다. 마침 지나가던 남녀 한 쌍이 지켜보더니 궁금증을 못 참고 그게 뭐냐고 물어온다. 대충 이야기를 듣고는 그들도 좀 떨어져서 쭈그려 앉아 캐기 시작했다. 산과 들에서 뭘 캐거나 뜯거나 하는 일은 전염성이 강하다. 수십만 년을 지속했던 채집경제 시대의 유전자가 남아 있어서일 것이다.
현대의 약리적 연구에 의하면 현호색에는 15종의 알카로이드가 함유되어 있다고 한다. 내복하게 되면 이 알카로이드들이 모르핀이나 코데인과 비슷한 효과를 내어 강력한 진통작용을 한다. 식초를 넣고 초(炒)하여 쓰면 알카로이드 용해도가 크게 높아진다. 전통적으로도 지통효과를 높이기 위해 현호색을 초초(醋炒·식초에 담그고 불에 볶음)해 써왔다.
현호색은 진통효과가 뛰어나지만 지속성이 있으면서도 독성이 없다. 급성통증에 많은 양을 써도 효과가 뛰어나면서 부작용이 크게 없고, 만성통증의 경우 오래 써도 그 효과가 일정하게 지속된다. 어혈로 인한 통증뿐 아니라 염증성 통증에도 쓰인다.
위궤양으로 출혈이 생겨 통증이 격심하고 대변색이 흑색이 될 때 현호색을 20g 정도 쓰면서 다른 어혈약을 배합하면 효과가 좋다. 현호색은 또 협심통을 멎게 하므로 단삼이나 도인 등을 배합해 쓰면 심근의 일과성 허혈증상이나 산소결핍증상을 개선하고 흉부의 발작성 통증과 압박감을 완화할 수 있다. 류머티스 관절염이나 좌골신경통, 요추신경통, 삼차신경통 등 각종 신경통, 생리통이나 여성의 골반 내 만성 염증질환, 자궁염 등에도 효과가 크다. 꽃이나 잎사귀의 생김새가 현호색과 비슷한 산괴불주머니가 있는데, 덩이줄기가 없고 꽃도 노란색으로 핀다. 현호색이 지고난 뒤에 꽃이 피기 때문에 구별이 쉬 된다.
항염, 해독 산자고(山茨菰), 천연 항암제 산자고(山慈姑)

산자고
부추잎을 닮은 가늘고 길쭉한 잎들 사이로 줄기 한 대가 올라와 별 모양의 소박한 흰 꽃을 피운다. 꽃잎 바깥쪽에 진한 자주색 줄무늬가 나 있는 게 인상적이다. 학명은 툴리파 에둘리스(Tulipa edulis)다. 에둘리스는 ‘먹을 수 있는’이라는 뜻이다. 실제로 비늘줄기는 장아찌의 재료로 쓰이기도 하는데, 독성이 조금 있어서 물에 우려 삶거나 구워 식용한다. 민간에서는 종기나 옹종(癰腫·독으로 생긴 종창)을 치료하거나 뱀, 독충의 독을 제거하는 약재로 썼다.
그런데 이 산자고가 천연 항암제라는 난데없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와서 좀 살펴봤다. 터무니없기도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는, 이것은 이름이 같은 탓에 빚어진 오해 같다. 아니면 의도적인 오해이거나. 본초서에서 청열해독약으로 분류하는 산자고(山慈姑)는 이 산자고가 아니기 때문이다.
본초서에 등재된 산자고는 백합과의 이 산자고가 아닌, 난(蘭)과의 식물이다. 향약(鄕藥)명은 약난초인데 두견란(杜鵑蘭)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남부지방(전북 내장산 이남)의 계곡 주변 숲이나 해안가에서 자란다. 중국은 쓰촨성 등 남방이 주산지다. 5~6월에 연한 자줏빛 꽃이 핀다. 둥근 알뿌리를 약재로 쓰는데 해독, 부은 종기나 상처를 치료하는 소종(消腫), 맺힌 것을 푸는 산결(散結)의 효능이 뛰어나다. 최근에 항암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천연물 항암제로 분류되고 있다. 유선암, 비강암, 식도암, 폐암 등에 쓰이며 피부암이나 자궁암에는 외용한다.
이 산자고는 흔히 편도선염이나 후두염 등 인후질환과 경부임파결핵에 치료제로 쓰인다. 종기가 나 붓고 열이 날 때 내복하거나, 연고를 만들어 쓰기도 한다. 100가지 독을 풀고 각종 악창과 종기에 뛰어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자금정(紫金錠)이란 전설적인 한약에도 이 산자고가 들어간다.
백합과의 산자고(까치무릇)는 난과의 산자고(약난초)와는 전혀 다른 식물이다. 그런데도 까치무릇 산자고에 약난초 산자고의 약성이 천지분간 못하고 뒤섞인 데에는, 미안하지만 우리나라 동의보감의 잘못이 큰 듯하다. 이 두 식물을 구분하지 못하고 난과의 산자고를 까치무릇으로 알고, 약난초의 약성을 옮겨 쓰는가 하면, 약초의 형태도 약난초와 까치무릇의 두 가지를 모두 기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발단은 중국의 본초서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이는데, 동의보감이 인용한 중국의 고전 본초서들이 산자고라는 이름으로 이 두 식물을 다 기술하고 있다. 이런 오류 탓에 오해도 아주 ‘당당하게’ 한다. 까치무릇 산자고가 경부임파결핵에 효과가 있고 항암효과도 있는 약초라는 것이다.
까치무릇의 약효를 굳이 따진다면 같은 백합과인 무릇의 그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다. 한약명이 야자고(野茨菰)인 무릇은 ‘석림(신장결석)을 고치고 종기를 삭이며 소갈을 가라앉힌다’(동의보감)고 되어 있다. 까치무릇과 달리 무릇은 비늘줄기의 크기가 주먹만하다. 양파와 비슷하게 생겼다. 흉년에 그 뿌리를 캐어 삶아 먹기도 한다. 필자도 어렸을 때 이 무릇을 먹어본 적이 여러 번 있다. 본초서엔 무독(無毒)하다고 되어있지만, 경험상 독성이 조금 있어서 물에 담가 우려낸 다음에 삶는다. 어쨌든 이 두 산자고가 혼란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봄날이 가기 전 올봄엔 산에 몇 차례 올라 진달래꽃을 따먹었다. 진달래의 분홍색처럼 사람들의 마음 빛이 훤해질 수 있다면. 섬진강의 시인 김용택의 진달래라는 시 한 구절이 느닷없이 생각났다. “연분홍 살빛으로 뒤척이는 저 산골짜기 어지러워라, 환장허것네.”
|
생강나무꽃, 길마가지꽃, 매화꽃, 산수유꽃, 보춘화 향기도 애써 맡았다. 알싸하고 청신하고 은은하고 보드랍다. 아쉬운 봄날이 지나가기 전에 현호색과 산자고의 뿌리도 캤다. 그래도 아쉬운 그 봄날은 한들거리는 바람처럼 어깻죽지 사이로 스쳐 지나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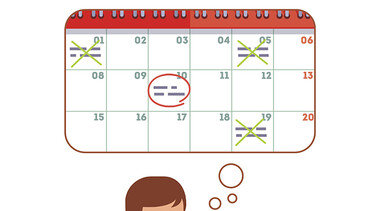


![[지상중계] 제12회 나지포럼, “북미 정상회담 성과내기 어려워”](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43/48/32/69434832107aa0a0a0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