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귀달은 세조 때 과거에 급제해 관직에 나온 이래 성종 때에는 대사성, 대제학, 이조 판서, 호조 판서 등을 거쳤다. 그는 문장 실력이 뛰어났고 중신(重臣)으로 명망이 높았다. 그러나 귀에 거슬리는 말을 듣기 싫어하던 연산군에게 할 말은 하는 강직한 신하 홍귀달은 늘 거북한 존재였다. 연산군 10년(1504) 2월 21일, 세자빈을 간택한다는 명이 내렸는데, 홍귀달의 손녀가 여기에 포함되었다. 20일 뒤에 경기 관찰사 홍귀달은 이 문제를 가지고 아뢰었다.
홍귀달
신의 손녀는 참봉 홍언국(洪彦國)의 딸로 신의 집에서 성장하였습니다. 그 아이가 처녀이므로 대궐에 나가야 하는데, 마침 병이 있어 신이 언국을 시켜 사유를 갖추어 고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담당 관사에서는 대궐에 나오기를 꺼리는 것이라 하여 언국을 국문하게 하였습니다. 정말 병이 없다면 신이 어찌 감히 대궐에 보내는 것을 꺼리겠습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라고 명하셔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언국의 딸이기는 하지만 신이 실질적인 가장이므로 처벌을 받겠습니다.
연산군
홍언국을 국문하면 진상을 알게 될 것이다. 아비가 자식을 위하여 해명하고 아들이 아비를 위하여 해명하는 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니, 홍귀달도 국문하라.
<연산군일기 10년 3월 11일>
홍귀달이 아뢴 말 가운데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지금 바로 들어오라고 명하셔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한 부분이었다. 병이 심해 지금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한 말을 연산군은 임금을 능멸한 것으로 듣고 묵과할 수 없다고 여겼다. 분노가 폭발한 연산군은 홍귀달을 처벌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이렇게 공손치 못한 말을 그대로 보고한 승지들까지 국문하게 하였다. 그러고도 성에 차지 않았는지 심문이 느리다고 의금부 당상을 심하게 독촉하였다.
더 풍부한 회원 전용 기사와 기능을 만나보세요.
<연산군일기 10년 6월 16일>
![20세기 초 태형을 집행하는 장면. [국립민속박물관]](https://dimg.donga.com/ugc/CDB/SHINDONGA/Article/5a/66/9e/ba/5a669eba0ed5d2738de6.jpg)
20세기 초 태형을 집행하는 장면. [국립민속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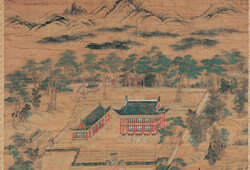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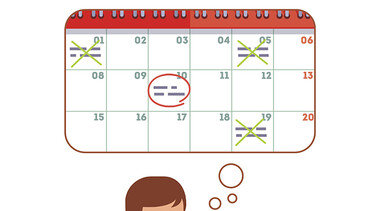


![[지상중계] 제12회 나지포럼, “북미 정상회담 성과내기 어려워”](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43/48/32/69434832107aa0a0a0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