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ttyimage]](https://dimg.donga.com/a/700/0/90/5/ugc/CDB/SHINDONGA/Article/66/de/4e/76/66de4e7623b3d2738276.jpg)
[Gettyimage]
내가 TV 갖고 방으로 들어가겠다고 하자 아내와 아이들이 그렇게 말했다. ‘흐이생’은 우리 가족이 누군가를 위해 자기 것을 포기하거나 양보할 때 자주 쓰는 말이다. 그냥 “희생”이라고 말하면 어딘가 너무 거룩(?)한 것 같아서 장난치듯 그렇게 말하곤 한다. 둘째 아이가 어릴 때 방 두 개짜리 아파트로 이사했는데, 첫째에게 방 하나를 내주고 우리 부부가 방 하나를 차지하자 둘째가 거실을 자기 방으로 여기며 지낸 적이 있다. 그때 둘째에게 미안해 ‘희생’을 장난치듯 발음한 ‘흐이생’이 우리 가족이 다 같이 쓰는 말이 됐다. 둘째는 다른 곳으로 이사하게 될 때면 좁아도 방 세 개짜리 집을 고집하며 그때의 ‘흐이생’을 농담처럼 섞어 말하곤 했다. 내 방 또 거실 되면 안 된다면서.
내 ‘흐이생’이 가족의 ‘흐이망’으로
이번엔 내가 그 ‘흐이생’의 대상이 됐다. 첫째가 중학생이 되던 해, 온전히 내 차지로 사무실(?)처럼 쓰던 거실이 아이들 차지가 된 것. 나는 TV와 함께 방으로 유배를 갔다. 좁은 방으로 내 책상이 옮겨졌고 그 책상 위에 내 일을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TV가 얹어졌다. 가뜩이나 평수도 작은 아파트를 방 세 개로 쪼개놓은 집이었다. 좁은 안방에 침대 놓고 책상까지 들이자 발 디딜 틈이 없어졌다. 나는 그 유배지에서 첫째와 둘째가 모두 고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10년 넘게 복역(?)해야 한다는 선고를 받았다. 내 작업 공간이자 오피스였으며 때론 안방극장이었던 거실은 온전히 아이들의 작업 공간으로 바뀌었다. TV가 있던 자리에는 책장이 놓였고, 그 앞에 길쭉한 책상과 의자들이 배치됐다. 또 인강(인터넷 강의)을 들을 수 있는 컴퓨터 책상도 따로 창가에 세워졌다.
거실 한쪽 벽면에 붙여놓았던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의 ‘아웃사이더’(1983) 포스터도 떼이고 대신 그 자리에는 세계지도가 붙었다. 토머스 하월, 로브 로우, 맷 딜런, 패트릭 스웨이지, 다이앤 레인, 에밀리오 에스테베즈, 랠프 마치오, 톰 크루즈가 함께한 그 영화 포스터는 내가 고등학교 때 한 외국영화 잡지 사은품으로 받은 소중한 유산이다. 출연 배우들 가운데 나는 랠프 마치오를 특히 좋아했다. ‘베스트 키드’라는 가라테를 소재로 하는 영화에서 클라이맥스에 ‘학다리 권법’ 장면은 지금도 기억날 정도로 인상적이었다. 이미 ‘대부’(1972) 시리즈로 세계적 거장이 된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의 성공작이지만 여기 출연한 청춘배우들은 사실 거의 신인이었다. 그들 모두 훗날 세계적 스타가 됐기에 그 영화 포스터를 보는 내 마음 역시 남달랐던 것 같다. ‘지금은 변방, 아니 골방에서 글을 쓰지만 언젠가는 저들처럼 세상 밖으로 나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하지만 안방으로 유배된 그때, 벽에 걸려 있던 그 포스터가 고이 접혀 어딘가에 보관되고, 그렇게 몇 번 이사를 거듭하면서 나의 랠프 마치오도 기억에서 사라져버렸다. 그렇게 어언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다행히 아이들은 무난히 대학에 들어갔다. 하지만 유배지 생활이 익숙해진 나는 거실로 나올 생각을 아예 하지 않았다. ‘쇼생크 탈출’에서 감옥 생활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 출소 후 일을 할 때도 점장에게 허락을 받아야 화장실에 갈 수 있게 된 모건 프리먼 같았다… 고 하면 과장이겠지만. 어쨌든 그즈음 나는 방이 더 익숙했다. 그건 거실이 익숙해진 아이들도 마찬가지였다. 대학 입시가 끝났지만 거실은 여전히 아이들 차지였다. 그들의 작업 공간이었고 도서관이었으며 놀이터였다. 그런데 입시가 끝나자 아이들은 이제 내 유배지로도 자주 찾아들었다. 넷플릭스 때문이었다.
‘흐이생’ 끝에 만난 ‘흐이망’의 감동
어느 날 그 좁은 유배지에 이제 다 커서 방을 꽉 채우는 아이들과 아내까지 같이 앉아 이재규 감독이 연출한 시리즈 드라마 ‘지금 우리 학교는(2022)’을 봤다. 좀비가 창궐해 학교에 고립된 아이들이 희망 반, 절망 반으로 대화를 나누는 대목이 인상적이었다.
“어떤 나라는 아이들보다 어른이 죽는 걸 더 슬퍼한대. 어디는 아이들이 죽는 걸 더 슬퍼하고. 우리나라는 어떤 거 같아?”
“뭔 말이야?”
“애들이 죽는 건 희망이 사라지는 거고 어른들이 죽는 건 노하우가 사라지는 거잖아. 희망과 노하우.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냐는 거지. 응?”
“어제부터 (헬기가) 엄청 날아다녔어. 구할 생각 있었으면 벌써 했겠지. 근데 구하러 온다고 해도 우리가 첫 번째는 아닐 거야.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은 아니잖아. 그냥 학생이잖아.”
좀비들로 가득한 학교로부터 탈출하는 이야기여서 그랬던 걸까. 좀비들 때문에 학교 교실에 갇혀버린 아이들이 창밖으로 날아다니는 헬기를 보며 과연 어른과 아이 중 누굴 더 먼저 구할까를 말하는 장면을 보며 난 아내와 아이들에게 말했다. “이제 아빠 거실로 나가도 되지 않을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듯 아내와 아이들은 멍한 얼굴로 나를 봤다. 그러더니 둘째가 말했다. “이제 나와도 돼. 내가 방으로 들어가지 뭐.” 그러자 첫째가 감탄하는 척 덧붙였다. “오~ 흐이생.”
둘째는 방으로 들어가는 대신 대학 기숙사로 들어갔다. 이후 주말마다 집에 들러 빨래한 옷가지며 필요한 물품을 가져가곤 했다. 거실에서 둘째의 자취는 점점 사라졌다. 첫째도 대학 생활에 바쁘다 보니 집보다 바깥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남자친구가 생기니 더더욱 그랬다. 마침 아내도 오랜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던 참이었다. 프리랜서로만 살아온 나를 대신해, 가족이 좀 더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고맙게도 직장 생활을 줄곧 선택해 온 아내였다. 그 일이 너무 소모적으로 여겨지던 아내는 그걸 이겨내기 위해 주말이면 동화를 쓰곤 했다. 동화작가의 꿈을 쥐고 삶이 생계에 먹혀버리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써온 거였다. 그러고 보면 내가 안방에서 그걸 유배 생활이랍시고 투덜대던 시간 내내, 아내는 진짜 직장이라는 쳇바퀴에 갇혀 살았던 거다.
“이제 그만둬. 직장 생활 틈틈이 했던 동화작가로 이제 펄펄 날아봐. 해리 포터 같은 것도 좀 써보고.”
아이는 희망, 어른은 노하우
일부러 세속적 농담을 더해 아내에게 말했다. 나 역시 ‘탈출 계획’을 하나하나 실행했다. 미리 그려놓은 거실 가구 배치도를 바탕으로, 거실을 채우고 있던 아이들 책상이며 의자, 컴퓨터 등을 각자 아이들 방으로 옮겼다. 방 안에 있던 TV를 거실 중간에 세워놓고, 맞은편에 넉넉하게 등을 받쳐줄 소파를 하나 사서 배치했다. 창을 등지고 책상을 놓고 거기 나와 아내의 작업 공간을 만들었다. ‘아웃사이더’ 대신 붙였던 세계전도를 떼고, 그 자리에 아내가 좋아하는 모네의 그림을 붙였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우리는 정리된 거실을 둘러봤다. 10여 년의 시간이 어느새 후루룩 지난 것만 같은 기분이었다.
‘지금 우리 학교는’에서 아이들은 희망이고 어른들은 노하우라고 한 말이 문득 떠올랐다. 맞는 말이지. 하지만 어른들에게도 희망이 필요한 법. 이런 말도 있거든. “희망은 좋은 거예요. 아마 가장 좋은 것일 거예요. 그리고 좋은 건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쇼생크 탈출’의 앤디(팀 로빈스)가 레드(모건 프리먼)에게 해준 말이다.
어른들이여. 그간 꽤 오래도록 아이들을 위해 ‘흐이생’을 자처하는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보기를. 너무 오래 그렇게 살아 그 ‘흐이생’하는 삶이 더 편하고 익숙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그 바깥에 있는 새로운 무엇을 찾아보도록. 흐이생보다 절실한 ‘흐이망’ 말이다.

● 1969년 출생
● 연세대 국어국문학과 졸업
● 2000년대 초반부터 문화평론가, 칼럼니스트로 활동
● 저서: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드라마 속 대사 한 마디가 가슴을 후벼 팔 때가 있다’, ‘다큐처럼 일하고 예능처럼 신나게’ 외 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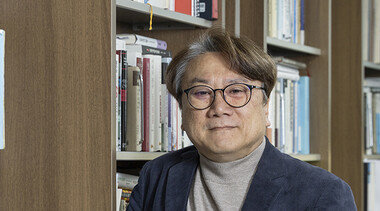
![[신동아 만평 ‘안마봉’] 2026년 ‘반중 지도자군(群)’의 행진](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9e/7c/5e/699e7c5e023ba0a0a0a.png)

![[영상] 김다현 “언제나 내 편인 ‘얼씨구다현’과 함께 붉은 말처럼 달리렵니다”](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8b/df/02/698bdf022269d2738e2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