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는 희찬이가 여전히 영어책보다 우리말 책을 열심히 읽는 것을 말리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영어든 한국어든 간에 책을 읽는다는 점 아니겠는가. 영국에서 살고 영국 학교에 다니고 있으니, 아이들은 결국 영어를 깨우칠 것이고 나보다 더 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아이들이 이곳에서 영어보다도, 세계가 참으로 크고 넓으며 다양한 사람들이 사는 곳임을 깨닫기를 바란다.

필자의 자녀 희찬이(왼쪽)와 희원이. 희찬이가 입은 방수 점퍼는 가톨릭계 초등학교 교복이다.
글쎄, 지금의 내 처지를 보고서도 그때의 엄마들이 날 부러워할지는 잘 모르겠다. 다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점 하나는 지난 6개월간 내가 아이들에게 가장 자주 느낀 감정은 ‘죄책감’이었다. 엄마가 새삼 늦은 나이에 공부한답시고 철모르는 아이들까지 이렇게 낯선 땅에서 생고생을 해야 하나 하는 마음 말이다. 그래서 더더욱 6개월 고지를 넘어서기를 기다렸는지도 모르겠다. 내가 유학을 준비할 때 선배 유학생들이 하나같이 해준 말이 있다. “아이들은 걱정하지 말고 공부할 당사자가 철저하게 영어공부 해와야 해, 아이들은 6개월만 지나면 금방 따라가. 걱정할 거 하나 없어”였다.
‘6개월 고지’의 이중성
잘 생각해보면 이 말에는 복선이 하나 깔려 있다. 바로 ‘6개월만 지나면’이라는 말이다. 즉 ‘6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아이들도 고생 좀 해야 한다’는 뜻이나 다름 없는 것이다. 그리고 정말 그랬다. 우리 아이들 역시 6개월이 지나는 현재까지 무진장 고생을 하고 있다. 이제야 나는 ‘영국 가면 아이들은 저절로 영어가 늘겠지’하는 생각이 참으로 순진했음을 깨닫고 있는 것이다.
어른이 낯선 언어와 낯선 환경에 놓이면 ‘컬처 쇼크’를 받는 것처럼, 아이들 역시 같은 컬처 쇼크를 받는다. 문제는 어른은 이런 쇼크에 나름 마음의 대비를 할 수 있지만, 아이들은 어떠한 대비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더구나 우리 아이들은 새로운 언어와 새로운 친구들에게 적응하기에는 너무도 어렸다. 흔히 조기유학은 초등학교 4학년 무렵이 가장 적당하다고 말하는데, 이 말은 최소한 열 살은 넘어야 외국학교에 적응하기 수월하다는 뜻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영국에 올 때 겨우 아홉 살과 다섯 살이었다. 아이들은 비행기를 탈 때까지 영국이 어디에 붙어 있는 나라인지, 비행기를 얼마나 오래 타야 하는지도 몰랐다.
특히 큰아이 희찬이가 몹시 힘들어했다. 희찬이는 한국에 있을 때부터 좋게 말하면 자기 세계가 뚜렷한 아이, 객관적으로 보자면 통제하기가 어려운 아이였다. 나는 ‘아이들은 걱정할 거 하나 없다’는 선배 유학생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희찬이를 일곱 살 때부터 유명한 영어학원에 보냈다. 그래도 조금이나마 영어를 배워가야 새로운 학교에 잘 적응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다. 더구나 만 일곱 살 3월에 공교육이 시작되는 한국과 달리, 영국은 만 다섯 살 9월(스코틀랜드는 8월)에 공교육이 시작되기 때문에 희찬이는 한국에서보다 더 높은 학년으로 영국 학교에 편입해야 하는 상황이었다(한국에서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온 희찬이는 영국에서 4학년 1학기로 전학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늘 희찬이에 대해 마음이 급했다. 최소한 영어로 읽고 쓸 정도는 익혀가야 할 것 같았다.
그러나 천성적으로 반항아인 이 녀석은 무려 1년 반이나 영어학원을 다니고도 그 흔한 ‘파닉스’ 하나 떼지 못했다. 희찬이가 얻은 것은 알파벳 스물여섯 자를 해독하는 정도에 불과했다. 아이는 흥미 없는 영어를 배우는 데 점점 더 넌더리를 냈고, 학원을 다닌 지 1년6개월 만에 “죽어도 영어학원은 더 못 다니겠다”고 선언했다. 나도 말 안 듣는 아이 때려가며 영어숙제 시키는 데 진력이 난 상태여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영어학원을 중단시켰다. 결국 희찬이는 친구들이 모두 영어학원에 다닐 때 자기가 좋아하는 미술학원을 열심히 다니며 초등학교 1,2학년 시절을 보냈다. 그리고 2학년 1학기를 마친 후, ‘저렇게 제멋대로인 녀석이 영국 학교에서 잘 지낼 수 있을까’하는 선생님들의 걱정 어린 시선을 받으면서 비행기에 올랐던 것이다.
영국에 와서 희찬이는 전교생이 80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가톨릭계 초등학교에 들어갔다. 영국의 초등학교(Primary School)는 네 종류가 있다. 수적으로 가장 많은 공립학교, 그 다음이 가톨릭계 공립학교 그리고 국가의 보조를 받지 않는 자율형 학교, 마지막으로 사립학교다. 이 중 사립을 제외하면 학비는 없다. 정확한 통계를 본 적은 없지만, 내 짐작으로는 공립과 가톨릭계가 전체 초등학교의 90% 이상을 차지하지 않을까 싶다. 영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학군이 있어서, 집 가까운 데에 있는 초등학교에 의무적으로 입학해야 한다. 우리 집이 있는 글래스고대학 근처의 동네에는 두 군데의 초등학교가 있는데 한 곳은 공립, 다른 한 곳은 가톨릭계 학교다. 나는 두 군데를 다 가본 후에 가톨릭계 학교에 희찬이를 집어넣었다.
전학 2주 만에 학교의 말썽꾼
내가 가톨릭계 학교를 택한 이유는 두 가지였다. 내가 사는 동네가 글래스고대학 근처다보니, 공립 초등학교에는 유난히 외국 학생이 많았다. 그리고 공립학교는 규율도 그리 엄해 보이지 않았다. 영국은 초등학교부터 교복을 입어야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 학교에는 교복을 입지 않은 어린이가 적지 않았다. 그에 비해 가톨릭계 학교는 학생의 절대 다수가 영국인이었고, 학생들은 넥타이까지 매야 하는 교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좀 제멋대로인 구석이 있는 희찬이는 엄한 학교에 다니는 게 낫지 않을까 싶었고, 외국인이 적은 학교를 다녀야 영어도 빨리 늘 것 같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내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다. 희찬이는 전학 첫날 의기양양하게 넥타이를 매고 학교로 향했다. 녀석은 별로 겁내거나 두려워하는 기색도 없었다. 첫날 학교를 다녀와서는 “엄마, 굉장히 재밌었어, 영국 학교 되게 좋아!”하고 말했다. 나는 아이가 새 학교에 잘 적응하려나보다 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이건 착각이었다. 영어를, 그것도 스코틀랜드 사투리를 전혀 알아듣지 못한 희찬이는 수업 내내 노트에 그림만 그리고 놀았던 것이다. 한 학년이 한 반밖에 되지 않고, 그나마 스무 명도 채 안 되는 같은 반 아이들은 서로 너무도 친한 사이여서 외국 학생인 희찬이가 끼어들 틈이 전혀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의사소통까지 안 되니 아이들은 결국 희찬이를 따돌리게끔 되었고, 다른 건 몰라도 자존심 하나만은 하늘을 찌르는 희찬이는 ‘어쭈, 니들이 날 무시해?’하면서 아이들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 급기야 같은 반 남자아이들을 모조리 때린 희찬이는 새 학교에 전학한 지 2주일 만에 학교의 말썽꾼이 되어버렸다.
워낙 엄격한 학교다보니 선생님 역시 희찬이처럼 별난 아이를 다뤄본 경험이 없었다. 희찬이가 늘 말썽을 부리고, 아이들을 밀치거나 때려서 점심시간에는 거의 교장실에 불려가 앉아 있었다는 사실을 나는 한참동안 알지 못했다. 영국 초등학교에서 다른 아이를 때리는 행동은 굉장히 중대한 잘못으로 치부된다. 영국 학교나 영국 학부모들 사이에는 “아이들은 싸우면서 큰다”는 사고방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심각하든 경미하든 간에,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때리는 것은 명백한 폭력이고,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전학한 지 한 달이 될 무렵 학부모 정기 면담시간을 통해서 나는 희찬이의 ‘심각한 비행’을 알게 되었다. 교장선생님은 “희찬이의 영어 실력으로는 학교에 적응하기에 무리다. 글래스고 시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특별학급에 넣자”고 제의했다. 반대할 여지가 없었다. 그즈음 희찬이 역시 “아이들도 선생님도 마음에 안 든다”며 떼를 쓰고 있었으니 말이다. 나는 복잡한 심경으로 글래스고 시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특별학급(Bilingual Unit)이 있는 초등학교로 아이를 전학시켰다. 새 학교는 집에서 3~4㎞ 떨어진 거리에 있는데, 글래스고 시의회(City Council)에서 미니버스를 집 앞으로 보내주어 학교를 다니기는 오히려 그전 학교보다 수월했다.
외국인 특별학급으로 희찬이를 데리고 가는 첫날, 편지를 써 갔다. ‘한국에서부터 희찬이는 선생님 말을 잘 따르기보다는 다분히 독립적인 성향의 아이였다. 첫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의사소통을 하기 어렵다는 사실 때문에 아이가 좌절감을 많이 느꼈고, 그 결과 좋지 않은 행동을 보여준 듯싶다. 외국인 특별학급에서 이런 점을 좀 살펴주셨으면 한다’는 내용의 편지였다. 외국인 특별학급의 주임교사 마틴은 “우리는 이런 케이스를 많이 겪어봐서 잘 알고 있다. 희찬이가 우리 학교에는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나를 안심시켰다.
희찬이에게 느끼는 죄책감

영국의 초등학교 수업 광경. 학생들의 참여를 중요하게 여기는 영국 학교에 영어를 잘 못하는 희찬이가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다행히 마틴 선생님의 말대로 희찬이는 특별학급에 곧잘 적응했다. 외국 학생을 많이 가르쳐본 이 학교 선생님들은 희찬이의 좌절감을 잘 이해해주었던 것이다. 희찬이는 자신의 장기인 미술과 레고 만들기 실력을 인정받으면서 조금씩 자신감을 회복했다. 희찬이가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주로 중동이나 동유럽, 대만 등지에서 온 아이들이었다-과 함께 레고 클럽을 만들자 담임교사인 미세스 레슬리는 ‘레고 클럽 조직상’이라며 직접 만든 상장을 주었다. 새 학교로 전학한 지 석 달 정도가 지나자 희찬이는 “주말이 오는 게 싫어. 주말이면 학교에 못 가잖아”라고 말할 정도가 되었다.
문제는 현재의 학교가 희찬이가 계속 다닐 학교가 아니라 말 그대로 임시 학교라는 사실이다. 희찬이는 빠르면 3월말, 늦어도 6월까지는 외국인 특별학급을 떠나 원래의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 외국인 특별학급은 영어를 하지 못하는 외국 학생을 위한 곳이라서 영어에 익숙해진 학생은 더 이상 다닐 수가 없다. 설상가상으로 글래스고 시의회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외국인 학급을 폐쇄할 기세라 희찬이는 3월말이면 죽어도 가기 싫다는 원래의 가톨릭 학교로 되돌아가야 할지도 모른다.
한국에서 죽어라 영어를 싫어했던 것처럼, 영국에서도 희찬이의 영어 실력 향상은 영 지지부진하다. 영국 학교에 다닌 지가 벌써 6개월이지만, 아직도 그림책을 떠듬떠듬 읽는 정도니 다른 건 몰라도 영어에 소질 없는 건 엄마를 닮은 게 분명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왜 이렇게 영어가 제자리냐”고 애를 다그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다만 한 가지 달라진 점은 있다. 5개월 정도가 지나면서 영어를 듣는 실력만은 확실히 늘었다는 느낌이 든다. 사실 그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동네에 친구가 없으니 학교에서 오후 3시40분쯤 돌아오면 어린이 방송이 끝나는 오후 6시까지 죽어라고 텔레비전만 본다. 그러니 자연히 영어 듣기 실력은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희찬이는 요즘 이렇게 말한다. “엄마. 나 영국이 좋아졌어.” 왜냐고 물으니 대답이 걸작이다. “여기는 학교도 재미있고, 텔레비전도 실컷 볼 수 있잖아.” 아아, 이 녀석아. 엄마 마음이 얼마나 복잡한지 알기는 아니?
다섯 살인 둘째 아이 희원이는 희찬이보다는 적응이 수월했다. 희원이는 시립 유치원(Nursery School)의 종일반에 들어갔는데, 이곳 역시 선생님이고 아이들이고 간에 모두 영국인뿐이었다. 한국에서 영어 공부를 전혀 안 하고 온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희원이의 영어는 하루가 다르게 늘었다. 선생님들의 스코틀랜드 사투리도 곧장 알아들었고. 다른 아이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눈치 빠르게 따라 해서 선생님들에게 금방 귀여움을 받았다.
“엄마, 나 눈이 고장 났나봐”
희원이는 온 지 3개월이 지났을 때부터 영어를 하기 시작했다. 6개월이 지난 지금은 최소한 말하는 능력만큼은 나보다 더 뛰어나다. 희원이는 내가 우리말로 물으면 우리말로, 또 영어로 물으면 영어로 대답한다. 예를 들면 이렇다. 희원이에게 “희원아, 너 엄마한테 ‘공주와 개구리’ 줄거리 이야기해줄래(Heewon, can you tell me the story of ‘The princess and the Frog’)?”라고 영어로 묻자 희원이는 금방 영어로 이렇게 술술 이야기했다. “Prince Nadim turned to the frog because he met the horrible magician. When he tried to kiss the princess, the princess turned to the frog. After that, they went to the river and met the crocodile there. But he is the funny crocodile… Emmm, and they tried to jump to the boat, but it′s too wobbly and they fell into the river…” 쉬운 표현만 사용하긴 했지만 아이는 며칠 전 본 영화 줄거리를 막힘없이 영어로 이야기했다. 희원이는 자신이 한국어로 표현할 수 있는 이야기는 대부분 영어로도 할 수 있는 듯싶다. 희원이의 말버릇 중 하나가 엄마와 오빠가 한참 이야기하면 “나도 좀 말하자!”라고 끼어드는 건데, 요즘 희원이는 이렇게 말한다. “Let me talk!”
그렇다고 해서 희원이가 낯선 환경에 대한 충격을 받지 않은 것은 아니다. 어찌 보면 희찬이에 비해 희원이가 받은 충격이 더 클지도 모른다. 영국 유치원에 다닌 지 2~3주쯤 되었을 때, 희원이가 이렇게 말했다. “엄마, 나 눈이 고장 났나봐.” 나는 처음에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다. “희원아 그게 무슨 소리야?” “응, 나 자꾸 눈물이 나와.” 희원이의 말인즉슨, 유치원에 가면 자꾸 눈물이 줄줄 나온다는 것이다. 눈앞이 하얘지는 것 같았지만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아이에게 되물었다. “언제 눈물이 나오는데?” “응… 뭐 하고 놀까 생각할 때.” “그럼 눈물 나올 땐 어떻게 해?” “화장실 가.” 유치원에서 자기와 놀아주는 아이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혼자 뭘 하고 놀까 생각하고 있으면 눈물이 저절로 나온다는 이야기였다. 그러면 우는 장면을 선생님들이 볼까 겁이 나서 화장실에 간다는 말이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머릿속이 텅 비는 것 같았다.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얻겠다고 철모르는 아이들까지 낯선 땅에 데려와 고생을 시키나 싶어서 그날 밤새 뒤척이고, 다음날 유치원에 가서 원장인 미세스 켐벨에게 이야기를 했다. 희원이가 말이 안 통해 친구들과 놀지 못하는 것 같다고, 자꾸 눈물이 난다고 말해서 내가 가슴이 너무 아프다고 말이다. 친절한 미세스 켐벨은 내 이야기를 듣고 눈물까지 글썽이며 미안하다는 말만 거듭했다. 그 후부터 원장과 다른 교사들이 희원이를 유난히 예뻐하는 걸 느낄 수 있었고. 희원이의 ‘눈병’은 조금씩 고쳐졌다.
유치원에서 유독 말없는 희원이
이제 더 이상 희원이는 유치원에 가기 싫다고 하지 않지만, 그리고 친구들과 잘 어울려 놀지만 아직도 문제는 남아 있다. 희원이는 유치원에서 ‘전혀’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말을 하지 않는다. 집에서는 웬만한 이야기는 모두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 정도인데 유독 유치원에만 가면 입을 꼭 다무는 것이다. 선생님들은 희원이가 이제 슬슬 말을 시작할 때가 되었는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며 걱정하는 기색이다. 사실 희원이는 우리 세 식구 중에 영어를 가장 잘한다. 다 같이 영화를 보러 가면 영어 주제가를 알아듣고 따라 부르는 사람은 희원이뿐이다. 그러나 그런데도, 아이는 유치원에서는 여전히 영어를 하지 않는다. 아직 영어를 하는 데 자신이 없어서일까, 아니면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은 영국이 아니라 한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까. 한번은 희원이에게 “너 한국에 가서 아빠랑 살래, 아니면 영국에서 엄마하고 오빠랑 살래?”라고 물었더니 아이는 “한국에서 할머니랑 아빠랑 살래”라고 대답했다. 새 학교 다니는 재미에 한국 학교는 까맣게 잊어버린 희찬이와 달리, 희원이는 여전히 한국에서 다녔던 어린이집과 한국 친구들 이야기를 한다. 단순한 남자아이에 비해 복잡하고 예민한 여자아이들은 새로운 환경을 받아들이기가 더 힘든 모양이다.
|
영어를 잘하게 되는 것도, 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아이들이 영국에 사는 동안 행복하기를 바란다. 아이들은 언젠가는 공부를 끝마친 나와 함께 한국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나는 희찬이가 여전히 영어책보다 우리말 책을 열심히 읽는 것을 말리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영어든 한국어든 간에 책을 읽는다는 점 아니겠는가. 영국에서 살고 있고 영국 학교에 다니고 있으니, 아이들은 결국 영어를 깨우칠 것이고 곧 나보다 더 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아이들이 이곳에서 영어보다도, 세계가 참으로 크고 넓으며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임을 깨닫기를 바란다. 영어는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더 넓은 세계로 나갈 수 있게 해주는 수단일 뿐이니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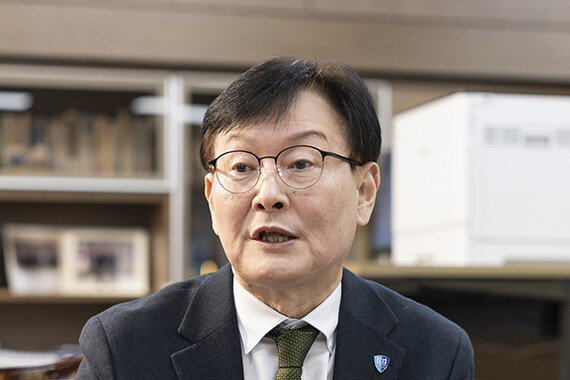


![[밀착취재] 리딩방 70여 명 대부분이 한통속…기망하는 수법까지 매뉴얼화](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48/98/bd/694898bd2399a0a0a0a.jpg)


![[지상중계] 제12회 나지포럼, “북미 정상회담 성과내기 어려워”](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43/48/32/69434832107aa0a0a0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