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픽사, 예술가와 기술자의 왕성한 교류 위해 공간 배치
- 거칠고 엉뚱한 초기 아이디어에 대한 평가는 금물
- 권위와 혁신의 결정적 차이는 ‘실패에 대한 태도’
- 거인은 키우고, 소인에겐 거인 어깨에 오를 용기를

폭스바겐(Volkswagen)과 함께 등장한 이 짧은 문구 하나가 고객의 사고와 미국 자동차 소비 시장을 변화시켰다. 1934년 히틀러는 독일 경제 부흥을 위해 페르디난트 포르셰 박사에게 “어른 2명과 어린이 3명을 태우고, 낮은 연비로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릴 수 있는 저렴한 소형차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독일에서 성공을 거둔 폭스바겐은 1950년대에 미국 시장에 진출한다. ‘자동차는 크면 클수록 좋다’는 미국인들의 생각은 폭스바겐이 넘기 힘든 장벽이었다. 이에 폭스바겐은 신문 광고지면에 작게 축소된 폭스바겐과 함께 ‘Think Small’이라는 문구를 집어넣었다. 낮은 연비, 합리적인 유지비 등 소형차의 장점도 강조했다.
이 광고는 미국인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신선한 충격을 준 광고에 힘입어 폭스바겐은 미국인들에게서 호응을 얻기 시작했고, 이후 미국 시장에서 급성장했다. ‘Think Small’이라는 단 하나의 문구가 고객의 생각을 바꾼 것이다. 이처럼 혁신제품이 반드시 새로운 기술을 요구하는 건 아니다. 작은 발상의 전환도 큰 혁신을 이룰 수 있다.
아르키메데스의 왕관과 뉴턴의 사과. 이 둘의 공통점은 뭘까. 모두가 늘 봐왔지만 모두가 보지 못한 것을 발견했다는 점이다. 창의(創意)란 늘 우리와 함께 있지만 보지 못한 것일 수 있다. 다만 창의는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안에 대해 풍부하고 치열하게 고민하는 사람에게서 나온다.
뉴턴의 사과
테레사 아마빌 미국 하버드 비즈니스스쿨 교수는 기업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려면 3가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지식과 경험에 기반을 둔 전문성(knowledge) △생각을 전개하는 과정에 대한 기술(skills)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열정(motivations)이 그것이다. 기업의 내부 인력만큼 자사 제품, 경쟁사, 관련 기술, 고객가치, 시장 동향에 대해 연구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동기를 부여할 프로세스가 뒷받침된다면 내부 인력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최고의 자산이 될 것이다.
“인류 역사에 등장한 탁월한 혁신은 대부분 천재 한 명의 머릿속에서 툭 튀어나온 게 아니다. 흩어져 있는 여러 아이디어가 교류하고 충돌하고 융합하는 과정에서 탄생했다.”
‘탁월한 아이디어는 어디서 오는가’의 저자 스티븐 존슨의 말에서 알 수 있듯, 창의적 인재를 채용했다고 해서 조직이 당연하게 창의적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스탠퍼드대 샘 서튼 교수도 “지속적인 혁신은 한 명의 천재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며 “모든 직원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과감하게 실천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 등이 갖춰져야만 진정한 창의적 기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집단 창의성은 개인의 창의성이 산술적으로 합산되어 나오는 것이 아니다. 서로 다른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는 능력 및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프로세스, 창의성을 위한 조직 환경(Organizational climate for creativity)에 의해 결정된다는 Simon Tagger(2002), Andrew Pirola-Merlo · Leon Mann(2004) 등의 연구결과들이 이를 뒷받침한다. 결국 창의적인 조직을 만드는 것은 개개인의 재능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하나하나 연결해 집단 창의성으로 만들 수 있는 프로세스인 것이다.
이에 스티븐 존슨은 집단 창의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협업적 혁신’을 강조했다. 최근 700년 동안 탄생한 200여 개의 뛰어난 혁신 성과를 추적한 결과, 여러 아이디어의 연관성을 찾아내 융합하는 협업적 혁신이 위대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협업적 혁신은 아이디어가 엉뚱하다고 해서 무조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아이디어를 붙여 사슬처럼 연결하며 키워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개개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프로세스를 통해 사슬처럼 연결돼 커져갈 때 기업의 창의는 극대화된다.

픽사는 협업을 통해 집단 창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믿는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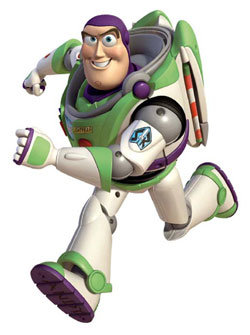
픽사의 첫 장편 애니메이션으로 큰 성공을 거둔 ‘토이스토리’ 주인공 버즈 라이트이어.
픽사의 주고객은 어린이다. ‘몬스터주식회사’에 나오는 “요즘 아이들은 예전처럼 겁먹지 않아(Kids don′t get scared like they used to)”라는 몬스터들의 대사는 픽사의 고민을 대변한다. 나날이 상상력이 풍부해지는 어린이들을 사로잡으려면 이를 뛰어넘는 영화를 만들어야 한다. 픽사에서는 창의력 넘쳐나는 한 편의 영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250명이 팀을 이뤄 4~5년에 걸쳐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나간다. 버즈 라이트이어가 도약을 준비할 때마다 외치는 ‘토이스토리’의 명대사 “무한을 뛰어넘어, 비상!(To infinity and beyond!)”처럼 창의성의 비상을 늘 추구하는 것이다.
창의의 구성요소인 전문성(knowledge)과 기술(skills)이 조직 전체에 흐르게 하기 위해 픽사는 ‘두뇌위원회’라는 프로세스를 뒀다. 8명의 감독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제작팀이 도움을 요청할 때면 언제든 위원들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해준다. 이후 제작팀은 위원회의 조언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의 조언을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작팀 스스로 문제해결 방식을 결정함으로써 창의성을 보호받는 것이다.
창의적인 기업들은 한 분야에서 깊이 있는 전문가인 동시에 다방면에 흥미와 지식을 갖고 있는 ‘T자형 인재’를 선호한다. T자형 인재는 자기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기술을 충분하게 갖고 있으면서도 다른 분야에서 주는 신선한 자극을 받아들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데 활용하기 때문이다. 픽사대학은 미술, 애니메이션, 영화 제작 등과 관련한 수백 종류의 강좌를 제공한다. 모든 직원은 적어도 일주일에 4시간 이상 데생, 조각, 연기,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 110개 코스 중 자신이 원하는 것을 골라 교육 받아야 한다. 요리사가 되고 싶은 생쥐 이야기를 그린 ‘라타투이(Ratatouille)’에서 주인공 래미가 “두 가지 맛을 섞으면 특별한 새 맛이 창조된다(Combine one flavor with another, and something new is created)”라고 했듯이 픽사 직원들은 다른 분야와의 만남을 통해 꾸준히 창의에 대한 자극을 받는 것이다.
하버드비즈니스리뷰(2008)에 따르면 픽사의 본사 건물은 광장을 기준으로 좌우의 사무실이 마주 보고 있다. 각각 이성과 감성을 조절하는 좌뇌 및 우뇌와 같이 좌측 사무실에는 기술 분야, 우측 사무실에는 예술 분야가 자리한다. 이 둘이 만나는 중앙광장은 픽사의 기술과 예술이 만나는 곳이다. 실제로 스티브 잡스가 1999년 픽사 본사를 지을 때 가장 신경을 쓴 것이 이 중앙광장이라고 한다. 픽사에서 일하는 다양한 예술가, 기술자, 과학자 등이 서로 다른 곳에서 일하다가도 언제든 쉽게 만나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잡스는 회의실, 카페테리아, 화장실 등 주요 시설을 모두 중앙광장에 배치했다. 그러니 직원들은 분야를 막론하고 우연한 만남을 자주 가질 수밖에 없다. 처음에는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중앙까지 나가야 하는 번거로움에 대해 불평했지만, 잡스의 의도대로 중앙광장에서 맺어진 인맥과 대화 등을 통해 예상치 못한 창의적 아이디어들이 탄생했다. 이런 아이디어들이 픽사를 세계 최고의 창의 집단으로 만들어주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Rough, Rapid, Right
이번에는 최근 20년간 350개의 디자인상을 휩쓴 세계 최고의 디자인 컨설팅회사 IDEO를 들여다보자.
직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보통 기업들은 그것과 관련한 보고서와 프레젠테이션을 요구한다. 그리고 ‘다른 기업은 어떻게 하는가’ ‘관련 케이스는 있는가’ ‘과연 성공할 수 있는가’ 등의 질문을 던진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초기엔 거칠기도 하고 다소 엉뚱하기도 하다. 다듬어지지 않은 초기의 아이디어가 의사결정이라는 명목 아래 비판과 우려 속에서 사장되기 일쑤다. 형식이 혁신을 가로막는 셈이다. 그러나 IDEO의 CEO 팀 브라운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프로토타입(prototype)부터 만들라”고 말한다.
프로토타입과 관련해 IDEO는 Rough(대략적인), Rapid(신속한), Right(올바른)라는 3R 원칙을 갖고 있다. 모든 것을 완성할 필요 없이 의도한 부분만을 대략적으로, 올바르고, 신속하게 만들면 된다는 것이다. 시각적으로 구체화하면 더 많은 아이디어가 생기기 마련이다.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동료와 고객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프로토타입을 수정해간다. 이런 과정을 통해 처음 거칠었던 프로토타입은 고객의 니즈(needs)에 가까운 제품으로 수렴된다. 애플 최초의 컴퓨터 마우스도 IDEO의 프로토타입에서 나왔다. IDEO의 한 디자이너가 방취제 뚜껑을 플라스틱 버터 용기 밑바닥에 붙여본 것이다. 이 프로토타입은 오늘날 PC용 마우스의 원형이 되었다.
IDEO 경쟁력의 원천은 직원들의 아이디어다. 그리고 그 원천의 핵심에는 IDEO만의 특별한 브레인스토밍 원칙이 있다. ‘질 대신 양을 추구하라’ ‘아이디어를 평가하지 말고, 다른 아이디어로 살을 붙여나가라’는 것이다. 양을 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회의를 오래하진 않는다. 회의시간은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 참여자들은 제한된 시간 동안 가능한 한 많은 아이디어를 생각나는 대로 말한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처음엔 거칠기 마련. 제시된 아이디어에 대해 어떠한 평가도 해서는 안 된다. 대신 다른 참여자가 살을 붙여 키워나간다. 쏟아져 나온 아이디어는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화이트보드에 적거나 포스트잇을 벽에 붙여가며 아이디어들의 상호관계를 표시한다. 단순히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그때그때 시각화하는 것이다.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 혁신 제품들이 탄생했다. 자전거 정수기 ‘아쿠아덕트(Auaduct)’가 그 대표적인 예다. 이는 물이 부족한 가난한 나라를 위한 제품으로, 더러운 물을 자전거에 싣고 페달을 밟아 이동하는 동안 페달의 구동으로 작동하는 펌프를 통해 물이 정수되도록 한 것이다.
나이키의 ‘이노베이션 키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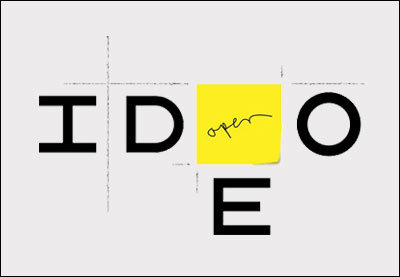
세계 굴지의 디자인 컨설팅 회사 IDEO는 직원들에게 아무리 엉뚱하고 거친 아이디어라도 버리지 말고 프로토타입부터 만들 것을 요구한다.
미국 경영월간지 ‘패스트컴퍼니(Fast Company)’는 ‘2013년 50대 글로벌 혁신기업’에서 나이키(Nike)를 1위로 선정했다. 나이키가 지난해 크게 성공시킨 실험 ‘플라이니트 레이서(Flyknit Racer)’와 ‘퓨얼밴드(Fuel Band)’가 1위 선정의 배경이 됐다.
플라이니트 레이서는 플라이니트 라인의 첫 번째 운동화로 한 장의 갑피로 이루어져 신발이 아니라 양말을 신은 것처럼 느껴지는 러닝화다. 플라이니트가 특별한 이유는 깃털처럼 가벼운 신발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여러 개의 천을 덧대어 만든 것이 아니라, 실로 직조한 제조 방식의 혁신이 있기 때문이다. 나이키의 R·D센터인 ‘이노베이션 키친(Innovation kitchen)’은 이를 두고 “모든 불필요한 부분을 없앤 혁신”이라고 발표했다. 이 운동화의 시작은 ‘고무 밑창을 붙인 양말’이었다. 그러나 이노베이션 키친은 이 무모하고 엉뚱한 제안을 받아들여 ‘갑피와 밑창이 하나로 이루어진 플랫폼’이라는 혁신 제품을 만들어냈다.
이노베이션 키친은 단순하고 엉뚱한 상상들을 창의가 넘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 제품들로 만들어내는 곳으로 유명하다. 설립자 빌 보어먼이 아침에 아내가 와플을 굽는 것을 보고 와플 모양의 운동화 밑창을 처음 만들었던 일화는 이노베이션 키친에서 전설처럼 전해진다. 2000년 밑창에 독특한 디자인을 넣어 돌풍을 일으킨 나이키 샥스 역시 신발 밑창에 스프링을 달아보겠다는 엉뚱한 상상에서 출발했다. 이처럼 나이키의 혁신은 직원들의 무모하고 엉뚱한 아이디어라도 기꺼이 수용하는 창의적인 조직문화에서 나온다.

사용자의 하루 활동량을 측정하는 팔찌인 나이키의 퓨얼밴드. ‘테니스용 머리띠’ 아이디어가 퓨얼밴드로 완성되기까지 2년의 시간이 걸렸다.
퓨얼밴드 역시 한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최초 아이디어였던 ‘테니스용 머리띠’에서 최종적으로 ‘팔찌’ 형태로 상품화하기까지 2년의 시간이 걸렸다. ‘어디에 착용할 것인가’ ‘어떤 색깔, 어떤 재질로 할 것인가’ 등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프로토타입이 만들어졌고 실패를 거듭했다. 이런 기다림의 바탕에는 직원의 아이디어를 존중하고, 실패를 창의로 향해 가는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나이키의 조직문화가 있다. 나이키의 디지털 스포츠 부문 스테판 올랜더 부사장은 “진짜 멋진 제품은 제약 없이 테스트하면서 탄생한다”고 말한다.
거인의 어깨 위에 서면…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간 소인을 그린 니콜라 푸생의 ‘태양을 찾는 장님 오리온(Blind Orion Searching for the Rising Sun·1658)’.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소장.
“내가 남보다 조금 더 멀리 바라보았다면, 그것은 내가 거인들의 어깨 위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If I have seen further it is only by standing upon the shoulders of giants).”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의 말이다. 이 말은 라틴어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는 소인(nanos gigantium humeris insidentes)’에서 유래한 것으로, 현대의 모든 발전은 과거 누군가의 연구와 업적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뜻을 담고 있다. 스티브 잡스는 아이패드를 처음 선보이던 날, 전자책을 사볼 수 있는 ‘아이북스’를 소개하며 “아마존은 킨들이라는 훌륭한 전자책 단말기로 전자책 시장을 열었지만, 애플은 아마존의 어깨를 딛고 올라서서 그들보다 더 멀리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는 소인’은 오늘날 기업에도 적용된다.
멀리 볼 수 있는 소인의 발아래 거인이 있듯이, 시장을 선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 아래에는 기업이 오랫동안 쌓아온 전문성과 기술, 그리고 다른 아이디어들이 있다. 아무리 작은 소인일지라도 거인의 어깨 위에 오르면 거인보다 더 멀리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다듬어지지 않은 거칠고 엉뚱한 상상들이 기업의 전문성과 기술에 바탕을 두고 다른 수많은 아이디어와 연결되면 미래를 이끌어갈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재탄생한다.
더 멀리 바라보려면 거인은 더 커져야 하고, 소인에게는 더 높아진 어깨를 딛고 올라갈 용기가 필요하다. 거인을 키워나가고 소인에게 용기를 불어넣는 일. 이것이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이 놓치지 말아야 할 역할이다.




















![[밀착취재] 리딩방 70여 명 대부분이 한통속…기망하는 수법까지 매뉴얼화](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48/98/bd/694898bd2399a0a0a0a.jpg)


![[지상중계] 제12회 나지포럼, “북미 정상회담 성과내기 어려워”](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43/48/32/69434832107aa0a0a0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