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꼭 잠 안 자고 그런 걸 해야 돼?”
“이런 게 다 자기와의 싸움이야.”
아버지가 엄숙하게 대답하자 아들이 물었다.
“왜 가만히 있는 자기하고 싸워야 되는데?”
‘자기 알기’ 열풍
프로이트의 책을 읽다보면 ‘모든 문제가 성(性)으로 귀결된다’는 인상을 받는다. 아마도 성적 억압이 심했던 ‘빅토리아 시대’의 산물일 것이다. 20세기 심리학 키워드가 성이었다면 요즘은 ‘자기를 안다’는 문제인 듯하다. 얼마 전 심리 학술대회에 갔다가 인파 때문에 깜짝 놀랐다. 그처럼 많은 사람이 ‘자기’라는 문제를 연구하려고 열성적으로 모일 줄은 몰랐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도 있다. 같은 대학에서 남편은 철학을, 부인은 심리학을 가르친 부부가 있었다. 1990년대 이후 남편의 학생 수는 급감했지만 부인의 수강생 수는 자꾸 늘어났다. 부인이 가르치는 마음 알기니, 자기 알기니 하는 것은 철학자 남편이 보기에는 학문이라기엔 일천했다. 남편이 샘이 나서 빈정거렸다.
“숫자만 많으면 뭐해? 학생들 열의가 문제지.”
부인이 대답했다.
“무슨 소리. 내가 강의실에 들어가기만 하면 180개의 눈동자가 모두들 반짝반짝 빛나는데.”
남편이 화를 냈다.
“거짓말 마. 그 반에는 애꾸도 없단 말이야?”
‘치유하는 자기 이야기 쓰기’ 강좌

우연한 시작이었다. 누군가 나에게 “당신은 소설 창작법을 가르치고 있는 데다 정신분석 분야도 잘 알고 있으니 그 두 가지를 결합한 강좌를 만들어보지 않겠느냐”고 제안한 것. 곰곰 생각해보니 글쓰기에는 자기분석적인 요소가 있어 정신분석과 유사했다.
나는 소설 쓰기를 좋아한다. 젊었을 때는 “왜 소설을 쓰냐”는 질문을 받으면 ‘자기 구원’이니 ‘세계 참여’니 하는 거창한 말을 내세웠다. 사실은 쓰는 게 재미있고 즐거워서였다. 전업 작가로 나선 이후 난 거의 일 년 단위로 작업실을 옮겨 다닌다. 책 한 권을 쓰고 나면 그 장소의 지기(地氣)가 쇠했다는 핑계를 대며 말이다. 예전 작업실이 있던 곳을 지나칠 때면 “여기선 어떤 소설을 썼다”는 기억이 떠올라 공연히 행복해진다. 그처럼 ‘행복한 작업’에 요즘 사람들이 절실해하는 자기 알기까지 더해진다면 그보다 좋을 순 없을 것 같았다.
글 쓰는 기술을 익히는 것은 어렵다. 아무리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가 재밌더라도 처음에 그 방법을 익힐 때는 힘이 든다. 두려움을 누르면서 물에 코를 박아야 하고 무릎이 까지고 피나는 과정을 통과해야 비로소 그 기술이 몸에 익는다.
그러나 강좌의 어려움은 그 때문은 아니다. 이런 강좌를 수강하려는 사람들은 대체로 글로 자기를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그래서인지 프로작가처럼은 아니더라도 글쓰기에 꽤 익숙한 편이다.
문제는 과거를 되새김질하는 데 있다. 자기를 알기 위해서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통틀어 통찰할 필요가 있다. 미래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행동을 찾는 일은, 이미 일어난 일들을 돌아보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결국 자기를 알기 위해서는 과거를 되새겨야 한다.
자기반성은 기분 나빠지기?
강좌 초기에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지난 일을 자꾸 쓰다보니 기분이 자꾸 처진다”였다. 심지어는 “일기를 쓰다 보니 그게 우울증에 빠지는 지름길 같아서 일기를 쓰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사람도 있다. “자기반성은 하면 할수록 기분만 나빠진다”는 불평도 들었다. 야심으로 시작된 강좌는 워크숍 시간만 되면 ‘기분이 나빠지는 100가지 방법’을 배우는 것처럼, 분위기가 가라앉기도 하고 눈물로 얼룩질 때도 있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자기를 알고 싶어하면서도 자기반성에는 상당한 거부감이 있음을 알게 됐다. 요즘 풍조도 경험을 되새기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기보다는, 닥치는 대로 경험을 쌓는 게 ‘쿨한 것’으로 여겨, 과거 되새기기에 대한 거부감을 부추기고 있기도 하다.
틱낫한, 크리슈나무르티를 비롯한 많은 현자(賢者)는 “사람이 행복하려면 오늘을 살아야지, 과거나 미래에 집착하면 안 된다”고 했다. 반대로 사람이 행복하려면 자기 인생에 의미가 있다고 느껴야만 하고,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려면 과거를 되새겨보아야만 한다. 딜레마다. 진정으로 행복하기 위해선 과거를 되새겨야 할까, 말아야 할까?
또 다른 딜레마도 있다.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만족하지 않아야 발전이 있다고 한다. ‘만족한 돼지가 되느니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되는 게 낫다’는 격언이 있을 정도. 반대로 ‘자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지혜롭지 못하다’는 격언도 있다. 헷갈린다. 도대체 자기에게 만족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은 계속된다. 자기반성을 하지 않으면 인격이 향상되지 않아 자기실현을 할 수 없다. 반대로 자기에 대해 지나치게 몰두하다보면 우울증에 빠지거나 자기애환자(자기도취적 성격장애,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가 된다. 그렇다면 자기반성을 하라는 것일까, 말라는 것일까?
이런 문제는 우리가 자기반성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데서 시작된다. 자기반성의 ‘대표선수’라 할 수 있는 일기 쓰기를 떠올려보자. 우리는 초등학교 때 일기 쓰기란 ‘어떤 일로 인해 기분이 나빴다, 좋았다’ 혹은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이라 배웠다. 어른이 된 뒤에도 일기에 대한 인식은 바뀌지 않았다.
바른 자아반성이란 무엇일까?
그러나 이건 자기반성이 아니다. 종이에 불평을 털어놓는 과정을 통해 마음은 가벼워질지 몰라도, 자기를 알고 자아를 실현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나는 ‘치유하는 글쓰기’를 가르치는 동안 이런 내용을 말로 풀어 설명하기가 어려워 애를 먹었었다. 그러던 중 불경(佛經)을 읽다가 불현듯 내가 설명하고 싶었던 바를 깨달았다.
제자 나가르쥬나가 부처에게 물었다.
“진아(眞我)란 무엇입니까?”
부처가 대답했다.
“사자가 사슴을 잡을 때와 같으니라.”
눈을 감고 상상해보자. 사자가 사슴을 잡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만약 ‘사슴이 나를 숲의 왕자라고 두려워할까?’ ‘나를 좋아할까? 무서워할까?’ 혹은 ‘저 사슴의 눈에 내가 우습게 보이는 건 아닐까?’ 등 사슴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집중한다면, 사자는 그 사슴을 잡아먹지 못할 것이다.
|
사자는 사슴에 주의를 집중해야 한다. ‘사슴은 어느 방향을 향해, 어떤 자세로 있구나. 뿔은 어디를 향하고 있고, 다리는 어떻게 뻗었고, 고개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코는 어디로 향해 있고, 달리는 속도는 어느 정도일 것 같고, 어디를 깨물어야 단숨에 숨이 끊어지겠고’ 처럼.
자기반성을 한다는 것은, 자신과 관계된 사람, 사건, 사물에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다. 그저 기뻤다든지, 슬펐다든지, 화가 났다든지 감정을 쓰는 대신, ‘그 상황이 내게 어떻게 감지됐는가’를 쓰는 것이 중요하다. 자기가 나서서 자기감정을 해설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런 글은 하소연을 들어주는 사람을 종이로 대신한 감정해소일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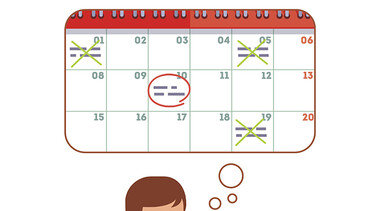


![[지상중계] 제12회 나지포럼, “북미 정상회담 성과내기 어려워”](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43/48/32/69434832107aa0a0a0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