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랜 골프친구 OCL 이동헌 사장, 수원대 이인수 이사장, 차범근 감독과 필자(왼쪽부터)가 함께 찍은
이쯤 되면 우리가 왜 사는가에 대한 질문이 나올 법하다. 길고 긴 진화의 과정을 거친 뒤에도 여전히 개코원숭이와 다르지 않다면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라는 종이 너무 가엾지 않은가 말이다. 결국 남는 것은 ‘어떻게 노느냐’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기본권’이나 ‘생존권’이란 말 대신 ‘삶의 질’이나 ‘행복추구권’같은 말이 자주 쓰이는 것은 그래서가 아닐까. 사람에게 ‘놀이문화’는 그만큼 의미심장한 것이다.
곰곰 생각해보면 ‘잘 노는 것’은 ‘잘 몰입하는 것’이다. 제대로 몰입하는 사람의 삶의 질이 더 높은 것은 당연하다. 물론 몰입이 전부 좋은 것은 아니다. 음주나 도박, 음란물 같은 것은 하면 할수록 심신이 피곤해질 뿐이다. 내가 아는 ‘긍정적 몰입’의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골프다. 골프에는 좋아서 미치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고, 그러다 보면 심신에 보탬이 되기 때문이다.
심리학자들은 사람이 몰입하기 쉬운 조건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한다. 우선 도전목표가 있을 것, 둘째 경쟁적인 요소가 있을 것, 셋째 피드백이 빠를 것, 넷째 적절한 난이도가 있을 것. 골퍼라면 이 모든 요소들이 골프에 들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골프장에 갈 때면 누구나 ‘오늘 몇 타 정도를 쳤으면 좋겠다’는 도전목표를 설정한다. 매 홀 티샷을 할 때 역시 마음속으로 목표를 세우게 된다. 누가 동반자와의 경쟁의식 없이 그린 위에 서겠는가. 피드백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18홀이 다 끝난 다음 숫자로도 나오지만, 사실은 샷을 하는 순간 공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굿샷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그야말로 번개와 같은 피드백이다. 마지막으로 난이도 이야기는 더 이야기해서 무엇하랴! 뜻대로 안 되는 게 골프고 영원히 만점이 없는 게 골프다.
그러나 심리학자들도 모르는 또 한가지 ‘몰입의 요소’가 골프에는 존재한다. 바로 사람이다. 골프는 네 명이 한 조가 되어 움직인다. 그러다 보니 항상 사람을 만나게 되고 교감을 나누게 된다. 복잡한 일상생활이나 비즈니스 세계에서 만났을 때와는 달리, 마음을 터놓고 필드에서 이루어지는 ‘만남’이야말로 인간관계의 절정을 체험하게 해준다. 지루하게 밀고 당기던 협상이 골프장에만 가면 말끔히 해결되는 걸 경험한 사람이 어디 한둘이랴.
반대로 ‘몰입을 방해하는 결정적인 요소’ 또한 여러 가지다. 대표적인 것을 꼽자면 단연 골프장의 환경. 그동안 여러 골프장을 다니며 느낀 것은 모든 골프장이 다 그 나름대로의 매력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소박한 골프장, 화려한 골프장, 은은한 골프장, 웅장한 골프장 등등. 코스만 보고 좋은 골프장인지 평하는 것은 현명한 일이 못 된다. 내가 생각하는 좋은 골프장의 조건은 좀더 복잡다단하다.
첫째는 몰입할 수 있는 ‘주변조건’이 갖춰진 골프장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앞뒤 팀의 간격이 너무 짧은 골프장, 캐디가 불친절한 골프장, 라커룸이 시끄러운 골프장, 운영이 매끄럽지 못한 골프장에서는 진정한 몰입이 불가능하다.
둘째는 몰입을 방해할 만한 사람들이 적은 골프장, ‘귀인’을 만날 수 있는 골프장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요즘 골프장에는 참으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온다. 귀인을 만날 수도, 조폭을 만날 수도 있는 것이다. 생각 같아서는 경건하고 품위 있는 사람들만 오는 골프장을 가고 싶지만,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 비싼 곳을 가면 되지 않겠느냐고? 회원권 가격이 수억 원씩 하는 골프장이라도 돈만 있으면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고 아무 때나 드나들 수 있다.
내가 골프채를 처음 잡은 것은 1988년 가을이었다. 한 달쯤 연습한 후 호기 있게 골프장으로 달려나갔다가 평생 잊지 못할 망신을 톡톡히 당했다. 연습장에서는 잘 맞던 공이 필드에서는 허공을 휘젓거나 큰 공(지구)을 때리는 등 난리였다. 이때의 충격으로 몇 년 동안 골프채를 내려놓았다가 다시 잡은 후 이제는 골프의 매력에 흠뻑 빠져서 살고 있다.
2년 전 겨울 남서울 골프장에서 차범근 감독의 장타를 따라 잡으려다가 허리근육을 크게 다친 적이 있다. 곧바로 병원에 갔는데 의사에게 던진 첫 질문이 “앞으로 계속 골프를 칠 수 있나요?”였다. 일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지보다 골프가 먼저 떠오른 것이었다. 어느새 내 생활 속에 골프가 녹아 들어와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해준 에피소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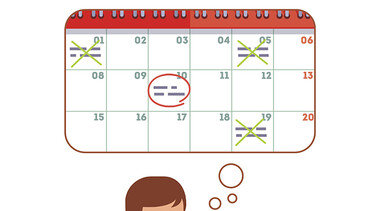


![[지상중계] 제12회 나지포럼, “북미 정상회담 성과내기 어려워”](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43/48/32/69434832107aa0a0a0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