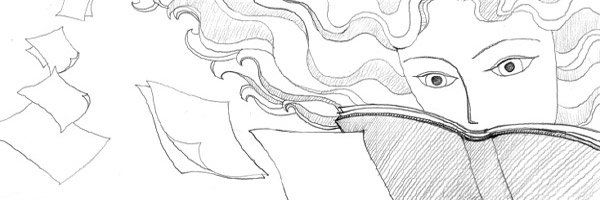
이에 비해 ‘김강사와 T교수’(1935)의 작가 유진오의 아호 현민(玄民)은 어떠할까요. 노자의 ‘도덕경’에서 玄자를, ‘민중’ ‘인민’ 등에서 民자를 땄다고 스스로 해명한 바 있습니다. 백성이나 민중, 인민 등이 씨의 마음에 들었다는 것, 그런데 그 위에 ‘도덕경’을 올려놓아야 한다는 것, 여기에서 비로소 씨다운 균형감각이 엿보인다고 하면 어떠할까요. 지식인이란 그러한 존재여야 한다는 뜻이기보다 ‘창랑정기’(1938)로 표상 되는 고전적 기품 쪽에 기울어진 그런 기묘한 균형감각이라 하면 어떠할까요. 자기의 아호에 대해 스스로 해명해놓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사연이 있는 문사에 김동리씨가 있지요.
“문단에 나올 무렵 나는 당선을 거듭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이름을 갈았었다”라고 그 복잡한 이유를 뚜렷이 해놓았더군요. 당시 문단 데뷔의 정식 코스란 신춘문예였던 만큼 3대 일간 신문의 관문을 모조리 통과하겠다는 야심찬 청소년의 꿈이 거기 꿈틀거리고 있었다는 것.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처음 시가(詩歌)가 입선되었을 때는 호적 이름이었고, 다음 해 소설이 당선되었을 때는 아명을 썼었고, 맨 끝의 ‘산화’는 지금 쓰는 동리(東里)란 이름으로 당선이 되었었다”(‘동리 변’).
이처럼 씨는 3대 신문을 모조리 돌파한 실력자였음이 드러났지요. 시가 ‘백로’(‘동아일보’, 1934. 1. 2)는 김창귀(金昌貴)로 되어 있어 호적 이름 그대로입니다. ‘화랑의 후예’(‘중앙일보’, 1935. 1)의 당선자는 김시종(金始鐘)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화’(‘동아일보’, 1936. 1)에서 비로소 김동리(金東里)입니다. 이처럼 昌貴, 始鐘, 東里의 사용이 당선을 거듭하기 위한 방편이었는데, 그 뒤로는 어떻게 되었던가. 그런데 씨는 이렇게도 말해놓아 혼선을 조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처음 이 이름(東里)을 쓸 때는 이것으로 호를 삼을 작정이었으므로 당선작 ‘산화’의 약력 소개에도 본명은 金始鐘이라 하여…”라고. 위에서는 金始鐘을 ‘아명’이라 해놓고, 아래에서는 그것을 ‘본명’이라 했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호적명, 아명, 본명에 대한 고려가 불가피한 형국이지요. 과연 씨의 호적명은 昌貴로 되어 있습니다. 족보에 있는 족명으로 하면 창봉(昌鳳)이고요. 본인 말대로 始鐘은 아명일 터인데 또 씨는 이를 ‘본명’이라 하기도 했습니다. 호적명을 본명이라 부르는 쪽에서 보면 조금 혼란스럽지요.
‘무정’(1917)의 작가의 경우도 알기 어려운 대목이 있습니다, 호적명은 분명 이광수(李光洙)로 되어 있고 와세다(早稻田) 대학 기록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어째서 그 이전에 씨가 다니던 중등과정인 메이지(明治) 학원 중등부엔 이보경(李寶鏡)으로 되어 있을까요. 일어로 쓴 씨의 처녀작 ‘愛か’(1909)엔 ‘한국 유학생 이보경’이 아니겠습니까. 호적 대조가 없었던 시절, 아명을 그대로 본명으로 쓴 경우라고나 할까요.
그건 그렇고, 東里의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삼국유사’ 열전에 나오는 백결(百結) 선생이 살던 동네 이름에서, 또 ‘논어’에 나오는 군자 동리자산(東里子産)의 이름에서 각각 연유했다고 하고, 씨는 이에다 덧붙여 놓았군요. 자기의 백씨께서 지어주셨다는 것. 신라천년의 고도(古都) 출신이라 자부한 씨이고 보면(미당은 신라천년의 폐도(廢都)라 했거니와) 고인(古人)의 이름이나 살던 동네에 연유한 東里가 마음에 들었을 뿐 아니라 그것이 실은 씨의 백씨의 지으심이라 함에 또 다른 모종의 무게를 놓고 있음이 드러나지요.
백씨인 데도 씨는 꼭 ‘범부(凡父) 선생’이라 적었지요. 만일 한글로 써야할 경우 씨는 반드시 ‘범보 선생’이라 적었지요. 父란, 사내 아름다울 ‘보’인 까닭. ‘용비어천가’를 배운 사람이면 누구나 아는 사실. 이 범보 선생의 족명은 기봉(基鳳), 호적명은 알지 못하나 저술 및 사회활동(국회의원)에서 사용된 이름은 정설(鼎卨). 해방공간의 저 좌우익의 소용돌이 속에서 문학가동맹과 맞선 우익단체인 전조선문필가협회의 명단 첫머리에 놓인 인물이 바로 김정설입니다. 그 외곽 단체인 청년문학가협회의 두목이 김동리였고.
이야기가 한참 무슨 포(浦)로 빠졌군요. 눈과 확 트인 들판이 좋아 한설야(韓雪野, 본명 병도)라 할 수도 있고, 또 무슨 곡절이 있어 임화(林和, 본명 인식), 김남천(金南天, 본명 효식)이라 할 수도 있겠지요. 김여수(金麗水, 본명 박팔양)라는 석자로 된 경우도 있습니다. 황순원씨처럼 본명으로 일관하는 경우도, 최재서 모양 석경우(石耕牛), 석조경조(石造耕造), 석조경인(石造耕人) 등 어느 쪽이 아호이고 또 창씨개명인지 모를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저마다의 곡절과 사연이 깃들여 있음에 아호랄까 필명이 지닌 의의가 있겠지요.
그런 작가 및 작품을 좋아하는 독자인 우리의 처지에서 보면 본명뿐 아니라 아호의 유래나 그 곡절까지 안다면 한층 친근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호만 알고, 그 아호의 곡절을 모르는 경우가 있다면 어떠할까요. 어리석은 우리 독자로서는 조금은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작가 쪽이 평소 아무런 실마리도 남겨놓지 않은 경우도 있을지 모릅니다. 공부가 부족해서 그런 단서가 있는데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어느 쪽인지 잘 알지 못하나, 그런 사례의 하나로 可山을 들 수 있을까요.
‘메밀꽃 필 무렵’(1936)의 작가 이효석의 아호임은 모두가 아는 사실. ‘메밀꽃 필 무렵’을 쓴 다음해까지만 해도 씨에겐 아호가 없었지요(‘삼천리’, 1937. 1, p. 224). 이광수를 비롯, 중요 문사 29명을 대상으로 한 이 설문에서 이효석은 분명 아호 없음을 표나게 드러내놓고 있지 않겠습니까. 可山이란 아호는, 아마도 썼다면 그 후이겠지요. 매우 딱하게도 可山에 대한 씨 자신의 설명을 찾아내기 어렵군요. 자료 부족 탓인지, 씨가 아무런 단서도 남기지 않았는지는 모릅니다. 혹시 씨의 고향 근처의 산 이름일까요. 그곳에서 물어보아도 무슨 실마리가 없더군요. 혹시 씨가 좋아하는 외국 작가에 관련된 것일까요. 바이런의 ‘카인’에 심취해서 스스로 可人 또는 假人이라 한 소싯적 벽초 모양 말입니다.
작가론으로 고명한 유진오씨의 ‘작가 이효석’(‘국민문학’, 1942. 7, 일문)에서도 다만 ‘작가 이효석’ 또는 ‘氏는…’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나, 추도문의 성격을 띤 또 다른 글에서 유진오씨는 이렇게 써놓았군요. “지난 5월25일 날 새벽 可山 李孝石은 36세의 젊은 나이로 다채한 일생을 끝막았다”(‘마지막 날의 이효석’, 한글, ‘大東亞’, 1942. 7, p. 124)라고.
평소 이효석과 가장 친밀한 친우라 천하에 소문난, 또한 명석하고 정확하기로 소문난 유진오씨가 ‘可山’이라 해놓았던 것. 그러고 보면 可山이란 한층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지상중계] 제12회 나지포럼, “북미 정상회담 성과내기 어려워”](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43/48/32/69434832107aa0a0a0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