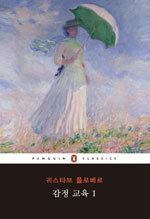
‘감정 교육’<br>G.플로베르 지음, 김윤진 옮김, 펭귄클래식코리아, 전 2권
트루빌에 가려면 삼십 분 더 가야 했다. 몇몇 동행인이 에콜 절벽에 가기 위하여 걸음을 재촉했다. 그곳은 바로 밑에 배를 내려다볼 수 있는 절벽이었다. … 모두들, 왼쪽에 도빌 마을과 오른쪽에 르아브르 항구가 있고 정면에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휴식을 하였다. 바다는 햇살에 빛나 거울처럼 매끄러워 그 출렁이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고요했다. -G.플로베르, ‘단순한 마음’ 중에서
모파상을 비롯해 아니 에르노, 파스칼 키냐르 등의 노르망디 지역이 현대 소설사에서 성좌를 이루는 것은 플로베르라는 거목의 영향임을 부인할 수 없다. 루앙 근처의 리(Ry)라는 작은 마을에서 실제 일어난 가정비극사건을 소재로 창작된 ‘마담 보바리’(1857)는 문외한의 눈으로 보면 통속소설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만, 세계 소설사를 플로베르 이전과 이후로 나눌 정도로 획기적인 작품이다. 보통 여자보다 예민하고 지적 허영심이 강한 엠마라는 여인의 꿈(욕망)과 환상의 비극으로 요약되는 이 소설에서 ‘보바리즘’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했고, 보바리즘은 ‘욕망의 화신’, 곧 현대인의 초상을 설명할 때 필수적인 참고점이 돼왔다. ‘마담 보바리’의 대성공 이후 플로베르는 사랑을 기저로 한 회심의 역사 장편에 돌입하는데, 이름 하여 ‘감정 교육(L‘Education sentimental)’(1869)이다.
마침내 배가 출발했다. … 갓 대학입학 자격시험에 합격한 프레데릭 모로는 노장-쉬르-센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법학 공부를 하러 떠나기 전까지 그는 그곳에서 두 달 동안 지내기로 되어 있었다. 그의 어머니는 여정에 딱 필요한 돈만 주며 행여 유산 상속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희망에 그를 르아브르에 있는 백부에게 보냈고, 그는 겨우 전날에야 그곳에서 돌아온 터였다. 그래서 가장 먼 길을 돌아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수도에 머물 수 없었던 아쉬움을 달랬다. - G. 플로베르, ‘감정 교육’ 중에서
주인공 프레데릭 모로는 플로베르 소설의 여느 주인공처럼 노르망디 출신이다. 그의 고향 트루빌은 플로베르가 14세 때 방학을 맞아 가족과 함께 갔다가 열 살 연상의 유부녀 엘리자 슐레징거를 처음 만난 곳. 플로베르는 루앙의 크루아세라는 센 강가의 한적한 별채에 평생 은거하며 소설에 몰두했는데, 몇몇 노르망디의 고장 중 트루빌을 끔찍이 사랑했다. 트루빌 해안가에 있는 플로베르의 멋진 동상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다.
‘그(플로베르)가 지닌 감상적인 정서와 너무나 생생한 미학은 트루빌 사람들의 것이었다.’
트루빌 옆 동네 도빌의 롱샹 경마장 맞은편 언덕에는 플로베르 가문의 별장이 있는데(이후 시에 기증했다), 그곳은 루앙의 명문가 플로베르네가 바캉스 때 머무는 곳이었다. 소년 플로베르는 트루빌로 가족 소풍에 나섰다가 누군가의 아내이자 갓난아이의 엄마, 20대 중반의 매혹적인 여인인 엘리자 슐레징거를 보았고, 그때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기묘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소년 플로베르가 여인의 아름다움에 처음 눈뜨는 순간이었다.
이후 플로베르는 평생 독신으로 살며 많은 여인에게 불규칙적으로 열정을 바쳤는데, 마지막까지 편지로 우정과 연정을 나눈 루이즈 콜레 부인에게 토로한 바에 의하면, 그에게 첫사랑이자 영원한 사랑은 트루빌에서 만난 엘리자 슐레징거뿐이었다. 열네 살 소년 플로베르의 혼을 앗아간 이 여인은 그로부터 30년 후인 1864년 소설의 주인공으로 호출돼, 작가 나이 47세 때(1869년)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 갓 파리 법대에 입학한 프레데릭 모로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배에서 마주친 여인의 모습으로!
마치 유령인 듯싶었다.
그녀는 긴 의자 한가운데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게 아니라면 그를 향한 그녀의 시선에 눈이 부셔, 그가 다른 사람은 전혀 보지 못했던 것이든지. 그가 스쳐 지나가는 것과 동시에 그녀가 고개를 들었고, 그는 자신도 모르게 어깨를 움찔했다. … 그녀는 바람에 나풀거리는 분홍색 리본이 달린 커다란 밀짚모자를 뒤로 넘겨쓰고 있었다. 모자의 검은색 끈은 그녀의 긴 눈썹 끝을 감돌아 아주 낮게 드리워지며 갸름한 그녀의 얼굴을 다정하게 누르는 듯했다. … 그녀는 무언가에 수를 놓는 중이었다. 오똑한 코, 턱, 그녀의 모든 것이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뚜렷이 떠올랐다. … 그는 그렇게 찬연하게 빛나는 갈색 피부, 매혹적인 몸매, 빛이 통과할 듯한 섬세한 손가락을 본 적이 없었다. - 앞의 책 중에서
첫사랑 ‘그녀’를 소설에 어떻게 등장시킬 것인가. 모든 사랑 이야기의 첫 장면을 훔쳐보는 일이란 소설 읽기의 즐거움에서 최고의 미덕. 열네 살 소년 플로베르를 사로잡았고, 죽을 때까지 마음에 품고 살게 한 여인 엘리자 슐레징거, 아니 아르누 부인. 이 순간을 위해 소설이 쓰였을 정도로 작가도 독자도 숨을 죽이게 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단어 하나, 쉼표 하나 예사롭지 않지만, 어딘지 낯익은 장면, 낯익은 감정을 느끼게 된다.
첫사랑의 설렘과 황홀
누구의 사랑인들 이만한 홀림과 꽂힘, 그리하여 설렘과 황홀의 충격이 없으랴. 모든 사랑의 첫 만남, 첫 장면은 유사한 환각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토록 자연스럽게 독자의 의식에 들어와 마치 자기의 그것처럼 감쪽같이 느끼게 그리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문학사가들은 플로베르가 최초라고들 한다. 그러니까 적절한 순간에 독자가 소설의 주인공이 되도록 극적으로 묘사해나가는 문체야말로 ‘플로베르 그 자체’라고. 문체, 곧 스타일, 작가의 이름에 값하는 스타일의 창조!
스타일리스트 플로베르의 ‘감정 교육’은 아르누 부인이라는 한 여성을 향한 프레데릭 모로의 열렬하고도 헛된 사랑의 역사를 배경으로 혁명 이후 근대로 접어든 1836년 무렵의 혼란한 파리를 세밀화로 포착해낸 ‘플로베르식 고현학(考現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이 소설은 한갓 연애소설이자 역사소설의 범주를 넘어서는데, 고현학적 방법론을 독창성으로 획득한 세계문학사의 천재들, 곧 샤를 보들레르의 ‘악의 꽃’(파리)이나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즈’(더블린)와 등가를 이룬다.
노르망디 지방의 작은 마을들을 소설 속에 지난하게 그렸던 플로베르의 눈은 ‘감정 교육’에서 비로소 파리로 향하고, 파리는 스타일리스트 플로베르의 카메라와 같은 정교한 필치로 새로운 장(場)을 열게 되는 것이다
평소에는 시끌벅적하지만 그 기간에는 학생들이 다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한적한 라틴구를, 그는 발길 닿는 대로 거슬러 올라갔다. 침묵으로 길게 뻗은 것 같은 학교의 커다란 담들은 더욱 더 나른한 모습이었다. 그래서 새장 속의 새가 날개 치는 소리, 선반 기계가 내는 가르릉거리는 소리, 구두 수선공의 망치질 소리, 온갖 평화로운 소리들이 들려왔고, 거리 복판에는 옷장수들이 헛되이 모든 창문을 힐끔거렸다. 손님 없는 카페들 안쪽에는 카운터에 앉은 여주인이 물을 채운 물병들 사이로 하품을 하고 있었고, 열람실 책상 위에는 신문들이 정연하게 놓여 있었다. 세탁소 안에서 세탁물들이 미지근한 바람의 입김 아래 떨리고 있었다. 이따금 그는, 고서적상이 늘어놓은 책들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승합마차 한 대가 보도 위를 스치듯 달려 내려오는 바람에 그는 돌아섰다. 그리고 뤽상부르 앞에 도달하자, 그는 더 멀리 가지 않고 발걸음을 멈췄다. -앞의 책 중에서
프레데릭 모로가 걸어가고 멈추고 다시 걷고 돌아서며 바라보는 파리의 길에 따라 파리의 냄새, 파리의 취향, 파리의 현실, 파리의 형상이 되살아난다. 이렇게 보면, 소설이란 별것 아니다. 우리가 보고 겪는 삶의 세부들을 집요하게, 그러면서 스타일을 갖춰 가지런하게 풀어내면 된다. 그것이 소설이라고 조이스는, 또 박태원은, 또 그들의 선조인 보들레르와 플로베르는 각각 ‘율리시즈’로,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로, 또 ‘악의 꽃’으로, 그리고 ‘감정 교육’으로 웅변하지 않는가! 이 봄, 파리가 궁금하다면, 플로베르가 창조한 ‘감정 교육’의 프레데릭 모로의 행보를 쫓아볼 일이다. 플로베르 스타일로, 21세기의 플라뇌르(flaneur·한가로이 도시를 떠돌듯 걸어 다니기 좋아하는 산책자/필자 주)가 되어!




















![[밀착취재] 리딩방 70여 명 대부분이 한통속…기망하는 수법까지 매뉴얼화](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48/98/bd/694898bd2399a0a0a0a.jpg)


![[지상중계] 제12회 나지포럼, “북미 정상회담 성과내기 어려워”](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43/48/32/69434832107aa0a0a0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