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경제개혁의 원동력은 인민의 춥고 배고픔을 해결해야 한다는 간단한 명제에서 나왔다.
- 이를 둘러싼 경제학계 7개 학파의 치열한 논쟁은 1980~90년대 중국경제가 자본주의를 받아들여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 7개 학파의 수장(首長)들과 그들의 이론체계를 알아본다.

덩샤오핑은 실사구시의 관점으로 돌아갈 것을 역설했다.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골몰하지 말고 당장 필요한 것을 실행하자는 것. 덩은 당시 중국의 당면과제로 이른바 원바오(溫飽) 문제해결을 들었다. 먼저 인민의 춥고 배고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당면한 개혁·개방의 최우선 과제라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했다. ‘원바오’. 이 간결한 문자로 중국개혁·개방의 당면 방침이 정해진 셈이다. 이후의 과정은 중국에서 흔히 쓰는 말 그대로 “상부에는 정책이 있고, 현장에는 대책이 있다”는 식의 강한 추진만이 남아 있었다.
춥고 배고픔을 해결하라
1976년부터 1984년까지 중국 대륙 전역에서 사상 초유의 개혁적 실험들이 펼쳐졌다. 흔히 가장 큰 성과로 평가하는 ‘경제특구’ 정책을 제외하고도 이 시기에 진행된 농촌, 기업체제에서의 일련의 정책들은 중국의 체제변화에 중대한 돌파구를 마련했다. 특히 평가해야 할 부분은, 이 시기에 중국 국민경제 운영의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했다는 점과 지도부가 경제 발전에 대한 인식에서 과거의 낡은 사고를 떨쳐냈다는 점이다. 이 과정은 ‘문화대혁명’ 정리기에 잔존했던 낡은 좌파적 잔재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것이다.
이 결과 1984년 이후 1992년까지 중국은 낡은 사상에서 완전히 탈피하고 개혁·개방의 성과를 제도화하기 위한 기나긴 모색에 돌입하게 된다. 이 시기에 정책적 목표와 수단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사이 중국의 경제가 급속도로 팽창하면서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왔다. 현실은 더욱 체계적이고 계획성 있는 방향제시를 요구했다. 이 과정은 당시 중국사회에 만연했던 ‘사상해방’ 풍조와 맞물리면서 중국 경제학계에 체제개혁 모형과 관련된 7대 학파의 개화를 이루어냈다.
좀 따분하더라도 중국 경제학계 7대 학파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중국 경제개혁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 이 7대 학파의 기본 주장을 차근차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징롄(吳敬璉)과 조절개혁파
조절개혁파의 기본사상을 알기 위해선 먼저 우징롄이라는 인물에 대해 알아야 한다. 우징롄은 일명 ‘우스창(吳市場)’으로 불릴 정도로 시장경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사람이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국유기업의 민영화에는 반대 의사를 밝히는 등 균형감을 갖춘 인물로 평가된다.
주룽지(朱鎔基) 총리와 막역한 사이로 알려진 그는 주총리의 유력한 정책 조언자이다. 1930년 장쑤(江蘇)성 난징(南京)의 신문 재벌 집안에서 태어나 푸단(複但)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중국과학원의 경제연구소에 오랫동안 몸담았다. 1984년부터 국무원 발전연구센터에 적을 두고 있다. 제9기 전국 정협(政協) 의원을 지냈을 뿐만 아니라 대중적인 지명도 역시 상당해 2001년 중국 IT 업계 종사자가 뽑은 최고의 경제학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러한 기본이론에 근거해 조절개혁파는 다음과 같은 전략적 주장을 펴나갔다. 개혁은 시장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우선 사회주의경제는 계획적 상품경제다.
그러나 시장경제는 고도로 사회화되고 현대화된 상품경제 개념이다. 시장을 중심으로 개혁을 진행한다는 전제에서 단일한 가격개혁만 추진해서는 안된다. 당연히 가격, 세무, 재정, 금융, 무역개혁을 중심으로 기업, 시장, 거시조정 세 범주가 서로 조응하는 개혁을 진행하여 거시 관리적 시장경제체계가 빠른 시일 내에 작동하게 해야 한다.
개인소유권파는 마르크스·엥겔스의 과학적 사회주의 이론에서 제기한 노동에 의한 분배는 현대 경제의 특징인 생산의 다양한 발전으로 존재조건을 잃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사회주의가 지속적으로 발전하자면 노동자 개인소유제도의 기초에서 소유권구조를 개혁해야 하며 민권도 새롭게 규정하는 등 국가권력의 조직과 운행구조의 개혁이 필수적이다. 중국개혁의 핵심은 노동자 개인소유제의 기초에서 소유권을 새롭게 건립하고 공민의 신분특권과 의구심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사적 소유권파는 홍콩의 장우창 교수를 위주로 하는데 그들은 오직 사적 소유권 제도만이 중국경제발전을 촉진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한다. 그들의 이론은 주로 현대서방소유권 이론으로서 중국의 국정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는다.
소장학자 중심의 체제변혁파
체제변혁파는 주로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소장학파를 중심으로 좀더 급격한 변혁을 꿈꾸는 경제학자들로 구성되었다. 대표 인물로는 대만에서 망명한 것으로 유명한, 베이징대학 중국경제 연구센터의 린이푸(林毅夫), 천측경제연구소의 반캉(樊鋼), 장쉬광(張曙光) 등이 있다. 주로 미국 경제학계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이들은 중국 경제개혁의 최첨단 모델을 제시하며 경제 이론의 현대화에 공헌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체제변혁파는 아직 완전한 이론체계를 형성하지 못했으며 그들의 관점은 대부분 계발적인 것으로서 개혁의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된다고 평가받는다. 그 어떤 제도배치도 항상 최저교역비용을 보장할 수 없다. 모든 것을 포함한 시장과 모든 것을 포함한 계획은 자원의 배치에 불리한 영향을 끼친다.
우리는 당연히 시장, 기업, 정부(계획)의 교역비용이 최저영역에서 결합하는 방식을 찾아야 하는데 이것이 곧 시장과 계획의 유기적인 결합점을 찾는 것이다. 그리고 ‘흐트러뜨리는 개혁(分解改革)’과 ‘보충해주는 개혁(補貼改革)’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원가의 제약이라는 관점에서 개혁을 한번에 이루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지만 개혁원가의 지나친 확장을 초래하기에 우리는 한 걸음 늦추어서 차선의 분해개혁(分解改革) 방식을 선택하여 ‘점진적’과 ‘급진적’개혁의 최적화 조합을 찾을 수 있다.
‘보충해주는 개혁(補貼改革)’은 개혁을 실시하는 동시에 가능한 손해자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보상방식은 첫째는 ‘외자도입’으로 개혁이 성공한 후 다시 갚아주는 것이고, 둘째는 ‘국내외수(國內外授)’ 즉 효율이 비교적 높은 신 경제체제를 구 체제가 존재하는 전제하에 발육·성장시켜 신 체제수익의 증가로 구 체제수익의 감소를 메운다는 논리다. 즉, 주민들로 하여금 스스로 보상받게 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1984~92년 사이의 중국 경제학계는 체제모형을 둘러싼 다양한 견해들이 7개 학파를 이루며 활발한 논쟁을 전개했다. 이러한 논쟁은 때로 과열되어 중국사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도 했다.
이 시기에 중국 경제학계는 이론면에서나 그 구성면에서 현대적인 의미로 도약하게 되는데 이들 학파의 견해가 어떻게 현실에 투영되었고, 또 1992년 이후에는 어떤 형태로 발전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호에서 자세하게 다루겠다.
조절개혁파는 기업의 제도개혁은 반대하지 않지만, 단일한 기업개혁 중심론은 반대한다. 기업은 시장의 주체일 뿐만 아니라 시장관계의 총화이며, 시장을 떠나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현재 중·대형기업의 문제는 소유권이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이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시장화 개혁의 지연과 이로부터 형성된 현행 체제와 관련된 비능률성이다.
가격과 시장체계가 비합리적이고 공정경쟁 환경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은 행정기관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날 수 없고, 독립적 상품생산자가 될 수 없다. 때문에 국영기업의 개혁과 주식회사의 설립도 중요하지만 우선 가격개혁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절개혁파의 또 하나의 중요 인물인 저우샤오촨(周小川)은 가격개혁을 주장하며 세 가지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그가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방안은 △총수요를 통제하고 2, 3년 내에 가격개혁을 기본적으로 완성하는 것. △선(先)조절 후(後)방임. 즉, 원시상품의 가격을 높이고 가공생산물은 가치 증가율을 조건으로 풀어놓는 것. △세무체계를 합리화하여 통일된 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급여수준은 물가수준에 따라 일정하게 보상하되 엄격하게 통제해야 한다.
저우샤오촨은 가격개혁의 위험을 회피하는 것은 전체 개혁에 더욱 큰 부담을 주며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나는 장기적으로 두 가지 체제의 충돌이 존재하고 미성숙한 시장조건에서 부패한 관료주의 현상이 나타난다. 다음으로 경제가 후퇴하여 명령형 경제형태로 되돌아갈 수있다.
조절개혁파는 이 외에도 개혁을 위한 안정된 환경 조성과 신구체제의 조속한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조절개혁파의 시장경제론은 사회주의경제학의 발전에 크게 공헌했지만 급진주의 경향으로 짧은 기한 내에 가격개혁을 중심으로 여러 과제를 완성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리이닝은 중국의 유력한 경제학자이면서도 당과의 관계가 비교적 소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의 이론이 갖는 사회적 파급력은 리구펀(?股·주식)이라는 그의 별명처럼 상당하다. 특히 그의 명저 ‘불균형의 중국경제’는 발표 당시 중국 전역에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소유제개혁파는 ‘소유제 우선 개혁파’ 또는 ‘기업개혁파’라고 하는데 1980년대 이후 경제체제 개혁이론의 중요한 유파다. 그들은 전통적인 경제 운행기제만 바꾸고 소유제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사회주의 계획적 상품경제를 건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런 경제사상은 리이닝 교수의 ‘경제체제 개혁에 대한 탐색’ ‘불균형의 중국경제’ 등의 저서에 잘 나타나 있다.
소유제 개혁파는 “주식제도만이 기업의 재산관계를 명확히 하는 최적화 형식이다”고 말해왔다. 리이닝은 이미 1980년 4월 중앙정책연구실에서 주최한 좌담회에서 주식제도에 관한 이론을 제시했다.
“중국기업의 활동성이 부족한 근본원인은 재산관계가 명확하지 못한 데 있으며, 재산관계를 명확히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주식제도라고 표현했다. 여기에서 관건은 주식제도의 성질을 규명하는 문제다.”
주식제도는 현대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전하고 성숙하였기 때문에 흔히 자본주의의 성질을 띠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주식제도는 생산수단의 다원화에 대한 객관적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구별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성질은 주식을 구매하는 사람의 성질에 따라 결정된다. 주식제도는 다음과 같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생산요소의 합리적인 유통 △정부와 기업의 분리에 유리 △분산된 자금을 흡수하여 생산에 투입 △기업행위의 이성화와 단기적 투자행위 극복.
리이닝의 소유제개혁이론의 핵심은 “개혁은 당연히 기업개혁을 위주로 하되 중·대형 국유기업은 주식제도를 실시해야 하며, 미래 중국의 경제지주는 주식제도 기업집단이다”로 요약된다.
왕줘(王琢) 중심의 거시개혁 우선파
거시개혁우선파는 거시적 체제개혁을 핵심으로 시장의 운행기제와 기업 운행기제를 발전시켜 전면적으로 개혁을 심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대표적 인물은 왕줘(王琢)다.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사회주의 생산관계와 사회주의 국가직능의 반영과 실현이다. 그것은 국가 집단 노동자와 개체 경제조직이 사회재생산, 분배, 교환, 소비과정에서 얽히고설키는 상호관계에 대한 규정이다. 경제체제와 관련되는 가장 중요한 경제범주는 △생산관계 및 그 구체적인 형식 △국가의 경제직능 △경제제도 모형 △사회 생산형식이다.
생산관계 및 그 형식은 상술한 네 개의 범주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중국 사회구조의 기초가 된다. 국가의 경제직능도 아주 중요해 사회주의 경제직능은 국가에서 행사한다. 교과서 적으로 말한다면 경제모형은 시장경제제도 모형과 계획경제제도의 모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는 경제체제의 성질을 규정한다. 다른 한면으로 경제제도 모형은 경제체제가 어떤 사회조절 형식으로 국민경제의 운행을 조직하는가를 결정한다.
사회주의 경제체제모형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상품생산형식과 시장경제체제가 결합되어 상품생산의 시장경제체제 모형을 형성한다. △제품생산형식과 계획경제제도가 결합되어 제품생산의 계획경제체제 모형을 형성한다. 이것은 전형적인 소련 모형이다. △상품생산형식과 계획경제제도가 결합되어 상품생산의 계획경제체제 모형-계획경제와 시장조절이 결합된 경제체제 모형을 형성한다. 이것이 중국식 경제체제개혁의 목표 모형이다.
사회주의 상품경제 운행기제의 뜻은 정부의 효과적인 거시적 조절에서의 시장경영기제라는 데 있다. 사회주의 상품경제 운행기제를 세우려면 다섯 가지 개혁이 진행되어야 한다.
① 기업을 독립적인 상품생산자로 만들고 파산제도 도입
② 주식제도 도입
③ 정부와 기업 분리
④ 정부는 집중과 통일 원칙. 업종간 도시간의 협력
⑤ 생산수단시장, 자금시장, 노동력시장, 기술시장 등 관리
거시적 체제개혁은 개혁의 첫 자리에 놓여야 한다. 그러나 단면적으로 진행하지 말고 다른 여러 요소에 관한 개혁과 연관시켜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첫째로 재정, 금융, 세무, 계획, 투자 등 거시적 체제개혁을 완성해야 한다. 둘째, 조건이 구비된 후 가격개혁을 진행해야 한다. 셋째, 다시 투자체제개혁을 진행하여 투자실체의 다원화를 실행해야 한다. 즉 투자의 일부분은 기업에 내려보내고 다른 일부분은 국가에서 장악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우선 기업체제의 개혁이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 거시적 체제개혁과 기업체제개혁은 시장을 배양하고 시장기제를 실현하기 위한 준비과정이다.
거시개혁 우선파가 체제개혁 모형의 선택에서 계획경제와 시장조절의 결합을 견지한 것은 정확한 견해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기업체제개혁과 거시적 체제개혁을 동등하게 중요한 지위에 놓은 것은 그들의 주장과 모순되며 거시적 체제개혁의 구체적 실행절차와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도 공통된 평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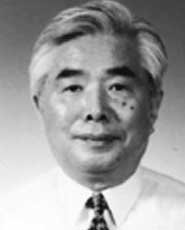
류궈광은 1923년 장쑤성 난징에서 태어났다. 1941년 서남연합대학 경제학과를 거쳐 칭화대학 연구원에서 공부했다. 톈진(天津) 난카이(南開)대학 조교와 난징중앙연구원 사회연구소에서 연구했으며, 1951년 모스크바 경제대학에서 부박사(석사) 학위를 받았다.
귀국 후 중국과학원 경제연구소에서 연구활동을 했으며 후에 경제연구소 소장을 지냈다. 1981년 국가통계국 국장, 1982년 중국사회과학원 부원장을 지낸후 당의 12~13대 후보 중앙위원에 피선됐다. 1993년부터는 중국사회과학원 특별고문을 지냈고, 8기 전인대 상무위원을 지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중국 경제정책의 핵심 문구인 ‘과열 방지’ ‘안정 속의 발전’ ‘연착륙’ 기조의 주요 주창자다.
이런 전제에서 콴쏭학파의 핵심 주장인 신·구 이중체제의 병존과 목표모형의 건설이론은 다음과 같다. 중국경제현실을 고려하면 체제개혁은 반드시 점진적이어야 하며 일정한 기한 내에 신구 경제체제가 병존해야 한다.
현 단계의 2중 체제가 주관적인 조건에서 가진 장점은 다음과 같다.
△개혁을 제때에 진행할 수 있다.
△개혁의 충격 완화가 가능하다.
△개혁과 경제성장을 이루며 개혁이 경제성장에 주는 장애를 피할 수 있다.
△경험을 축적하고 개혁인재를 키울 수있다.
객관적인 조건에서 지적할 점은 다음과 같다.
△중국은 이원적 경제구조이며 도농(都農)간, 지역간 발전이 불균형적이다.
△개혁범위가 크다. 농촌으로부터 도시로, 연해로부터 내륙으로 소수시점 기업으로부터 전국의 각개 기업에 대해 점차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경제성장 모형과 발전 수준의 제고, 경제구조의 합리화, 국가 조절직능의 변화는 모두 시간을 요구한다.
△정치적 지원이 제한되어 점진적 방식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중체제를 목표모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콴쏭학파 개혁이론의 핵심이다.
먼저 기업·시장·거시적 관리 이 셋의 관계를 잘 처리하여 각 방면의 개혁이 상보적일 수 있게 해야 한다. 우선 기업개혁을 진행하여 기업의 활력을 증강시켜야 한다. 이것은 전반 경제체제개혁의 중심이다. 둘째로 동시에 거시적 관리에 시야를 돌려 국가로 하여금 경제수단을 이용하여 간접적 관리를 진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경제발전과 경제체제 전환모형의 관계를 정확히 규명하여 체제변혁 진행과정에 지속적이고 온건한 경제의 발전을 보장해야 한다. 경제발전모형과 체제모형은 모두 일정한 역사조건에서 나온 산물이다.
낙후한 경제조건에서의 경제발전 모형은 ‘양적성장’과 ‘산발적’ 형태에서 경제발전에 따라 점차적으로 ‘효율적’ ‘집약적’으로 바뀌게 된다. 경제발전 모형과 경제체제 모형전환에 있어 장기성, 점진성과 상호제약성은 콴쑹학파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1990년대에 들어선 후 지방정부의 결정권이 강화되고 이익이 팽창함으로써 국가의 거시적 조절능력이 약화됐으며, 체제개혁의 심화를 방해했다. 여기에 대하여 콴쏭학파는 다음과 같은 대책을 제기했다.
첫째, 국가 소유권 조직을 조속히 건립하여 기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지나친 간섭을 억제하고 기업개혁의 조건을 창조한다. 은행의 독립화를 추진하고 중앙정부의 화폐관리 결정권을 강화하며, 지방정부의 신용대부활동에 대한 지나친 간섭을 방지한다. 둘째로 세무 개혁을 진행하여 지방정부에서 재정을 도맡는 현상을 없애고 중앙과 지방의 세금을 나누는 분세제를 실시한다.
셋째,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강제적 기초시설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통해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을 약화시키고 지방정부가 경제생활에 불필요하게 간섭하는 것을 감소시킨다.
넷째, 점차적인 긴축정책으로 산업구조를 조정하면서 사회보장체계가 완전히 건립되기 전에 기업부도와 실업으로 인한 사회의 불안정 요소들을 피한다.
다섯째, 통화팽창을 통제해야 한다.
여섯째, 수요에 대한 관리와 공급에 대한 관리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주식제도 개조사업을 잘하고 주식시장을 성숙시켜야 한다.
종합하자면 콴쏭학파는 비교적 전면적으로 경제개혁이란 현실요구를 반영하였고 미·거시적 두 차원에서 계획과 시장의 결합문제와 계통적인 개혁설계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에도 여러 부족한 점들이 존재하며 일부 관점은 비현실적이라는 반론도 있다.
량페이신은 별명이 ‘량청바오(梁承包)’라 불릴만큼 청파오 제도의 대표적인 신봉자다. 흔히 얘기하는 유지화(有計劃), 우스창(吳市場), 량청바오(梁承包)의 중의 일인이다. 1922년 광둥(廣東)에서 태어나 중화대학 공상관리학과를 거쳐 충칭(重慶) ‘전시청년’ ‘신호북일보’ ‘상무일보’ 등에서 기자, 주편으로 일했으며 1948년 홍콩 ‘문회보’를 창간했다. 국무원 발전연구센터의 연구원으로 있다.
경영권 주도개혁파의 핵심이론은 ‘국영기업의 양권분리 모형’과 ‘청바오제’에 있다. 그들은 청바오제의 특징과 중국에서 실시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바오제는 공동소유제도를 견지하는 조건에서 공동소유제의 소유자와 경영자가 체결한 도급합동을 통해 책임과 권리를 명확히 하는 제도이다. 정부와 기업소의 직책을 구분하고 소유권과 경영권의 분리를 실현함으로써 기업소를 경영자에게 맡겨 생산자가 자체로 경영하게 하는 경영 방식이다.
중국에서 청바오제를 실시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 다섯 가지다.
① 소유권 변혁의 현실적 곤란이다. 소유제 개혁은 두 가지 방향이 있을 수도 있다. 하나는 비 국영경제의 발전을 고무하고 다른 하나는 현행 국가소유제도에 대하여 개혁을 진행하는 것이다. 주식제로 국영기업을 개조하려면 비교적 긴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의 개혁이 서로 어울려야 한다. 이로부터 국가소유제도를 견지하는 틀 속에서 역량을 집중하여 경영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비교적 합리적인 방법이다.
② 생산력발전이 불균형적이다. 청바오제는 서로 다른 기업, 지구, 업종, 관리수준에 적응할 수 있다.
③ 시장기제가 불완전하다. 시장발육이 불완전한 조건에서 기업을 시장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가격이 불합리하면 기업소의 이익차이가 커지고, 요소시장이 발달하지 못하면 자원의 최적화배치를 실현하는 데 어려우며 평균 이윤율이 형성되기 어렵다. 때문에 정부와 기업이 청바오 계약을 체결하는 것만이 실제적인 선택이다.
④ 거시적 조절의 수요이다. 국가에서는 세금징수와 같은 규범형식, 또는 도급기초금액과 비율 등 비규범화 방식으로 기업에 대하여 조정·관리를 진행할 수 있다.
⑤ 상품경제발전의 개관적 수요다. 청바오제는 상품경제가 발달하지 못한 중국현실에 부합된다.
량페이신은 청바오제가 국가·기업·노동자 삼자의 관계를 정확히 처리하였기에 전반 사회주의경제 개혁기간에 시종 일관되게 실시해야 하며 사회주의 기업체제의 최적화 선택이라고 하였다. 문제는 청바오제가 진정 양권 분리를 실현하고 정부와 기업을 분리하며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점이 될 것이다.
탕펑이 중심의 소유권 개혁파
소유권 개혁파는 1980년대 말기에 형성되었는데 그 후 커다란 발전을 이루었으며 중국의 경제개혁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그들의 이론은 국영기업에 대한 양권이 분리된 청바오제도 개혁으로부터 제기되었다.
공동소유권파의 구체적 개혁방안에서 톈위안(田源)이 제기한 ‘소유권계정-소유권경영-소유권 양도 개혁방안’과 ‘이중 주식제도 개혁 방안’으로 나눌 수 있다.



















![[밀착취재] 리딩방 70여 명 대부분이 한통속…기망하는 수법까지 매뉴얼화](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46/2f/27/69462f270feda0a0a0a.jpg)
![[르포] “농사짓다 다치면 예천 찍고, 안동 돌고, 대구 간다”…경북 의료수난史](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45/0a/a7/69450aa70243a0a0a0a.jpg)
![[특집] 희망으로 채운 여정, 사랑으로 이어진 발자취](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45/0b/21/69450b211cfca0a0a0a.jpg)
![[지상중계] 제12회 나지포럼, “북미 정상회담 성과내기 어려워”](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43/48/32/69434832107aa0a0a0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