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7월25일 이탈리아 로마 빌라 톨로니아에서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작은 음악회가 열렸다.
결국 7월 말 나는 무개차는 아니었지만 관광버스를 타고 가족과 함께 산타루치아를 지나 포지타노 인근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관광 가이드는 차내 방송으로 파바로티가 부르는 ‘산타루치아’를 들려줬다. 시리도록 푸른 바다, 맑은 하늘과 따가운 햇볕. 오감이 모두 날름거렸다.
전날 밤엔 로마 시내 빌라 톨로니아(Villa Torlonia)에서 열린 작은 음악회에 갔다. 이탈리아에 도착하기 전 인터넷 서핑을 하다 우연히 알게 된 음악회였다. 1인당 21유로씩 주고 티켓 네 장을 예매했다.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Sotto Il Cielo Stellato)’라는 콘서트 제목이 마음에 들었다. 연주자는 별로 유명하지 않았지만 리스트와 쇼팽의 피아노곡들이 연주된다니 서정적인 저녁 한때를 보낼 수 있겠거니 생각했다.
공연장이 있는 빌라 톨로니아는 신고전주의 양식의 건물들이 들어서 있는, 로마에서 대표적인 정원 가운데 하나다. 19세기 초 은행가 톨로니아가 건축한 이 정원은 한때 궁전으로도 쓰였다. 1920년대 독재자 무솔리니는 이 가문에 상징적으로 1년에 1리라의 집세만 내고 이 거대한 정원을 독차지하고 살았다.
빌라 톨로니아 안 ‘올빼미의 집(Casina delle Civette)’으로 불리는 예쁘장한 건물의 아치형 테라스가 공연장이었다. 말 그대로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였다. 관객은 할머니 네 분, 할아버지 세 분, 젊은 남녀 한 쌍이 전부였다. 그들은 난데없는 동양인 관객의 등장에 좀 의외라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의자에는 우리 가족 네 명의 이름이 하나씩 붙어 있었다. 이름표를 떼고 의자에 앉자 좀 허탈한 기분이 들었다. 아이들의 입이 뽀로통하게 튀어나온 것을 애써 피하며 여기저기 둘러보았다. 고풍스러운 건물과 아름드리 나무, 드문드문 반짝이는 하늘의 별들 때문인지 분위기는 제법 운치가 있었다. 이제 이런 시각에 어울리는 ‘청각’이 나올 차례였다.
저녁 8시 30분쯤 잘생긴 백인 남자 피아니스트가 등장했다. 표를 예매할 때 자세한 레퍼토리가 소개돼 있지 않았지만, 어떤 곡이든 괜찮다고 생각했다. 공연 제목에 걸맞은 곡들이 나오겠거니 했던 거였다. 그런데 첫 곡이 리스트의 ‘장송곡(Funerailles)’이었다. 이 곡에 대해 시적이고 종교적인 영감을 준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지만 어쩐지 그 순간과는 좀 어울리지 않았다. 피아니스트 마르타 아르헤리치가 연주한 이 곡을 들을 때와는 느낌이 너무 달랐다. 몇 분 지나지 않아 아이들은 몸을 비틀고 신음을 내기 시작했다. 아이들에게 참으라고 눈에 힘을 줘보지만 어찌할 수 없었다. 두 번째 곡은 리스트의 ‘오버만의 골짜기’(Valee d Obermann). 이 역시 도입부는 좀 어려웠고, 리스트에게 미안한 얘기지만 이날은 수면제가 따로 없었다. 내 눈꺼풀도 무거워져왔고, 아이들과 아내는 졸기 시작했다.
세 번째 곡 연주가 물 흐르듯 자연스럽고 가볍다 생각했는데, 쇼팽의 녹턴 9번이다. 계속되는 쇼팽의 왈츠곡들. 아내도 아이들도 깨어나고, 별들도 눈을 반짝였다. 왈츠 64번의 두 곡, ‘화려한 왈츠’로 불리는 34번의 세 곡이 나올 때 아이들의 박수소리도 커졌다. 왈츠 A단조 19번(posthumous)은 이날 분위기와 가장 잘 어울렸다. 세상을 자기 맘대로 다스렸던 독재자가 몸소 자신의 처소로 점찍은 곳에서 아무런 중압감도 없고, 자유로운 상태로 쇼팽의 피아노 선율에 몸을 맡겼다. 전날 로마 공항 수하물 찾는 곳에서 감쪽같이 사라진 여행가방에 대한 생각도 모두 잊었다(가방은 공항 직원 실수로 스페인으로 갔다가 이틀 만에 돌아왔다).
#2 바로크 음악과 미술의 만남
지난 5월 말 후배가 건네준 음악회 티켓을 보니 ‘바로크·로코코 시대의 궁정문화 전시 기념 바로크 음악회’라는 제목이 눈에 띈다. 그 시대의 유물을 보고, 그 시대 음악을 듣는다는 발상이 흥미로워 음악회에 꼭 가겠다며 고마워했다. 전시회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5월3일부터 8월28일까지 이어지지만, 음악회는 박물관 안 소극장 용에서 6월2일 단 1회만 열렸다.
먼저 전시회에 들렀다. 영국 빅토리아·알버트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 가운데 17~18세기 유럽 군주들이 소장했던 예술품들이 주를 이뤘다. 당시는 순도 높은 분말을 코로 들이마시는 코담배가 유행했던 시절이다. 프리드리히 대왕은 300개가 넘는 코담뱃갑을 모았는데, 그 가운데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초록색 코담뱃갑은 ‘섹시하게’ 아름다웠다. 태양왕 루이 14세가 소유했던 상아로 만든 초상 조각도 압권이었다. 작은 조각에 부모와 아내, 태양신 아폴로를 형상화해 자신의 이미지를 구축하려 했던 의도가 읽혔다.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온 킨타 포르모사 음악실의 타일 그림 앞에 섰다. 클라리넷과 바이올린 연주자가 배경에 있고 깃털 장식 모자를 쓴 귀족과 귀부인이 막 춤추기 시작하는 장면이다. 실제로 그 그림 안에서 연주하는 음악이 들리는 듯했다. 전시회 공간에는 계속해서 바흐 헨델 등 바로크 시대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그것과는 구별되는 멜로디였다. 여기서도 시각과 청각이 공명하는 순간이었다. 어차피 바로크음악이라는 말도 미술에서 먼저 쓰인 바로크양식을 빌려 쓴 것이라고 한다. 음악과 미술 사이에는 어떤 숙명적 끈이 연결돼 있는 듯하다.
저녁 7시 서울바로크합주단(음악감독 김민)이 연주한 바로크 음악회에선 텔레만의 ‘돈키호테’,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의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하라’가 이어졌다. 마지막을 장식한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5번’은 솜털처럼 부드러운 플루트가 쳄발로와 오케스트라를 이끌어나갔다. 연주회 내내 바로크 시대로 시간여행을 가능하게 한 것은 쳄발로였다고 생각한다. 만약 이 악기가 없었다면 그 시대의 음색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 외형은 피아노와 비슷하지만 음을 내는 원리에서는 오히려 현악기에 가까운 이 악기가 새삼 소중해 보였다.
#3 근육과 공감각으로 듣는다
지난해, 그리고 이번 여름의 일들을 추억한 것은 공감각(共感覺·synesthesia)에 대해 말하기 위해서다. 공감각은 사전적 의미를 보면 하나의 감각이 또 다른 감각을 일깨우는 것이나 그런 상태를 말한다. 이미 우린 ‘푸른 종소리’니 ‘시끄러운 그림’ 같은 공감각적 표현에 익숙하다. 예술이나 심리학 문학에서 공감각을 중요하게 여겨 끌어안은 사람이 적지 않다. 나바코프는 공감각을 여러 소설에서 사용했고, 칸딘스키와 몬드리안은 그림에 이미지와 음악의 관련성을 담았으며, 스크리아빈은 컬러 음악을 작곡했다.
CBS 데이비드 콘 기자에 따르면(2009년 2월11일자 인터넷판 보도) 뉴욕에서 활동하는 화가 캐럴 크레인은 “발목에서 항상 기타 소리를, 얼굴에선 바이올린 소리를” 느낀다. 그녀는 모든 영어 스펠링도 색깔을 갖는 것으로 느끼는데 “Z는 맑고 강한 에일(ale) 맥주 색깔”로 파악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콘서트에 가서 단순히 연주를 듣지만, 캐럴 크레인은 실제로 모든 악기, 모든 음조를 세밀하게 느끼는데 그녀에게 이 공감각은 일종의 영감이다. 그녀는 자신이 음악을 미술로 ‘번역한다’고 말한다.
공감각은 누구나 경험하는 세계다. 이 복합적인 감각을 개발해 음악을 들을 때 그 긍정적 영향을 좀 더 많이 받게 되지 않을까. 음악의 의미에 대해 탐색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결코 음악을 귀로만 듣는 건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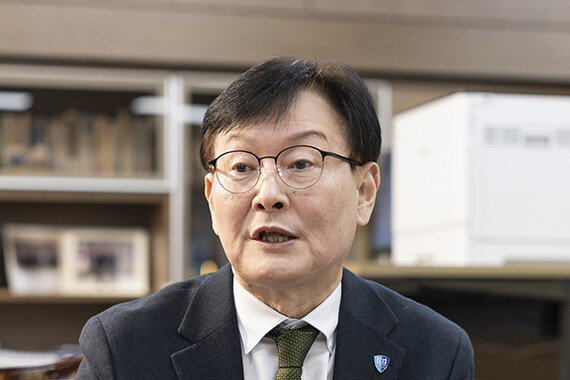


![[밀착취재] 리딩방 70여 명 대부분이 한통속…기망하는 수법까지 매뉴얼화](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48/98/bd/694898bd2399a0a0a0a.jpg)


![[지상중계] 제12회 나지포럼, “북미 정상회담 성과내기 어려워”](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43/48/32/69434832107aa0a0a0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