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름 오르다’ 이성복 지음/ 현대문학<br>‘강석경의 경주산책’ 강석경 지음/ 열림원
이성복의 ‘오름 오르다’는 제주도에서 활동하는 사진작가 고남수의 흑백사진 ‘오름’ 스물네 컷에 부친 에세이 묶음이다. 고남수의 사진에 박힌 오름들은 추상적 도형에 가깝고 미세 혈관처럼 뻗은 하얀 길들은 오름과 오름 사이를 “내포의 바다”로 만든다. 오름 주변에 배치된 하얀 길들은 “죽음을 넘어설 뿐만 아니라 죽음을 거느리고 빛을 향해 헤엄치거나 날아가는” 것으로 상상된다. 그것은 “평평한 몸체를 아래위로 흔들면서 헤엄쳐 가는 도다리나 가오리의 느린 몸짓”(107쪽)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하얀 길들에 의해 생긴 그 내포의 바다는 “벌레 먹은 한 장의 나뭇잎”으로 바뀌고, 나뭇잎의 돌기 많은 굴곡은 다시 “고대 왕릉에서 출토된 금관의 나뭇잎 장식”이 된다. 그리하여 “사슴 뿔처럼 날렵한 그 문양은 퇴색한 금관 주위로 흔들리는 곡옥(曲玉)의 희미한 음향을 들려주면서, 그것을 둘러싼 시커먼 오름들의 형상을 빛이 들지 않는 고분의 내부”로 바꾸어버린다. 그와 더불어 “내포의 바다 여기저기 떠 있는 섬처럼 보이던 지형지물은 오래 돌보지 않은 야산의 무덤들처럼 화면의 상단 중앙으로부터 흘러드는 석양빛을 받고 있다”(106쪽). 이처럼 오름의 둥은 자주 무덤의 둥과 겹쳐지며 관람자로 하여금 삶과 죽음을 끌어안고 있는 우주의 질서에 대해 명상하게 한다.
오름의 분화구, 비어 있는 중심
오름은 기생 화산에서 솟구쳐 나온 용암이 굳어서 생겨난 독특한 지형지물인데, 완만한 곡선으로 이루어진 선들은 여체의 관능성과 겹쳐진다. 오름의 능선들은 움푹 팬 여인의 등허리를 떠올리게 한다. 더 나아가 굽이진 능선은 한껏 가랑이를 벌린 여인으로, 또는 “퍼질러 누워 붕긋한 배와 처진 가슴을 드러내놓고 잠자는 중년 여인”(52쪽)으로 그 상상을 확장해간다. 이때 오름의 곡선들은 몸의 고단함과 겹쳐져서 “저도 몰래 살덩어리가 만드는 곡선, 아무도 달랠 수 없고 저도 어쩌지 못하는 하염없는 곡선”(53쪽)으로 뻗어나간다. 오름은 차안과 피안의 경계에 걸쳐 있는 단순하며 하염없는 곡선을 지닌 여성의 몸이다. 결핍의 몸, 상처 많은 몸. 그래서 오름의 중심은 비어 있다. “스스로 오름의 정상이기를 포기하고 자신의 내면 속으로 침잠하는 오름의 분화구는 비어 있는 중심이기에 그것은 자기 내부에 또 다른 비어 있는 중심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86쪽). 여성이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 비어 있는 자궁을 갖고 있듯이 오름도 또 다른 비어 있는 중심을 잉태하는 비어 있는 중심을 끌어안고 있는 것이다.
사진이 드러내 보이는 오름의 이미지들은 언어 이전의 현전이다. 검은 빛으로 뒤덮인 것은 오름이고, 화면 상단을 지나가는 곡선은 오름의 능선을 보여준다. 그 위에 떠 있는 잿빛은 하늘이다. 화면 거의 전체를 뒤덮은 검은 빛의 표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날카로운 못 같은 물건에 긁힌 것처럼 희끗희끗한 선들이 불규칙하게 배열되어 있다. 가는 선들의 현존은 너무 희미해서 잘 보이지도 않는다. 그것은 바람에 불려가는 풀이거나 작은 나뭇가지들일지도 모른다. 놀라운 것은 시인이 2차원의 프레임 속에 갇힌 풍경, 검게 인화된 오름의 사진에서 “검은 무게와 검은 부피에서 벗어나 바람에 불리는 풀들의 아우성과 간혹 재빨리 지나가는 새들의 외마디 울음소리”(17쪽)를 들을 때다.
고분은 영원한 회귀의 흔적
‘강석경의 경주산책’은 숲과 능과 오솔길에 대한 걷기의 기록이자, 한 장소에 대한 지극한 사랑의 기록이다. 그래서 글에는 햇빛, 바람, 나무들을 통해 느끼는 자연의 순환에 대한 단상들이 불연속적으로 끼여든다. 기저에 깔린 정서는 생멸하는 것들의 덧없음, 상실과 허무의 느낌들이다. 작가는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35쪽) 하는 소박한 의문을 품고 산책에 나서는데, 그 사유는 비약과 상상을 낳는다. 만삭의 임산부와 같이 고도(古都)의 도심에 솟아 있는 둥근 능들은 100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나면서 자연의 일부로 귀속한다. 작가는 그 고분들 앞에서 “늘 말발굽 소리와 초원에서 불어오는 바람소리”의 환청을 듣고 자신에게 “중앙아시아 초원의 유목민 피가 섞여 있다고” 상상하며 가슴이 뛴다(83쪽). 이처럼 작가의 사유와 상상은 시간과 현실과 논리를 뛰어넘어 근원으로 영겁 회귀한다.
경주는 고대와 현대, 죽은 자들의 시간과 산 자들의 시간이 평화스럽게 공존하는 곳이다. 죽은 것은 죽음으로써 불멸의 시간에 포획되고, 산것은 삶으로써 늘 현재적 소멸의 시간에 포획된다. 죽은 것은 불멸의 시간에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죽지 않지만 살아 있는 것들은 매 순간 죽음을 향해 나아간다.
작가는 계절의 순환을 보여주는 자연의 변화와 그 기미들을 민감하게 포착한다. “겨울 내내 언 땅도 갈무리되어 초봄의 공기를 쐬고 나무마다 움이 초록 불꽃처럼 돋아 있다”(9쪽) “며칠 서울에 다녀왔더니 그 사이 능역이 더 푸르러진 듯하다. 비가 와서 초목이 무성해졌나보다. 계림 숲도 우거져 여름의 비경을 보여주는데 그 앞으로 펼쳐진 들판엔 누런 유채 줄기만 볕에 탄 듯이 메말라 있다”(36쪽) “집집마다 석류는 붉게 여물었고 무화과도 성급한 놈은 벌써 속살을 드러내려 한다. 담 너머 가지에 열린 무화과 중 살짝 벌어진 것을 땄으나 완전히 익지는 않아서 분홍빛 살만 먹었다”(58쪽). 언 땅은 녹고 씨앗들은 싹을 틔우고 나무에는 움이 돋는다. 식물들은 푸르러지고 무성해지다가 이윽고 시든다. 석류와 무화과와 사과는 둥글게 여물어 붉어지는 과일들이다. 도심에 솟아 있는 고분과 어우러진 자연이 보여주는 순환의 기미들은 생의 덧없음 위에서 매 순간을 찬연하게 만든다. 이는 삶과 죽음으로 순환하는 생명과 우주의 질서를 구현하는 것이다.
황룡사 터부터 황오동의 뒷골목까지 계림골, 교동, 남산동, 북천, 남천으로 이어지는 산책의 동선에는 신라의 유적들과 그 역사의 숨결이 있다. “도심의 평지에 솟아 있는 고분들이 무릉도원 같기도 하고, 타임머신을 타고 고대로 되돌아간 듯 환상을 주었다”(42쪽). 고분들은 죽음의 증거물이 아니라 자연으로 돌아가는 영원한 회귀의 흔적이다. 경주가 아름다운 것은 그 회귀의 흔적들이 생생하기 때문이다. 고분들이 밀집해 있는 능원에서 대릉원을 바라보며 작가는 그것이 “우리의 뿌리요 원형”(34쪽)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작가는 능의 완만한 곡선에서 모든 것을 품고 양육하는 여성성의 원형을 본다.
작가는 왜 그토록 경주에 몰입할까. “내 영혼의 유전인자가 신라혼의 DNA와 같기 때문”(107쪽)이다. 그것은 근원으로의 회귀다. 1000년의 장구한 역사에 겹쳐볼 때 한 사람의 모둠살이는 한순간의 꿈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강석경의 글은 늙은 회화나무 아래서 꾸는 꿈이며, 인생은 덧없는 “꿈, 환상, 거품, 그림자, 이슬, 번개”(92쪽)와 같다고 속삭인다.
내부화된 익숙한 풍경
풍경을 바라봄은 외부에서 바라보는 풍경에 대한 탐색이며, 바라보는 주체를 그 탐색에 겹쳐 탐색하는 것이다. 풍경은 외부자의 시선에 의해 발견됨으로써 풍경-텍스트가 된다. 그것은 해석된 풍경이다. 주체의 해석 행위는 풍경을 향한 시선의 증식과 시선의 활동적인 삼투가 진행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 시선-풍경의 결합은 풍경-텍스트를 원소들로 잘게 쪼개 징표들의 풍경으로 변환하는 일이다.
글로 씌어진 것들은 외부자의 시선을 충분히 빨아들여서 자극과 낯섦의 원소들이 제거된 풍경이다. 즉 내부화된 익숙한 풍경이다. 외부자에 의해 발견된 모든 풍경은 궁극적으로 메타-풍경이다. 풍경-대상에 대한 해석을 내포로 머금으며 해석하는 주체에 대해 해석하고는 내포를 감싸 안는 외연을 배치시킨다.
제주도의 오름들과 경주의 능들은 그 내부가 텅 빈 자궁이며, 풍경이 끌어안은 자궁들은 공(空)과 무(無)라는 기의를 머금은 기표적 기호의 체계로 환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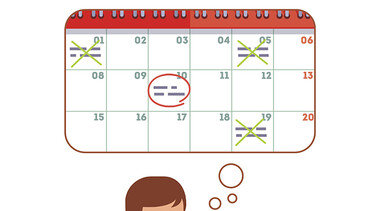


![[지상중계] 제12회 나지포럼, “북미 정상회담 성과내기 어려워”](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43/48/32/69434832107aa0a0a0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