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명 안으로’<br>김민정 등 9명 지음, 한길사, 299쪽, 1만6000원
궁금증을 풀려고 6월16일 강연장을 찾았다. 백발을 휘날리며 연단에 선 크리스천 교수는 “거대사는 민족과 국가 중심의 역사를 뛰어넘는 지구 전체의 큰 역사”라면서 “137억년 전에 빅뱅으로 우주가 탄생하고 46억년 전에 지구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통 크게’ 역사를 바라보는 셈이다. 호주 맥쿼리대 교수인 그는 인류 문명에 대해서는 “지역사에 매몰되면 전체 그림(whole picture)을 보기 어렵다”면서 시야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명은 인간이 지구상에 남긴 결과물이다. 집을 짓거나, 길을 만들거나, 논밭을 일구는 등 유용한 일을 한 결과 말이다. 흔히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라 하면 나일,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황하 등을 일컫는다. 이런 강변의 거대한 고대 문명 이외에도 소규모 문명권이 세계 여러 곳에서 존재했다. 문명은 발상지에서 이웃으로 옮겨가 새로운 문명을 낳곤 했다.
세월이 흘러 과학기술문명이 발달하면서 대도시, 대규모 공장, 우주선, 핵무기, IT기기 등이 양산됐다. 문명 발달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휴대전화, 자동차, 고속전철, TV, 컴퓨터 등 온갖 문명의 이기(利器)를 사용하는 현대인은 “문명이란 무엇인가?”란 화두에 대해 고구(考究)할 필요가 있다.
‘문명 안으로’라는 책을 보니 그 화두에 대한 전문가들의 치열한 고민이 담겼다. 문명의 기원, 문명과 야만, 문명의 표준, 조선과 문명 등 문명을 열쇳말로 한 13편의 글이 실렸다.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HK문명연구사업단이 ‘문명의 허브(hub), 한국 인문학의 새로운 구상’이라는 주제로 3년여 연구한 성과를 정리한 것이다. 서울대 인문학연구원은 ‘인간·문명·세계에 대한 탐구’를 활동목표로 출범한 조직이다. 이 책은 ‘문명공동연구’라는 총서(叢書)의 첫 번째다. 함께 나온 ‘문명 밖으로’는 총서 두 번째 책이다. 김헌 서울대 HK 연구교수가 쓴 ‘문명 안으로’의 서문을 옮겨보자.
인문학뿐만 아니라 인문학 인접 학문 전공학자 스물세 명이 모여 세계의 문명을 한반도의 반쪽 땅에 살면서 연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어떻게 한국 인문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 좀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계획하며 이제 다시 새로운 출발점에 선다. 이 시점에서 지난 3년간의 연구 성과를 모아 책으로 펴내는 일은 참으로 뜻 깊다. … 매월 한 명의 필자가 작성한 글을 놓고 다른 사람들이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형식의 세미나가 격렬하게 진행되었다. 각자의 글쓰기 스타일이 부딪치며 사소한 문제에 얼굴을 붉혔던 적도 있다. 중요한 개념의 번역을 두고 심각한 논쟁이 오가기도 했다. 하지만 모두 서로의 뜻을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생산적인 방향으로 글을 만들어갔다.
서양 근대문명 발상지는 피렌체
문명(civilization)이라는 개념은 언제 생겼을까. 여러 학자는 계몽주의 시대인 18세기 중반에 영국과 프랑스에서 거의 동시에 생긴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 단어의 뿌리는 고대 로마시대에서 찾을 수 있다. 라틴어 시민(civis)과 도시(civitas)와 관련 있다는 것이다. ‘civilization’을 글자대로 번역하자면 ‘도시화’가 된다. 이 부분에 대해 안성찬 서울대 HK 연구교수는 “근대 이래 서양의 문명화 과정과 지난 세기 이래 동양의 문명화 과정이란 농촌 중심에서 도시 중심으로 인간의 생활공간이 옮아가고 이에 따라 생활양식도 변화하게 된 것을 가리킨다”고 설명했다. 근대 서양에서 이런 변화가 가장 먼저 이루어진 곳은 르네상스의 중심도시 피렌체라고 한다.
일본은 1868년 메이지유신(明治維新) 이후 서양문물을 받아들이는 데 국력을 집중했다. 총포, 선박, 철도, 건축 등을 도입하는가 하면 서적을 들여와 번역에 몰두했다. “아시아를 벗어나 유럽으로 들어가자”라는 뜻인 탈아입구론(脫亞入歐論) 주창자인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1835~1901)는 ‘문명론의 개략’이란 저서에서 문명이란 단어를 처음 썼다. 후쿠자와는 조선의 젊은 개화파 인물인 김옥균, 박영효 등을 부추겨 갑신정변을 일으키는 배후 역할을 하기도 했다. 아시아의 맹주를 꿈꾸던 일본은 당시의 중국을 비(非)문명국으로 규정했다. 일본의 지배세력은 일본이 문명국으로 얼른 자리 잡아 아시아를 제패하겠다는 야심을 품은 것이다.
중국은 중국의 중심부, 즉 중원 이외의 변방에 사는 사람들을 모두 오랑캐라고 비하했다. 오랑캐는 마땅히 선진문화국 중국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논리였다. 중국은 1840년 제1차 아편전쟁에 패배하고서도 이런 소신을 굽히지 않으며 ‘서양 오랑캐’들을 깔봤다. 1856년 제2차 아편전쟁에서 수도 베이징이 함락당하자 비로소 서구 열강의 무력에 눌려 고개를 숙였다. 김월회 서울대 중어중문학과 교수는 “이는 중화(中華)가 자신 이외의 문명과 최초로 병립하는 문명사적 사건”이라며 “중화가 구축된 이래 처음으로 중원에 복수의 문명이 병존하게 됐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에서 서양문명 도입의 필요성을 앞장서 주장한 천두슈(陳獨秀·1879~1942)는 중국의 낡은 봉건적 의식을 비판했다. 이혜경 서울대 HK 연구교수는 “천두슈는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면 망한다 해도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고 소개했다. 무능한 청(淸)나라 조정의 몰락을 당연시하는 견해다. 천두슈는 일본의 조선 합병에 대해 “합병은 조선 인민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복이므로 옛 주인을 부흥시키려는 생각은 해롭다”라는 과격한 의견을 내기도 했다.
계몽사상가이자 번역가인 옌푸(嚴復·1854~1921)는 영국 유학 시절 다윈, 스펜서, 밀, 애덤 스미스 등의 저서에 감명을 받아 이를 중국어로 번역했다. ‘번역을 통한 근대 중국 지식인들의 모색’이라는 단원을 쓴 중문학자 김민정 님은 “그들은 찬란하게 빛을 발하는 서구문명의 근저에 그 문명의 ‘주체’인 ‘개인’이 놓여 있음을 깨달았다. 천두슈 등이 ‘신청년’(잡지)의 번역을 통해 제공하려던 것은 문명의 전달이 아닌 문명 주체의 창출이었다”고 서술했다.
중국 공산당 정부가 출범해서는 ‘중국적’이라는 수식어에 서구 문명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담겼다. 김월회 교수의 글에 따르면 지금 중국 어디를 가도 “화장실문명을 도모하자!” “식당문명을 꾀하자!” “교통문명을 강구하자!” 등의 구호와 마주친다. 요즘에는 문명이란 단어는 교양 있는 행동양식을 뜻하는 셈이다.
소중화(小中華) 조선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세계는 급변하는데 조선은 ‘조용한 아침의 나라’에 머물렀다. 중국에서 명(明)나라가 북방 세력 청(淸)에 의해 멸망했을 때 조선은 청을 오랑캐라 깔보며 조선이야말로 명의 뒤를 잇는 소중화(小中華)라고 자부했다. 세상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좁은 식견이었다. 이혜경 서울대 HK 연구교수는 “후쿠자와나 량치차오에 필적하는 조선의 ‘문명’ 선전가로는 유길준(兪吉濬·1856~1914)을 꼽아야 할 것”이라면서 유길준에게는 문명보다는 ‘개화’란 단어가 더 익숙했다고 설명했다. 문명, 개화 개념이 널리 퍼진 데에는 ‘독립신문’의 공적이 컸다. 일본에 강점된 후 역사학자 신채호(申采浩·1880~1936)는 영토, 주권 등 형식상 국가에 못지않게 독립정신, 자유정신 등 정신상 국가도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최남선(崔南善· 1890~1957)은 동방문화권을 중국문화권, 인도문화권, 불함(不咸)문화권 등으로 나누고 불함문화권은 조선을 중심으로 일본, 동부 중국, 만주, 몽골, 중앙아시아, 발칸반도 등으로 뻗어 있다고 주장했다.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에 기독교는 서양문명의 전파자 구실을 했다. 성직자들은 낯선 땅 조선에 와서 선교, 교육, 의료, 언론 사업에 매달렸다. 이런 사업 자체가 당시 서구문명을 상징했다. 종교사학자 안연희 님은 ‘기독교 문명화론의 빛과 그림자’라는 단원에서 “청일전쟁, 러일전쟁, 을사늑약을 거치면서 한반도가 황폐화되는 시점에 기독교 개종자들이 급증하는데 그 가장 큰 원인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표상하는 서구문명의 힘을 빌려 그 문명의 푯대 아래서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동학을 창시한 수운(水雲) 최제우(崔濟愚·1824~1864)는 반봉건·반외세를 외치며 여성과 어린이까지 평등하게 존중받는 이상사회를 추구했다. 수운에게 인간은 절대자인 한울님(상제)과 같은 존재였다. 동학은 문명을 앞세워 동양의 문화적 정체성을 위협하던 서구열강에 대한 종교적인 대응 방안이었다. 성해영 서울대 HK 연구교수는 “안타깝게도 우리는, 수운이 치열하게 고민하고 살다 갔던 그 땅에서 여전히 극심한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면서 “그러기에 수운은 우리가 중심임을 기억해내고, 그 앎을 현실에서 구현해내기를 채근한다”고 지적했다.
1920년대에 한국에는 신식 고등교육을 받은 ‘신여성’들이 출현했다. 화가 나혜석, 성악가 윤심덕 등이 일본에서 공부하고 귀국해 조선여자유학생친목회를 결성하고 여성독자를 겨냥한 잡지 ‘여자계’를 창간한 것은 한국여성사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손꼽힌다. 이들은 현모양처(賢母良妻)를 지향하는 기존 가치관에 맞섰다. 남성들이 만들어놓은 문명화의 길을 걷기를 거부한 것이다. 번역가 우효경 님은 신여성의 활동상과 관련해 “그녀들의 삶은 매순간 투쟁으로 점철되었다”면서 “그들 자신은 불행한 삶을 살았다고 느꼈을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이 믿은 문명화의 길을 갔다”고 논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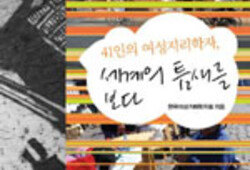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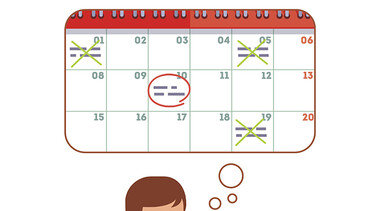


![[지상중계] 제12회 나지포럼, “북미 정상회담 성과내기 어려워”](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43/48/32/69434832107aa0a0a0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