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는 이중 삼중의 죄책감에 시달리며 일자리마저 잃고, 초라한 보트에서 난민처럼 살아간다. 1년 넘도록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원래 직업과는 전혀 상관없는 페인트공 일을 하며 술에 절어 지낸다. 아들이 죽은 후, 그의 인생 시계는 완전히 멈춰버린 것이다. 전처가 찾아와 아들의 유품인 음악 CD와 전기기타를 전해주고 가자, 그는 비로소 고통스럽게 자신의 ‘그림자’와 만나기 시작한다. 아들과 아버지는 함께 음악을 연주하며 행복한 한때를 보냈다. 그 아름다운 추억이 이제는 참혹한 고통으로 다가온다.
그는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직장을 잃고, 모든 인간관계로부터 도망치며 자신의 ‘그림자’로부터 도피하려 하지만, 아무리 도망쳐도 사랑하는 아들과의 기억을 지울 수 없다. 가장 사랑했던 존재가 가장 아픈 그림자를 드리울 때,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대면해야만 했다. 자신의 쓰라린 그림자를 돌보지 않는 한, 그는 결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림자와 대면하기
그림자와의 대면이란 이토록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다. 할 수만 있다면 그림자 전체를 지우고 싶어도, 그림자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문신처럼 우리의 존재를 짙게 물들이는 슬픔이다. 과연 이 아픈 그림자와 화해할 수 있을까. ‘그림자와 대면하는 것’은 고통과 우울을 동반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은 그 자체를 회피하려 한다. 하지만 심리학자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진정한 치유는 ‘그림자와 용감하게 마주하기’부터 시작된다고.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조언한다. 그림자를 계속 부인하는 것은 동전의 뒷면을 문질러 지우는 것과 같다고. 뒷면이 없다면 동전이 가치를 잃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그림자라는 ‘마음의 뒷면’을 통해 비로소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
콤플렉스, 트라우마, 나아가 무력감과 우울증을 동반하는 모든 감정의 편린들은 그림자의 구성 성분이다. 하지만 그림자로 인한 슬픔을 ‘성찰의 계기’로 삼는다면 그림자는 오히려 정신적 성장의 자양분이 될 수 있다. 심리적으로는 괴로움을 느끼더라도 영적으로는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속을 썩이는 아이들을 통해 어머니들이 깊은 슬픔을 느끼면서도 인격적으로는 성장하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다.
강인한 사람들은 고통을 제거하거나 고통으로부터 회피하려고만 하지 않고, 고통을 통해 끝내 성장한다. 고통 자체를 피할 수는 없지만, ‘고통과 친해지는 법’ 또는 ‘고통을 통해 자신을 단련하는 법’은 배울 수 있다. 그리하여 내면의 그림자야말로 성장의 동력이자 창조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
욕망이라는 동전의 뒷면이 바로 ‘내면의 그림자’다. 즉, 그림자는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이 만들어내는 그늘 때문에 생기는 어두운 그림자다. 자식을 통해 자신의 잃어버린 과거를 보상받으려 하는 부모는 자식의 ‘성취’에는 환호하지만 자식이 조금이라도 뒤떨어질 때는 좀처럼 참아내지 못한다. 자식의 성취가 곧 자신의 성취라 믿는 가치관 때문에, 자식의 탁월함만이 자신을 빛내준다는 믿음 때문에, 그 부모는 자식의 인생뿐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도 그림자를 드리운다.
‘공부를 잘한다’는 자만심에 빠진 우등생도 마찬가지다. 늘 공부를 잘했던 사람은 조금이라도 남에게 뒤처지는 것을 참지 못한다. ‘공부를 잘한다’는 빛이 ‘자신이 잘하는 공부 말고는 다른 것에 관심이 없거나 무능력한’ 그림자를 만드는 셈이다.
자기 안의 그림자를 인식하려면 먼저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학벌에 콤플렉스가 있다면, 단지 ‘학벌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라고 스스로를 윽박지르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뛰어난 사람들을 질투하거나, 그가 가진 지식을 폄하하는 공격적인 행동으로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런 행동은 그림자의 고통을 더욱 심화할 뿐이다. 자신이 단지 ‘남이 좋다고 하는 학교’를 나오지 못해서 괴로운 것인지, 진정한 배움의 기쁨을 느껴보지 못해서인지, 지식을 통해 자아실현을 하지 못해서 괴로운 것인지, 좀 더 구체적인 방식으로 그림자의 ‘정체’에 접근해야 한다.
자신과 비슷한 콤플렉스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어떻게 문제를 극복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대단한 학벌이 없이도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쟁취해낸 사람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진짜 중요한 것은 ‘학벌’이 아니라 ‘배움을 통해 인생을 바꾸는 능력’임을 알게 된다. 이렇듯 우리는 그림자와의 대면을 통해 자기 안의 더 큰 힘과 만날 수 있다.
큰 욕망, 짙은 그림자
저자는 모든 내면의 그림자에 공통적인 현상으로 ‘자아의 비대함’을 든다. ‘나’라는 존재를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 사람들에게 ‘나’를 인정받고 싶은 것, ‘나’ 이외의 존재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 모두 자아의 비대함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들이다. ‘나’를 너무 강하게 의식하는 것은 ‘타인과 공존하며 살아가는 실제 삶’에서 걸림돌이 되곤 한다.
자기를 더욱 대단하게 포장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아야 하는 현대사회에서 더욱 ‘자아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그로 인해 각종 정신질환이 늘어나는 것은 바로 ‘나’를 과도하게 강조하고 숭배하는 ‘자기관리’ 문화 때문이 아닐까. 자아에 대한 심각한 집착에서 해방될 때에만 우리는 그림자와 대면할 수 있고, 그림자와 대화할 수 있고, 마침내 그림자와 ‘춤을 추는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왜 자아를 놓아버려야 할까? 억압되어 있지만 분명히 풍부히 존재하는, 남에 대한 사랑을 해방시키는 최상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아를 놓아버린다. 우리가 위기와 협력할 때 위기는 자아를 수축시켜 사랑에 대한 잠재력을 해방시킨다. (…) 자아를 걸치면 변화에 대항하지만 자아를 벗어버리면 변화를 향해 함께 협력한다.
-‘내 그림자가 나를 돕는다’ 중에서
‘자아’를 놓는 순간, ‘내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놓아버리는 순간, ‘다른 존재와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내가 아닌 다른 존재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아닌 다른 존재와의 교감에 커다란 의미를 부여할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한다. 내 아픔, 내 상처, 내 슬픔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픔, 당신의 상처, 그들의 슬픔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내가 남에게 어떻게 보일까’, ‘남들은 왜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를 걱정하는 것보다는 ‘나를 둘러싼 더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중요하다. 내 안에 지금의 나를 괴롭히는 자잘한 고통보다도 훨씬 큰 그림이 있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내 마음에 지금 당장 나를 괴롭히는 수많은 문제보다 ‘더 커다란 그림’이 있다는 믿음이 바로 ‘전일성’에 대한 깨달음이다.
그림자와 춤추는 날
전일성(wholeness)은 우리 안에, 우리의 긍정적 그림자 안에 모든 미덕이 잠재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예를 들면 용기는 항상 우리 정신 안에 있다. 다른 미덕과 마찬가지로 용기는 어떤 식으로든 활성화될 수 있다. 요컨대 용기는 노력으로 생길 수도 있다. 용기 있는 사람처럼 계속 행동하면 언젠가는 용기가 몸에 배게 된다. 미덕은 습관이다.
-‘내 그림자가 나를 돕는다’ 중에서
내 안에 눈에 보이는 내 모습보다 훨씬 커다란 나, 다른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깊이와 넓이를 지닌 진정한 ‘나’가 있다는 믿음이야말로 우리를 성장하게 한다.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결정적인 기회가 바로 ‘위험상황’이다. 위기에 처했을 때 인간은 자기보다 더 큰 자기, 그동안 일상적으로 자신을 지켜주던 관성적인 자아가 아닌 ‘더 큰 자아’와 맞닥뜨리게 된다. 그 ‘더 큰 나’의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위험을 깨부수고 진정한 내적 성장을 이룰 수 있다.
그렇게 더 큰 나와 만나기 위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내 그림자를 인정하고 이를 가장 잘 이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림자가 나만의 가장 깊은 욕구, 가치, 소망에 도움이 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림자가 내 운명의 여행을 돕는 힘이 되게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피하지 않고 ‘자기를 향한 기나긴 여정’에 오를 용기가 있는 사람만이 마침내 자신의 어두운 그림자조차 눈부신 파트너로 만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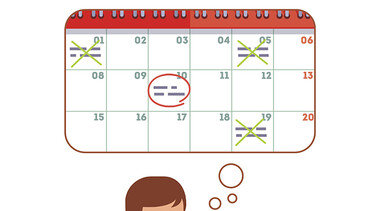


![[지상중계] 제12회 나지포럼, “북미 정상회담 성과내기 어려워”](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43/48/32/69434832107aa0a0a0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