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부터 제주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지내고 있다. 처음엔 한 달살이 정도로 생각하고 가볍게 제주에 왔다가 이곳이 점점 좋아졌다. 고민 끝에 아예 제주에 몇 년 살아볼 결심으로 이사를 왔다. 결과적으론 한 번쯤 제주에 살아보고 싶다는 꿈을 이루긴 했지만 먹고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건 별개의 일이었다. 1년간 이러저러한 시도를 해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국제학교단지에 겨우 자리를 잡았다.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독서지도 방문 수업을 맡았다.
동화책 읽다 깨달은 내 모습
수업을 시작하기 전 생각한 연령층은 중학생 정도였다. 실제로 수업 요청이 들어온 아이들은 예상하던 것보다 어린 아이들이었다.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연령대의 아이들이 대부분이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대개 서울에서 영어유치원을 다니다 국제학교 입학을 위해 가족 모두가 제주로 온 경우가 많았다.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한국어와 영어를 동시에 배우다 보니 생기는 애로 사항이 있었다. 아무래도 한국어만 접하는 또래보다 한글로 된 책을 읽거나 쓰는 일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그만큼 한글로 자신의 의견이나 감상을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아이가 많았다.이맘때 아이들의 수업은 동화책을 읽는 것으로 시작된다. 내 역할은 책 읽기와 독후 활동을 포함한, 독서지도 수업이었다. 단순히 동화책을 읽어주는 것보다는 책을 읽은 후 어떻게 읽었는지 아이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수업의 주된 내용이었다.
이야기를 나누며 아이들이 자연스레 ‘내가 책 속의 주인공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상상해 보게끔 도왔다. 그러면서 아이와 같이 책의 내용에 대해 이야기한다. 책과 관련된 이야기는 금방 가지를 다른 곳으로 뻗게 된다. 아이의 평소 생활이 감상에 섞이게 되고 이를 주제로 그림도 그리는 일이 종종 생긴다. 그러다 보니 이 아이의 성격은 어떤 편인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요즘 고민이 무엇인지 등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기도 한다.
그리고 동시에 나 또한 아이들이 읽는 동화책에서 배우는 측면이 있다. 내가 평소에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어떤 말을 가장 자주 입에 담는지를 문득 깨닫는 순간이 생기기도 한다.
![[Gettyimage]](https://dimg.donga.com/a/650/0/90/5/ugc/CDB/SHINDONGA/Article/63/b3/93/84/63b393842587d2738276.jpg)
[Gettyimage]
어려워도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지
지난주에는 일곱 살 아이와 동화책을 한 권 읽었다. 책의 제목은 ‘괜찮아, 다시 하면 되지’. 주인공으로 남자아이가 등장하는데 아직 어려서 혼자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자주 실수를 한다. 블록을 높게 쌓다가도 금세 와르르 쏟아지기 일쑤이고, 낮은 담장 위를 똑바로 따라 걸어가려 해도 비틀비틀거리다 ‘콰당’ 넘어지기까지 한다. 옆에서 지켜보던 아이의 아빠는 그때마다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 준다. “괜찮아, 다시 하면 되지.” 블록이 쏟아져도, 걷다가 넘어져도 “괜찮아, 괜찮아. 다시 하면 돼.”언제고 어느 때고 내 편이 돼주는 말. 실수를 탓하고, 힐난하는 대신 ‘괜찮다’고 말해 주며 ‘다시’ 도전해 보게끔 격려해 주는 말. 어쩐지 그 말에 내가 더 뭉클해져서, 아이에게 이 이야기를 꼭 돌려주고 싶어 ‘괜찮아, 다시’ 놀이를 했다. 아이가 어느 상황을 상상해서 이야기하면, 내가 ‘괜찮아, 다시 하면 돼’라고 대답해 주는 식이었다.
‘컵에 물을 따르다 컵을 엎질러 버리면?’ ‘과자를 먹다가 떨어뜨리면?’ 아이는 예전에 실수했던, 혹은 실수할까 봐 걱정했던 것들을 떠올리려는 듯 가끔은 골똘히 생각에 잠기기도 했다. 아이가 뭐든 말할 때마다 나는 “괜찮아, 물은 다시 따르면 되지.” “괜찮아. 떨어뜨린 과자는 치우고 새로 먹으면 되지.” 하고 힘주어 대답해 주었다. 그렇게 하면 나의 그 말이 작은 씨앗처럼 아이 마음속에 심어지기라도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아이가 앞으로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괜찮다며 스스로를 다독일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어른이라고 해서 다시 시작 못할 것 없다
어느덧 시간이 다 돼 수업을 정리하려는데 그날은 아이가 돌연히 물어왔다. “선생님은요? 선생님은 언제가 걱정돼요?” 술술 말했던 아이와 달리, 나는 걱정할 것도 무서운 것도 많은 탓인지 곧바로 대답이 잘 나오지 않았다. 매달 내야 할 월세를 못 낼까 봐 걱정이라고 해야 할까. 나이가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아질까 봐 걱정이라고 해야 할까. 머릿속 한편에 싸매어 둔 고민이 머리를 들었다.‘아니야, 아니지.’ 이렇게 현실적인 이야기를 아이에게 할 수는 없었다. 그럼 어떤 걸 말하는 게 제일 나을까, 고민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아이에게 왜 괜찮다고 말해 주고 싶었을까. 어떤 마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걸까.
사실은 어른들에게도 필요한, 누군가를 통해 한 번쯤은 듣고 싶은 그런 말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다시 시작하지 못하는 어른이 될까봐 무서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묻는 나의 말에 아이가 힘차게 말했다.
“괜찮아요, 다시 하면 돼요!”
김버금
● 2019년 6회 브런치 북 출판 프로젝트 대상
● 에세이집 ‘당신의 사전’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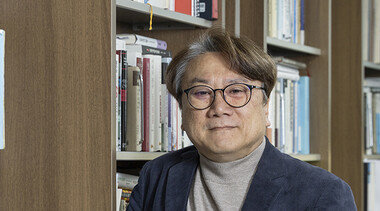
![[신동아 만평 ‘안마봉’] 2026년 ‘반중 지도자군(群)’의 행진](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9e/7c/5e/699e7c5e023ba0a0a0a.png)

![[영상] 김다현 “언제나 내 편인 ‘얼씨구다현’과 함께 붉은 말처럼 달리렵니다”](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8b/df/02/698bdf022269d2738e2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