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청나게 화가 나거나 일에 짓눌려 헉헉댈 때, 혹은 조마조마하게 추진하던 일이 기분 좋게 해결됐을 때 ‘이 정도는 내게 선사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언젠가 스트레스를 받아 세상을 저주하며 인사동을 돌아다니다 쌈지아트마켓(일종의 미술작품 할인점)에서 데비 한의 ‘미의 조건’을 축소한 주먹만한 조각을 보고는 신용카드를 내밀며 행복해서 다리가 후들거린 적도 있다. 조심조심 쇼핑백을 들고 인사동 길로 나섰을 땐 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조차 잊어버렸다.
밤새 마감을 한 뒤 백화점에 달려가 누렇게 뜬 얼굴에 샹들리에만한 새 귀고리를 걸어주면서, ‘얼굴색이 노라니까 금색보다 실버가 잘 어울려, 마침 실버가 트렌드인데…’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물론 내 인생을 ‘2000원어치 순대 자르듯’ 썰어서 헛된 ‘상품’과 바꿔 먹는다는 회한이 왜 없을까. 마르크스가 말한 인간 소외가 포스트모던 사회를 사는 우리의 인생에 ‘다크 서클’ 혹은 암처럼 번져 있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Retail Therapy’란 책을 소개받았다. ‘음악요법’ ‘미술요법’처럼 쇼핑으로 마음의 병을 치료한다는 것이다. 물론 돈이 들어가지만, 병원에 치료비 내는 셈 치자는 거다. 반쯤은 트렌드 용어겠지만, 음악이나 미술처럼 쇼핑이 영험한 효과를 내는 건 사실이다. 물건을 사지 않더라도 세계 최고의 아티스트가 만든 쇼윈도들, 상품과 브로셔 비주얼, 트렌디한 라운지뮤직을 들으며 쇼핑몰을 돌아다니는 것이 방이나 사무실에 처박혀 머리를 쥐어뜯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낫다.
얼마 전 아파서 병원에 하루 입원했다가 수십만원을 날렸다. 그 돈으로 ‘쇼핑요법’ 삼아 하이힐을 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1930년에 나온 잡지 ‘별건곤’에는 의사가 환자에게 ‘유행성 불경기균이 작용하는 황금부족증 히스테리’라 진단하는 장면이 있다. ‘쇼핑요법’의 역사도 긴 셈이다. 아침마다 색색의 알약들을 목으로 넘기면서 주말을 기다렸다. 내일은 새로 문을 연 신세계백화점과 롯데백화점을 씩씩하게 오가며 ‘쇼핑요법’을 받을 작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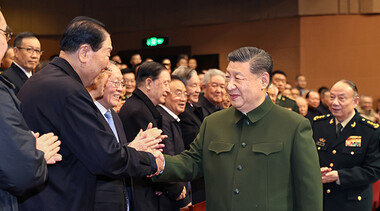

![[신동아 만평 ‘안마봉’] 2026년 ‘반중 지도자군(群)’의 행진](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9e/7c/5e/699e7c5e023ba0a0a0a.png)

![[영상] 김다현 “언제나 내 편인 ‘얼씨구다현’과 함께 붉은 말처럼 달리렵니다”](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8b/df/02/698bdf022269d2738e2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