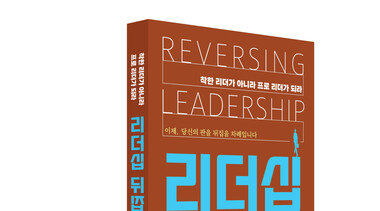- 올림픽은 그저 스포츠 경기가 아니다. 인류 최대의 축제다.
- 기업에는 자사 제품을 알릴 절호의 마케팅 기회다. 블루 블랙 레드 옐로 그린.
- 오륜기 컬러를 키워드 삼아 글로벌 기업들의 마케팅 열전을 들여다봤다.

LED 스크린을 장착한 삼성전자의 런던 올림픽 성화봉송 홍보차량 ‘삼성 캐러밴.’
변방의 한국은 서울올림픽을 통해 세계 만방에 이름을 알렸다. 당시 글로벌 기업이라고 할만한 한국 기업은 전무했다. 그로부터 10년 후 삼성전자가 한국 기업으로는 최초로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에 공식 후원사로 참여한다. 삼성은 나가노에서 무선통신 분야를 지원했다. 올림픽 후원은 선진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이미 다른 분야를 차지해 빈틈이 없고 IOC가 권고한 TV 등 백색가전은 소니 등 일본 기업에 막혀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IOC 위원인 이건희 회장의 영향력과 ‘휴대전화 분야 신설’이란 기발한 아이디어를 통해 진입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1998년은 아시아 외환위기가 격랑을 일으켜 한국 경제가 가라앉고 있을 때다. 그럼에도 삼성전자의 투자는 파격적이었다. 올림픽에 참여한 것은 삼성전자가 글로벌 기업으로서 입지를 다지고 휴대전화 분야 최강자로 탈바꿈하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런던 올림픽에도 무선통신 분야 공식 후원사로 참가한다. ‘스마트 기술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즐기고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올림픽’을 압축한 ‘Everyone′s Olympic Games’가 삼성전자의 이번 올림픽 마케팅 테마다. 삼성전자가 가진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적절하게 담은 테마라는 평가가 나온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6월 세계적인 축구 스타 데이비드 베컴을 런던 올림픽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올해 3월에는 영국 출신 스타 요리사 제이미 올리버도 홍보대사로 영입했는데, 두 사람은 삼성전자가 벌이는 각종 캠페인 및 광고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삼성전자가 런던에서 개최한 ‘런던 올림픽 캠페인 론칭 발표회’도 성공적이었다. 영국의 떠오르는 아티스트 케이트 모로스(Kate Moross)와 손잡고 올림픽 마케팅 전반에 적용될 ‘삼성 올림픽 비주얼 아이덴티티 시스템(SOVIS·Samsung Olympic Visual Identity System)’을 발표했다.

아디다스 ‘올림픽 에디션’ 가방
또한 삼성전자는 다양한 올림픽 관련 모바일 기기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했다. 삼성전자 제품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올림픽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한 것.
# Yellow Yolk : 스포츠 마케팅의 ‘노른자위’ 올림픽
올림픽 규모가 확대되면서 기업들이 올림픽 마케팅에 투자하는 비용도 늘고 있다. 런던 올림픽에 소요되는 예산은 16조 원에 달한다. 이 중 공식 후원사가 투자한 돈은 3조6000억 원가량이다. 삼성전자는 스폰서십뿐 아니라 바이어 초청 행사 등 2차 마케팅 비용까지 합쳐 3000억 원 정도를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런던 올림픽에 공식 후원사로 참여하는 기업 명단은 화려하다. 세계적인 노트북 회사 에이서, 글로벌 인력 서비스 그룹 아데코, 스포츠 의류 브랜드 아디다스, 세계 최대 철강업체 아르셀로미탈, IT 전문 기업 아토스 오리진, 자동차 제조사 BMW, 영국 국영 석유회사 BP, 영국 최대 민간항공사 브리티시 에어웨이스, 영국 최대 통신 사업자 BT, 영국 초콜릿 업체 캐드버리, 음료 회사 코카콜라, 컨설팅 업체 딜로이트, 화학 전문 기업 다우, 세계 최대 핵 발전 회사이자 프랑스 국영기업인 프랑스전력공사(EDF), 전자기기 전문 회사 GE, 영국 대표 금융회사인 로이드TSB, 패스트푸드 체인 맥도날드, 올림픽 타임키핑을 맡은 시계업체 오메가, 일본 가전 업체 파나소닉, 생활용품 제조 회사 P·G, 영국 대형 마트 세인스버리, 영국 최대 여행사 토머스 쿡, 물류기업 UPS, 신용카드 회사 VISA가 후원사로 이름을 올렸다.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모두가 기존의 선진국 기업이다.
후원사들은 올림픽 개최 1년 전부터 올림픽 에디션 제품을 발매하는 등 마케팅 전쟁에 들어갔다.
비자카드는 1988년 캘거리 동계올림픽 때부터 지구촌 최대 스포츠 축제를 글로벌 마케팅 플랫폼으로 활용해왔다. 비자카드는 이번 올림픽에서도 국제 프레스 센터(International Press Centre), 국제방송센터(International Broadcast Centre), 올림픽 빌리지(Olympic Village)에 올림픽용 특수 ATM 망과 수백 대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했다.
비자카드는 또 삼성전자와 제휴해 경기장 주변 3000여 곳에 올림픽 전용 ‘모바일 결제 앱’을 구축했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비자의 페이웨이브(payWave) 기술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모바일 기기를 전용 리더에 갖다 대는 방식으로 물품 대금을 결제하는 시스템이다.
파나소닉 역시 1988년부터 올림픽 공식 파트너로 참여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부터 시작한 디지털 방송은 파나소닉의 기술력으로 이뤄진 것이다.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처음 사용된 디지털 슬로 모션 카메라도 파나소닉이 개발했다.
파나소닉의 이번 올림픽 슬로건은 ‘열정 나누기’다. IOC, 런던 올림픽 및 장애인 올림픽조직위원회(LOCOG), 올림픽방송서비스 런던(OBSL)은 파나소닉과 ‘ 3D 기술 파트너십’을 맺었다. 이번 올림픽은 3D로도 중계방송을 하는 첫 대회다. 파나소닉은 풀 HD 3D를 지원하는 ‘AG-3DP1’ 카메라와 리코더를 런던으로 공수했다.

코카콜라 ‘올림픽 에디션’(왼쪽), 파나소닉 카메라.
코카콜라는 런던 올림픽 기념 리미티드 에디션 6종의 판매를 시작했으며 세계 각국에서 해당 국가 선수단을 응원하는 이벤트를 시작했다. 한국코카콜라도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cocacolaolympic)을 통해 ‘승리의 비트(Share the Beat)’라고 명명한 행사를 벌이고 있다.
# Black Ink : 올림픽 마케팅, 실제 수익은?
올림픽 스폰서십은 브랜드 가치를 올릴 뿐만 아니라 매출 신장에도 기여하고 있다. 2016년 올림픽까지 후원 계약을 맺은 삼성전자는 “1998년 올림픽 스폰서를 시작한 뒤 브랜드 가치가 7배 넘게 상승했으며, 휴대전화 시장점유율도 4배 이상 늘어났다”고 밝혔다.
비자카드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마케팅으로 4년 동안 4000만 달러 상당의 가치를 창출했다. 2002년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 기간에 비자카드 이용 매출은 2001년 같은 기간 대비 30%, 전월 대비 23% 증가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때도 비자카드를 이용한 결제 건수가 전년 대비 55% 증가했으며,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 기간에도 매출액이 급증했다.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이 열린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에서는 올림픽 개막 첫날 비자카드를 이용한 결제액이 520만 달러에 달했다. 이는 전년 같은 날 대비 46%가 늘어난 금액이다.
비자카드는 런던 올림픽 및 장애인올림픽이 열리는 7주 동안 영국의 소비자 지출 규모가 크게 늘 것으로 기대했다. 비자카드가 내놓은 보고서는 “영국 경제가 올림픽으로 인해 51억 파운드 규모의 경기 진작 효과를 누릴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 Red Carpet Service : ‘특혜’ 논란

올림픽 후원사는 공식 심벌인 오륜마크뿐 아니라 올림픽 관련 단어와 마스코트, 디자인을 광고나 제품에 부착해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다. 올림픽 운영과 관련한 제품을 대회 조직위원회에 우선적으로 납품할 권리도 갖는다. 올림픽은 ‘후원사의 제품과 기술로 도배돼’ 치러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게다가 후원사들은 다음 올림픽 스폰서십에서도 우선권을 갖는다. 기업이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경쟁자에게 후원사 지위를 빼앗기지 않는다는 뜻이다.
반면 올림픽 스폰서십을 확보하지 못한 기업은 올림픽 기간 공식적으로는 올림픽 관련 마케팅을 벌일 수 없다. 이번 런던 올림픽부터 IOC는 규제를 더욱 강화했다. 공식 스폰서가 아닌 기업은 올림픽 기간 중 홍보나 마케팅에 ‘올림픽’이라는 단어는 물론이고 ‘2012 런던’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등의 낱말을 사용할 수 없다. 스포츠를 통해 이념과 사상, 국가와 인종, 종교와 빈부의 차이를 초월해 인류의 화합과 평화에 기여한다는 올림픽 정신에서 벗어나 ‘지나친 상업주의’라는 비난이 끊이지 않는다. 기업들은 IOC의 규제를 우회한 마케팅 아이디어를 내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
김종 한양대 교수(스포츠산업학)는 한국 기업들이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국제 규모의 대회를 활용한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으나 국내 스포츠 대회와 스포츠팀에 대한 내실 있는 지원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 Green Vision : 환경·문화에 집중한 런던… 평창의 비전은?
올림픽은 국가 홍보 및 도시 마케팅 수단이기도 하다. 런던 올림픽은 환경과 문화를 주제로 삼았다. 쓰레기를 매립하던 런던 북동부 리 밸리에 주경기장을 세웠다. “부수고, 파고, 디자인한다(Demolish, Dig, Design)”는 모토 아래 건설한 친환경 경기장이다. 전체 8만 석 중 5만5000석이 임시좌석이다. 올림픽이 끝난 뒤 철거된다. 주경기장은 2012~2013 시즌부터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의 홈구장으로 사용된다. ‘리사이클’ 개념을 경기장에 도입한 것. 적자로 신음하는 한국의 월드컵 경기장들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은 한국, 강원도, 평창을 세계에 알릴 호기다. 평창은 그간 올림픽이 열린 도시보다 입지 조건이 나쁘다. 글로벌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려면 비전이 훌륭해야 한다. 기업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평창 동계올림픽의 매력은 뭘까? 올림픽을 위해 강원도에 건설한 시설은 사후에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성공한 올림픽을 교사 삼고, 실패한 올림픽을 반면교사 삼아 ‘국가 홍보 및 도시 마케팅 방안’과 ‘올림픽, 이후의 비전’을 지금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