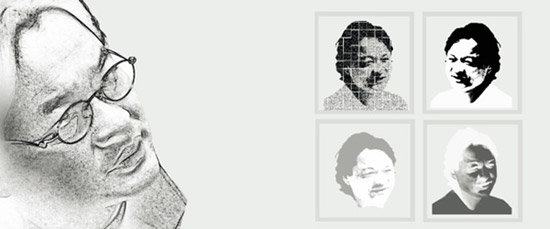
내 이름에는 대략 다섯 개의 타이틀이 붙어 다닌다. 시인, 문화평론가, 출판평론가, 방송인, 음악칼럼니스트. 이렇게 여러 개의 타이틀을 가졌다는 건 어느 하나 뚜렷한 타이틀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평을 쓰면 ‘출판평론가’, 음악원고를 쓰면 ‘음악칼럼니스트’, 장르가 애매하면 ‘문화평론가’ 하는 식이다. 원고를 쓰거나 방송에 출연할 때마다 같은 질문을 받곤 한다. ‘직함을 뭘로 달까요?’ 민망한 일이다. 내 대답은 한결같다. ‘아무거나 편한 대로 쓰세요….’
며칠 전 종로 세운상가 앞에서 전경들에게 불심 검문을 당했다. 부스스하고 초라한 차림에 장발을 휘날리는 외양이 아마도 범죄자가 망치나 칼 같은 범죄도구를 구입하러 서성거리는 모습으로 비쳤던 모양이다. 그런데 아, 창피하여라. 잔뜩 주눅든 채 주민등록증을 건네면서 나는 “저어, 방송진행잔데요…”라고 말하고 말았다. 전경 셋은 “아, 방송이요?” 하면서 저희들끼리 비쭉 웃는다. 어쨌든 아무 일 없이 풀려나긴 했지만, 나를 보내놓고 그들끼리 킬킬거렸을 것이다. ‘네가 방송진행자면, 나는 박신양이다’라고 하면서.
하지만 나는 3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현역 방송인이 맞다. 매일 아침 FM라디오에서 음악DJ를 하고, 또 매주 TV 토론 프로그램과 라디오 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전경들에게 그런 반응을 얻은 까닭은, 아마도 너무나도 ‘비(非)방송스러운’ 행색 탓일 게다. 나는 자동차도 없고, 싸구려 밥집만 드나들고, 1만원짜리 남방셔츠 하나로 한 계절을 때우며 산다.
방송이 직업 중 하나가 된 것은 정말 우연이었다. 회사원 시절 라디오에서 10분짜리 책 소개 코너를 맡고, 또 FM라디오에서 선곡 아르바이트를 한 게 방송 일의 시작이었다. 뜻밖에 진행자 자리를 제의받고는 회사 월급과 출연료 사이에서 고민하다 좀더 많이 주는 쪽을 택한 게 방송이었다. 하지만 단 6개월 만에 ‘잘리고’ 나서의 그 황당함이라니. 이후 한때는 일주일에 일곱 군데의 프로그램에 회당 5만원짜리 패널로 출연하기도 했다. 이렇게 9년이 지났다. 이제는 방송일이 매우 익숙해졌지만 언제 잘릴지, 잘리게 되면 다른 일을 맡게 될지 막연하고 불안한 마음만은 변하지 않았다. 나는 어떤 이유로든 ‘프로’를 택했다는 방송인을 볼 때마다 정말 부럽고 존경스럽다.
출판평론가 타이틀 역시 우연히 얻게 됐다. ‘책하고 놀자’라는, 국내 방송 사상 최초의 데일리 책 프로그램이 생겼는데, 이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된 것이다. 프로그램은 꽤 성공적이었고, 각종 서평 요청이 밀려들었다. 심지어 동아일보에서 ‘출판자문위원’이라는 타이틀까지 안겨 줘 한동안 막연한 원고를 꽤나 휘날린 적도 있다. 대학교수가 아니면 전문가일 수 없는 국내 풍토에서 가령 ‘담배의 역사’ ‘성의 풍속’ ‘법정스님 에세이’ 같은, 분야가 애매한 책은 온통 내 차지였다. 어떤 지면에서는 김치에 대한 글까지 쓴 적도 있다. 그렇게 던져주면 썼다. 달리 도리가 없었다.
문화평론가라는 타이틀에는 약간의 역사성이 깃들여 있다. 1980년대 초 신군부의 ‘언론대학살’ 이후 자유기고가라 불리는 일군의 필자가 등장했다. 신문사에서 쫓겨난 기자들이 생계수단으로 각종 지면에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들을 일컫는 칭호가 자유기고가였던 것이다. 당시 자유기고가들은 그것이 ‘백수’를 뜻한다고 말하곤 했다. 1990년대 접어들어 백수 자유기고가를 약간 격상시켜 표현한 것이 바로 문화평론가다. 여기엔 ‘교수는 아니지만 지식사회의 일원’이란 함의도 들어 있다. 박사 실업자가 양산된 이후의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다.
어쨌든 어떤 잡지의 여기자가 그동안 즐겨 쓰던 ‘시인’이라는 타이틀을 떼어내고 문화평론가 타이틀을 붙여줬는데, 그 기자의 변(辯)이 지금도 귀에 쟁쟁하다. “시인은 너무 고리타분하잖아요.” 시인을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멋진 존재로 알고 성장기를 보낸 내게 그의 말은 충격이었다.
이제는 시를 쓰지 않으니 ‘시인 김갑수’가 잊혀지는 건 당연한 이치다. 그럼에도 나는 여전히 웬만하면 시인으로 불리길 바란다. 사춘기 시절, 시로부터 강력한 불세례를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1989년 첫 시집을 내고 난 뒤부터는 시에 대한 미친 듯한 열정이 사그라들었다. 이제는 읽지도 쓰지도 않은 채 10년을 훌쩍 넘겼다. 그러나 간혹 시인이라는 타이틀이 내 이름 밑에 걸리면, 나는 옛 여자를 떠올리는 심정이 되곤 한다. 그녀를 다시 만날 길은 없는 걸까, 그녀가 다시 내게 돌아와주진 않을까….
그러나 음악에는 ‘모든 것을 바쳤다’는 표현을 쓸 수 있다. ‘모든’이란 시간과 돈을 의미한다. 중학교 시절 이래 정말 많은 음반을 사들였고, 수없이 오디오를 교체했다. 최근에는 작업실에 있는 음반 전부를 집으로 옮기는 대역사를 감행했는데, 그동안 2만장으로 추산했던 음반이 인부들의 계산으로 그보다 훨씬 많다는 걸 알게 됐다. 내 귀는 흡사 자석과도 같아서 음반가게에서 전화가 걸려오면 모든 일을 제쳐두고 달려가야 한다. 지금도 음반가게에서는 전화가 끊임없이 걸려온다.
지난 연말부터 여러 일로 수입이 꽤 늘어나게 됐다. 처음으로 통장에 잔고가 쌓이기 시작해서 심지어는 땅을 살까, 아파트를 살까 하는 삿된 마음까지 품게 됐다. 친구들과 모인 자리에서 호탕하게 계산을 치르기 시작한 것도 그 즈음부터였다. 하지만 그런 여유도 잠시였다. 최근 두 달에 걸쳐 나는 네 조의 스피커, 다섯 대의 앰프, 그리고 대략 1000여장의 LP를 새로 구입했다. 세운상가를 서성대다 불심 검문에 걸린 것도 대개 그런 연유였다.
고교시절을 온통 채웠던 무교동 ‘르네쌍스’의 바로 그 스피커 ‘하츠필드’ 오리지널이 들어왔고, 알텍 발렌시아, JBL 에베레스트, 알텍-웨스턴 풀레인지 755A 스피커가 작업실과 거실을 그득 채웠다. 300B, EL 34, 6550 등의 화려한 진공관 불빛이 밤하늘의 별처럼 스피커 주위를 빛낸다. 훌륭한 사람이었다면 이웃돕기성금에 희사했겠지만, 나는 처음 가져본 여유로 한풀이를 한 셈이다. 하지만 기자가 내 원고에 ‘음악평론가’라고 붙이면 나는 기를 쓰고 고쳐달란다. 평론가는 무슨…. ‘음악애호가’가 적절할 텐데. 그렇게 승강이하다 타협한 게 ‘음악칼럼니스트’란 직함이다. 작년부터는 한 신문사의 객원기자가 되어 음악회 리뷰를 담당하고 있으니, ‘기자’란 타이틀 하나를 더 얻은 셈이다.
대여섯 개 타이틀로 살아가는 내 삶에 자조도 자부도 하지 않으련다. 살다 보니 그렇게 돼버린 것이니까. 다만 취향과 기질로 먹고 산다는 게 행운이라면 행운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공통점은 없을까. 돌이켜보니 나는 꽤나 집요했다. 소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오디오 세팅으로 며칠 밤을 새우기 일쑤였고, 황당한 원고청탁을 받고도 어떻게든 써냈다. 거의 원수처럼 마음 맞지 않는 PD와도 이 악물고 버티며 일했다.
이제는 10년 후가 궁금하다. 그때도 지금처럼 종잡을 수 없는 여러 개의 타이틀과 더불어 살고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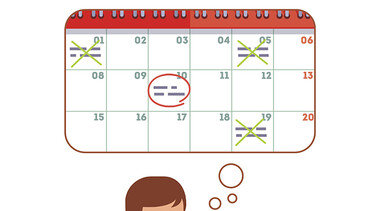


![[지상중계] 제12회 나지포럼, “북미 정상회담 성과내기 어려워”](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43/48/32/69434832107aa0a0a0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