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도로 익산 인터체인지를 나와 시내를 향해 10여 분 달리면 여산으로 가는 갈림길을 만날 수 있다. 왕궁저수지를 거쳐 가는 그 길은 부드러운 구릉과 정겨운 동리가 이어져서 마음에 성가신 바가 없다. 갈림길에서 6㎞쯤, 그 정도 운전이면 된다. 여산이 아직 먼데 길가에 ‘가람 이병기 생가’라는 표지판이 나타난다. 여기가 논산군 여산면 원수리다.
마을 골목길을 조금 걷다보면 머지않아 단정하면서도 기품 있는 초가 채가 손님을 맞는다. 수우재(守愚齋). 가람의 집이다. ‘어리석음을 지키며 사는 집’이란 옥호(屋號)도 옛 선비들이 하던 통상의 작명법을 좇은 것이다. 1891년, 가람은 이 집에서 태어났고 1968년 이 집에서 눈을 감았다.
가람 이병기 생가의 난초 향
집 안으로 들면 먼저 ‘초가집도 이렇게 품위가 있을 수 있구나’ 놀랄 정도로 집의 모양새와 배치 그 가꿈이 남다르다. ‘一자형’의 사랑채, 그 옆의 고방채, 마당 안쪽의 기역자 안채 그리고 작은 연못을 두고 선 억새 지붕의 정자. 어느 것 하나 예쁘고 정갈스럽지 않은 것이 없다. ‘조선 말기 선비 집안의 집 모양을 따랐다’는 설명을 얻을 필요 없이 담백한 선비의 생활상을 그대로 엿볼 수 있는 아름다운 집이다. 크지 않으면서도 옹색한 바가 없고 꾸민 바 없으면서도 절로 꾸며진 집이기 때문이다. 맷돌이 놓인 조붓한 마당을 지나 안채를 돌아들면 윤기 나는 장독들이 햇살을 퉁기고 집을 두른 대밭의 댓잎들이 콩알 쏟아내듯 청명한 바람소리를 전한다. 연못가의 오래된 산수유와 배롱나무들도 옛 주인의 여유와 멋을 자랑하는 듯싶다.
잠시, 볕 좋은 사랑채 좁은 툇마루에 앉아 바람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어느 가을 밤 술 한 잔을 반주로 한 시인이 읊었을 시구마저 절로 떠오른다.
바람이 서늘도 하여 뜰 앞에 나섰더니
서산머리에 하늘은 구름을 벗어나고
산뜻한 초사흘 달이 별과 함께
나오더라
달은 넘어가고 별만 서로 반짝인다
저 별은 뉘 별이며 내 별 또한
어느 게오
잠자코 호올로 서서 별을 헤어 보노라
- 가람 이병기 시 ‘별’ 전문
이 시는 전주의 다가공원에 서 있는 시비에, 그리고 가람이 다닌 여산 남초등학교 교정에 세워진 시비에도 적혀 있다. 곱고 맑지 않은가. 자칫 유치할 수도 있는 바를 여백의 미와 의도적인 무심으로 헌칠하게 극복하는 솜씨가 놀랍다. 난초를 시로 제대로 읊자면 시인 자신이 난초의 향과 맑음을 지니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 시가 곧 사람임은 가람의 여타 시조들을 통해서도 쉬 깨닫는 바다.
눈 덮인 모악을 넘어
세상을 이기러 가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의 발자국마다
늦게 눈이 녹고
올해도 핏빛 진달래는
눈부시게 나부낀다.
- 김용택 시 ‘모악산은 모악이다’
부분
석가모니 부처의 세상이 다한 뒤 이 세상을 제도하는 부처가 미륵이다. 질병도 고통도 없는 그 영화로운 미륵 세상의 이름이 곧 용화세계다. 수천 년 세월 동안 우리네 민초들이 미륵을 받들면서 미륵 오시는 때를 기다린 것도 모두 현재의 고단과 간난 때문이었다. 모악산(母岳山) 기슭의 큰 가람 금산사는 미륵 부처의 전당이다. 따라서 익산의 용화산과 함께 김제의 모악산은 우리네 미륵신앙의 홈그라운드가 되는 영험한 산이 다.
앞의 시에서 김용택 시인은 모악산을 가리켜 ‘제 살을 허물어 사람을 키우고’ ‘제 피를 흘려 풀뿌리를 적시는’ 산이라면서 그 역사성과 민중성을 여실히 드러내지만 나는 이런 엄숙한 이야기는 잠깐 접어둔 채 발걸음 가볍게 산길로 들었다. 핏빛 진달래가 피기는커녕 낙엽도 다 진 늦가을, 청승맞게 찬비까지 내리는 날이었다.
등산로는, 절을 지나 절을 버린 데서부터 시작된다. 심원암까지는 완만한 산책길. 도중에 갈림길이 있지만 표지판이 있어서 혼동할 염려는 없다. 암자를 지키던 스님마저 빗소리 좇아 큰절로 가신 것일까. 헛기침을 해보지만 인기척이 없다. 절 뒷마당으로 돌면 무성한 시누대 울타리를 만나고 그곳의 개구멍 같은 통로 끝에 다시 등산로가 이어진다.
제 피 흘려 풀뿌리 적시는 모악산
아연 산길이 가팔라진다. 비옷을 걸친 탓에 금세 땀이 난다. 20여 분 만에 능선 안부(鞍部)에 선다. 장군대다. 높은 데 올랐건만 비안개 덕에 그럴싸한 조망은 얻질 못한다. 정상으로 가는 오른편 길을 따라 오르면 또다시 시누대 무리를 만난다. 예사의 산죽들 모양 키 낮은 것들이 아니어서 우중 산행에서는 웬만큼 성가시기도 하다. 그렇지만 댓잎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만으로도 홀로 모악을 찾아든 감상은 오롯이 할 수 있다. 그리고 산길에 도열한 이 푸르고 날카로운 잎새들이 가지는 위의(威儀)와 함께 모악의 정한을 생각해볼 겨를도 가질 수 있게 된다.
그것들이 자연에 덧칠한 감상이면 어떠랴. 물상의 의인화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 미륵 용화세상을 꿈꾸던 이들이 이 산에 크고 높은 가람을 세우고 기구를 올린 내력도 결국은 그런 감정이입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었다. 탐관오리와 외세를 무찌르고자 떨쳐 일어난 동학도들이며 개세(蓋世)의 웅지를 품었던 정여립과 강증산이 이 산을 정신적 의지처로 여겼던 연유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산이 사람들을 키웠으며 그들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 눈 덮인 산을 넘어갔다는 시인의 감개는 전혀 지나친 것이 아니다. 모름지기 산을 찾고 강을 만나는 이들은 자연의 즉물적인 미감만 취할 것이 아니라 앎의 안목을 보태어 내재의 미감까지 얻어 느낄 줄 알아야 하는 법, 그렇게 보면 모악산은 산 스스로 넉넉한 탓에 만학천봉이며 기암괴석은 차라리 사치스러운 것이 되고 만다.
산은 위로 오를수록 더 깊어지는데
나는 저 아래 도시에서
한 뼘이라도 아파트 평수를 늘리려고
얼마나 얕은 물가에서 첨벙대기만 했던가
세상을 휘감고 흐르는 강물로 되지 못하고
하릴없이 바짓가랑이만 적셔 왔던가
-안도현 시 ‘모악산을 오르며’ 부분
같은 시대를 사는 같은 연배의 두 시인이 산 하나를 두고 가지는 생각은 이렇듯 다르다. 앞의 시가 심각하고 씩씩하다 싶으면 뒤의 것은 수줍고 살갑다. 이는 대상에서 가지는 느낌을 ‘우리’로 확대하는 것과 ‘나’로 축소하는 데서 오는 차이다.
더욱 굵어지는 빗줄기, 앞을 가늠할 수 없게 하는 비안개 그리고 동행 하나 없다는 적요감이 발걸음을 무겁게 하지만 이런 시들이 거들어주는 탓에 크게 힘든 줄은 모른다. 그러곤 위의 시에 있는 시구처럼 ‘조금만 더’ ‘저기까지만 더 가보자’ 하다가 이윽고 정상 어귀에 서고 만다. 이제 왔던 길로 되돌아가는 일밖에 없지만, 산꼭대기 돌멩이를 디디고 서지 못한 데서 오는 아쉬움 따위는 없다.
귀신사, 금평저수지, 제비산…
금산사에서 나오는 때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귀신사도 한번 둘러보라고 권한다. 금산사 주차장에서 나오면 이내 신주 사거리를 만나는데 이곳에서 전주 방향의 712번 도로를 따라 10여 리쯤 가면 절을 볼 수 있다. 규모가 크지 않고 소문난 절도 아니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각별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 의상대사가 창건했다는 이 절은 지금은 금산사의 한 말사(末寺)이지만 예전에는 되레 금산사를 말사로 두던 시절도 있었다. 양귀자의 소설 ‘숨은 꽃’에서도 이 절은 꽤 중요하게 언급된다.
개울을 건넌 뒤 돌담이 예쁜 마을길로 해서 절에 오르면 여느 절에서는 쉬 맡아보지 못한 억겁의 먼지 냄새 같은 것이 풍기곤 했는데. 절 앞 화단에는 앙증맞은 남근석(男根石) 하나도 있으니 예사로 지나치지 말 일이다. 산이 가진 음기를 누르기 위해 그 옛날부터 있었다는데 그것 자체의 모양새는 ‘위풍당당’과 거리가 멀다.
왔던 길로 되돌아 나올 경우, 내친김에 금평저수지 상류 쪽으로 좀 더 올라가본다. 증산교 교당 있는 곳에서 2~3㎞만 더 전진하면 된다. 기슭에 과수들을 심어놓은 밭들이 층층으로 있는 이 산이 제비산이다. 밭뙈기 위편에 작은 암자 하나가 있어서 저수지며 평야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이는 월명암이다. 벼슬을 내던지고 고향에 내려왔던 정여립이 대동계를 만들어 앞날을 준비하던 무렵 그는 이곳에서 군사훈련을 하는 동시에 천신에게 기도를 드리며 의지를 다졌다고 전해진다. 승용차는 암자까지 올라갈 수 있다. 조용한 암자 마당에서 탁 트인 전망을 보노라면 절로 가슴속이 후련해진다. 절 뒤편 산길을 200여m 오르면 치마바위라는 바위벽을 볼 수 있는데 이곳이 바로 정여립이 기도를 드리고 강증산이 후천개벽을 꿈꾸던 유서 깊은 곳이다.
이렇듯, 새기고 익혀서 둘러보노라면 모악산과 그 주변 어디에도 역사의 숨결과 겨레의 정한이 남아 있지 아니한 곳이 없다.
망해사(望海寺)와 심포 나루터
예전 학창 때 교과서에서 읽은 글들 중 아직 기억에 남아 있는 것이 더러 있다. 역사학자 천관우 선생의 글이었던가. ‘기차는 원의 한가운데를 달린다’고 시작되는 미국 대평원 기행 글도 그중 하나다. 일망무제(一望無際). 가도 가도 산 하나 보이지 않는 드넓은 평원을 글쓴이는 그렇게 멋지게 표현하고 있었다. 짐작은 가나 실감할 수 없었던 독서의 경험은 먼 뒷날 만경평야 한가운데를 차로 달리는 동안 보기 좋게 되새김할 수 있었다.
키 낮은 집들이 도로 가에 엎드려 있고 행인들의 발걸음조차 한가로운 만경의 면소재지를 벗어나 진봉면을 찾아 차를 달리다보면 어느 순간 아연 원의 한가운데에 포착되었음을 깨닫는다. 둘러보면 사방 어느 곳에도 산이 없다. 들판과 마을뿐이다. 들판이 넓다보니 마음마저 절로 아득해지는데 다행히 실개천이 길을 따라주고 낯익은 마을들이 길을 터주는 까닭에 지루한 줄을 모른다.
진봉에 이르러 새롭게 낮은 산들을 만나면 바다가 멀지 않았다. 고사리 마을을 지나고 진봉초등학교를 거치면 경주의 왕릉 하나를 떼다놓은 듯한 봉화산이 눈앞에 다가든다. ‘망해사’ 안내판을 보고 비탈진 산길로 꺾어들면 숲 그늘이다. 나뭇가지 사이로 마을을 내려다보며 산길을 가다보면 이윽고 더 나아갈 수 없는 작은 공터를 만난다. 망해사 주차장이다. 절 지붕 너머로 푸른 바다가 그림처럼 펼쳐 있는데 바닷바람을 타고 오는 풍경 소리가 애처롭다.
깎아지른 바위벽 위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망해사 절집이 갈매기 집 같다. 요사채에 앉은 비구니는 객인한테 무심한 눈길 한 번 주고는 그만이다. 법당을 등진 채 아름드리 고목 아래 서서 바다를 마주하면 지금껏 지나왔던 산과 들판이 모두 꿈과 같다. 더 나아갈 수 없는 벼랑. 욕망과 회한 그리움조차 바닥난 몸살 같은 것. 물결은 그렇게 끝없이 바위벽에 제 몸을 부딪히며 제 몸을 깨뜨리고 있다.
심포는 망해사 산 너머에 있는 작은 포구다. 어패류를 파는 작은 골목을 지나면 곧바로 바다다. 썰물 때 드러나는 끝 간 데 없는 갯벌 그것은 차라리 시베리아평원이며 사하라사막이다. 그곳에서 조개 캐는 여인네들이 폐선들 사이를 지나 아지랑이 이는 지평선 끝으로 사라지는 막막한 모습을 보라.
|
이 바다에도 미륵을 기다리는 천년의 간구가 있다. 오늘날에도 재현되는 매향제(埋香祭)가 그것이다. 향나무를 통째로 갯벌에 묻는 의식. 500년, 1000년이 지나면 향나무는 다이아몬드보다 더 단단해진다. 그 향을 사루어 부처님을 뫼신다는 정성이 이 의식에 담겨 있다. 500년 전, 세상 바꾸려고 마음먹었던 정여립도 이 갯벌에 향나무를 묻었다. 기다림과 그리움의 간구가 바다처럼 퍼져나간 데가 이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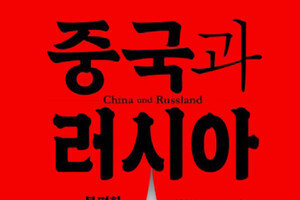




![[전쟁이 남긴 빈자리②] 혼자 아닌 ‘연대’로... 요르단 난민들의 회복 공동체](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3f/d5/4a/693fd54a1f36a0a0a0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