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11월22일 오후 7시(현지시각) 인도 뉴델리 시리포트 공연장에서 열린 리틀엔젤스 예술단 공연을 보러 온 현동화(79)씨는 인도에 남은 마지막 반공포로다. 최인훈 소설 ‘광장’의 주인공 ‘이명준’처럼, 그는 6·25전쟁 이후 남한도 북한도 아닌 제3국을 선택했다. 고향을 떠난 지 60년이지만 여전히 진한 북한 말씨가 남아 있다.
현씨는 1932년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나 1950년 사동군관학교를 졸업했다. 6·25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인민군 중위로 참전했다 10월 포로로 잡혔다. 약 2년간 거제도포로수용소에 수감되면서 국군에 귀순했지만 그는 전쟁 이후 남한도 북한도 아닌 제3국을 택했다.
“살아선 못 돌아갈 거라는 비장함”
“인민군으로 참전할 때부터 공산주의에 대한 반감이 컸어요. 당시 이북에서 머리가 좀 있는 사람은 모두 공산주의를 싫어했고 이남에서 똑똑한 사람들은 이북을 동경했지. 전쟁 이후 남한에 남느니 미국 가서 공부를 더 하고 싶었는데 미국은 바로 갈 수가 없거든. 그래서 제3국 멕시코로 가겠다고 한 거죠. 밀입국을 해서라도 꼭 미국에 가고 싶었으니까.”
1954년 1월 중립국을 택한 인민군포로 76명과 중공군 포로 12명은 인도 군인들과 함께 인도로 가는 아스토리아호에 몸을 실었다. 그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란 비장한 생각에 빠져 있는데 선착장에서 반공 청년단 150명이 ‘한국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외쳤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그가 최인훈 소설 ‘광장’ 이야기를 꺼냈다.
“1960년대 남과 북의 현실과 이념, 고뇌에 대해 글을 썼다는 건 아주 놀라운 일이지만, 사실 그 사건을 겪은 사람으로서 최인훈씨 소설에는 오류가 많습니다.”
일단 소설 속 이명준은 남과 북에 대한 환멸 때문에 제3국을 택했지만, 포로 76명의 생각은 제각각이었다. 현씨는 “나처럼 유학하기 위해 가는 사람도 있었고 자유롭게 사업을 하고 싶어 제3국을 선택한 사람도 있었다”며 “우리가 모두 이념적 선택을 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11월 21일 리틀엔젤스 예술단이 인도 집권당 국민회의의 소냐 간디 당수 앞에서 공연을 선보였다.
이러한 ‘사소한 오류’ 말고도 현씨가 “광장은 100% 픽션”이라 주장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소설 속 이명준이 월북 후 노동신문사 편집국에 근무하는데, 북한 사정상 이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
“이건 북한의 사고방식을 몰라서 하는 소리야. 이북은 아무리 아버지가 고관이라도 이남 출신이면 절대 큰일을 안 줘요. 남로당 박헌영을 숙청하는 게 북한이라고. 똑똑하거나 무조건 찬양하거나 비판하는 사람은 다 위험요인으로 보거든. 그런데 이남에서 온 대학생을 바로 노동신문 기자 시킨다? 말도 안 돼. 특히 당시 노동신문은 신민당 기관지랑 공산당 기관지가 통합한 신문이었기 때문에 북한의 정치권력 중심에 있었어요. 실제 권력은 장관보다 많았다고. 그리고 소설에는 북한의 억압적인 통치 실상이 제대로 묘사되지 않아 아쉬웠어요. 소설보다 몇 배는 더 처절하고 숨 막히는 일들을 내가 목격했는 걸. 소설 쓰기 전에 최 선생이 나랑 한 번 만났다면 훨씬 좋은 작품이 나왔을지도 모르지(웃음).”
월남 이명준이 노동신문 기자? 말도 안 된다!
1954년 인도에 온 인민군포로 76명은 2년간 뉴델리 야전병원에서 생활했다. 상당수 포로가 아르헨티나와 브라질로 떠났다. 현씨는 멕시코를 거쳐 미국에 가겠다는 일념으로 기다렸지만 멕시코는 끝내 포로를 허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결국 포로 4명만 인도에 남았다.
당시 인도 정부는 네 사람의 자립을 위해 1만 루피 융자를 줬다. 공부를 포기한 그는 그때부터 사업에 매달렸다. 델리 인근에 큰 양계장을 차려 성공했다. 이후 인도 힌두교사원에서 머리카락을 사 한국 가발공장에 수출했다. 힌두교도는 소원을 빌 때 머리카락을 잘라 사원에 바치는데, 사원은 이 머리카락을 모아 경매에 붙인다. 1970년 현씨는 한국 기업을 도와 아프가니스탄 카불에 섬유공장을 세웠다. 이밖에도 무역회사, 여행사 사업 등을 성공시켰다. 그는 “대한민국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를 악물고 사업했다”고 고백했다.
“사실 나는 전쟁 이후 우리나라가 가장 힘들 때 나 혼자 잘되겠다는 생각으로 조국을 등지고 이곳에 왔잖아요. 거기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어요. 그만큼 한국이 잘되게 백방으로 도와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죠.”
그가 1989년 이후 20년 가까이 주(駐)인도 한인회장으로 활동하며 한국과 인도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해온 것 역시 같은 이유에서다. 은퇴 이후 그가 가장 마음을 쓰는 일은 인도 유피주 아요디아에 있는 허황옥 기념비 관리 사업이다. 인도와 한국에는 가야의 시조 김수로 왕의 부인 허황옥이 인도 아유타국의 공주라는 전설이 내려온다.

11월22일 공연을 마친 리틀엔젤스 예술단 단원들이 한국전 참전 용사 4명에게 ‘영웅 메달’을 수여했다.
“허황옥 공주는 2000년 전 여자의 몸으로 혼자 한국으로 갔죠. 저는 60년 전 당시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인도에 정착했고요. 허황옥 공주나 저나 한국과 인도를 이었다는 점에서 인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불교 용어로 카르마라고 할까요. 허황옥 공주와 김수로왕의 인연을 살린다면 인도와 한국이 더욱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을 텐데 한국 정부가 이에 소홀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는 1962년 대한민국 국적을 획득했다. 지금도 1년에 4차례 이상 한국을 방문한다. 두 자녀 모두 한국에서 대학을 마쳤다. 늘 한국이 마음에 남아 있다. 하지만 아직도 고향, 함경북도 청진에는 못 가봤다. 그는 “북한 입장에서 나는 민족의 반역자인데, 죽기 전에 고향에 갈 수 있겠어?”라며 웃었다. 그는 2011년 초 강원도 양구를 찾았던 이야기를 꺼냈다.
“6·25전쟁이 1951년에 끝나지 않은 이유는 반공포로 때문이거든. 북에 안 가겠다는 반공포로 때문에 유엔군과 중공군이 이념적으로 옥신각신하다보니 휴전하는 데 2년이나 걸린 거지. 그때 양구에 가서 제4 땅굴을 봤는데 ‘아, 여기서 많은 육군, 유엔군이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사실 그게 나 때문이잖아. 가슴이 너무 벅차오르더라고.”
공연 내내 그는 어린 소녀들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덤덤하게 털어놓았지만 그의 79년 인생은 굴곡진 한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그의 희생 덕분에 한국의 아이들은 즐겁게 노래할 수 있었다. 공연 막바지, 단원들이 인도 전통 민요를 합창할 때 그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한국은 나를 낳아준 나라고, 인도는 나를 살려준 나라예요. 고운 한국 소녀들이 작은 입을 오물거리며 인도 민요를 부르는데, 꼭 내 두 조국이 합쳐지는 느낌이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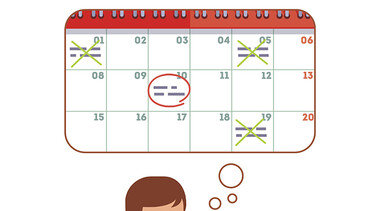


![[지상중계] 제12회 나지포럼, “북미 정상회담 성과내기 어려워”](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43/48/32/69434832107aa0a0a0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