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민공 1000여 명이 경찰차량을 불태우는 등 과격시위를 벌이자 6월13일 무장경찰들이 광저우 쯩청시 거리를 행진하고 있다.
샤오린 사건뿐만 아니다. 1979년 개혁개방 이후 30년 넘게 고도성장을 구가한 중국에서 최근 들어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같은 날, 광저우(廣州) 쩡청(增成)시에서는 농민공(農民工·시골 출신 도시 이주 노동자)들의 대규모 시위로 군이 투입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보안요원들이 청바지를 팔던 쓰촨(四川)성 출신 임신부를 폭행하자, 이에 분개한 농민공 1000여 명이 시위를 벌인 게 발단이었다. 6월12일에는 최소 6대의 경찰·단속차량이 불탔고, 무장 병력 2700여 명과 장갑차까지 동원됐다.
이에 앞서 6월9일에는 철거지역 재개발 과정에서 주민 입장을 옹호하다가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던 공무원이 숨지자 시민 1500여 명이 시 청사 앞에서 달걀을 던지며 항의시위를 벌였다. ‘일사불란’ ‘강경진압’을 떠올리는 중국에서 말이다.
잇따른 시위는 대체로 생활고와 상대적 박탈감에 기인한다. 지난해 말부터 중국에서는 돼지고기 등 식료품 가격과 주택 임대료가 급등했고, 도시 호구(일종의 주민등록)를 갖지 못한 농민공들이 자녀 취학과 주택 임대 등에서 사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데 대한 불만이 컸다. 소득불평등지수인 지니계수가 5.0(폭동을 유발하는 수준)을 넘는 상황이니 어쩌면 시위는 당연하다 할 수도 있겠다.
문제는 시위가 갈수록 잦아지고 폭력양상을 띤다는 점이다. 줄곧 ‘친민(親民)정책’을 천명한 후진타오(胡錦濤) 지도부로서는 쇼크에 가깝다.
체제 내 시민사회 vs 체제 외 시민사회
중국의 시민사회는 크게 ‘체제 내 시민사회’와 ‘체제 외 시민사회’로 구분할 수 있다. 체제 내 시민사회는 민영기업가, 지식인, 사회단체 등을 꼽을 수 있다. 체제 외 시민사회는 노동자 ,농민, 농민공 등이다. 장쩌민(江澤民) 체제의 중국은 기업가 등을 체제 내로 흡수하는 ‘엘리트 포용정책’을 썼다. 많은 자본가가 나타났고, 대학 교수의 급여는 올랐다. 정책결정에 인민(사회)단체의 대표를 참여시켰다. 이들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 올라탔고, 정부와 공생했다. 장이머우(張藝謀) 감독의 사정도 비슷했다. 1994년 칸영화제 수상식 참석을 막았던 중국 정부는 2000년대 들어 그를 영웅으로 만들었다. 2008 베이징올림픽 개막식 총감독으로 임명했고,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위원으로 포용했다. 이들은 경제발전과 정치체제 유지 전략의 핵심이었다.
문제는 ‘체제 외 시민사회’였다. 경제성장 최우선 정책은 당연히 이들의 희생을 요구했다. 사회주의에 시장경제를 접목해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뤘지만, 분배에서는 오히려 자본주의 체제를 넘는 심각한 불균형을 드러낸 나라가 중국이었다. 후진타오 역시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었다. 이들의 불만을 체제 내로 흡수하기 위해 친민정책, 즉 조화사회(和諧世界)와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을 주창했고, 신노동계약법을 만들어 농민공의 임금과 노동조합 권리를 강화했다. 올해 ‘10대 중점업무’에서 1번은 물가안정이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체제 흡수’ 노력의 결과는 ‘힘겨루기’로 나타났다. 중국 내 시위 건수는 2006년 약 6만건에서 지난해 18만건으로 급증했다.

이쯤 되면 후진타오는 ‘이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들을 끌어안으려면 임금상승과 노동권 보호는 필수다. 필연적으로 체제 내로 흡수한 기업가들의 이익과 대립할 수밖에 없다. 체제 내 시민사회의 동요는 곧 중국 정부의 동요다. 올해 처음 치안예산(106조원 이상)이 국방예산(102조원)보다 많은 중국의 고심이 깊은 이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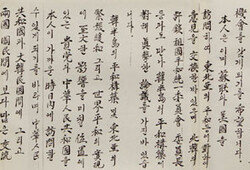















![[속보]‘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LG家 장녀 구연경·윤관 부부 1심 ‘무죄’](https://dimg.donga.com/a/570/380/95/1/ugc/CDB/SHINDONGA/Article/69/8a/d0/11/698ad0110e85a0a0a0a.jpg)






![[영상] 김다현 “언제나 내 편인 ‘얼씨구다현’과 함께 붉은 말처럼 달리렵니다”](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7c/82/65/697c82650640a0a0a0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