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원 100여 명과 매월 연구발표회를 여는가 하면, 초청 학술대회와 역사유적지 답사, 문화재지킴이 특강, 책자 발간 후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부산 용두산공원에 초량왜관표지석이 세워진 데 이어, 최근에는 연구회와 부산 중구청(김은숙 청장)의 노력으로 초량왜관 종합안내도가 설치됐다.
“왜관은 조선시대 대마도인들에게 허가한 무역 장소이자 체류지로, 대마도주의 요청으로 1407년 태종 때 처음 생겼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폐쇄됐다가 두모포왜관(동구 수정동)을 열었는데, 부지가 좁고 항구시설이 불편해 대마도주는 조선 정부에 계속 확장 이전을 건의했죠. 결국 1678년 초량왜관을 준공했어요. 초량(草梁)은 영도다리 아래를 흐르는 좁은 바다 물길을 일컫는데, 이 명칭이 현재 이 일대를 지칭하는 지명이 됐습니다.”
초량왜관은 현재 중구 대청로를 따라 국제시장을 지나 남포동 해변까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이는 오늘날 부산 원도심의 모태가 됐다. 약 10만 평 규모에 150여 동의 건물이 들어섰다. 네덜란드인의 거류지였던 일본 나가사키 데지마(出島)의 면적이 1만3000㎡(약 4000평)인 것을 감안하면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초량왜관에서는 대마도가 조선에 진상하는 (조)공무역과 사무역이 있었는데, 매월 여섯 차례 사무역 시장이 열렸다고 기록돼 있다. 왜관에 체류하는 대마도인 500여 명과 조선의 외교관(역관), 동래부 관원과 특허상인 등 많은 조선인과 대외 교역이 이뤄졌다. 대마도인들은 주로 면사와 인삼·쌀을, 조선인은 은·유황·서양 물품을 구입했다고 한다.

오늘날의 대사관, 무역관, 체류 숙소 등을 두고 교류한 자랑스러운 역사죠. 시계와 안경 등 서구 문물이 처음 들어왔고, 효종 때 북벌(北伐)을 즈음해 소총 4000여 자루를 들여온 곳도 초량왜관입니다.”
그러나 강화도조약 이후 왜관은 일본인 전관거류지로 변했고, 이로 인해 일제의 대륙 침략 교두보 구실을 하면서 ‘왜란’ ‘왜놈’ 같은 지우고 싶은 ‘왜(倭)자 콤플렉스’가 생겼다는 게 그의 설명. 당당한 역사가 ‘왜’자가 붙으면서 보여주기 싫은 역사의 흉터로 오인됐다는 부연이다.
일본인들도 조선 국왕의 전패(초량객사)에 숙배례(肅拜禮)를 하고, 조선이 교부한 도장을 날인한 문서를 지참해야 하는 등 부끄러운 장소로 인식했던 터. 강화도조약 이후 일본인이 제일 먼저 왜관의 수문을 없애며 흔적 지우기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이처럼 한일 양국에서 외면받던 초량왜관은 연구회의 연구와 복원 노력, 일본 대마도·나가사키시와의 교류 등으로 조금씩 알려지면서 한일 양국에서 재조명받기 시작했다.
“처음 왜관 연구를 한다고 하니 다들 ‘일본에 잘 보일 일 있느냐’며 핀잔을 주더군요(웃음). 그러나 이제는 왜관의 역사성이 제법 알려져 편하게 얘기합니다. 일본은 중앙정부가 나서 지난해 10월 데지마를 복원해 ‘세계 속의 데지마’를 알리는 전시관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도 정부가 나서 200년 넘게 지속된 평화 교역의 역사적 공간을 되살려 국제도시 부산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는 옛 한국은행 부산지점 건물을 복합문화시설로 만들 계획인데, 이곳에 초량왜관전시관 설치를 논의 중이다.
배수강 편집장
bsk@donga.com
굽은 나무가 선산을 지키듯, 평범한 이웃들이 나라를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남도 나와 같이, 겉도 속과 같이, 끝도 시작과 같이’ 살려고 노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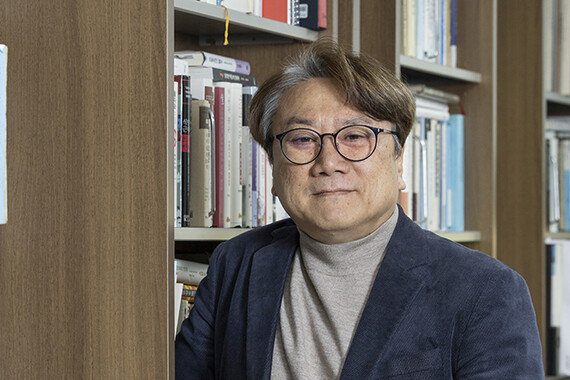




![[신동아 만평 ‘안마봉’] 2026년 ‘반중 지도자군(群)’의 행진](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9e/7c/5e/699e7c5e023ba0a0a0a.png)

![[영상] 김다현 “언제나 내 편인 ‘얼씨구다현’과 함께 붉은 말처럼 달리렵니다”](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8b/df/02/698bdf022269d2738e2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