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창립 50년 만에 한국을 세계 6대 원자력발전 강국으로 이끌었다. 외국 기술을 도입해 국내에 건설한 원자로를 자체 설계하고 핵연료의 국산화도 마무리했다. 2010년까지 한국을 원자력 톱5 국가에 진입시키고 2020년에는 넘버 3에 올려놓겠다는 한국원자력연구소의 爐心을 들여다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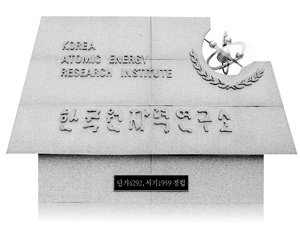
북한은 1955년에 원자 및 핵물리학연구소를 세웠고, 1962년에 원자력연구소를 만들었다. 남한도 비슷한 시기에 원자력 관련 기관을 설립했다. 1958년에 원자력법이 공포됐고 원자력원이 발족했다. 이듬해 3월1일, 원자력원(原子力院) 소속 기관으로 원자력연구소가 탄생했다. 당시 원자력연구소는 3부 11과 체제로 구성되었다. 시작이 반이었을까? 한국원자력연구소의 탄생은 폐허 위에 뿌려진 작은 씨앗이었다.
이렇게 남과 북이 원자력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당시의 국제정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원자력연구소 설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었던 것은 당시의 국제정세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1953년 겨울, 미국은 유엔 총회에서 원자력의 평화적인 이용을 제창했다. 그리고 이듬해 겨울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결의안을 유엔에 제출해 통과시켰다. 이후 미국은 여러 나라와 원자력에 관한 협력협정을 체결해 나갔다. 한국과는 1956년 2월3일 협정을 체결했다.
1950년대 후반은 한국 최초의 연구용 원자로 ‘트리가 마크-Ⅱ’의 건립으로 원자력원이 분주한 시간을 보내던 때였다. 독자적인 원자력 기술이 없던 우리는 미국의 도움으로 트리가 마크-Ⅱ를 마련했다. 1962년 11월, 원자력원은 원자력발전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외국의 원자력발전 기술개발 현황을 조사하고, 원자력발전소를 건립하기 위한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원자력연구소법을 갖고 있는 연구소
1967년 3월30일, 과학기술처가 발족하고 김기형 박사가 초대 과학기술처 장관을 맡았다. 원자력원은 과학기술처 외청인 원자력청으로 개편됐다. 1971년 3월19일 한국전력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WH)와 고리원자력발전소 제1호기(고리 1호기) 건설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때 원자력청은 제안서를 평가하는 등 기술적인 부분의 지원을 맡는다.
1973년 1월15일, 한국원자력연구소법이 제정 공포됐다. 이에 따라 원자력청 산하 3개 연구소인 원자력연구소·방사선의학연구소·방사선농학연구소가 통합되면서 한국원자력연구소가 발족한다. 이때 한국원자력연구소가 민영화됐는데, 이유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제약을 뛰어넘기 위해서였다. 운영의 자율성, 안정성 및 융통성의 확보와 연구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했던 것이다. 1966년 법인체 형태로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연구소가 효율적인 운영을 해서 본보기가 된 것이 자극제가 되었다.
이후 한국원자력연구소법은 1996년까지 모두 6차례 개정됐다. 이 법은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위상과 연구비 출연, 연구 방향, 연구자 양성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계획과 예산안은 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한국원자력연구소법이 제정된 데는 최형섭 과기처 장관의 공이 컸다. 1959년 8월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온 그는 한국원자력연구소법을 제정하는 데 힘을 쏟고, 1962년 한국원자력연구소 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한국원자력연구소는 꾸준히 발전해왔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원자력 개발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을지도 모른다. 한국원자력연구소는 1975년 10월 한국전력기술(주)을 자회사로 설립하고 1976년 12월1일엔 한국핵연료개발공단을 설립했다. 그리고 1980년의 마지막 날인 12월31일, 한국핵연료개발공단을 흡수 통합하면서 한국에너지연구소로 명칭이 바뀌었다.
되찾아온 이름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소에 있는 진단용 방사성 의약품 테크네튬-99m 생산시설.(맨위) 1984년 원자력연구소가 개발한 국산 중수로용 핵연료 최초 장전 행사.(가운데) 하나로에서 생산한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연구.(맨아래)
애초 원자력병원은 1963년 원자력원 산하 방사선의학연구소로 설립됐고, 1968년 2월 방사선의학연구소 암병원으로 문을 열었다. 방사선의학연구소 초대 소장은 안치열씨였다.
1989년 12월30일 한국에너지연구소는 본래 이름인 한국원자력연구소로 돌아왔다. 1990년 2월엔 한국원자력연구소 산하 원자력안전센터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 독립했고, 같은 해 9월 원자력환경관리센터를 부설기관으로 설립했다. 1996년에는 정부 방침에 따라 핵연료사업과 방사성폐기물사업 등을 산업체로 이관했다.
한국원자력연구소는 1990년대 중반까진 기술 자립을 이루고, 그 후론 기술고도화 달성에 주력했다. 첫 번째 성과로 1987년 국내 중수로의 핵연료 전량을 공급하게 됐다. 1981년 개발에 착수해 6년 만에 성과를 거둔 것이다.
1988년엔 경수로 핵연료를 국산화했다. 1995년에는 통합안전성분석코드 ‘키랩(KIRAP)’을 개발하고 수출했다. 1995년엔 다목적 연구로(爐)인 ‘하나로’를 자력으로 설계해 완공하고 다음해엔 한국형 표준원전 ‘KSNP’를 개발했다. 2002년에는 일체형 원자로(SMART) 개념을 설계 완료했다.
최근에는 외국 기관들과 여러 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올해 9월5일엔 루마니아 원자력연구소와, 9월14일엔 카자흐스탄 국가원자력센터와, 9월27일엔 일본 최대 방사성 동위원소 및 방사선 관련 사업체인 치요다테크놀사(CTC)와 업무협력을 약속했다. 한국원자력연구소의 박창규 소장은 2006년 2월 국제원자력기구(IAEA) 자문위원에 임명되었다.
9월29일에는 5년간의 준비 끝에 한국원자력연구소 정읍분소인 방사선연구원을 설립했다. 이곳에는 ▲감마선 조사시설 ▲전자선 가속기 ▲이온빔 조사시설 ▲감마파이토트론 농작물 육종연구를 위한 자체 시험농장 등의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다. 정읍분소 방사선연구원에는 앞으로 IAEA 지정 국제RT(Radiation Technology·방사선기술) 협력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한국원자력연구소는 미 항공우주국(NASA)과 함께 ‘우주 김치’도 연구하고 있다. 방사선 조사(照射)를 이용해 국내 모 김치업체와 최초의 한국 우주인이 먹을 김치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원자력연구소법 제7조에 따라 ▲원자력발전 관련 연구개발(신형원자로, 핵연료, 핵연료주기 기술, 원자력 안전연구) ▲방사선의학, 농학, 산업, 식품, 생명 등 원자력의 비발전(非發電) 분야 연구 ▲원자력 기초 기반기술 연구(핵융합, 양자광학, 신소재, 로봇 연구) ▲원자력 정책연구 및 원자력 인력 양성 등에도 힘쓰고 있다.
모방에서 창조로!
올여름, 한국원자력연구소에 희소식이 날아들었다. 바로 세계적인 중성자 전문지인 ‘뉴트론 뉴스’에 국내 유일의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 관련 기사가 실린 것. 과학기술부는 ‘하나로’의 국제적 위상이 제고됐으며, 연구로 수출에도 청신호가 켜졌다고 내다봤다.
‘하나로(HANARO)’는 ‘High-flus Advanced Neutron Application Reactor’의 약어이다. 우리말로는 ‘고성능 첨단 중성자 응용 원자로’이다.

민영화한 한국원자력연구소 현판식(1973년).
하나로는 어떠한 종류의 원자로일까? 먼저 재료의 측면에서 보면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는 원자로에 속한다. 우라늄은 우라늄-235의 함량에 따라 감손 우라늄(DU), 천연 우라늄(NU), 저농축 우라늄(LEU) 혹은 고농축 우라늄(HEU)으로 나뉜다. 저농축 우라늄이란, 우라늄-235의 존재비가 20% 미만인 우라늄을 말한다.
하나로의 결정적인 특징은 다목적이라는 데 있다. 934억원이 들어간 하나로를 설계하고 만들어내는 데는 긴 시간이 걸렸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1956년 2월3일 원자력기술과 관련한 협정을 체결하고 미국의 제너럴 아토믹사로부터 트리가 마크-Ⅱ를 도입해, 1962년 3월30일 가동에 들어갔다. 1972년 5월10일엔 더 큰 용량의 트리가 마크-Ⅲ가 준공되었다.
중성자 유도관 국산화
트리가 마크-Ⅱ 원자로는 ▲원자력 관련 교육훈련 ▲중성자 빔을 이용한 물성 연구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 ▲방사화 분석 ▲방사선 응용연구 ▲육종 개량 ▲중성자 회절연구 등 원자력 이용기술 개발의 기초를 다지는 데 사용됐다. 트리가 마크-Ⅲ도 비슷한 용도로 쓰였다.
하나로의 열출력은 3만㎾로 트리가 마크-Ⅱ의 300배에 이른다. 하나로는 ▲의료용과 산업용 동위원소 생산 ▲핵연료의 성능시험 ▲원자로의 재료 개발 ▲중성자를 이용한 첨단소재 개발 ▲방사화 분석 등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지난 6월 중성자 유도관을 국산화했다고 밝혔다. 2003년부터 3년간 연구해 만든 것이다. 중성자 유도관은 냉중성자 실험동과 하나로를 연결해서 다양한 중성자 산란 장치를 유도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한다. 중성자 유도관은 2008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성자는 다양하게 활용된다. 전자 현미경, 원자 현미경으로도 볼 수 없는 미시세계를 관찰하는 데 중성자를 사용한다. 중성자는 빛이나 X-선처럼 파동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X-선으로 내부를 볼 수 없는 식물 뿌리가 영양을 흡수하는 과정, 건축 자재에 물이 스미는 현상, 자동차 엔진에서 연료가 분사되는 장면 등을 볼 때 중성자를 사용한다. 생명현상 연구나 신약개발을 위해서, 단백질에서 수소나 물 분자가 어떤 구실을 하고, 어떻게 붙어 있는지 관찰하는 데도 사용된다.
어떤 원소의 동위원소 중에서 방사능을 지니고 있는 것을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한다. 방사능은 방사선을 방출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방사선에는 방사성 원소의 붕괴에 따라 방출되는 입자선(粒子線)과 복사선(輻射線)이 있다. 방사성 동위원소 대부분은 중성자를 써서 만든다.
우주에는 92가지 원소가 있다. 그중 원자번호 84 이상은 방사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에 탄소처럼 원자번호가 낮은 원소들은 인공적으로 핵 내 입자 조성을 변화시켜 방사능을 지닌 불안정한 동위원소를 만들 수 있다. 물질에 중성자를 쪼이면 원자핵의 식구가 늘어 불안정해진다. 불안정한 원자핵이 안정한 상태로 되돌아갈 때 내는 에너지가 방사선이다.
국내 방사성 동위원소 40% 공급 예정
과학자들은 유전자 본체가 DNA라는 사실을 방사성 동위원소인 유황-35와 인-32를 이용해 밝혀냈다. DNA의 복제구조를 해명할 때도 질소-15라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했다. 이는 방사성 동위원소가 지닌 트레이서(추적자) 특성을 활용한 결과다. 물질 속에 방사성 동위원소를 붙이면 그 방사성 동위원소에서 방사선이 나온다. 이 방사선을 측정하면 조사 대상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알 수 있다.
하나로는 요오드-131과 테크네튬-99m 등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를 비롯해 산업용, 연구용 방사성 핵종들을 생산하고 있다. 2010년까지 30여 종 이상을 생산 공급함으로써 국내 방사성 동위원소 수요량의 40%를 충당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국원자력연구소 정문에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일반상대성 이론 ‘E=mc2’(에너지는 질량과 가속도의 제곱을 곱한 것과 같다)를 새긴 구조물이 세워져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원자력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사고 방지방안과 사고 완화 방안, 사고 관리대책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사후에 철저하게 관리한다는 3중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뭐니뭐니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방지. 이를 위해서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위험도 최적 관리 기술’을 개발했다. 연구성과는 ▲위험도 정보활용을 위한 확률론적 안전성평가(PSA) 표준 모델 개발 ▲국내 원전 고유 신뢰도 DB 구축 ▲PSA 수행용 전산 체계인 KIRAP/CONPAS 개발 ▲실시간 위험도 감시 시스템 DynaRM 개발 등이다. 한국원자력연구소는 1997년 2월 루마니아 원자력청 산하 원자력공학기술센터에 연구소가 자체 개발한 안전성 평가 컴퓨터 코드인 ‘키랩(KIRAP·KAERI Integrated Reliability Analysis code Package)’을 무상 제공한 바 있다.
사고 대비한 매뉴얼 작성
만에 하나 사고가 났다면 최선을 다해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중대사고 현상 평가 기술’을 개발했다. 중대사고 위해도(危害度) 완화전략 및 평가 기술을 통한 원전의 안정성 확보를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중대사고 해석용 종합 전산코드(MIDAS/TH) 개발 ▲원자로 하부 용기에서의 노심 용융물 냉각 해석 코드(LLAC) 개발 ▲연소/화염 해석코드(COMFAC) 개발 ▲국제 공동 실험 모의를 통한 MELCOR 모델 개량 및 검증.
마지막으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사고관리에 집중한다. 사고관리를 위해서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실시간 방사선 피폭해석시스템(FADAS) 개발’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원전 수거물의 처리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원자로에서 다 타고난 사용후핵연료(使用後核燃料)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다. 사용후핵연료는 방사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안전하게 처리해야 한다.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사업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았다. 사용후핵연료를 관리하는 방법에는 영구처분과 재처리가 있는데, 영구처분은 안전성 때문에, 재처리는 국제 여건 때문에 채택하지 않고 중간저장을 계획하고 있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보다 안정적인 형태로 만들어 강철 드럼통에 넣어 처분한다.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시험용 아스팔트 고화설비를 가지고 있다. 아스팔트 고화법은 아스팔트를 약 160℃로 예열한 다음 폐기물과 섞어서 폐기물 중의 수분을 제거하고 고화(固化)하는 방법이다.
핵폐기물의 처리 방법 중 최선은 방사성 물질이 붕괴를 계속해 생명을 다하도록 방치하는 것이다. 핵폐기물은 원자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데 전체 폐기물의 70~90%다. 문제는 반감기가 몇만년이 넘는 핵종이 있다는 사실이다.
반감기가 유난히 긴 핵종을 ‘장수명 핵종’이라고 한다. 예컨대 핵분열에 의해 생성된 Tc-99, I-129는 반감기가 21만년, 1600만년이라고 하니 경악할 만하다.따라서 장수명 핵종들은 원자로나 가속기 등을 이용해 소멸시킬 필요가 있어, 각국에서 연구 개발 중이다.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아직 이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다. 장수명 핵종 소멸처리 기술개발은 한국원자력연구소의 대과제 중 하나이다.
2001년 9월6일 제7회 원자력안전의 날을 맞아 ‘원자력안전헌장’이 선포됐다. 이 헌장은 “우리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인식하고, 원자력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국민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존하는 것이 최우선임을 확인하면서…”라는 문구로 시작된다.
한국원자력연구소 연구원들은 이러한 다짐으로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애쓰고 있다.
G5 넘어 톱3로
20기의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2015년까지 모두 26기의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이 원자력발전소들을 통해 40%의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다. 세계는 원자력에 의지해 총 에너지의 10%를 충당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위원회(IPCC)는 향후 전 세계가 원자력으로 총 전력의 27%를 공급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원자력연구소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를 ‘원자력 선진기술 확보기’로 설정하고, 이 기간에 세계 5대 원자력 강국(G5)에 들어가고, 2020년엔 세계 3대 원자력 발전대국이 될 것을 바라고 있다. 꿈은 이루어진다.



















![[밀착취재] 리딩방 70여 명 대부분이 한통속…기망하는 수법까지 매뉴얼화](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48/98/bd/694898bd2399a0a0a0a.jpg)


![[지상중계] 제12회 나지포럼, “북미 정상회담 성과내기 어려워”](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43/48/32/69434832107aa0a0a0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