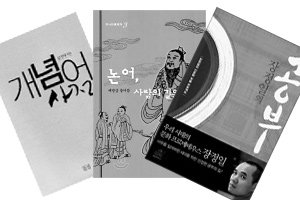
‘촉처통연’의 경지에 이를 날은 언제일까.왼쪽부터 ‘개념어 사전’ ‘논어-사람의 길을 열다’ ‘장정일의 공부’.
其聞夫子之言에 默識心融하여 觸處洞然하여 自有條理라.
공자의 말씀을 들음에 묵묵히 이해되고 마음에 융통하여 닿는 곳마다 막힘이 없고 환하여 스스로 조리가 있었다.(논어 위정 제2)
촉처통연하여 자유조리한 이가 바로 공자가 그토록 아꼈다는 제자 안회다. 안회는 3000명에 이르는 공자의 제자 중에서도 학문과 덕을 고루 갖춰 ‘후생가외(後生可畏)’라는 말이 나오게 한 주인공이기도 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안회가 31세(41세라는 설도 있다)로 요절하자 공자는 “하늘이 나를 버렸다”며 통곡했다고 한다. 어쨌든 우리가 흔히 하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도 안회를 두고 한 말이다.
안회는 이미 20대에 막힘이 없이 트여 환한, 뭘 해도 이치에 딱 맞는 경지에 이르렀다. 그걸 시대의 천재요 성인인 공자가 인정했으니…. 마흔 고개를 넘긴 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다. 촉처통연의 경지가 뭔지 맛이나 보고 눈을 감을 수 있을까 싶다. 그러나 ‘논어’에는 범부들이 위안을 삼을 만한 내용도 많다. 다음은 한문 시험에서 빈 칸 채우기 문제로 자주 나와 아주 친숙한 구절이다.
子曰 吾十有五而志于學하고, 三十而立하고, 四十而不惑하고, 五十而知天命하고, 六十耳順하고, 七十而從心所慾호대 不踰矩라.
무슨 위안이 되느냐고 물을지도 모르겠다. 공자가 “난 서른에 뜻을 세우고, 마흔엔 불혹했거든” 하고 잘난 척하는 대목 아닌가. 영산대 배병삼 교수의 뜻풀이에 따르면 ‘논어’ 위정편은 ‘나는 이렇게 살았노라’라고 한다.
거꾸로 생각해보니 답이 나왔다. 공자 같은 성인군자가 아닌 이상 웬만한 사람은 마흔에 사리에 어긋나지 않기 어렵고, 쉰에 천명을 알기도 어렵고, 예순에 이르러도 이순(耳順·귀로 들으면 그대로 이해됨)하기는 더더욱 어려우니, 다만 그리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이라도 하라는 뜻 아니겠는가. 나이가 찼다고 저절로 ‘종심소욕 불유구’가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다.
‘중용’은 앎을 3단계로 설명한다. 사람이 나면서부터 도를 아는 것을 생지(生知)라 하고, 배운 뒤 비로소 아는 것이 학지(學知), 배워도 알지 못하고 경험을 쌓고 애써서 비로소 아는 것이 곤지(困知)다. 웬만한 해설서들은 ‘타고난 능력에 다름은 있으나 한번 알고 나면 다를 바 없다는 뜻’이라고 풀이하지만, 이 또한 필부들을 위로하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 적어도 ‘생지’는 공자 정도는 돼야 말할 자격이 있고, 웬만해서는 ‘학지’도 언감생심, 나 같은 사람은 ‘곤지’에라도 이르면 다행이기에.
중용은 사람이 성실해서 도를 얻으려면 널리 배우고(博學), 자세히 묻고(審問), 조심스럽게 생각하고(愼思), 분명하게 판별하고(明辯), 독실하게 행하는 것(篤行), 이렇게 다섯 가지 덕목이 필요하다고 했다. 범부는 이렇게 배우고자 죽도록 힘을 쏟으면 겨우 ‘곤지’ 쯤은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평생 공부를 해야 하는 모양이다.
‘공부하는 시인’이 돌아왔다
시인 장정일이 ‘공부’(랜덤하우스)라는 책을 썼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마흔 넘어 새삼 공부를 하게 된 이유는 우선 내 무지를 밝혀내기 위해서다. 극단으로 가기 위해, 확실하게 편들기 위해, 진짜 중용을 찾기 위해!”
그는 중용이 본래 칼날 위에 서는 것이라지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은 사유와 고민의 산물이 아니라, 그저 아무것도 아는 게 없음을 뜻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는 무지의 중용을 빙자한 지긋지긋한 ‘양비론(兩非論)의 천사’가 너무 많단다.
맞다. 무지에서 벗어나려면 공부해야 한다. 그가 공부한 내용을 사람별로 모으면 박노자, 송시열, 다치바나 다카시, 마르크 블로크, 이종오, 고미숙, 시마자키 도손, 모차르트, 조봉암, 바그너, 촘스키, 오이디푸스, 엘리자베스1세 등등. 이쯤해서 뭘 공부했는지 감이 잡히는가?
‘장정일의 공부’라는 새로운 제목을 붙이고 띠지에는 ‘우리 시대 독서광 장정일이 사회를 향해 던지는 지적 반성문’이라는 광고문구로 호기심을 자극하지만, 사실 이 책은 성실하게 쓴 독서일기다. 기존의 책읽기 책들이 특정 책을 골라 내용을 소개하고 저자의 주관적 감상을 덧붙이는 수준이었다면, 장정일은 한 권의 책에서 시작했든, 하나의 주제로 시작했든 그와 관련된 지식들을 매트릭스처럼 엮어 독자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다.
이덕일의 ‘송시열과 그들의 나라’(김영사)를 읽으며 인조반정은 잘못된 쿠데타였다는 주장에 손을 들어주더니, 군약신강의 문치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이승만·박정희와 같은 독재자를 갈망하게 된 것은 아닌지 묻고, 송시열의 북벌론이 허구이듯 우리나라 보수우익이 국부로 떠받드는 이승만의 북진통일론도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몰아붙인다. 결론은 다음과 같은 ‘한국 주류의 기원’에 대한 자문자답.
“오늘까지도 일제와 영합했던 서인 계열의 척족들이 일부 기업의 대주주가 되어 있다는 현실은 권력과 부에 대한 한국인들의 불신과 혐오의 근원을 짐작케 한다.”(김인호·박훤, ‘우리가 정말 몰랐던 조선 이야기2’)
‘장정일의 공부’ 주제는 봉건성과 국가주의, 교양, 근대의 신화로서 민족주의, 이광수의 변절, 성공한 파시즘의 나라 일본, 미국 극우파, 모차르트와 영재교육, 역사의 종언과 과두제, 레드콤플렉스, 나치 근대화론, 시오니즘, 조봉암과 이승만 등 럭비공처럼 튄다. 독자에게 생각할 거리를 툭툭 던져주는 형식이다.
그래서 책 전체가 정리가 덜 끝난 상태의 노트를 보는 것 같다. 저자도 이 점을 인정한다. 이미 서문에서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공부의 내용들은 그야말로 하나의 시안에 불과하고,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으며 “원래 공부란 ‘내가 조금 하고’ 그 다음에는 ‘당신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내가 다 하면 당신이 할 게 뭐 남아 있느냐”고 너스레도 떤다. 밉지 않다. 밥벌이의 지루함에 빠진 사람들에게 이 정도의 지적 자극이면 충분하다.
백과사전적 지식인이 쓴 사전
‘장정일의 공부’가 산만한 필기노트였다면 자신의 공부 이력을 사전식으로 일목요연하게 보여준 책이 있다. 남경태의 ‘개념어 사전’(들녘)이다. 남경태란 이름은 주로 인문사회과학 책의 번역자로 알려졌지만 ‘종횡무진 한국사’ ‘종횡무진 서양사’ ‘종횡무진 동양사’ 의 저자이기도 하다. 특히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동서양의 역사를 동시에 정리한 ‘트라이앵글 세계사’에서 남경태는 백과사전적 지식인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그가 ‘고삐 풀린 망아지가 종횡무진 초원을 누비듯이’(저자의 표현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지적 세계 속에서 좌충우돌하며 겪고 부딪힌 개념들을 정리해 ‘사전’이라는 제목으로 펴냈다. 이 상품의 취급 주의사항 중 하나는 사전이라는 말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것. 각 개념의 사전적 정의는 없다. 사실 설명보다는 주장에 가까운 내용이 많다. 지극히 주관적으로 쓴 용어풀이라면 적당하다.
‘가상현실’이라는 첫 번째 개념을 어떻게 설명했나 보자. 1991년 미국이 주도한 걸프전쟁은 한마디로 ‘가상전쟁’이다. 불과 42일 만에 15만명의 목숨을 앗아갔지만 전쟁에서 병사들은 컴퓨터 화면의 가상 이미지와 싸웠을 뿐이다. 여기서 이미지는 시뮬라크르(모방)라는 프랑스 철학자 보드리야르의 말이 인용되고, 사이버 스페이스라는 말이 1980년대 윌리엄 깁슨의 SF소설 ‘뉴로맨서’에서 나왔다는 것도 놓쳐선 안 된다. 장자의 호접몽(胡蝶夢)도 슬그머니 끼어든다.
이 책 역시 ‘열린 상태’로 독자를 맞는다. 저자는 “특정한 개념어에 관해 지은이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독자는 스스로 그 개념어에 관한 또 다른 시안을 구성해보는 것도 무척 흥미로울 것”이라며 슬쩍 공을 독자에게 넘긴다. 그래서 두 책의 가치는 ‘완성’이 아니라 ‘시도’에 있다. 열심히 공부한 흔적을 이런 식으로 남길 수 있음을 보여준 셈이다.
올해는 나도 공부 흔적을 남겨볼까? ‘중용’의 한 구절이 떠오른다. 人一能之어든 己百之하며 人十能之어든 己千之라. 남이 한 번에 능하거든 나는 백 번을 하며 남이 열 번에 능하거든 나는 천 번을 하라. 이것이 ‘곤지(困知)’가 아니겠는가.



















![[밀착취재] 리딩방 70여 명 대부분이 한통속…기망하는 수법까지 매뉴얼화](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48/98/bd/694898bd2399a0a0a0a.jpg)


![[지상중계] 제12회 나지포럼, “북미 정상회담 성과내기 어려워”](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43/48/32/69434832107aa0a0a0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