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롱나무 꽃 대궐로 이름난 명옥헌은 호남고속도로 창평나들목을 나오면 쉽게 찾아갈 수 있다. 물론 담양에서 광주호로 가는 국도에도 표지판이 나온다.
정말이지, 나는 그때까지 배롱나무가 뭔지 몰랐다. 배롱나무가 나무 백일홍의 본래 이름이란 사실은 더더욱 몰랐다. 어릴 때 내가 살던 곳에서는 도무지 이 말이 없었던 탓이고, 훨씬 뒷날에 더러 배롱나무란 표기를 보면서도 이런 나무가 따로 있는가보다, 하고 그냥 무심히 지나쳐왔다.
배롱나무뿐인가. 그 사이 여러 차례 소쇄원을 다녀오면서도 나는 명옥헌을 몰랐다. 사람들이 소쇄원이 있는 줄 몰라 턱없이 한적하던 때, 소쇄원 제월당 시원한 마루에서 낮잠까지 한숨 자고 나오던 때에도 이 정원은 그냥 스쳐 지나가기만 했던 것이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길가 간판 하나를 보곤 불현듯 길을 달리해 명옥헌을 찾아갔다. 그곳이 배롱나무 꽃 천지일 줄이야! 야산을 넘고 논 가장자리를 돌아 다다른 작은 마을. 아름드리 느티나무가 늘어뜨린 그늘에 차를 세웠다. 사과나무 이파리마다 뽀얀 소독약을 묻히고 있는 과수원의 옆길을 따라 걸을 때에도 햇살은 따가웠다. 여름이었다. 옥수수 밭이 있는 둔덕을 넘어서자 아연 연분홍 꽃의 세상. 명옥헌이 자리한 딴 세상이 그렇게 골 안에 펼쳐져 있었다.
배롱나무 꽃들의 세상
정원을 만들고 다듬은 이의 고요하고도 사치스러운 심성이 쉬 손에 잡히는 듯했다. 가지마다 꽃등을 단 커다란 배롱나무들이 둘러선 연못은 사람의 손길을 오래 맞지 않은 듯 규모에 걸맞지 않게 태고의 적막 같은 것도 거느리고 있었다. 이런 연못이 아래 위 둘이나 있는데 가운데 통행로를 지나면 마루 높은 정자 한 채가 오도카니 바위덩이를 올라타고 있다.
정자 마루에 앉아 흐드러지게 핀 배롱나무 꽃무리와 그 사이로 비치는 초록 물빛을 보고 있으려니 나도 모르게 탄식이 나왔다. 좋아라, 옛사람이여. 아침저녁으로는 짧은 낚싯대 하나 들고 물가에 앉아 분분히 수면에 떨어지는 꽃잎이나 희롱하고, 소나기 내리고 천둥 우는 때는 정자 마루에 비스듬히 드러누워 골에 피는 물안개나 지켜보면 그만, 그밖에 달리 탐하고 샘낼 것이 무엇 있으랴.
꽃의 헌사로움과 물의 적요가 소리 없이 어우러져 절묘한 풍광 하나 빚어내는 데가 곧 명옥헌이다. 그런 탓에 한 다감한 시인이 ‘완전한 사랑’을 운위하며 자못 위험스레 ‘목마름의 절벽’과 ‘산산이 깨어지는 물방울’을 부르고 있어도 그 계절, 그 꽃등 아래를 걸었던 이로서는 십분 그 감정에 동참하고 싶기도 한 것이다.
생이 아름다운 때가 있다면
필시 저런 모습일 게다.
(중략)
완전한 사랑이란 이를테면 그
소나기 같은 것일 게야
목마름의 절벽에서 비류직하(飛流直下) 하며
산산이 깨어지는 물방울
몸과 마음의 경계를 깨끗이 지우는 일
몸도 잊어버리고 몸이 돌아갈 집도 다 잊어버리고
그게 우수수 목숨 지는 것인 줄 다 알면서도
여름 내내 명옥헌 꽃 지는 배롱나무
여자의 환한 눈물이 그렁그렁하다.
- 이지엽 시 ‘배롱나무 꽃그늘 아래’ 부분
배롱나무의 작은 꽃들은 다투듯 계속피고지고 해서 그렇게 가을이 무르익어갈 때까지 핀다고 한다. 담양 현지에서는 배롱나무를 ‘쌀밥나무’라고 더 많이 부르는데 쌀밥나무가 초복에 한 번 피고 중복에 두 번 피고 말복에 세 번 피면 나락이 팬다는 말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그 나무의 ‘쌀밥’이 ‘여자의 환한 눈물’로 바뀌는 자리가 곧 현실의 눈과 시의 시선이 교차하는 자리임도 여기서 새삼 확인할 수 있다.
조선 중기의 문신 명곡 오희도가 외가가 있는 이곳에 와서 독서하던 것을 기려 그의 넷째 아들 오이정이 정자를 세우고 연못을 파서 별장으로 꾸민 것이 명옥헌으로 전해진다.
송강정과 면앙정
어렸을 때, 저는 선조 문정공 송강 선생 연보와 유고(遺稿) 등을 손을 씻고 읽었습니다. 그 뒤에 비로소 송강정이 담양 땅에 있다는 것과 숙정사라는 시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계(牛溪·성혼) 선생 유집을 읽다가 ‘차송강운(次松江韻)’이라는 시가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 뒤로는 밤낮으로 몇 번씩 되풀이하여 읽고 감모하는 마음이 갈수록 새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한 번 송강정에 올라가서 우리 선조의 자취를 찾을 수 있을까, 하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분이 말씀하시기를 정자가 없어진 지가 이미 오래되어, 무덤들만 빽빽이 들어앉아 볼만한 것이 없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약관이 되었던 어느 하루, 저는 불현듯 그곳에 가고 싶어 혼자 찾아 나섰습니다. 현지에 사는 토박이 노인에게서 정자가 있었다는 곳을 알아서 그곳에 올라가 사방을 보니 높직한 언덕이 있는데, 공동묘지가 다 된 땅에 깨어진 주춧돌과 무너진 담의 흔적만이 남아 있고, 황량한 들에 잡초만이 우거져 있어서 어디에 정자가 있었는지 분간할 길이 없었습니다….
송강 정철의 6대손 정재가 적어놓은 ‘송강정 중수기(松江亭重修記)’의 앞부분을 우리말로 옮겨 적어보았다. 참 착한 후손이다. 새카만 윗대 어른의 유고를 읽을 적에는 항상 손을 깨끗이 씻었다지 않는가. 그런 경신한 마음이 있었기에 폐허에 새로 정자를 일으켜 세울 수도 있었다. 송강이 세상을 떠난 지 200년 뒤의 일이다.
송강정을 보기 위해서는 광주에서 담양으로 직접 가다가 들르거나 담양에서 광주 쪽으로 나오면서 찾아야 한다. 면앙정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으니 둘을 함께 묶어 봄이 좋다. 즉, 담양읍에서 봉산면으로 가다가 먼저 면앙정에 올라본 뒤, 그 산 아래 길을 직진해서 유산교 큰 다리를 건너면 곧바로 송강정에 이를 수 있다. 국립 5·18민주묘지가 여기서 멀지 않다.
선조 17년 정철은 대사헌이 되었으나 다음해 동인의 탄핵을 받아 사직했다. 그 후 어린 시절을 보낸 이곳 창평(昌平)으로 돌아와 4년 동안 은거한다. 꽤 먼 길이긴 하나 그는 이곳에서 식영정을 오가며 ‘사미인곡’ ‘속미인곡’ 같은 가사와 시조를 짓기도 했다.
가파른 층계를 올라가면 노송과 참대를 두르고 앉아 있는 정자를 만날 수 있다. 전면과 양쪽이 마루이고 가운데 칸에 방을 배치했다. 정각 옆에는 1955년에 건립했다는 ‘사미인곡’ 시비가 서 있으며, 현재의 건물 역시 그때 중수한 것이다. 정각 앞으로는 너른 들판이 펼쳐져 있고 멀리 무등산이 바라다보인다.
면앙정은 담양군 봉산면 제월봉 등성이에서 ‘강쟁리 뜰’이라고 부르는 너른 들을 내려다보고 있다. 송강정과 마찬가지로 곳곳에 안내판이 붙어 있긴 하지만 도중에 샛길이 많아서 혼란스러운 경우가 없지 않다.
초입부터 층계길이 가파르고 아득해서 다리 힘 약한 이들을 쉬 낙담시키기도 하지만 막상 오르고 보면 그렇게 힘든 길은 아니다. 대숲을 지나는 바람소리를 들을 수 있고, 돌이끼와 야생화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길은 광주호 주변의 정자들과는 달리 사시사철 찾는 이가 드물어 한적하다. 기이함과 요란스러움은 없어도 정자 주변의 풍치가 그윽하고, 정자에서 바라는 조망이 상쾌하다. 이 덕에 학생들과 더불어 이 지역을 답사하는 때면 나는 차라리 소쇄원은 건너뛸지언정 면앙정을 빠뜨리는 법이 없다.
측면과 좌우로 마루를 두르고 가운데 두 사람 겨우 누울 만한 작은 방 하나를 배치한 정자는 바라보기에도 질박한데 마루에 걸터앉기만 해도 절로 한숨이 나올 정도로 편안하다. 낯선 이가 없다 싶으면 내 학생들마저 염치 불고하고 양말을 벗고 마루에 드러눕던 까닭도 거기에 있었다.
이 정자는 중종 28년(1533년) 송순이 건립했는데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기와채가 아닌 초정(草亭)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액(詩額)도 걸려 있듯이, 안동의 퇴계 또한 이곳에 온 적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걸음을 했는지는 모를 일이다. 사림(士林) 가운데서도 구파에 속해 이황과 같은 신진 사류(士類)와는 대립각을 세웠던 송순이기에 그런 생각도 해본다.
내로라하는 명사들이 읊었다는 시들을 적어놓은 편액들이 곳곳에 걸려 있지만 그것들을 쳐다보면 무엇하랴. 한가롭던 시대, 새소리 바람소리밖에 들리지 않는 산언덕 정자 마루에 드러누워 꿈결처럼 펼쳐진 들판과 그 너머의 아득한 산자락들을 바라보며 목구멍 안에서 저절로 생겨 나오는 시가를 중얼거릴 수 있는 옛 사람의 한유와 안일을 더듬어 느끼는 것만으로도 면앙정을 찾아온 복됨이 있다.
물 위의 서늘한 바람이야 그칠 줄 모르는구나.
인간 세상을 떠나와도 내 몸이 한가로울 겨를이 없다.
이것도 보려 하고, 저것도 들으려 하고 바람도 쏘이려 하고 달도 맞으려 하니, 밤은 언제 줍고 고기는 언제 낚으며, 사립문은 누가 닫으며, 떨어진 꽃은 누가 쓸 것인가?
술이 익었거니 벗이 없을 것인가.
노래를 부르게 하며, 악기를 타게 하며, 곡조를 흔들게 하며 온갖 아름다운 소리로 취흥을 재촉하니, 근심이라 있으며 시름이라 붙었으랴.
- 송순 ‘면앙정가’ 부분
|
오늘을 사는 이의 삐딱한 눈으로 볼라치면 이 가사도 당대 지배계층의 턱없이 사치스러운 감상의 토로에 지나지 않는다. 자신은 소나무 아래 굽은 길을 가면서도 가마를 타는데, 가마꾼의 헉헉대는 숨소리와 비지땀은 아랑곳없다. 종들이 다 모 내고 타작해서 곡식을 지고 오니 근심이며 시름인들 있겠는가. 기생이며 악동을 불러 풍악이나 잡히게 하고 자신은 벗들과 더불어 잘 익은 술이나 마시며 시를 읊으면 그만이다. 한데 면앙정에 앉아서까지 굳이 그런 까탈을 부릴 일은 아니다. 그의 세상과 우리의 세상이 다르거늘 어찌 그들더러 지금의 옷을 입어라 할 수 있겠는가. 면앙정에서는 정자도, 그곳을 거친 인물도, 심지어 그들의 작품마저 자연을 품으려는 문화 현상 자체로 보면 그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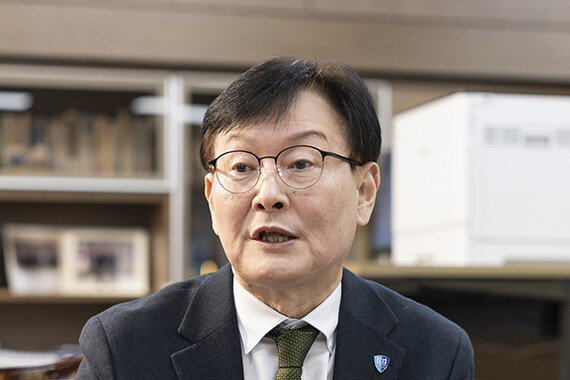


![[밀착취재] 리딩방 70여 명 대부분이 한통속…기망하는 수법까지 매뉴얼화](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48/98/bd/694898bd2399a0a0a0a.jpg)


![[지상중계] 제12회 나지포럼, “북미 정상회담 성과내기 어려워”](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43/48/32/69434832107aa0a0a0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