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년 전부터 당뇨병을 앓아온 최모(31·자영업)씨는 한 달 전 새로 산 신발을 신다가 오른발 뒤꿈치에 물집이 잡혔으나 보통 사람들이 그러하듯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뒤꿈치에 고름이 나오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소독만으로 치료를 대신해왔다. 결국 걷기조차 힘든 상태가 되어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병원을 찾았다.
진단 결과 최씨의 발뒤꿈치는 살이 썩어들어가는 괴사상태였다. 이를 치료하기 위해 제일 먼저 괴사 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고 광범위하게 작용하는 항생제를 처방 받았다. 이 외에도 인슐린을 하루에 2회 투여받으며 혈당을 철저하게 조절했다. 그 결과 4주 후에 발궤양이 어느 정도 좋아지고 염증도 호전되어 입원 석 달 만에 무사히 퇴원할 수 있었다.
당뇨병 환자는 피부에 상처가 생기면 잘 아물지 않고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특히 발에 상처가 생기면 진행 속도가 매우 빨라 궤양이나 괴사로 넘어가고 결국에는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끔찍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 이를 당뇨병성 발병변이라 한다. 해외 연구결과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가 평생 발에 상처가 생겨 고통을 겪을 확률은 약 15%라고 한다. 이를 입증하듯 당뇨병 환자의 가장 흔한 입원 원인 또한 발에 생기는 문제인 것으로 밝혀졌다(약 40%). 이 밖에도 불의의 사고 등으로 다친 경우를 제외하면 하지 절단의 50%가 당뇨병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하지 절단 수술을 받은 환자의 반수가 약 1년 내에 유명을 달리한다는 점이다.

당뇨병 발병변이 생긴 환자의 발 모습(맨 위). 치료를 하면 차차 괴사조직이 살아나면서 정상으로 돌아온다(아래).
꼼꼼한 검진, 생활습관 교정
대개 당뇨병성 발병변이 발생하면 상처 부위에 염증이 생겨 발이 붓고, 붉게 변한다. 냄새가 나고 고름이 나올 정도로 상처가 심해도 막상 환자는 모르고 넘어가는 수가 많다. 발에 통증을 거의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초기에 서둘러 치료받지 않으면 상처 부위가 퍼지면서 열이 나고, 골수염, 패혈증을 일으킨다. 심한 경우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당뇨병성 발병변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환자들은 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 진단받을 수 있다. 우선 신경병증은 모노필라멘트나 핀을 이용해 촉각 및 냉온 감각을 검진한다. 팽팽한 낚싯줄처럼 생긴 모노 필라멘트나 핀을 이용해 발 부위를 콕콕 찔러보고 감각을 느끼는 정도를 파악하는 검진이다. 좀더 자세한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생리학적 검사를 시행한다. 발등의 맥박을 짚어보는 것만으로도 혈액의 흐름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좀더 정밀한 방법으로는 발목 수축기 혈압 측정, 도플러 초음파, 3차원적 컴퓨터 토모그램을 이용한 하지혈관 촬영 등이 있다.
당뇨병성 발병변을 예방하려면 우선 생활습관을 점검해봐야 한다. 혈액 순환이 잘 되도록 담배를 피우지 말고, 다리를 꼬는 습관을 고친다. 너무 꽉 끼는 양말이나 신발을 신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신발을 신을 때에는 안에 돌이나 이물질이 들어 있는지 매번 확인한다. 맨발로 다니지 않으며, 양말은 면으로 된 것을 고른다. 신발 굽은 1인치가 넘지 않는 것이 좋고 볼이 좁은 것은 피한다. 당뇨병 환자는 말초신경병증 등으로 하지의 감각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뜨거운 전기장판이나 온돌 바닥에 양반다리로 오래 앉아 있지 않도록 하고, 뜨거운 물에 손이나 발을 담그지 않는다.
다리 구하려 생명 버리는 일 없어야
발가락이나 발톱의 아주 작은 상처, 티눈이나 발뒤꿈치의 굳은살도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절대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 발톱은 너무 깊게 깎지 않도록 하고 일직선으로 깎아 엄지발톱이 발가락 살을 파고들어가는 것을 예방한다. 무좀이 있다면 조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티눈제거제를 함부로 사용하거나 굳은살을 함부로 깎아내면 안 된다. 발뒤꿈치가 갈라지지 않도록 유연제를 자주 발라주고, 상처가 나면 조기에 치료를 받는다.
당뇨병 환자에게 좋은 운동 중 하나가 바로 ‘걷기’다. 그러나 당뇨병성 발 병변의 위험이 높은 환자라면 한번에 오랜 시간 걷기보다 조금씩 여러 차례로 나누어 걷기 운동을 한다. 이미 발에 상처가 있거나, 발이 변형된 경우에는 걷기보다 자전거 타기처럼 앞다리를 이용한 운동을 하도록 한다.
일단 발병변이 생긴 경우에는 우선 인슐린 치료를 통한 혈당의 엄격한 조절 및 적극적인 항생제 투여, 적절한 영양상태의 유지, 병변 부위의 전문적 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미 상처가 크게 번져 절단이 불가피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았지만 심한 패혈증으로 진전된 경우, 교정이 불가능한 발 변형이 함께 온 경우, 약물로도 줄지 않는 심한 통증이 있는 경우, 상처가 심해 보존적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발의 말초혈관이 막혀 발의 조직이 죽은 경우가 바로 그런 상황이다.
그러나 의사로부터 절단을 권고받게 되면 대부분의 환자가 장애인이 된다는 절망에 빠져 생명이 위태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거부부터 하고 본다. 발도 소중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환자 자신의 생명이다. 최근에는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무리가 없을 만큼 재활, 보조기 기술이 크게 발전됐으므로 환자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예전과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러니 무조건적인 수술 거부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우는 절대 범하지 말아야 한다.
| 李亨雨 |
| 현재 영남대 의대 내과 교수, 내분비 대사내과분과장으로 재직 중이다. 미국당뇨병학회 회원, 유럽당뇨병학회 회원이며 대한당뇨병학회 대구경북지회장, 평의원, 간행위원, 대한내분비학회 대구경북지회장, 평의원, 대한내과학회 고시위원 등 학술 및 연구와 관련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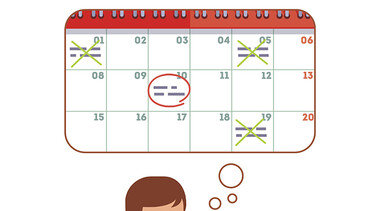


![[지상중계] 제12회 나지포럼, “북미 정상회담 성과내기 어려워”](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43/48/32/69434832107aa0a0a0a.jpg)
